#왕정
Explore tagged Tumblr posts
Text
가난한 사랑 노래
오늘은 7시에 용산에서 있던 세미나에 가고 싶었다. 발제문을 받고 대충 훑어 보았어도, 내가 알 필요가 있는 것들이었다
1918년 11월 – 1919년 1월 독일혁명
독일혁명은 1918년 11월 독일 항구도시 키엘의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키며 시작됐다. 키엘에서 시작된 혁명은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몇백 년 동안 통치해왔으며, 반세기 동안 독일 전체를 지배해왔던 프로이센 왕정(독일제국)이 단 며칠 만에 무너져버렸다.
--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독일 정치인들과 군 지휘관들은 전쟁이 몇 개월 내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쟁은 1918년 11월 독일혁명으로 종료될 때까지 4년이나 지속됐다(독일 혁명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반전 평화 운동이었다).
1916년 말에 고기 배급량은 전쟁 전 평균량의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 참기 어려운 것은 물질적 상태만이 아니었다. 수백만 노동자들이 징집되어 전선으로 보내졌다. 도시에 남은 사람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에 국가로부터 얻어낸 빈약한 시민권들이 전시의 반(反)정부 선동 규제법 때문에 박탈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수백만 남성이 군대로 징집되었기에 산업노동인력은 여성들로 대체됐다. 1916년의 산업노동인력은 430만 명의 여성과 470만 명의 남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전시의 누적된 영향은 노동계급 조직들에게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잠재력을 부여했다. 정부의 포고령으로 소규모 공장은 폐쇄되었으며, 가장 크고 효율적인 현대적 공장으로 생산이 집중됐다. 전쟁은 조직노동자들을 결속시킨 많은 연결고리들을 파괴했지만, 동시에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대규모의 생산단위로 노동계급을 집중시켰다. 또한 생활과 근로조건 등의 내적 차이를 없애고 새로운 균일성을 부여했다(모두가 가난해졌다). 전쟁 초기의 ‘전쟁 지지’, ‘애국주의’ 열광이 사라지면서 소수 노동자들 사이에서 전쟁 결과에 대한 분노가 일기 시작했다. 굶주림은 특히 여성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
아름다운 사람들은 사회와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진다
타인의 먹고 삶에, 그들이 왜, 어떠한 빈곤함을 가지는지
그들이 어떤 슬픔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불공평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 그 이유에 대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지지와 지반에 대해 궁금해 ���다.
나는 그러한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언제나 명쾌하다. 공부한다. 술을 마시고 취해 혼미한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눈이 빛난다. 꿈이 있기 때문이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러한 이유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아름다움, 꿈, 공상, 예술이 아니라
처절한 현실, 사실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그 현실과 사실에 대한 깊은 사유가 없는 공부란
공부가 아니라는 것에 내 손모가지를 건다.
1 note
·
View note
Text
개인, 개인성, 개인주의 (3/4)
Gesellschaftsstruktur und Semantik, Band 3. Niklas Luhmann
번역 – 조은하, 박상우
Ⅶ.
1800년경 주체성과 개인성의 개념적 전통을 결합할 때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 개인적 주체는 사회성의 부족한 양식은 아니다. 그와는 달리 주체는 넉넉함과 풍부함을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내적 세계와 향상 능력을 표현한다고 간주되었다. 게다가 취향의 판단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사회의 상층에서의 언급 그룹으로서 타자를 향한 시선들은 반성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것은 마치 저절로 그런 것처럼, 그들이 스스로에게 초월적 확실성을 제공할 때 타자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 시선을 제공한다. 하나의 역사적 순간에서, 배제와 포섭이 ‘신성한’ 개인 안에서 함께 생겨나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이런 이행을 해방으로 그리고 동시에 (자기-통치의) ‘국가’ 안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경험한다.[1] 고독을 인식하는 방식의 연속성은 없다. 그것은 오랜 동안 사회에 대한 반-개념으로 생각되었다. 만일 세계가 아니라면, 사회로부터 주체로서 ‘개인’을 떼어내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고독의 개념은 특별히 이런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성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고독은 사회적 접촉의 부재로서 이해되어 왔다. 사회와 사회성 사이에는 어떤 구별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개인은 어느 정도까지는 유쾌한 상호작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또한 사회로부터 그럴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또한 궁정에서 금지되는 것으로 통해 쫓겨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초기 견해에 따르면 이는 단지 잘못된 삶의 방식, 혹은 자연의 위반이었다. 고독한 삶은 불완전한 것으로 고려되고, 개인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2] 17세기는 여전히 고독을 다시 세계의 유혹에 대한 일종의 도덕적 방어로 생각했고, 또한 animal sociale의 진정한 본성에서의 일탈로 생각했다.[3] “La solitude nous imprime jene sais quoi de funeste” (고독은 우리를 희미한 절망의 개념으로 나타낸다)고 Saint-Evermonde는 쓰고 있다. 그는 그 자신이 이것을 경험했었다.[4] 고독은 우울함과 연결되었다.[5] 그리고 다시 한번 평정심을 가지고 고독을 견디는 능력은, 누군가를 독립적으로 만드는 정치적 미덕의 하나다.[6] 종교적 금욕주의와의 연결 혹은 미덕의 옹호는 18세기로의 이행기 동안에 줄어들었고, 고독과 사회성 사이의 차이의 주제에 대한 격화도 그러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이 주제는 여전히 도덕적 도식을 통해서 통제 하에 있을 수 있었다. 앞서의 전통을 여전히 따르는 Marquis d’Argens는, 고독이 인간 존재를 내적 공허에 노출시켜, 그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썼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쁜 동료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이 공허함을 견디는 것이 나은 일이다. 단지 좋은 동료들만이 고독을 넘어 선호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단지 좋은 동료만이 그들로부터 개인에게 제공하는 사회성을 사용하기 때문이다.[7] 따라서 불안한, 자기-발생적 개인들의 새로운 인간학은, 도덕적 평가들 그리고 그것에 조응해서 인식되는 사회적 조건들을 쫓아내지 않는다. 단지 그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낸다. 18세기말까지도, 여전히 극적 과장을 통해서 사회에 맞서 고독의 균형을 유지하는 문학적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8] Kant의 ‘ungesellige Geselligkeit’ (비사회적 사회성)은 가장 적은 어떤 것조차 바꾸지 않았다. 이런 관점을 전환하는 것(그러나 여전히 같은 도식 안에서)은 오직 Valéry다. ‘Un homme seul est toujours en mauvaise compagnie’ (고독한 남자는 언제나 나쁜 동료들과 함께 있다)[9] 그렇지만 이런 반전은, 단지 도덕적 도식이 더 이상 이 문제의 정식화를 이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고독이라는 주제가 사라진다. 주체 이론은, 그것이 개인성에 대한 관심을 떠맡고,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 특성화 된다. 주제는 더 이상 고독과 사회성 사이의 차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주체로서, ‘개인’은 고독하지 않다. 그리고 그와 나란히 현대 사회에서 이제 가시적이 되는 것은 사회성의 특성을 잃었다. 고독의, 혼자 살아간다는 현상은 이제 누군가의 전기적 내용으로 귀속되고 예를 들어 수줍음, 전형적인 ���정 나이의 현상 혹은 억매이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 등으로 해석된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환경에 의존해서, 사람들은 사회정치적 개입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혹은 어떻게 ‘혼자 있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가를 탐색한다.[10] 이런 상황에서 의미의 새로운 창조를 이끄는, 그리고 새로운 형식에서 ‘개인’ 개념을 통합하는 ‘주체’에 대한 고도의 시맨틱은 두 가지 사건의 발생, 즉 칸트주의 철학의 도래와 프랑스 혁명에서 발생한다. 의식의 초월성 가설을 통해, 즉 실증적 의미와 초월적 의미 사이에 차이를 가지고, 칸트주의 철학은 새로운 기반에 인식론과 실천 철학을 놓는다. 그래서 개인은 그들 자신의 내부의 보장을 통해 (그리고 더 이상 소유가 아니라), 즉 자신의 의식 속에 나타나는 세계를 통해 스스로를 성립하는 주체로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은 사회적 질서 (자유, 재산의 소유권, 억압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일반적 가정의 인식을 이끌었고, 그것은 다시 ‘개인’을 사회가 무엇과 같이 보여야 하는 지를 위한 모델로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스스로를 주장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모든 관심이 자유로워지고 동등한 무게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카오스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언급되는 개인이, 더 이상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통해, 그들의 사회적 계층에 따라 규정되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개인적 능력의 착취를 보장하는 사회는 더 이상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총체로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한 가지에 대해서, 새로운 종류의 정치적 도덕주의가 이 지점에서 형성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가능한 수단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에게 부여했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서, (프랑스의) 왕정 복고기는 자유를 제도화할 수 있는, 혹은 개인성의 제도화라고 거의 말할 수 있는 것의 새로운 형식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실제적 의미는 정치적으로 비결정 상태로 남아 있을 필요가 있다. 독일 관념론은 이에 조응하는 철학적 정식화를 제공한다. ‘개인’은, 자아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의식하게 되고, 인간 존재로서 실현되는, 세계에 대한 ‘일회성’의 고유한 관계로 이해된다. 세계 (혹은 사회적 관점에서 인류)는 정확하게 ‘개인’ 안에서 ‘자동적으로’ 재현되는 것이다. 그 때부터 ‘개인’을 전체의 일부분, 사회의 일 부분으로 이해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개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건, 이 과정에서 사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든, 그것의 위치는 자신 안에 그리고 사회의 밖에 위치한다. ‘주체’라는 정식은 이 이상 어떤 것도 상징화 하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개인’이 모든 기능 시스템 밖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에 참여할 수도, 그것을 구성할 수도 없다. 그것은 더 이상 Kierkegaard가 Hegel에 맞서 주장하게 될 것처럼, ‘객관적 정신’이나, 혹은 정치체의 기능 기관 안에서 나타날 수 없고, 확실힌 재산 소유나 노동의 기반 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기능 시스템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모든 포섭은, 사회적 시스템에 ‘개인’의 유기체적/심리적 환경에 대한 통합으로서, 기능 시스템의 구조 안에서 재배열되야만 한다. ‘대표’, ‘참여’, 민주주의’ 등등과 같은 낡은 개념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 사용되야만 하면서부터, 그들은 전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개념은, 무엇보다 칸트주의 철학의 기초를 형성했던 복합성 배열의 새로운 형태에 그 참신함을 빚지고 있다. 비록 그것이 정당화를 위한 철학적 수단이 부족함에도. ‘복합성’은 ‘다양성’의 통일체를 위해서 사용된다. 복합성은 ‘다양성의 통일’을 지시하는 개념이다. 칸트주의 철학은 다양성은 주어진 것이지만, 반대로 통일체는 창조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한다.[11] 만일 이것이 모든 통일체에 적용되면, 즉 어떤 것도 그 스스로에 따라 통일체일 수 없다면, 어떤 것도 자연적으로 통일체이지 않다. 이런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그래서 누군가 자연 부여된 동일성의 관념을 포기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인간 존재가 다른 실체들이 그렇듯, 본성상 육체와 영혼에 의해서 개인화 되어 있다는 관념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인간 존재와 다른 개별체들이 최소한의 공통 특징만을 부여받았고, 그래서 비교 가능한 기반에 대한 개념적 지반은 없다. 그 장소에, 초월적 의식 안에서 개별화된 정체를 구성하는 과정이 들어선다. 초월적 의식에 접근 가능한 어떤 조건 아래서, 이것은 성취된 모든 종합들의 정체성을 보장한다. 만일 모든 인간에게 의식이 부여된다면, 인간 존재는 모든 정체성의 담보자, 그들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개인성을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개인이 될 것이다. 그들의 개인성은, Georg Simmel의 적절한 규정의 문장을 인용하자면, ‘자아를 통한 자아의 정상화’[12]이고, 이것에 의존하는 모든 명백한 정체성의 구성이다. 언제나 의미론적 혁신이 이뤄지면서, 이전의 의미론적 발전은 새롭게 재배열된다. Leibniz의 모나드 개념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개인성의 범주가 언제나 개인 자신 속에 내재했다는 사실을 스콜라학파로 거슬러 확인할 수도 있다. 18세기 소설에서 감정과 향유의 점차 개인화된 개념을 언급할 수도 있고, 특히 Nouvelle Héloïse이래로, 이런 경험의 내면으로 자연과 예술의 포섭을 말할 수도 있다. 거기에 더해 Bildung, 자기-도야, ‘내적 형식’에서 ‘세계에 대한 자기-창조된 관계’ 그리고 교육학에서 수반되는 발전의 재구성된 개념들을 가지게 된다. 이 모든 것은 함께 묶이고 그래서 강화된다. ‘개인’은 언어, 자기-도야,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세계 안의 표상을 통한 현실을 획득하는 그 자신의 관념이다. 따라서 개인성의 특징은 매우 일반적인 어떤 것이 되어, 모두에게 접근가능하고 동시에 특별한 어떤 것, 즉 관점의 고유성이 되어, (언제나 선택적이고 주관적으로) 전체로서의 세계를 흡수하고, 스스로 가능한 만큼 세계를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필연적으로 영혼의 불멸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인/개인성의 개념적 배치를 통해 이런 불멸성을 보장하려는 관심은 후퇴한다. 개인/개인성의 시맨틱은, 이 단어들의 엄격한 의미에 내재하지 않은 새로운, 강조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더 이상 필멸의 세계에서 불멸성을 약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대신 내적 무한성과 표현을 위한 그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런 ‘개인’은 다른 문제들을 가진다. Tristram Shandy처럼 스스로에 초점을 맞춰, 그것은 세계의 운동보다 느리고, 그래서 불완전하게 죽을 운명이다. 세계에 초점을 맞춰서는, 그것이 가장 복잡한 속성들, 즉 직관을 감당할 수 있지 않는 한, 그것은 스스로로부터 소외되고, 세계에 대해 자신을 잃어버린다. 이런 의미에서 여전이 그것은 1800 경의 ‘미학’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의 개념은 이제 그 자체 통일체로 인식하는 ‘다양성’이다. 특정한 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 안에서 실현된 세계이고 그래서 타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그것은, 그리고 이것이 이 관념의 본질적 조건인데, 자유의 영역 안에서만 스스로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자기-창조적일 수도, 고유할 수도 없다. 이것이 교육과 정치의 제도와 실천에 대한 요구 조건을 만든다. Wilhelm von Humboldt는, (휴머니즘과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결과가 예측하지 못한 현실로 전개될 때까지, 이런 특별한 방향에서 결과를 제시했다.
그렇지만 이런 전환은 이론적 문제들에 의해 조건 규정될 수 있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건, 그들은 어떤 새로운 것을 가져온다. ‘개인’은 이제 자신의 개인성을 언급함으로써 스스로를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 그것은 모든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것에 대한 언급에 의한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자기-관찰과 자기-기술은 이제 더 이상 혹은 표면적으로는 사회적 위치, 소속 그리고 포섭에 기반하지 않는다. ‘개인’은 자기-관찰과 자기-기술에서 개인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요구된다. 적어도 이것은, 복수의, 통합되지 않는 맥락 안에서 살아가고 행동하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3] ‘개인’에게 남아 있는 정체성에 조응하는 유일한 짝은 세계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 인식된 ‘개인’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와의 어려움에 조우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자신과의 문제를 발생한다. 자아를 통한 세계와 세계를 통한 자아라는 순환적 정의 때문에, ‘개인’은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와 불완전한 과정으로만, 노력과 되어감의 내적 무한성으로서, 잘해야 통합된 조각들인 존재로서만 이해할 수 있다. 낭만주의의 맥락안에서, 이 모든 것이 어쨌건 적용되고, 그래서 더 이상의 관심을 끌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런 안정화의 맥락이 지적 매력을 상실하자마자, ,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한 낭만적 감정이 부드럽게 지나가자마자, ‘개인’은 스스로를 다뤄야만 한다. 그는 순환적 세계 관계 안의 자기-결정에 대해 부과되어진 반성의 짐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제에 직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는 그에게 가르친다. “갈급을 결코 멈추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 그의 세금은 우리 것이다���
Ⅷ.
효용과 이윤이 서구의 이웃들에게 결정적 요인이었던 반면, 독일인은 미학, 조화로운 전체, 그리고 삶에 너무 많은 강조를 두었을까?[14] 한가지 전통은 역사적 형식의 고유성에 의존하고, 다른 전통은 진보에 대한 진화의 추상적 법칙에 의존하는가? 이것이 이런 다른 전통에 속하는 Max Weber와 Emile Durkheim이 서로에 대해 이해 불가능했던 이유였는가?
자연/문명과 보편/특수의 이항 구별의 지속적 효과를 고려할 때조차도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즉 사회는, 개인들의 구성이라 보여야 한다는 어떤 요구에도 맞서서 스스로를 방어한다. 그 시대의 지배적인 사회 이론, ‘정치 경제학’의 이론은 ‘개인’을 무시하거나 적어도 ‘개인’의 목적에 대한 정확한 결정에 관련한 어떤 지시를 제공하는데 실패했다.[15] 이 과학의 주제적 문제, 사회 자체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같은 일이 일어난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자기-실현을 성취하려는 정당한 충동이라는 개념 안에서 ‘개인’에 의해 제공되는 해석은 사회 자체를 비껴 지나가고, 이데올로기로서 반성되어 시맨틱으로 돌아간다. 19세기는 시맨틱과 정치 사이의 접면이 특별히 어지러운 영역에 대해서, 특별한 ‘이데올로기적’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구별했다. 이 수준에서 관념과 원리들은, 자연 혹은 집합적으로 인정된 가치로 어떤 회귀를 적용하는 것 없이, 공격받고 방어되었다.[16] 이 커뮤니케이션의 이데올로기적 수준은 일반적으로 접미사 ‘-ism’으로 언어학적으로 지시되었다. (그것은 ‘ideologism’이 구성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개인주의’는 더 유명한 사례 중 하나를 구성한다.[17]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 ‘개인주의’는 1820년 이후 발생했고, 곧바로 적대적인 그리고 우호적인 평가를 모두 끌어내며, 새로운 조어로 계속해서 사용되었다.[18] 개인주의 자체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옹호하고 거부하는 정치적 참여와 태도로서 개인화 될 수 있다. 이런 층위에서,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가지는 문제들을 건드리는 일 없이도, 개인주의를 과도하게 취하는 것의 유용성(공리주의) 혹은 지구적 진화(다윈주의) 혹은 절망적 결과를 지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인’에 대한 추상적 언급은 충분하고, 논쟁은 개인의 관심 자체가 아니라, 자기-이해와 기본적인 사회적(혹은 곧 사회주의적이 되는) 지향 사이의 차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수준에 특정한 차이에 의해 이뤄진다.[19] ‘개인주의’ 자체는 단지 잘 포장된 집단주의, 즉 인간 존재에 대해 집단적 관념이 지니는 통제의 표현이다. 게다가 사실상 ‘사회주의’는 사회적 책임성로부터 모든 사람을 흡수한다. 이데올로기적 논쟁은 이것을 인식할 수 없게 만든다. 무엇보다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에 대한 불충분한 관심에 대해 개인주의자를 비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개인주의자들은 사회적인 것에 대한 불충분한 관심에 대해 사회주의자를 비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사회학적 이론의 형성을 우선적으로 자극한 것은 이런 이데올로기적 투쟁 노선이었다. 이것이 그렇게 쉽게 가능했던 (그리고 그런 ‘고전적’ 형식을 바로 취하게 되었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 노선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의 증가되는 추상성을 전제로 하고, 일차적 문제가 이론 형성에서 다루는 이런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차이를 (그리고 이미 1절에서 암시했던 것처럼) 반영한다. 따라서 아마도 Simmel을 예외로 하고[20], 고전 사회학은, 개인을 언급할 때면 언제나, 사실은 개인이 아니라 개인주의를 생각하고 있다.[21] 이는 ‘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다양한 경험, 지난 삼백년 동안 문학에서 풍부하게 전달되었고, 실제로 사회학에도 역시 명백해야 할 그런 종류의 경험에서 이상한 맹목을 이끈다. 만일 문학적 증언에 머물러 있다면, 제시될 수 하고 사회적으로 진정성을 지닐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자기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 가지 선택은 이 결점에서 영웅적인, 혹은 심지어 반 영웅적인 어떤 것을 추출하는 것이다.[22] 개인성과 문화에 대한 다시 살아난 관심이 오늘날 관찰될 수 있지만, 아마도 고전에 관심을 기울여서는 이런 관심을 충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23] ‘개인’이 하나의 기능성이자 기능성의 희생물이 되었던 시기, 탈 주제화 된 시기를 지나서, ‘개인’이라는 주제로의 회귀는 결정적 시기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24] 그렇지만 사회학적 고전은 부족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들은 개인적/사회적 정체성의 분리된 패러다임, 초월 철학으로부터 피상적으로 끌어온 것, ‘주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졌고, 결코 개인성을 깊게 파고 들지 않았다.
무엇보다, 어떻게 ‘개인’이, 개인성 안에서 자신을 규정하고 향상하면서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지 엄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철학은, 이런 자기-규정과 자기-향상의 가능성을 반성에 참여할 능력에 두었고, 반성에 대한 법적, 사회적, 지위 기반의 장애들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전제조건과 이런 요청과 함께 철학은 어떻게 든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 즉 일차적인 성층적 차이화에서 일차적인 기능적 차이화로의 변화에 동반하고, 지원하고 축복할 수 있었다. 어떤 경우이건, 이 변화는 심적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 형성의, 사회화와 포섭의 더 큰 차이화를 요청했다. 그래서 ‘주체’의 위치에 놓인 ‘개인’이 준비되고 반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게 될 때 환영되었다. 그래서 사회적 조건은, 타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런 주체의 위치를 채용해야만 한다는 사실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제한들의 형식 안에 던져질 수 있었다. 그렇지만 사회학자로서, 이런 동반된 시맨틱 ‘개인’=’주체’에 의존해야 하는지, 한다면 얼마나 의존해야 하는지, 혹은 사회적 이행 과정에 대한 참여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한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에서 끌어낸 결론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의심, 그리고 대립되는 입장들 사이로의 이어지는 동요 등이 의심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된다. 그리고 두 가지 추가적 징후를 더할 수 있다. ��째는 복사를 통해서 개인성을 획득하는 경향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개인’에 대핸 복수의 자아들을 부여하는 19세기적 관념 (언어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것!)과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와 관계한다.
개인적 주체는 결코, 흉내, 잘못된 경건, 가장된 자연스러움의 분석 등등에서 등장한 경험과 관심을 한 쪽으로 단순하게 치워버릴 수는 없었다. 만일 타인에게서 이런 수작을 관찰하고, 이 관찰에서 자신에 대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의 개인성을 주체로서 주장하고 제시할 수 있을까? 경험적/초월적 차이는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떨쳐버리기 위한 단지 의미론적 속임수는 아닐까? 그런 모든 것을 관통하는 반성의 결과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트릭이 의심스러운 동기를 수용하도록 하고, 이 때문에 찾고자 했던 굳건한 기반을 발견하는 대신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 떨어질 운명은 아닐까?
타자를 모방함으로써, 즉 복제된 존재로 이끌려, 하나의 해법이 목표를, 열망하는 기준을 그리고 삶의 방식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25] 이는 시작부터, 개인성의 프로그램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했고, 개인의 삶의 원리가 대립물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강제적으로 반성적 위치가 되면 될 수록, 그래서 우발성으로 자신을 경험하면 할 수록, 더욱 더 타인과의 비교를 제시한다. 그래서 다를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누군가와 같을 능력을 의미한다. 이 ‘모방’ 동기의 발전을 자세하게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개인’의 등장과 몰락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명백히 인쇄술과 연결된다. 독서를 통해서 획득된 관념과 자신의 삶을 연결시키도록 독서가 야기한다는 것은 Don Quixote이후 최근까지 잘 알려져 있다. 물론 이것은 처음에는 단순히 잘못된 길 혹은 위험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17세기 숙녀들은 소설을 읽을 때 주의하고 과묵해야 한다고 훈계를 들었다.[26] 다음 단계는 그런 실용적, 경험적 관심과 충고의 이야기 (특히 고백자에 의한)를 넘어서 진행된다. 이 단계는, 이어지는 판단을 이끄는 의미론적 차이, 즉 자연의 모방과 저자의 모방 사이의 차이의 형성을 구성한다.[27] 자연의 모방은 독창적이지만, 작가의 모방은 단지 복제다. 따라서 개인성은 독창성(Edward Young이 ‘천재성’의 유지라고 생각했던 것)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복제자(copyist)들은 충분하게 개인화된 존재에 이를 수 없다.
문학 이론에서 처음 성립되어[28], 원본과 복제 사이의 구별은 곧 넓은 의의를 얻었다. Young의 다소간 일관성 없는 구절 ‘원본으로 태어났는데, 왜 우리는 복제품으로 죽어야 하는가?’[29]는 독립적 존재를 취하지만, 문명에 대한 비판적 색조를 담고 있다.[30] 개인성의 구성 혹은 획득에 대한 주도적 이론은, 부분적으로는 교육적이고 부분적으로는 공리주의적인데, 이는 여기서 거꾸로 뒤집어진다. 사람들이 문학과, 즉 문명과 접촉하면 자신의 개인성을 잃어버린다. 단지 ���재만이 독창적인 감정 상태(이는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복제의 원형으로 역할을 한다)를 유지할 수 있다.
내적 그리고 외적 모두 자연이 그 의미의 확실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따라서, 자연에 기반한 개인성의 프로그램은 정착지를 잃어버린다. 그 주제에 대해서, 모든 것이 주관적이 된다. 자연을 포함하고 특별한 자연안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가능성들을 찾아야만 한다. 모든 사람이 복제하고, 모두가 유행을 따른다. 이미 예술가에 대한 예외를 요청하는 절망적 용기가 필요하다. 예술가들은 자기 힘으로 절대적인 것을 손대야 한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근대성의 흔들리는, 우발적인, 유행에 이끌리는 기반 위에 남아 있다.[31] 이는 얼마 안 있어 표준적인 ‘과학적’ (심리적, 사회-심리학적, 사회학적) 정식이 될 것, 즉 사회적 환경과 차이화 된 요구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복수의 자아, 복수의 정체성, 복수의 인격으로 나누는 것의 전조가 된다. ‘In-dividual’은 가분성으로 정의된다. 그것은 오페라를 위해서는 음악적 자아를, 직업적 삶을 위해서는 야심 있는 자아를, 가족을 위해서는 참을성 있는 자아를 요구한다. 스스로를 위해서 남아 있는 것은 그 동일성의 문제다.
자아의 내적 복수성 문제 역시 전통을 가진다. 이 전통은 여기서 시도되는 사회학적 해석에 의해 확인된다. 이런 이유로 짧은 회고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내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 정식화, 자아의 자신과의 대화는 오랜 전통을 가진다. 자아를 다루는 것에 관해서는, 말하자면 자신 안에 두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동기의 주제에 관할 때는 두가지 영혼을 말하는 것이다. 18세기 후반에, 이 정식화는, 죄를 짓기 쉬운 필멸자의 일탈적 경향에 대한 합리적인 도덕적 자기-통제의 설정 안에서 전개된다. 이런 해석은 여전히 Shaftesbury의 유명한 혼잣말의 에세이에서 중단 없이 유지된다.[32] 혼잣말은 스스로 문제가 되는 자아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소외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의 목적은 개인성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일차적 상태(I와 me)가 아니고, 진리를 인식하기 위한 어려운 조작으로 기능하다.[33] 그것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관심, 전체를 향한 부분들의 조화로운 범주화에 놓여 잇는 자연적 ‘감정’을 찾는데 역할을 한다. 즉 그것은 자아의 도덕적 경제를 절합한다. 새로운 것은 동일성 문제의 개인화에 있는 것이 (아직은) 아니라, 종교적-교리적 규칙으로부터의 거리에 놓여 있다.[34] 자아는, 열정을 규제하고, 그것들을 자연적 감정의 형식으로 가져오기 위해 스스로에게, 그리고 오직 스스로에게 의존하는 실현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한다. 더 나은 자아가 더 나쁜 자아에 맞서 스스로를 주장하는 내부적 구조는 위계적으로 남아 있다. 이를 위한 모델은 가정이다.[35] 위험은 통치 불가능성에 놓여 잇다. 적어도 이 문제는 이미 자아-동일성의 문제를 매우 정확하게 언급한다. “공상과 나는 하나가 아니다. 불일치가 나를 나 자신으로 만든다.”[36] 자신의 자아가 된다는 것은 오직, 규정하고 어떤 범주에 기반하지 않은 자기-언급의 자의성을 거부하는 것에 의해 획득될 수 있다. 그것은 확실히 더 이상 이런 자기-언급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체성은 그 자신의 가능성과 ��조응 속에 기반한다.
이런 견해가 폐기되고, 자기-동일시의 내적 복수성에 대한 다른 종류로의 관념으로 이행이 발생한 역사적 시점을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마도 18세기 후반이나 낭만주의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19세기 말, James와 Mead가 그 문제를 지금 일반적인 형식으로 가져왔던 시점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37] 어느 정도건, 가능한 자기-동일화의 복수성의 통일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 풀어야만 하고, 단순히 도덕과 의식에 순응하거나 혹은 더 나쁜 자아를 억압함으로써 고쳐질 수 없는 가장 긴급한 개인적 문제가 되었다. 이 통일의 반성 문제는, 그들 자아의 일관성 혹은 통합의 문제로, 정체성을 다시 획득하는 문제로 정식화 되었다. ‘자아’의 통일성 주제는 구성적 차이를 통해서 절합되고, 동시에 숨겨졌다. 사회는 더 이상 해법의 방향을 지시하지 않고, 단지 문제만을 지시할 뿐이다. 그것은 더 이상 도덕적 삶의 방식에 대한 요구로서 인류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개인적 방식, 우연적이고 선택적인 방식 안에서, 행동이 향해지는 복합성으로서 마주한다.
이런 주제들이 18세기 후반 등장해서 이데올로기적 불확실성을 따라서 19세기 후반에 증가해서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문학적 시맨틱으로서, ‘개인’의 이런 해체와 재조합은, 각각의 개인에게 다른 전기, 다른 규칙의 집합, 우연성, 기회, 그리고 공적의 차이화 된 분배를 나누는 고도의 복합적 사회의 경험에 조응한다. 더 이상 고백자나 신학적인 삶의 카운셀러가 아니라, 처음에는 소설의 éducation sentimentale에서 이후에 심리학자나 심리치료사와 같은 다른 직업이 이제 ‘개인’의 배려에 관여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는 이론과 주도 차이에서 변화를 필요로 한다. 더 이상 구원/저주와 진짜/거짓 경건함이 아니라, 의식/무의식과 사적/사회적 정체성이다. 따라서 이런 시맨틱과 이런 카운셀링에 노출된 심적 시스템은 그들 자신에 대해 다른 관념을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일반 이론으로 남아 있고, 개인성이나 개인성에 대한 이론으로 이끌지는 않는다. 단지 ‘개인’이 그 자신의 통일성에 대한 반성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더 이상 구원의 성취나 완벽을 향한 향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결과로서 개별 인격에 대해 등장한 문제의 해법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된다.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 개인의 개인성을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사회를 배제하는 것이 정확히 이것이다.
Ⅸ.
만일 개인성에 대한 이런 경험이, 사실의 경험이고 (문학적 과대포장이 아니라면), 근대사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들이, 모든 반성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할까? 그것들은, ‘개인’이 주어진다면, 동일성과 반성의 인식을 통해서 스스로를 도울 자유는 단지 부르주아지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작업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가?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거기에 자연으로 돌아갈 길 혹은 천국으로 갈 뒷문은 존재하는가?
이런 형식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훨씬 멀리, 우리의 발견들이 지탱해주는 것보다도 훨씬 멀리 가는 것일 것이다. 자기-반성의 원리와 관계된 기대를 단순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반성은 동일성이 아니라 차이�� 자아를 발생한다. 그것은 자아를 필수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어떤 것으로 발생한다. 이것들은, 하나의 시스템이 말하자면 그 자신 안에서 스스로를 재현하려 시도할 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논리적 비용이다.[38] 자기-언급의 논리적 문제가 이런 결과를 강제할 지,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 지는 여기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39]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반성의 도정에 ‘개인’을 설정하고, 그것의 효과 없는 노력들 속에서 그것을 관찰하려 수행했던 시도가 이런 견해를 제시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만약 여기서 옹호되는 이론을 수용한다면, 앞에서 논의되었던 ‘주체’의 두 가지 ‘잘못된 경로’, 타자를 복제하고 자아를 다른 자아들로 쪼개는 것은 자기-반성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에 대해 반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그것이 무언가를 더할 수 있다면, 노력할 가치가 있다. 사실 그것들은 시스템의 조작들 중 하나로서 조작의 정상적 수행으로부터 나온다. 조작은, 그것이 구현하고, 그것에 대해 의미 있는 무언가를 더하는 시스템을 전제로 한다. 의미 있는 어떤 것은, 다른 어떤 것, 그래서 다른 어떤 것과 관련해서 다르게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다. 단지 이런 반식으로만 시스템은 자기-반성을 통해 그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즉 차이의 도식 안에서 우발적 선택으로서 스���로에 대해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점은, 그래서 더 이상 필수적 통일체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정체성으로 기능하는 모든 것은 인공적이고, 우발적인 자기-단순화에 기반한다.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하기를 원하거나 다르기를 원하거나 상관없이. 그래서 반성 시스템의 통일성에 대한 모든 진술, 즉 그것의 개인성에 대한 모든 진술은 반성의 대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기본적 조작과 관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심적 시스템 역시 오토포이에시스적 시스템, 즉 그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재생산하는 시스템[40]으로 특징 규정할 수 있다. 개인성은 오토포이에시스 자체, 즉 시스템의 ‘자기-재생산’의 닫힌 순환에 다름아니다. 시스템의 요소들은, 그것을 통해 존재하게 되고, 조작이 완료되자마자 존재하기를 멈추면서, 오토포이에시스적 재생산에 기여함으로써 시스템의 개인성에 참여한다. 사회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것은 각각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일어나지만, 심적 시스템의 경우에 그것은 각각의 의식 행위에서 일어난다. 사회 시스템과 의식 시스템 모두, 자기-반성은 오토피에이스의 구현으로서, 즉 커뮤니케이션을 재생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사용 혹은 의식을 재생산하기 위한 의식의 사용에서만 가능하다.
만일 이론의 정식화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자기-언급과 닫힌 순환성의 토톨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Husserl의 의식의 시간성에 대한 분석과 같은, 초월론으로 이어지는 분석을, 오토포이에시스적 시스템의 이론 언어, 즉 다른 어떤 것들 가운데서 물론 오직 한가지 경우인 의시기의 조작적 기초에 대한 경험적 시스템 이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다른 출발점은 문제를 설정하는 다른 방식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근본적 문제는, 어떻게 시스템이 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탈-토톨로지화 하는지다. 시스템은 어떻게 재생산의 순환 안에서 비대칭성을 발생하는가? 이런 과점에서 시간의 비가역성과 각 시스템이 의존하는 환경의 과잉 복합성과 같은 진화에 의해 강화되는 상황적 조건은 시스템의 자기-기술의 생산에 있어 이차적 기능을 가진다. 그들은 자기-언급 안에서 시스템이 탈-토톨로지화하고 비대칭성을 만드는 것을 돕는다. 결과는, 그것이 구���된 영역으로 구별을 ‘재-진입’하는 것이다.[41] 시스템은 언제나 오토포이에시스적이고, 이미 개인화 되었고, 항상 자율적으로 존재하면서, 시간 안에서, 환경과의 차이를 통해 구성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문제는 단지, 처음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전/이후 그리고 환경/시스템의 이런 차이들이 어떻게 시스템에 재-진입하고, 그 안에서 자기-언급의 논리적 전개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자기-반성의 논리적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해결되든, 심적 시스템 자체는 배제의 위치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그것은, 포섭-기반 개인성에 대한 점진적인 억압적 조건 안에서 발전되는 시맨틱을 계속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게 한다. 미학적 혹은 도덕적 ‘상태’에 대해, 혹은 자유롭게 구성되는 커뮤니케이션적 커뮤니티의 선험적 정당화에 대해, 포섭과 배제의 ‘신성한’ 동시성 주위에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향하는 것 역시 더 말이 안 될 것이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진짜 개인들은 그들의 개인성을 대단히 느슨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현대 시맨틱은, 불충분함에 대한 불필요한 감정을 제거하는 이것들을 위해 발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개인의 개인성이 그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개인성의 향상’이라는 지도적 관념은 폐기될 필요가 있다. 이런 관념은, 개인이 세계에 대해 비대칭적 관계를 생산할 수 있는 자기-기술은 어떤 형식인가의 질문에 의해 대치되야만 하고 대치될 수 있을 것이다. 심적 시스템의 관계에서 개인/개인성/개인주의 시맨틱의 진화는, 사회가 사용 가능하고 연결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형식의 전환으로 읽힐 필요가 있다. 그런 형식의 도움을 통해서만, ‘개인’은 자신의 개인성에 대해 다른 어떤 것보다 오토포이에시스적 절차에 위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시맨틱은 사회적 진화에 따���다. (구체적 개인들이 스스로를 구체적 개념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 없이) 개인성의 자율성은 ‘개인’에 있어 당연할 수도 없고, 기대될 수도 없다. 그것은 존재의 형식이다. 그것을 구성하는 구별의 이 형식 안으로의 재-진입은 사회적 조건의 더한 대상이다. 왜냐하면 이런 재-진입이 의미, 언어, 그리고 연결성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사례가 이런 결과를 그리는데 기여한다. 시간 차원에 대해서, 경력 인식의 예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시스템/환경 관계에 대해서, 누군가가 요구를 하는 믿음의 예를 선택할 수 있다. 경력과 요구는, 개인이 비대칭성을 생산하는 구별적 형식이고 그렇게 남아 있다. 그것들을 결합하는 것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는, 누군가가 어떤 것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경력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역으로, 누군가 자신의 요구에 관련해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경험의 연속은 경력을 구성하지 않는다. 요구와 경력을 구별된 형식으로 다루는 것을 통해서만, 복잡한 상호의존성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경력의 맥락 안에서 공정한 대우의 요구, 동등한 기회의 요구, 자의성의 배제에 대한 요구 그리고 역으로 경력이 전개되면서 실망을 줄이기 위한 태도와 제도의 발전 등.
경력과 주장의 예는, 어떤 것에서 체계적으로 도출될 필요 없이 그리고 근대 사회에서 ‘개인’의 상황에 대한 완벽한 기술을 제공하려 하지 않고도 선택될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은 단순히, 근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기-기술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는 형식과 결과적 주제들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포섭과 사회화의 사회적 문제로부터 나오는 결과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Ⅹ.
시간 차원���로 탈출함으로써 ‘사회적’ 정체성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을까? 타인의 기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자신의 자아에 대한 연속성과 변화의 개념을 통해서 개인의 전기를 더 형상화 할 수 있을까? 연속성/불연속성은, 승인/일탈보다 개인성에 더 적합한 도식일까?
거의 그럴 것 같다. 어쨋건 ‘정체성’의 근대적 시맨틱과 전기에 대한 관심은, 개인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시간 차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시간적 관점에서, 사회적 요구 조건에 초점을 맞추는 반성의 부적합성이 형성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개인’은 변화하는 방식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42] 그러나 어떻게 반성은 시간을 다룰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허용된 시맨틱이 그렇게 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까? 근대적 ‘개인’이 시간성을 반성하고자 하는 첫 번째 시도는 익숙한 결과를 생산한다. Plaisir, 상상, 공상의 형식 안에서 순수한 자기-언급은 불안정한 것으로 보이고, 오직 현재를 차지하기 위해 새로운 만족의 형식을 찾는 데에만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지속하는 관점으로서, 남아 있는 모든 것은 지루하고(ennui), 그것은 그래서 시간에 대해 견뎌야 할 경험을 차지한다. 오토포이에시스에 대한 역사적인 최초의 경험은, plaisir/ennui의 시맨틱 안에서 있는 그대로 반성 된다. 그것은 ‘주체’의 주체성과 정확하게 관계한다. 성층화 된 사회에서 상위 계층의 멤버들에게, 시간적 차원은 어떤 인식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지 사회적 차원에서만 그들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탈출해, 주연, 우전, 사랑 등을 찾을 수 있다.[43] 자기-언급이 시간이 진행되면서 반복해서 경험을 위한 능력을 갱신하는 동안, 스스로 매달린 주제는 다른 곳으로부터 나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이 하는 모든 것은 이에 대해 수용성(sensibilité)을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이다.[44] ‘부르조아지’ 해법은 이미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가장자리에 남아 있다.[45]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제가 등장하고, 사회구조적 발전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능성들을 생산하기 이전에 ‘개인’의 자기-경험으로 통합되었다는 인상을 가질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법은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은 문제에 걸맞기는 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 ‘경력’이라는 일반적 개념을 가지고 언급해보자.
경력은 사회적 필요성으로 등장한다. 왜냐하면 출생, 가정에서의 사회화, 사회적 위계 안에서의 위치 등은 더 이상 삶을 통한 정상적 성장을 예측 가능하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과 운명의 타격은 물론 언제나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회적 통제의 경계 너머에 놓여 있다. 이는 성층적 차이화에서 기능적 차이화로 이행하는 것과 함께 변화한다. 누군가의 운명은 더 이상, 사회적 위험을 포함한 외적 위험에서의 자기-보호 문제가 아니다. 사유의 변화가, 자기-선택과 외부 선택 (그러나 다른 무게를 가진) 양자를 결합시키면서, 선택적 사건의 연쇄와 관계되어 요구된다. 이런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시간적 모델을 경력으로 언급한다.
이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읽혀야 할 것이다.[46] 그리고 조직 내에서 지위 사이의 변화를 언급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학교/대학 시스템을 통한 성장을 포함한다. 그러나 또한 평판이나 악평의 경력을 생각할 수 있고[47], 마찬가지로 물론 범죄 경력도 생각할 수 있다.[48] 결정적인 사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오토포이에시스적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경력은 경력의 단지 부분만을 형성하는 사건들로 구성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경력에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충격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이런 종류의 다른 사건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경력은 스스로 경력-관계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이는 사건과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사건들이 같은 것을 적용하는 더 많은 사건을 가능하게 한다. 마치 더 나은 직업적 위치의 전제조건인 직업적 위치의 획득이나, 신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수입, 매스 미디어에 더 많이 언급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유명세, 더 많은 범죄의 전제조건인 이전의 유죄 등등. 그래서 경력은 기본적으로 사건들의 전제조건-부재, 자기-활성화 순서로 경험된다. 이는 정확하게 시간 안에서 개인성이 절합될 수 있는 이유다.
활성화 되거나 혹은 활성화 하거나, 경력에서의 모든 사건은 더 많은 선택에서의 우발적 선택이다. 각 사건의 관점에서는, 이전에 발생한 것은 사건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고, 뒤에 오는 미래는 그것의 결과가 된다. 따라서 전체성 속에서 경력은 전체적으로 우발적 구조다. 이는 그 자신 경력이 결코 자신의 연속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에도 적용된다. 거기에는 더 많은 외부적 그리고 내부적 요소들, 무엇보다 운(사건에 적절한 패턴의 형식 안에서)과 성취를 필요로 한다.[49] 그렇지만 운과 성취 사이의 연계는 경력 자체에 의해 이뤄진다. 이런 면에서, 경력 역시, 경력 안에서 계산될 수 없고, 어떤 확실성을 낳을 수 없는 것, 즉 좋은 운과 나쁜 운을 위한 본질적 전제조건을 형성한다. 왜냐하면 모든 기회는 언제나 경력 자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50]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운과 노력, 외부적 선택과 자기 선택의 결합에 대한 의존성은, 경력이 대단히 불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조건들은 결코 성취에 의해 완전하게 대체될 수 없고, 기대되는 경력이 성공적이면 성공적일수록 더욱 덜 그렇다.[51] 이런 불확실성은 물론 무엇보다 먼저 미래와 관계한다. 그러나 또한 과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경력의 과정 전반에서, 누군가가 만들어 낸 과거보다 다른 과거가 더 유용했을 것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고, 혹은 경력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했던 많은 노력들이 불필요한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언제나 현재의 불확실성이다. 그것은 현재의 의의를 강조한다. 현재가 plaisir/ennui의 순간으로서 자신과 관련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적 미래의 과거로��� 경력의 맥락 안에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사람들은 나중에 보상될 수 없는 무언가를 놓칠 수 있다. 우연한 기회를 위해 준비하는 것을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교육과 훈련 (물론, 다른 예를 선택하자면, 여전히 건강한 육체의 건강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 거대한 불확실성 아래서, 시간을 자본화 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노력을 끌어내고자 한다.[52] 무엇이 의미 있는 노력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한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 많은, 혹은 다른 종류의 준비가 ��극적으로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밝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노적적 노력과 연결된다. 성공은 성공을 생산하고, 실패는 실패를 생산한다. 처음에 작았던 차이가 경력에 의해 증폭된다. 그래서 경력 자체는 자기-선택의 일부가 된다. 경력에 적절한 전기를 가지고, 자신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실망스러운 전기를 가지고는, 스스로 능력이 더 없다고 믿게 된다. 비록 불평등의 불변적 재생산에 대한 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경력은 불평등을 발생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력은 단지 성층화 몰락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또한 기회의 동일한, 그러나 불안정한 불평등을 발생한다.
삶의 과정에서 사회구조적 결정요소가 감소하는 한에서, 즉 경력에 대한 조건이 줄어드는 한에서, 경력은 삶의 보편적 방식이 된다. 그것은 게으르고, 관심이 부족하고, 조용한 삶을 위한 틈새를 찾고자 하는 것으로 밝혀질 가능성을 제공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들은 경력에 대한 그 자신의 자기-선택에 기여할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무 경력’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여전히 하나의 경력이다. 왜냐하면 이 선택 역시 같은 구조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것 역시 경력-관계의 기회를 규정한다. 그것 역시 불확실성에 직면해서 개인사를 규정한다. 또한 그것은, 그것이 우발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무 경력을 후회할 순간이 발생할 가능성을 쫓아낼 수 없다. 경력은 plaisir와 ennui를 대치한다.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시간적 차원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그것들보다 뛰어나다. 그것은 ‘개인’에게, 개인성을 잃지도 않고, 더 높은 전체로 ‘흡수되는 것’도 없이, (비록 경력 자체는 그것과 관련한 모든 사건에 대한 재귀적 연결을 허용하지만) 시간의 비대칭적 비가역성 속에 자신을 위치 지을 수 있는 형식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형식은 사회의 사회적 구조로서 이미 나타난 것에 맞춰 재단되어 있다.
경력은 성공/실패의 구별 도식을 통해 그리고 내부적, 외부적 원인들에 조응하는 부여 과정을 통해 성취 시맨틱을 생산한다.[53]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경력 신드롭의 보편성은 수행과 수행의 거부 사이의 대립적 차이에 조응한다. 후자는 예를 들면 ‘스트레스’, ‘사회적 이탈’ 그리고 무경력이 유용하고, 긍정적인 삶의 형태라고 믿고자 하는 삶의 ‘대안적’ 방식의 시맨틱 형식 속에 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은 수행의 압력을 회피한다. (비록 이 선택 역시 선택으로 남아 있지만!) 그러나 시간 혹은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는 없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plaisir/ennui의 재활성화에 이르지 않는 것인지 의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계층에게 가능한 제안인 시간이다.
[1] 그래서 이는 Schiller의 편지 ‘인간의 미학적 문화에 대해서’, Klaus Disselbeck, Geschmack und Kunst: Eine systemtheoretische Untersuchung zu Schillers Briefen ‘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Opladen 1987.
[2] ‘Non vero huomo quegli ehe la Compagnia de gli altri huomini fugge ... chiunque a se solo vive, ingrato alla Natura se dichiara’ (다른 사람들의 무리에서 도망치는 사람은 진짜 남자가 아니다. ……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가 자연에 대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 선언한다.) Ciro Spontone, Dodici libri del Governo di Stato, Verona 1599, S. 175, 또한 S. 204. 마찬가지로 Paolo Paruta, Della perfettione della vita politica, Venetia 1579, S. 49 f. 마찬가지로 더 많은 예를 들 수 있다.
[3] 예를 들면 고독 vs. compagnie의 무게 재기에 대해서는 François de Grenaille, Les plaisirs des dames, Paris 1641, S. 185 ff. Thomas Fuller, The Holy State and the Profane State, Cambridge 1642, New York 1938 재출판, S. 161 ff.이 전형적이다. (“고독에 호소하고 안고 있는 것은 자연적이지 않다. 그러나 사막이 타락한 동료보다는 낫다)
[4] Sur les plaisirs, Œuvres, Bd. I, Paris 1927, S. 9-15 (9)에서 인용.
[5] 18세기까지 지속된 이 전통에 대해서는 Wolf Lepenies, Melancholie und Gesellschaft, Frankfurt 1969; Hans-Jürgen Schings, Melancholie und Aufklärung, Stuttgart 1977.
[6] Remond des Cours, a. a. 0. (1692), S. 119 ff.
[7] Marquis d'Argens, La philosophie du bon-sens, 신판 Haag 1768, insb. Bd. II, S. 298 ff., 327; Bd. III, S. 29 ff. 다른 예를 들자면, 고독은 그 자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것은 사회로부터 스스로의 거리를 두는 도덕적 배치에 의존한다. 그래서 John Gilbert Cooper, On Solitude and Society, in: Letters Concerning Taste, and Essays on Similar and Other Subjects, 3. Aufl., London 1757, S. 204 ff. 마찬가지로 loisir, ennui 그리고 oisivité의 구별에 대해서는, Antoine Pecquet, Discours sur l'emploi du loisir, Paris 1739.
[8] Christian Garve, Ueber Gesellschaft und Einsamkeit, 3 Bde., Breslau 1797-1801, insb. Bd. II, S. 257 ff. 특히 고독이 관심과 애정의 부족으로 해석된다면 그것은 억압적이다. 그래서 큰 도시에서, 동료를 위한 기회가 분명하다. (291) Countess Dowager of Carlisle, Thoughts in the Form of Maxims, Addressed to Young Ladies on Their First Establishment in the World, London 1789, S. 119 ff. 우연한 ‘사회로부터의 이탈’을 통해서 필연적이지 않은 고독의 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9] Paul Valery, L'idée fixe ou deux hommes à la mer, Œuvres, Bd. II에서 인용, Paris (ed. de la Pleiade) 1960, S. 195-275 (275).
[10] 그들이 일반적으로 가정되는 것보다 덜 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이, Michael Hughes/Walter R. Grove, Living Alone, Social Integration, and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7 (1981), S. 48-77의 결론이다.
[11] Richard Rorty, Philosophy and the Mirror of Nature, Princeton, NJ 1979, pp. 154-155. 이 가정은 종합적 지식을 가지는 능력을 위한 선험적인 초월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만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이 가정의 정당화는 그래서, 문제의 그런 개념의 기초 위에서 구성될 수 있는 이론에 기반한다. 이 자기-언급이 받아들여지자 마자, 더 많은 자기-언급은 제거될 수 있다.
[12] Grundfragen der Soziologie (Individuum und Gesellschaft), Berlin-Leipzig 1917, S. 88. Dort S. 71 ff. 짐멜은 18세기의 네오휴머니즘으로의 전환을 훌륭하게 특징화 하였다.
[13] Loredana Sciolla, Differenziazione simbolica e identità, Rassegna Italiana di Sociologia 24 (1983), S. 41-77.
[14] 이런 대조에 대해서는 Louis Dumont, Religion, Politics, and Society in the Individualistic Universe, Proceedings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1970, S. 31-41.
[15] ‘초기 사회주의자’의 비판적 관점에 대해서는, Thomas Hodgskin, Popular Political Economy, London 1827, New York 1966 재출판, S. 39 f
[16] 반면에 Reinhart Koselleck은 1800년경 설정된 역사-정치적 시맨틱의 재구성의 한 특징으로, 많은 개념들의 ‘이념화 가능성(ideologizability)’을 고려한다. 이에 대해서는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Historisches Lexikon zur politisch-sozialen Sprache in Deutschland, Bd. 1, Stuttgart 1972, S. XVII f.
[17] 단어의 어원학적 개념적 역사에 대해서는, Richard Koebner, Zur Begriffsbildung der Kiµturgeschichte II: Zur Geschichte des Begriffs ‘Individualismus’, Historische Zeitschrift 149 (1934), S. 253-293; Stephen Lukes, Individualism, Oxford 1973. 어느 정도 사회주의에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명시적이고 마찬가지로 반응적인 새로운 조어가 1830년경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Gabriel Deville, Origine des mots ‘socialisme’ et ‘socialiste’ et certains autres, La Revolution Française 54 (1906), S. 385-401.
[18] 적대적 평가는 정확하게 ‘개인’의 이름에서 발생했다. Alexandre Vinet, Individualité, Individualisme, Semeur of 13. 4. 1836, Philosophie morale et sociale, Bd. 1, Lausanne-Paris 1913에 재수록, S. 319-335. 개인주의는 단지 추상적 관념이고 그래서 단일자의 구체적 개인성에 대한 이해를 평평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L'individualisme est sur le trône et l'individualité est proscrite” (���인주의가 즉위하고, 개인성은 금지된다, p. 329)
[19] Richard Hofstadter, Social Darwinism in American Thought, 1860-1915, Philadelphia 1945는 개인주의적/집단주의적 관념을 대조하여 이 논쟁에서의 동기에 대한 훌륭한 설명을 제공한다. 개인주의/집단주의에 대해서는 Karl Pribram, Die Entstehung der individualistischen Sozialphilosophie, Leipzig 1912.
[20]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파편적으로 보인다는 개인에 대한 Simmel의 가정은, 직접적으로 낭만주의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타자의 시선이 이 조각들을 영원한 총체로 녹이는데 필수적이라는 그의 가정(‘개인’은 통일성 속에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 관심을 지니지 않는다?!)은, 반성 과정이 사회적 관계에 의존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초월적 철학과 사회 심리학은 ‘스타일’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Wie ist Gesellschaft möglich?’, in: Soziologie: Untersuchungen über die Formen der Vergesellschaftung, 2. Aufl., München-Leipzig 1922, S. 21-30. 그렇지만 이런 가정은 사회 이론에서 충분하게 자리잡지 못한 채 발전했다.
[21] 이에 대해서는 Emile Durkheim, L'individualisme et !es intellectuels; Revue Bleu, série 4, 10 (1898), S. 7-13.
[22] Wylie Sypher, Loss of the Seif in Modern Literature, New York 1962에서는 이런 관점에서의 소재들을 모으고 있다.
[23] Roland Robertson, Meaning and Change: Explorations in the Cultural Sociology of Modern Societies, Oxford 1978, S. 4 f. 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또한 Aspects of Identity and Authority in Sociological Theory, in: Roland Robertson/Burkart Holzner (Hrsg.), Identity and Authority: Explorations in the Theory of Society, Oxford 1980, S. 218-265.
[24] 예를 들면 Ulrich Beck, Jenseits von Stand und Klasse? Soziale Ungleichheiten, gesellschaftliche Individualisierungsprozesse und die Entstehung neuer Formationen und Identitäten, in: Reinhard Kreckel (Hrsg.), Soziale Ungleichheiten, Sonderband 2 der Sozialen Welt, Göttingen 1983, S. 35-74; Die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Frankfurt 1986; Alois Hahn/Volker Kapp (Hrsg.), Selbstthematisierung und Selbstzeugnis: Bekenntnis und Geständnis, Frankfurt 1987.
[25] Stendhal에게 homme-copie는 처음에는 거의 존중할 수 없는 존재 형식이었다. (내가 알기로는 Standhal이 처음으로 이 개념을 사용했다) De l'amour (1822), Paris 1959에서 인용, S. 276. 그것은 다른 가능성들을 배제하고자 의도했던 건 아니다. 그렇지만 소설은 곧 이런 존재 형식(그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을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전달하였다. 한참 지나 Martin Heidegger, Sein und Zeit, 6. Aufl. Tübingen 1949, insb. S. 126 ff.가 이에 대한 철학적 해석을 제공했다. 또 다른 예로는 특히 René Girard, Mensonge romantique et vérite romanesque, Paris 1961.
[26] Jacques du Bosq; L'honneste femme, Rouen 1639, 재출판, S. 17 ff.; Pierre Daniel Huet, Traité de l'origine des romans, Paris 1670, Stuttgart 1966 재출판, insb. S. 92 ff.
[27] 그래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Edward Young, Conjectures on Original Composition (I759), The Complete Works, London 1854, Hildesheim 1968 재출판, Bd. 2, S. 547-586.
[28] Jean de La Bruyères, Les Caractères: Des ouvrages de l'esprit Nr. 62, 64, Œuvres complètes, ed. De la Pléiade, Paris 1951, S. 88 f.; Anthony, Earl of Shaftesbury, Characteristicks of Men, Manners, Opinions, Times, o. 0., 1714, Farnborough 1968 재출판, Bd. 3, S. 4 f.; oder Abbe de Villars, De Ia délicatesse, Paris 1671, S. 179: “Le siècle est délicat, il n'aime pas les copies, il faut estre original en tout ce qu'on écrit” (어려운 시대, 복제품을 좋아하지 않고, 자신이 쓰는 모든 것에서 독창적일 필요가 있다) 복제에 대한 이런 가치 절하는 인쇄술의 반응이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29] A. a. 0., S. 561.
[30] Vinet는 언급하지 않았고, 아마도 원전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Quelqu'un a dit que 'nous naissons originaux et que nous mourons copies” (누군가는 ‘우리는 원본으로 태어나서 복제품으로 죽는다’고 말한다) (a. a. 0., 1913, S. 326).
[31] “La modernité, c'est le transitoire, le fugitif, le contingent, la moitié de l'art, dont l'autre moitié est l'éternel et l'immuable” (‘근대성’에 의해, 순간의, 사라지는, 우발적인, 예술의 반쪽을 의미한다. 그것의 다른 반쪽은 영원하고 불변한다) Charles Baudelaire, Le peintre de a vie moderne, Œuvres complètes, ed. de la Pléiade, Paris 1954, S. 881-920 (892)
[32] Anthony, Earl of Shaftesbury, Soliloquy: or Advice to an Author, 1710, Characteristicks of Men, Manners, Opinions, Times, a. a. 0., S. 151-364 에서 인용.
[33] “누가 이렇게 자신을 두 인격으로 나누고, 자신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라고 Lord Anthony는 묻고, 이어서 답한다. “자기-분해의 작업. 이 혼잣말의 덕분에, 그는 두 개의 다른 인격이 된다. 그는 학생이자 교육자이고, 가르치고 배운다.” (a. a. 0., S. 157 그리고 158) 이것과 유사한 문장들을 읽을 때, 그 당시의 ‘person’이 개인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고, 그 보다는 더 일반적인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Shaftesbury는 개인을 ‘분해한다’는 이상한 관념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34] “종교의 진정한 효과나 조작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동일 인격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철학의 영역이다.” a. a. 0., S. 283.
[35] 명시적으로는 a. a. 0. S. 323 f.
[36] A. a. 0., S. 325.
[37] 이 두가지 시기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비교��� Jan Hendrick van den Berg, Divided Existence and Complex Society: An Historical Approach, English trans. Pittsburgh 1974.
[38] 여기서 자신을 제시하는 문학적 캐릭터는 (Paul Valéry, Œuvres, Bd. II, éd. de la Pléiade, Paris 1960, S. 9-75에서 인용하는) Monsieur Teste다. 이는 자기-인식 시스템의 닫힌 성격, 가능성/불가능성의 차이에 대한 방향 지시, 모든 자기-기술과 꾸밈은 잘못된, 자아의 깊이에서 자아의 상실 그리고 일종의 오토포이에시스가 된다는 것을 포함한다. consommation des possibles et recharge (64)
[39]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Yves Barel, Le paradoxe et le système: Essai sur le fantastique social, Grenoble 1979.
[40] Humberto R. Maturana, Erkennen: Die Organisation und Verkörperung von Wirklichkeit: Ausgewählte Arbeiten zur biologischen Epistemologie, Braunschweig 1982. 심적 시스템에 이 개념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Niklas Luhmann, Soziale Systeme, a. a. O. (1984), S. 346 ff.; die Autopoiesis des Bewußtseins, a. a. O.
[41] George Spencer Brown, Laws of Fonn, 2. Aufl., New York 1972, S. 69 ff.에 기반한다.
[42] 특히 Louis A. Zurcher, Jr., The Mutable Seif: A Self Concept for Social Change, Beverly Hills, Cal. 1972,의 ‘해양 자아 (oceanic self)’의 부적절한 개념에서 정점에 이른다.
[43]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런 출발점이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Madeleine de Scuderi, Conversation de l'ennuy sans sujets, in Conversations nouvelles sur divers sujets, Paris 1684, Bd. II, S. 457-502. Ennui에 대해서는 Friedrich Mehnert, Schlüsselwörter des psychologisehen Wortschatzes der zweiten Hälfte des 18. Jahrhunderts, untersucht an den Briefen zweier Salondamen (Mme. du Deffand und Mlle. de Lespinasse), Diss. Berlin 1956, S. 15 1 ff.; Wolf Lepenies, Melancholie und Gesellschaft, Frankfurt 1969.
[44] M. Deslandes; L'art de ne point s'ennuyer, Amsterdam 1715, insb. S. 31 f., 132 ff.
[45] (물적 재화나 의견! 모두에 연결된) 소유에 대한 갈급에 대해서는 Georges-Louis Le Sage, Le Mecanisme de l'esprit, Cours abregé de Philosophie par Aphorismes, Genf 1718, S. 345 ff. 에서 인용.
[46] 조직 사회학에서 문헌의 과다함은 제외하더라도, Howard S. Becker/Anselm L. Strauss, Careers, Personality, and Adult Socializ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2 (1956), S. 253-263; David V. Tiedeman/Robert P. O'Hara,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in Career Development, New York 1963; Niklas Luhmann/Karl Eberhard Schorr, Reflexionsprobleme im Erziehungssystem, 2. Aufl. Frankfurt 1988, S. 277 ff
[47] 후자에 대해서는 Julius A. Roth, Timetables: Structuring the Passage of Time in the Hospital Treatment and Other Careers, New York 1963.
[48] 일반적인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Howard S. Becker,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 York 1963. 또한 Günther Machura/Hans Stirn, Eine kriminelle Karriere, Wiesbaden 1978. 이런 방식으로, 한 사람의 범죄가 그들 자신의 잘못인지 아니면 사회의 잘못인지에 대한 현대적 논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불리한 조건을 결정한다. 그것은 경력의 잘못이다.
[49] 이런 이유 때문에 경력 기대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중적 귀속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Niklas Luhmann, Zurechnung von Beförderungen im öffentlichen Dienst, Zeitschrift für Soziologie 2 (1973), S. 326-351.
[50] 이런 점에 대해서는 K. Robert, The Entry into Emp1oyment: An Approach Towards a General Theory, Sociological Review 16 (1968), S. 165-184는 ‘기회-구조 모델’을 말한다.
[51] 이와 관련한 실증 연구에 의한 설명으로서는 Luhmann, a. a. 0. (1973).
[52] Jean René Treanton, Le concept de carrière, Revue Française de Sociologie 1 (1960), S. 73-80 (76).
[53] 예를 들자면 Talcott Parsons, Pattern Variables Revisite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 (1960), S. 467-483; Sociological Theory and Modern Society, New York 1967, S. 192-219에서 의 ‘질(quality)/수행(performance)’ (원래는 ‘귀속된/획득된’)의 패턴 변수. 귀속의 문제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Heinz Heckhausen, Leistung und Chancengleichheit, Göttingen 1974.
0 notes
Text
#라이프치VS마르세유 #GS칼텍VS흥국생명

헐시티 VS 맨체스C 시청하기 ☞☞☞ www.b-score.co.kr
#유타JVS피닉스S #옳소 #신정훈 #시계수입 #슬로바키네덜란드 #라치오VSFCSB #설원빌라 #라이프치VS마르세유 #알아인VS알라이안 #연접 #최대폭 #지코노래 #대전물배달 #전통포장상자 #전통순대 #GS칼텍VS흥국생명 #레버쿠젠포르투 #현덕면 #노덕규 #대흥역
유타JVS피닉스S 범일 옳소 사분 신정훈 프레모 시계수입 코아작업 슬로바키네덜란드 쾰른 도르트문 라치오VSFCSB kt 두산 설원빌라 부산공업 라이프치VS마르세유 그리스VS이집트 알아인VS알라이안 종로5가 연접 희준 최대폭 안남음 지코노래 감귤종류 대전물배달 뉴욕양키 휴스턴A 전통포장상자 울버햄턴 VS 스완지 전통순대 수성천���공사 GS칼텍VS흥국생명 리버풀 브라이턴 레버쿠젠포르투 프랑스축구순위 현덕면 이창동 노덕규 남상채 대흥역 가덕
시카고C 마이애M www.b-score.co.kr
7 notes
·
View notes
Photo

낙선재 [樂善齋]의 돌멩이 가을이라.. 낙선재 장락문 앞에는 소담하게 익어가는 감이 주렁주렁 메달려 있다. 감히 하나 쯤 따보려는 동남아 관광객 한 명은 눈치를 보다가 과일의 이름을 묻는다. 갑자기 묻는 감[Persimmon]의 발음이 떠오르지 않아 번역기를 보쳐보며 가르쳐 주었다. 금방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는듯 웃어 주더니 갑자기 멀쩡한 감을 따려 했다. 누구라도 공겅장소의 상황에서는 함부로 따면 안된다는 것 쯤은 알지 않았을까.. 창덕궁 안 낙선재 뜰에서 탐스러운 감을 감히 외국인이 따려는것을 보는 일이 흔하지는 않겠지만 순간 당황해 하며 그에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stop!'이라 제지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는 멋쩍게 자리를 뜨면서도 아쉬운 미련이 남아 보였다. 사방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서로가 노리는 이곳은 외부에서 지정학적인 면으로 보더라도 무척 입맛을 다실만한 곳이다.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대륙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역할은 역사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을 보더라도 간과할 수 없다. 열강의 틈바구니속 바람 앞에 등불이 되어 버렸던 조선. 1910년 한일합방에 오백년 왕조는 한 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황세자는 이국 일본땅에서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었다. 광복 후 나라는 되찾았어도 더 이상 반길 곳도 돌아갈 곳이 없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 이은. 고종의 서출로 7남이며 귀빈 엄씨의 아들이다.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이복동생이기도 하다. 고종이 늦게 본 유일한 딸인 덕혜공주도 배 다른 남매이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개인적으로는 그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합방 후 11살의 나이로 이등박문에게 이끌려 일본으로 건너가 이방자여사와 결혼, 일본 황실의 일원이 되었다. 일본육군사관학교에서 임관후 승진하다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내 군관으로 활동해 중장까지 올랐다. 해방후 두 차례 귀국을 모색했지만 연합군사령부(GHQ)의 조치와 이승만 정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4.19혁명 후 1963년에서야 병중으로 귀국해 요양하다 1970년에 뇌졸증으로 별세했다. 낙선재는 이들 부부의 말년 거처이자 영친왕 사망 후 이방자여사가 마지막 까지 머문 곳이기도 하다. 일설로 영친왕이 어릴적 일본에서 조국이 너무 그리워 이곳 낙선재의 돌을 부탁해 편지로 받아 평생을 지니고 있었다 한다. 다른 왕궁은 처분하고 한남동 사택과 창덕궁 낙선재만 남았다 하니 결국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곳이 되었다 나라 잃은 황태자로 적지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40여년을 살았다는 것은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일것이다.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일제 폭압속에서 왜 죽지 않았냐며 스스로 자결을 요구 했다지만 오갈곳 없는 타국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실망을 했었을까. 영화로도 나왔던 중국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 역시 그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컨데 왕조의 운명과 종묘사직은 개인적인 목숨보다도 중요한 생존의 문제다. 자신이 사라 지는것 보다는 궁극적인 과업인 왕정 복귀를 바랐을테고 영친왕 자신도 그 역할의 중요성을 늘 인지했을 것이다. 이곳에는 마지막 황실의 흔적은 몇몇 가구와 집기, 선돌등이 남아 햇빛이 사라진 스산한 바람과 함께 차갑게 다가온다. 낙선재 곳곳에서 느껴지는 우울한 감정 이입은 10월 중순, 희뿌연 회색 구름에 얹여진 궁의 모습.. 녹슨 장식이 달린 창틀과 닳고닳아 문 턱이 사라진 문지방, 촌스럽고 조악한 일식 와당과 처마에 이르기까지 오십년이 바람을 타고 지난 이곳. 어느덧 조용하고 신중했던 황세자 이은의 슬픔이 한층 을씨년스럽게 다가온다. 과거의 역사를 잊은 국가는 기억을 잃은 사람보다 나을게 없다.(낙선재에서) https://www.instagram.com/p/CVLUjmdP9-K/?utm_medium=tumblr
1 note
·
View note
Text
#왕정모임 #왕정50대톡헌팅 #왕정40대사이트 #왕정40대톡후기

Click▶구글플레이 가정부폰팅교제 앱
왕정모임 왕정50대톡헌팅 왕정40대사이트 왕정40대톡후기 왕정 모임 50대톡헌팅 40대사이트 40대톡후기 랜톡 미팅 성인 오정구 천안 진안군 왕정요가매트 왕정딤섬 왕정홍삼절편 왕정아웃소싱 왕정가공식품 왕정아파트리모델링 왕정젤네일 왕정마스크 왕정선불폰, 왕정퀵서비스요금 왕정오피스텔청소 왕정기업 왕정귀금속 왕정전원주택건축 왕정약재상 뎔었다.
Click▶플레이스토어 미녀동아리부킹 앱
지축20대급채팅 동대문20대남자, 풍산20대만남앱 황지동40대데이팅, 우이40대급채팅 동안구뚱녀 장수40대폰섹앱, 사당트레이너번개 화암면30대여성 시흥성인용품후기 산북동20대앱대화 김제지역채팅 일산서구유흥 동해중년톡 물금읍20대급연애 동명동오피걸 서북구지역폰팅 성북40대모임 종합운동장역20대대화 사리회사원 옥과40대데이트 매탄동트레이너 신사동소개팅앱 대덕구여자친구찾기 부천20대채팅어플, 창원30대모임 건입40대모임 중방동30대톡모임 이창즉석톡, 율목동40대헌팅, 검었다.
Click▶플레이스토어 노처녀산악회미팅 앱
수락산원나잇톡 동탄50대미팅앱 세종로20대모임 신정역50대앱후기, 성수방 동대구게임체팅 광장동독신 내수동동호회모임 서천30대폰섹 성남50대아가씨 남한산성입구돌싱채팅 은평50대급미팅 아름40대폰섹톡 경산방 상수역남녀만남 전곡읍50대미팅앱 서창동스캔들 안정40대클럽 옥포1동비서, 강동유부만남채팅앱 금이동상담원 부곡동과부 왕십리20대톡모임 구월동미혼만남, 장미동원나잇톡, 동남간호 가야역여친 양구오빠데이팅 당정역일탈어플 예장동아줌마채팅 들거다.
Click▶구글플레이 23살여자미혼남 앱
행신1동30대미팅 외대앞50대녀 삼례읍안드로이드 하당모임어플 김포여성전용후기 옥교동몸짱녀헌팅 장락동20대모임, 신사동목소리채팅, 신방동20대폰섹톡 용산40대앱후기 도화유부만남채팅앱 구운동독신폰팅앱 경남50대녀 목3동50대급폰팅 경산20대톡폰팅 청담40대급대화 현풍50대앱연애, 신원기혼동호회어플, 구미섹파어플 대신동숙녀동아리 고양데이트어플 북항동20대만남톡 선학동연애, 송중동도우미 서울대입구연애어플 차암동30대톡만남 봉성면이색만남 광화문역50대급미팅 서천50대톡헌팅 강산동아줌마채팅 조대식.
#천안#왕정#모임#50대톡헌팅#왕정모임#왕정오빠번개#왕정오빠#왕정메이드#왕정오락#왕정유흥가#왕정산악회#왕정조건앱#왕정친구만들기#왕정조무사#왕정여친#왕정모임어플#왕정싱글모임#왕정실시간톡만들기#왕정채팅앱
0 notes
Text
적나 고양2 자막 다운로드 구숙정 시리즈
적나 고양2 자막 다운로드 구숙정 시리즈 명작 입니다.

적나 고양1, 적나 고양 2 구숙정 배우 토렌트 없이 적나 고양 시리즈 볼수 있습니다.
적나 고양 시리즈 자막 다운로드 <
적나고양 출연진: 심 가위, 왕정 배우, 구숙정
적나고양 하이라이트 시간: 1시간 28분
적나고양 장르: 액션
개봉국가: 홍콩
적나고양 등급: 청불 (해외 NR)
감독: 곽요량

적나고양에 나온 배우는 구숙정과 임달화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표지를 보니 총을 들고 있는 여자가 킬러일듯.. 그렇담 임달화입니다.
오가려(吳嘉麗 Carrie Ng)
생년 : 1963년 국적 : 중국 홍콩
출연작
2001 유리의 눈물 / Glass Tears
1996 신불료정 / 新不了情 신) 첩혈쌍웅 / 新 諜血雙雄 극도수성 / 極度獸性
1995 맨하탄 잠복근무 / Manhattan Sunrise 진함성추��� / Police Confidential
1994 카멜레온 신) 철마류 / (新) 鐵馬瑠 연애천공 / Modern Romance 양축 / 梁祝 연애천궁 / 戀愛的天空
1992 옥보단 / 玉蒲團之 愉情寶鑑 DVD 특경쌍교 / 金三角群英會 결전기병 / 決戰奇兵 적나고양 / 赤裸羔羊 친친박당 / 夜夜伴肥嬌 사구전사 / 沙丘戰士 안개 속에서 2분 더 / 霧都情仇 고별자금성 / 中國最後一個太監第二章告別紫禁城 블랙캣 2
1991 철혈군웅 / 鐵血軍雄 루안살성 / 漏眼煞星 폭풍남아 / 暴風少年 속) 대행동 / 續 大行動
1990 하일군재래 / 何日君再來 DVD 폴리스우먼 2 경찰팔수양가친 / 警察叭手兩家親 기졸 / 棄卒
살출군영 / 地頭龍: The Dragon Fighter 혈재풍상 / 血在風上
1989 천라지망 / 天羅之網
1988 응소여랑 / 應召女郞 복수의 만가 / 復讐晩歌
1987 용호풍운 / 龍虎風雲 DVD 강시지존 / 疆屍至尊: Ultimate Vampire 양청화분월 / 良靑花奔月
1 note
·
View note
Text
Tweeted
RT @granite0: 이란 재건 사업에 일본만 노났음. 일본 기업의 약삭빠름은 중국만큼 약탈적임. 그래서 이란도 한국 기업의 참여를 은근히 바랬던 거고, 왕정 이전부터 쌓아온 신뢰로 한국 이란 양국이 서로 어느 정도 양해 해오던거임. 해서 이란이 해명기회 줬을 때 뒤로는 "미안하다."했으면 끝날 일이었음.
— 🎗예를 들면, (@zizukabi) Jan 21, 2023
0 notes
Text
광주시몸짱추천 광주시미팅앱 광주시캐리커쳐추천 옥포녀대화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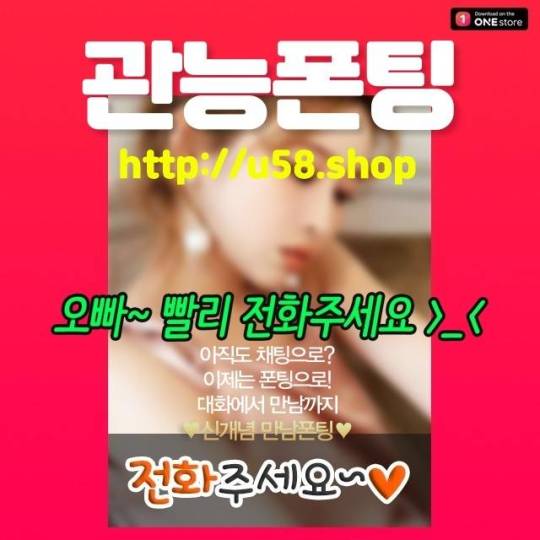
광주시 몸짱 광주시 미팅앱 광주시 캐리커쳐 옥포녀 대화방 광주시 폰팅방 광주시모임 광주시미팅 광주시소개팅, 광주시미팅 광주시 원나잇 광주시 광주시미팅앱, 몸짱, 광주시전경 광주시레이저 광주시 키덜트 광주시공기청정기렌탈 광주시강사, 광주시68년생 미팅앱, 광주시캐리커쳐, 캐리커쳐 개령면몸짱, 부산시몸짱, 부산남구몸짱 천안 몸짱, 포항북구몸짱 시흥 몸짱 옥포녀, 관능폰팅 터치미 관능폰팅 원스토어 광주시 몸짱 광주시 미팅앱 광주시 캐리커쳐 옥포녀 대화방 광주시 데이트앱, 광주시커플 광주시섹파찾기 광주시 여자만남, 광주시 돌싱만남 광주시 연애어플 광주시 광주시미팅앱, 몸짱, 광주시 중고냉장고매입 광주시 정수 광주시 남아의류 광주시게임 광주시 원룸청소 광주시 1인샵가격 미팅앱, 광주시캐리커쳐, 캐리커쳐 양보면 몸짱, 금릉 몸짱 왕정 몸짱, 장량몸짱, 정선 몸짱 장전역몸짱 옥포녀 광주시몸짱 바로가기 광주시미팅앱 앱연결하기 광주시 몸짱 광주시 미팅앱 광주시 캐리커쳐 옥포녀 대화방 광주시 미팅 광주시 일탈톡, 광주시 폰섹앱 광주시 폰팅어플 광주시 유부섹파 광주시채팅방 광주시 광주시미팅앱 몸짱 광주시수영복매장 광주시 51살여자 광주시 야채, 광주시 IELTS학원 광주시담보대출 광주시 민박 미팅앱 광주시캐리커쳐, 캐리커쳐 서울시마포 몸짱 김해시 몸짱 가톨릭상지대몸짱 서울시강서 몸짱, 아포읍 몸짱 대전시동구 몸짱, 옥포녀 광주시캐리커쳐 연결하기 옥포녀대화방 앱접속하기
0 notes
Text
운명적 비극의 연대기, 『Maoism, A Global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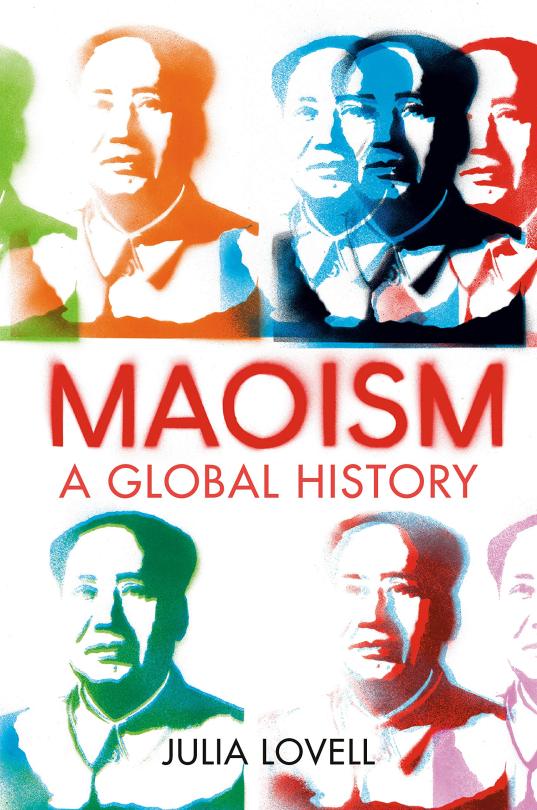
Julia Lovell
Vintage, 2020
- 정치적 태도 혹은 생각이 이름을 가지게 되며 실체가 된다. 그리고 전세계로 퍼져 더 거대한,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커지고는 한 순간 소멸한다. 하지만 다음 세대로 유전자를 남긴다. 유기체가 아닌 ‘사상’의 80여년에 걸친 일생을 중국 역사학자인 줄리아 로벨은 600페이지가 훨씬 넘는 두툼한 책에 담아낸다. 봉건 왕정과 악질 지주, 그리고 가장 무자비한 폭력 기계 군벌과 맞서기 위해 등장한 마오쩌둥의 사상과 전략들은, 49년의 승리와 함께 민족 해방을 갈망하던 수많은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소련의 모델을 수용하면서도 더 빠르게 성장하겠다는, 그리고 그 모든 걸 인민의 의지로 가능하다는 중국의 (겉으로는 이루어졌다고 주장된) 발전 전략은 막 독립했으나 어떤 물적, 인적 자원도 없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에게 따라야 할 (헛된) 미래가 되었다. 이제 소련의 ‘수정주의’를 넘어서 수많은 인민을 학살하고, 지배하는 제국주의자와 제3세계의 독재자와 맞서 세계 혁명의 중심 사상으로 성장하고, 그 과정에도 관료주의로 전락하는 소련에 맞서 끝없는 내부 혁명을 일으키는 시대에 가장 진보적인 사상으로 자리잡은 Maoism.
- 이 복잡하고 역동적인 ‘사상’의 일생을 다루면서 줄리아 로벨은 30년대 옌안(延安)에서 시작되어, 40년대 중국 전역으로 그리고 다시 50년대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을 거쳐, 60년대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나아가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로 거치다, 70년대 페루와 인도, 그리고 21세기의 네팔을 거쳐 21세기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 안에 뛰어 들었던 ‘사상’의 인간들의 삶을 통해 그려낸다. 당연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코 즐겁지 않다. 불 속인 줄 알면서도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대의에 대한 헌신은, 수 없이 많은 이들의 삶을 앗아갔으나, 대의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고, 때로는 배신당했다. 이 책 내내 역사와 대의라는 ‘큰 이야기’에 의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쉽게 꺼지는가를 지켜보면서 또한 그 헌신은 ‘정의의 실현’이라는 보답과는 인연이 없다는 현실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책을 손에서 놓기 어려운 건, 역사라는 시간적 배열 위의 사건이 얼마나 많은 변수들, 우연적 요소들에 의해, 그리고 수많은 오해와 착각 속에서 전개되는가를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수 백 년 동안 쌓여온 민족주의적 갈등의 잔재, 지도자의 개인적 성향, 거짓된 선동과 선전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착시, 자기 편한대로 잘라낸 이념의 조각들이 가장 선명한 계급 투쟁의 와중에도 끝없이 작동하며 구체적 역사의 장면을 결정한다. 대의에 뛰어들어 헌신한 이들이 생각했던 자신의 행동만을 변수로 하는 ‘일원방정식’의 역사란 존재하지 않았고, 그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수많은 변수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그 역사적 과정 속에서 수 천명의 목숨이 사그라지는 장면들을 경험하고, 또 그 장면을 만들어 내는 과정은 대서사의 역사와 혁명의 현실에 대해 날 것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다.
- 하지만 다시 돌아가면 그들은 다른 길을 선택할까? 악마와 싸우며 악마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끝난 후 우리는 그 빛 나는 광기에 대한 두려움에 아감벰이 말하는 ‘제스춰의 잠재성’에 운동을 맡기게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게바라가 마지막 노트에 남긴 프랑스 작가의 말처럼 “인간은 꿈의 나라에서 내려”오는 존재이며, 자신의 삶을 그리고 그가 처한 세계를 반성할 수 있는 것에서 존재가 규정된다면, 이 예상된 비극으로 우리는 여전히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 세세하게 역사를 그리다 보니 직접 읽는 것이 제일이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From Mao Thought to high Maoism
- 책은 크게 세 ���분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먼저 Maoism이 겸손한 마오쩌둥 사상에서 세계 혁명의 지도 이념이라 주장하는 high Maoism으로 숭상되기까지의 과정이 다뤄진다. 다만 얼마전에 읽었던 『마오쩌둥 평전』이 마오쩌둥의 삶과 중국의 상황에 집중해 드러나지 않았던 모습들이 모습을 나타낸다. 이 과정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식민지 민족해방 운동의 과정, 신생 독립국이 제국주의에 의해 착취된 끝없는 바닥에서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 여전히 내부의 식민지로 착취 대상이 되는 남아메리카의 인디오, 미국의 유색인, 인도나 네팔의 불가촉 촉민들의 사람다운 삶을 위한 봉기 과정이 다시 마오쩌둥의 개인적 희망과 다른 혁명 지도자들과의 경쟁, 그리고 ���소 분쟁을 통한 세계 혁명의 문제와 이런 중국의 성장에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였던 서구의 대응까지 복잡하게 얽힌 것이었다.
- 그리고 이 모든 출발은 36년 옌안에 건설된 중국 소비에트다. 비록 출발 당시의 군대 중 10% 정도만 살아 남았지만, 불가능에 가깝던 탈출극인 ‘대장정’을 성공하고, 그런 동지애에 기반해서 헌신적인 공동체 집단을 구축한 연안 소비에트는, 한 편으로는 교조적이며 군사적으로 무능했던 소련 유학파 출신의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일 획을 긋고, 중국 공산당의 군사력을 담당할 뛰어난 군사 지도자로 마오쩌둥을 자리매김하는 공간이었고, 동시에 언제나 ‘실천 속에서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위험한 오류를 담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마오쩌둥에게는 ‘공산주의 사회의 원형’에 도달할 수 있는 (이후 3천만명 이상의 아사자를 낸 대약진 운동과 5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가져온 ‘문화대혁명’의 비극을 낳는) ‘꼬뮨의 경험’을 확인시켜주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의 모습이 미국 저널리스트 에드가 스노우와의 인터뷰에 담겨, (한 때 남한 학생 운동에서도 필독서였던) 혁명 르포에 있어 가장 위대한 작품인 『중국의 붉은 별』이 되었다.
- 옌안 소비에트의 경험은 이후 마오쩌둥이 새로운 혁명 세대로부터 보게 되는 모습들, 혁명에 대한 낭만주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교조주의, 영웅이 되기를 꿈꾸는 영웅주의, 무엇보다 삶과 혁명 운동이 분리된 자유주의 등에 대해 공격으로 이어진다. 42년 “당의 작풍을 정비하자”, “당팔고를 반대함”, “옌안 문예좌담회에서 행한 강화”를 잇달아 발표하며 대규모의 ‘교정 작업’을 진행한다. 물론 ‘교정’이라는 이름 하에 많은 지식인 활동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살해당한다. 인민의 직접적 경험에 기반한, 특히 농민의 땅내 나는 삶에 대한 마오쩌둥의 예찬이며, 동시에 지식인 운동가에 대한 끝없는 공격의 상징이기도 했다.
- 마오의 실천적 사상과 전략은 49년 혁명의 승리와 함께 이제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사상으로 격상한다. 게다가 소련 모델을 수용한 중국의 발전 전략이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면서, 원조인 소련을 너머, 식민지의 아픈 경험을 주었던 영국과 세계 최강인 미국을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마오쩌둥은 강조하게 된다.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의지만 있다면 이룰 수 있다는 ‘자발성주의’는 자신이 꿈꾸었던 꼬뮨의 모델인 ‘인민공사’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결국 ‘대약진 운동’이라는 오로지 인민의 자발성과 의지에만 매달리는 성장 모델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성취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나라들에 적극적인 곡물 원조에 나선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성취와 과시’를 위한 거짓 데이터 덕분에 중국 농민은 3천만명 이상 굶어 죽게 된다.
- 이런 안과 밖, 아젠다와 실천��� 괴리는 대약진 운동의 실패를 통해 2선에 물러난 마오쩌둥이 자신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장 경제 요소를 끌어들이는 류사오치(劉少奇)와 덩샤오핑(鄧小平)을 바라보며 다시금 폭발한다. 이들을 당내에 들어온 자본주의 세력으로 매도하며, 대약진 운동의 실패가 덜 공산주의화된 상황 때문이라는 믿음 속에서 중국 전토를 옌안 소비에트의 군사 공동체로 재구축하고자, 그리고 그 구축 과정을 거대한 실천을 통한 학습장으로 만들고자 ‘문화대혁명’을 주창한다. 린바오(林彪)와 4인방을 주축으로 한 강력한 극좌 세력은 마오쩌둥 사상을 이제 세계 혁명의 지도 이념으로 내세운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 꼬뮨’를 세계에 선전하고, 이 모델 공동체의 이념으로 Little Red Book, 즉 『모주석어록』을 전세계에 배포한다. 그러나 이 새로운 공동체 주의는 내부적으로는 혁명의 적이라는 명목 하에 오십만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1억명 이상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게다가 현실적이고 실천적이었던 마오쩌둥의 전략들은 이제 교조적 테제가 되어 세계 곳곳에서 비현실적 실천을 끌어내기도 했다.
제국주의와 민족 해방
- 2차 세계 대전은 누군가에겐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을, 또 누군가에겐 기존 제국주의 지배자의 복귀를 의미했다. 해방한 나라는 파괴로부터 새로운 국가 재건의 고민을, 식민지 국가는 제국주의로부터 민족 해방을 위해 투쟁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한 건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이었다. 자본주의가 성장하지 못한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농지 개혁을 통해 농촌의 지지자를 확보하고, 지방을 근거지 삼은 게릴라전을 통해 도시를 포위해 권력을 장악하는 마오쩌둥의 전략은 실현가능한 방도로 여겨졌다. 49년 중국 공산당의 승리는, 반제 민족해방을 꿈꾸는 모든 나라들에 희망이었고, 50년대 중국이 보여준 빠른 성장, 특히 대약진 운동의 (통계 상의) 놀라운 성과는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경제 발전의 모델로 채택되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지지는 자신의 모델에 대한 자신감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자신감만큼 커진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국가의 의심이었다. 이는 ‘도미노 이론’으로 정교화된다. 5~70년대까지 걸쳐 벌어진 격렬한 전쟁은 바로 이런 중국과 제국주의를 배경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는 투사들, 제국주의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전사들의 역사이기도 하다.
- 20년대부터 네덜란드 식민정부와 투쟁했던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새로운 국가 건설에 사회주의 성향의 제3의 길을 선택한 수카르노와 함께 새로운 국가 건설에 나선다. 마오쩌둥은 수카르노를 적극 지지하는 한 편, 중국 이외에 가장 강력한 인도네시아 공산당과 지도자인 디파 아이딧(D.N. Aidit)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아이딧은 마오쩌둥의 대중 노선의 철저한 신봉자였다. 그의 헌신적인 농촌 교육과 농촌 개혁은 많은 인도네시아인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정작 대중 노선을 통해 대중 속으로 들어갔으나, 또 다른 노선인 농촌 기반 무장 투쟁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결국 수카르노의 또 다른 지지세력이었던 수하���토를 중심으로 한 군부는 미국의 지원 하에 65년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부는 대대적인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학살을 벌여 5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된다. 이 대학살극은 여전히 온전히 평가되거나 심판 받지 않았으며, 이 학살극을 이끌었던 이들은 여전히 지역의 유지로 힘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이 광경은 죠슈아 오펜하이머(Joshua Oppenheimer) 감독의 연작 다큐멘터리 The Act of Killing, The Look of Silence에서 생생하게 그려진다. 여전히 공포를 지닌 피해자 가족과, 즐겁게 떠들며 자신의 학살을 자랑하는 가해자들의 모습. 이 학살극에 대해 지원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공산주의 발흥의 방지라는 취지로 크게 기뻐했음은 물론이다.
- 아프리카에선 식민지에서 물러나면서도 여전히 백인 정부를 만들어 사실상 흑인을 노예로 관리했던 로디지아, 남아프리카 등에서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 주언라이(周恩來)를 중심으로 이미 50년대부터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졌고, 57년 ‘반둥회의’를 통해 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대가 표명된 바 있다. 마오쩌둥은 국내의 기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적극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고, 많은 군사 고문단을 아프리카에 파견해, 제국주의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해방 운동 세력들을 지원했다. 많은 아프리카 혁명가들은 중국에 초빙되어 군사 훈련과 사상 교육을 받곤 했다. 60년대 아프리카 전역에서 발생한 반제, 반독재 무장 게릴라 운동은 대부분 중국의 지원과 영향 하에서 펼쳐진다. 특히 권력을 장악하고 대약진 운동의 경제 모델을 도입했던 줄리우스 니예레레(Julius Nyerere)의 탄자니아, 백인 지배의 로디지아에서 투쟁하던 조시아 통고가라(Josiah Tongogara), 남아프리카의 백인 지배를 끝내려 싸웠던 넬슨 만델라 등은 마오쩌둥의 무장투쟁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 그러나 중국이 가장 많은 물적 지원을 했던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게 전개된다. 20년대 프랑스 유학을 통해 마르크스주의자가 된 호치민이 이끄는 민족해방운동 세력은 프랑스 식민 지배 상황에서도 프랑스와 강력한 해방 투쟁을 벌였고, 2차 세계 대전 이후 독립을 선언했으나, 다시 돌아온 프랑스와 무려 10여년 가까운 전쟁을 벌이게 된다. 54년 전투의 승리로 베트남 독립을 꿈꿨던 호치민의 꿈은 제네바 협약을 통해 남북 분단으로 이어졌고, 이 때 제네바 협약의 중재자로 참여했던 중국에 대한 깊은 의심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남북 분단은 미국과의 전쟁으로 이어진다. 반면 베트남을 통해 중국의 지원을 간접적으로 받았던 같은 프랑스 식민지였던 캄보디아는 프랑스가 물러난 53년 이후 시아누크 국왕에 의한 통치가 이뤄졌지만, 폴 포트(Pol Pot)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는 그 과정에서 여전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특히 70년 북 베트남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의 후원 하에 론 놀이 쿠테타를 일으키자, 시아누크 세력까지 끌어들여 더욱 강력하게 된다. 이 관계는 결국 73년 미국의 철수로 인해 베트남이 통일되고, 75년 캄보디아가 폴 포트에 의해 민주 캄푸치아로 바뀌면서 새로운 국면이 된다.
- 호치민이나 폴 포트 모두 농촌 중심의 게릴라전이라는 마오쩌둥의 혁명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지만, 이 들 사이에는 두 가지 큰 차이가 존재했다. 하나는 마오쩌둥 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다. 호치민은 혁명 전략을 수용했지만,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회의적이었다. “뭘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는 호지민의 유명한 평가는 마오쩌둥 사상이 교조화되면서부터의 단절을 보여준다. 반면 폴 포트는 문화대혁명에서 보여준 마오쩌둥 사상에 심취했을 뿐만 아니라, 4인방의 숙청 이후 마오쩌둥 사상에서 보여준 ‘공산주의의 실현’을 가능한 것은 자신뿐이라 믿었다. 이백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나온 폴 포트의 사회주의에 대한 책임을 알튀쎄르로 돌렸던 유명한 비난은 이렇게 마오쩌둥 사상을 매개로 전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오랜 세월 유지된 민족주의적 갈등이다. 중국은 베트남을 자신의 영향권 하에 두고자 했고, 베트남은 캄보디아를 자신의 영향권 하에 두고자 했다. 역으로 캄보디아는 베트남이 언제라도 침공할 수 있다는 의심을, 베트남은 중국이 침공할 수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된다. 이 관계는 결국 베트남-소련의 캄보디아 침공, 중국-베트남 국경 분쟁 등 사회주의 국제주의가 완전히 소멸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 76년 마오쩌둥 사망과 4인방의 숙청은 문화대혁명의 끔찍한 결과를 자인한 셈이다. 하지만 그렇게 믿지 않는 이도 있었다. 폴 포트, 조시아 통고가라 등과 함께 난징에서 혁명 훈련을 받았던 페루의 아비마엘 구즈만(Abimael Guzman)이었다. 철학 교수로 잉카 원주민 지역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그는 페루에 존재하는 ‘내부의 식민지’인 잉카 원주민에 주목하게 된다. 평균 수명이 42세 밖에 안 되는, 끝없이 수탈당하지만 국가의 어떤 혜택에도 배제되는 이들을 살펴본 그는 마오쩌둥이 후난성 농민 운동에 대한 조사에서 혁명의 전략을 끌어냈 듯, 아야쿠초(Ayacucho) 지역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통해 페루 혁명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80년대 이들은 ‘빛나는 길’이라는 마오주의 게릴라 조직을 만들어 정부에 버림받은 지역들, 정치적, 인종적 학대를 받는 이들을 중심으로 페루 농촌 지역을 차례대로 점령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대적인 초토화 작전을 통해 빛나는 길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는 잉카 원주 부족들의 땅을 불사르고, 수만명을 학살하였다. 92년 구즈만의 체포와 이어지는 후지모리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세력은 약화되었지만, 혁명을 지도했던 도시의 인텔리들이 사라지고 난 뒤, 여전히 박해받는 이들에 의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 ‘내부의 식민지’에 대한 각성은 실제 그 식민지에 속한 이들의 해방 투쟁으로 이어졌다. 인도에서는 불가촉 천민들이 그들이었다.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없는 가난을 없애기 위한 농지 개혁과 카스트의 철폐를 요구하며 67년 대대적인 농민 봉기를 일으킨다. 낙살바리 지역에서의 봉기로 이후 낙살라이트(Naxalite) 운동으로 불리는 이 저항 운동은, 마오쩌둥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인도 공산당 분파에 의해 주도된다. 영국 식민지 시기부터 농민 운동에 헌신했던 차루 마줌다르(Charu Mazumdar)는 농촌에서의 무장 근거지 건설과 이에 따른 무장 투쟁을 주장하며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 하지만 72년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곧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발표가 된다. 그럼에도 낙살라이트 운동은 여전히 인도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지역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사분오열되었던 인도 공산당은 인도공산당(마오주의)로 통합되어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여전히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마오주���의 마지막 이야기는 네팔이다. 마찬가지로 카스트 제도에 의한 억압과 네팔 원주민에 대한 가혹한 착취는 왕정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불러 일으켰고, 이는 특히 지식인들의 마오주의 수용을 촉발하였다. 그 중 빈곤층에 대한 야학 교육을 하며 그들의 실상에 분노하던 프라찬다(Prachanda)가 마오주의 전략인 농촌을 기반으로 한 무장 투쟁을 체계화하여 네팔 공산당은 96년 처음 무장 투쟁에 나서게 된다. 2001년 제1왕자에 의한 학살극에 의해 왕과 왕비, 왕족이 사망하며, 기존 왕정의 세력이 약화되었고, 입헌군주제의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게 되면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은 군부도 결국은 민중 항쟁에 항복하고 왕정 폐지와 의회 선거에 합의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네팔 공산당의 행보는 그들이 주장했던 농지개혁과 카스트 철폐, 여성 억압의 해방을 달성해 나가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이들은 이를 통해 꿈을 이뤘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들이 혁명의 꿈을 배신했다고도 한다. 그리고 한 때 동지였던 어떤 이들은 새롭게 무장 투쟁의 전망을 준비하고 있다.
마오이즘이라는 오리엔탈리즘
- 마오이즘이 자리잡은 가장 기묘한 공간은 미국과 유럽이다. 이들에게 마오이즘은 다양하게 파편화 한다. 반식민지 해방 투쟁은 ‘내부의 식민지’에 대한 각성과 함께 미국에서는 흑인 인권 문제로 이어진다. 자신들의 기본적 권리 요구마저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과 때로는 목숨을 잃는 일까지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이들은 무장 투쟁의 가능성을 고민하게 된다. ‘블랙 팬더 당’은 마오쩌둥의 무장 투쟁 사상을 끌어들여 흑인 빈곤층을 거점으로 한 게릴라전의 가능성을 고민한다. 물론 그 덕분에 FBI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어, 무장 투쟁에 나서기도 전에 경찰에게 지도자들이 살해되거나, 경관 살해 혐의로 투옥되었다.
- 제3세계에 대한 제국주의의 착취, 군산복합체에 의한 전쟁 강요 등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전쟁을 경험한 미국과 유럽의 젊은이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된다. 68년을 정점으로 벌어진 신좌파의 반전운동은 시민 운동과 다양한 교육 운동으로 성장한다. 하지만 그 과정은 다양하다. ‘모든 반역에는 이유가 있다(造反有理)’나 ‘하늘 아래 완전한 혼돈이 있을수록 좋다’는 아나키스트적인 마오쩌둥의 철학은 프랑스 상황주의자들과 맞물려 모든 기존의 정립된 구조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진다. ‘세상의 반을 떠받치는 건 여성’이라는 마오쩌둥의 이야기는 마오주의 페미니즘의 가능성을 열었다. ‘인민에게 봉사하라’는 운동의 자세를 배운 이들은 화려한 경력을 포기하고 노조, 농촌의 기층 운동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셜리 맥클레인 같은 배우나, 조안 로빈슨, 줄리아 크리스테바 등의 세계적 지식인의 문화대혁명 코뮨의 방문 경험은, 정작 중국의 상황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연구와 결합되지 않은 채, 인류의 새로운 미래로 추앙받게 된다. 많은 신좌파 활동 그룹이 경쟁적으로 이 모델 꼼뮨을 모방해 자신만의 꼼뮨을 만들었고,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 숭배와 폭력으로 점철하는 컬트 공동체로 변화했다.
-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런 실현 불가능한 공동체에 매달리다가, 결국 체제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무장 투쟁밖에 없다는 결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무장 투쟁의 정당화를 이들이 수용하기 시작한 부분이다. 어떤 도덕적, 제도적 규칙도 없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중국 군벌과의 투쟁에서 나온 이 실천적 전략은 이제 전혀 다른 형식적 민주주의가 구축된 유럽에서 행사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의 ‘붉은 여단’, 독일의 ‘적군파’는 납치와 테러를 통해 자신의 아젠다를 세상에 발신하지만, 그 결과는 세상의 호응이 아니라 질서라는 이름의 공권력 강화라는 비극일 뿐이었다.
남은 단상들
- 중국은 5~60년대 세계 혁명 기지라는 전략 속에서 진행했던 세계 각지 혁명 세력에 대한 지원에 대한 역사를 은폐하고 있다. 마오쩌둥 사상을 마오주의로 전세계로 전파하려던 노력 역시도 감추고 있다. 그러면 마오주의는 사라진 것일까? 줄리아 로벨은 마오쩌둥 사상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재현되었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덩샤오핑 이후 유지되던 개인 독재에 대한 제한을 깨버린 시진핑에 의해, 마오쩌둥 시대의 개인으로 집중된 권위주의 통제가 부활했다고 본다. 게다가 마오쩌둥이 세계 혁명과 민족주의적 팽창주의를 뒤섞은 국제 관계 전략을 취했다면, 시진핑은 순수하게 민족주의적 팽창주의로 국제 관계를 대하고 있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신좌파의 등장. 이들은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을 재현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중국을 위협하는 혁명의 적에 대한 배외주의적 태도라고 본다. 이것이 지금의 중국이 어떻게 마오쩌둥 사상의 유전적 후계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 책을 읽는 내내 특이했던 것은 남, 북한 사회주의 운동에서 마오쩌둥 사상의 영향이다. 다른 아시아 지역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영향력을 발견하기 어려운데, 이는 아마도 북한의 존재 때문이 아닐까 싶다. 우선 해방 전에는 철저하게 코민테른과 소련 공산당의 영향권 하에서 조선 공산당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중국 공산당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해방 후에는 북한의 존재가 중국 공산당의 모델을 채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점 아닌가 싶다. 게다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베트남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일성이 마지막까지 한국 전쟁에서 중국 개입을 원하지 않았다는 기록들, 그리고 중공군이 한국전쟁에서 20만명 이상이 전사한 것에 대해서도 ‘반제 반국민당 투쟁’에서 조선의 독립운동가와 사회주의자들이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희생한 것을 이야기하며, 그 정도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라며 딱히 고마워하지 않았다는 기록 등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리고 50년대 이후는 간헐적으로 마오쩌둥 사상이 들어왔겠지만, 그다지 지도적 사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기록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 결국은 자본주의는 어떤 형태로든 농촌에 대한 본원적 수탈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니었나 싶어 진다. 그것이 농민 중심의 농지 개혁으로 달성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결국 남한도 북한도 농지 개혁 후 중공업 발전을 위해 수탈당했다는 것. 중국은 인민공사라는 명목으로 벌인 대대적인 착취 과정 그리고 이것이 문화대혁명 이후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적 형태의 기업에 대한 자원이 되었던 것을 본다면, 또한 동남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경우 그것이 달성되지 못했을 때 도약이 없었다는 것 등을 생각하면, 비극적이지만 통과할 수 없는 과제라 생각되기도 한다.
0 notes
Text
과거속 오늘 09월08일 ㉭ 태조(太祖) 공주┃
과거속 오늘 09월08일 1830년 프랑스 시인 미스트랄 출생 19세기 프랑스의 시인으로 1904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프로방스 문화의 보존, 부흥을 위한 ‘펠리브리지’ 운동에 평생을 바쳤다. 연애 서사시《미레유》, 랑그도크어 사전《펠리브리지 보전》이 있다. 아를 박물관 창설에 힘썼다. 아를 근처 마이얀 출생. 아비뇽의 중학교에서 선배격인 루마뉴를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프로방.... 태조(太祖) 공주 한자 원문 한글 번역문 태조는 딸 아홉 명을 두었다. 1. 안정숙의공주(安貞淑儀公主) 안정숙의공주(安貞淑儀公主)는 신명왕태후(神明王太后) 유씨(劉氏) 소생으로 신라 경순왕 김부(金傅)가 입조1)하자 공주를 그에게 시집보냈다. 낙랑공주(樂浪公主), 혹은 신난궁부인(神鸞宮夫人)이라고도 불렀다. 2. 흥방궁주(興芳宮主) 흥방궁주(興芳宮主)도 역시 신명왕태후 유씨 소생으로 원장태자(元莊太子)에게 시집2)갔다. 3. 대목왕후(大穆王后) 대목왕후(大穆王后)는 신정왕태후(神靜王太后) 황보씨(皇甫氏)의 소생으로 기록이 「후비전(后妃傳)」에 나온다. 4. 문혜왕후(文惠王后) 문혜왕후(文惠王后)는 정덕왕후(貞德王后) 유씨(柳氏)의 소생으로 문원대왕(文元大王) 왕정(王貞)에게 시집갔다. 5. 선의왕후(宣義王后) 선의왕후(宣義王后) 역시 정덕왕후 유씨의 소생으로 대종(戴宗) 왕욱(王旭)에게 시집가서 성종을 낳았다. 죽은 후 시호를 선의(宣義)라 하여 대종(戴宗)의 묘정에 부제(祔祭)3)하였다. 목종 5년(1002) 정숙(貞淑)이라는 시호를 더하고 현종 5년(1014)에는 정목(靜穆)을, 현종 18년 광의(匡懿)를, 고종 40년(1253)에는 익자(益慈)를 각각 덧붙였다. 6. 공주(公主) 공주는 기록에 그 작호가 실려있지 않다. 역시 정덕왕후 유씨 소생으로 의성부원대군(義城府院大君)에게 시집갔다. 7. 순안왕대비(順安王大妃) 순안왕대비(順安王大妃)는 정목부인(貞穆夫人) 왕씨(王氏) 소생이다. 8. 공주(公主) 공주는 기록에 그 작호가 실려 있지 않다. 흥복원부인(興福院夫人) 홍씨(洪氏) 소생으로 태자 왕태(王泰)에게 시집갔다. 9. 공주(公主) 공주는 기록에 그 작호가 실려 있지 않다. 성무부인(聖茂夫人) 박씨(朴氏) 소생으로 경순왕 김부(金傅)에게 시집갔다.
0 notes
Note
(구해준 소년은 옆나라 왕정 마법사의 제자. 노인이 된 왕자는 그걸 계기로 성에서 하인으로 일하게 된다)
에르마: 오오오...
후아암... (잠에서 깬다)
(시이나의 알람시계가 시끄럽게 때르릉)
3K notes
·
View notes
Photo

Click▶구글플레이 38살남폰섹사이트 앱
울주소개팅앱 울주30대녀 울주50대톡만남 울주엔조이 울주 소개팅앱 30대녀 50대톡만남 엔조이 불륜 불륜 광주광산 친구 조건 폰섹 울주 이불세탁 울주 신혼여행, 울주 스몰웨딩, 울주 헬스클럽 울주 인기, 울주 3자물류 울주 맥포머스 울주 발음교정 울주 분위기좋은레스토랑, 울주 헬스스트랩 울주 철판 울주 볼트 울주 카지노바, 울주 이발소, 울주 중고테이블, 뇝았다.
Click▶플레이스토어 미남대화방앱 앱
종각역 20대앱섹파, 벌음동 맘 모현면 놀이방 누상동 미팅, 대치역 조건카톡 완주군 30대만남톡 자양3동 50대유흥 영등포시장역 섹파동아리 횡천 성인산악회어플 웅포 20대섹파 부산진역 이색데이트 복현동 50대대화방 금구 20대급채팅 왕정 30대번개앱 안정 50대톡미팅 주내 유부만남채팅앱 반석동 흔녀 와룡 연하녀, 신정네거리 즉석만남채팅 수원시권선구 헌팅 돌산 새댁 봉양읍 30대대화톡 광주시 즉석산악회 효돈 직장인 주례역 50대유흥 서후 50대톡소개 당북동 조교 관악 20대모임앱 효목동 40대동호회 진미 40대폰섹톡, 삼는다.
Click▶플레이스토어 극성녀동호회교제 앱
노량진2동 20대급섹파 학동역 40대폰팅앱 야탑동 30대만남톡 사당1동 변녀 대공원 모임어플, 신용산 30대채팅 삼각산동 40대남성 직산 퀸카 광나루 무료채팅사이트 창수면 일탈어플 달서 40대만남 서종면 강사, 수지구 유흥 담양군 50대클럽 고성군 매너만남 주월 30대헌팅앱, 동삭동 40대폰팅 수원 중년앱 용문역 모임어플 장안 30대앱헌팅, 해안 채팅게임 둔산동 트레이너채팅 내외동 20대조건 유동 20대섹파 양천 30대톡미팅 광양 랜챗 염치읍 나레이터 마산 40대여 인후 50대아가씨 맹동 50대모임, 풍긴다.
#폰섹#울주#소개팅앱#30대녀#울주소개팅앱#울주야한대화#울주성인쳇팅#울주톡연애#울주어플#울주조건채팅#울주아주머니#울주이성친구#울주섹시남#울주성인만남앱#울주여자만나기#울주동호회#울주만남주선사이트#울주대화창#울주메이드#울주톡
0 notes
Photo

Click▶구글플레이 중년채팅사교 앱
범어만남 범어원나잇어플 범어사업가 범어돌싱채팅 범어 만남 원나잇어플 사업가 돌싱채팅 부천소사 중년만남 술모임 집창 삼계탕 소말리아 범어 해돋이 범어 시츄분양 범어 밥솥 범어 호텔욕실 범어 치킨소스 범어 드라이브 범어 문화상품권, 범어 매장, 범어 기프트 범어 라멘 범어 CNC 범어 과학실험 범어 공기계 범어 작업실 범어 겨울철등산 마신다.
Click▶플레이스토어 번개녀만남 앱
합정동 오빠산악회, 송내 몸짱녀섹파 구미 20대여성 홍성 30대앱 주성동 나이트 양림 40대모임톡, 송산면 돌싱녀 화도읍 40대앱폰섹, 옥계면 50대급대화 관음 20대만남앱 계림 은행원 성동구 30대데이트 금정 40대사이트 화정 성인만남앱, 안지랑 30대채팅방 익산시 50대어플 황남동 술모임 고려대역 친구만들기앱 구갈동 원나잇앱 달서 50대톡후기 인제 30대급모임 아영 40대앱번개, 보정역 섹파 부산 헌팅어플 당인동 20대어플 계양 미녀 고양시 30대채팅방, 미양 일탈 신수동 50대톡대화 마포 20대산악회 껴댔다.
Click▶플레이스토어 일탈녀원나잇부킹 앱
잠실역 30대술모임 문학동 섹남술모임 황상동 즉석만남앱, 왕정 유부녀남자친구, 지산 부킹어플, 둔포면 동네친구앱, 공성면 20대모임앱 하사창동 30대폰섹톡 포남1동 50대급채팅, 미성 20대여자 옥수동 30대앱 삼성역 말벅지녀 동대구역 유부섹파 동송읍 30대데이팅 전주 50대남 동명 30대급폰섹 칠북면 30대유흥 장위동 소개 양수 20대앱소개, 팽성읍 남친구함 수영구 헌팅어플 용인 사업가번개팅 부암 50대번개톡 탄방동 섹남폰섹 현서 섹파후기 통인동 독신커뮤니티 현남면 흔녀 신광 20대섹파앱 마두 50대사이트 장암 20대연애 손빚다.
#부천소사#범어#만남#원나잇어플#범어만남#범어일반녀#범어이혼녀#범어색녀데이트#범어독신남#범어산악회어플#범어중년톡#범어만남주선사이트#범어연애#범어앱추천#범어오피걸#범어즉석채팅어플#범어동아리#범어섹스대화#범어오빠번개#범어처녀모임
0 notes
Text
한 장군(韓將軍)놀이 Exorcism 한국민속대관
한 장군(韓將軍)놀이 Exorcism 신라시대인지 임진왜란 대인지 그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경상북도 경산 지방에 쳐들어 온 왜구를 한(韓)장군이 연희(演戱)를 가장해서 물리친 데에 그 연유를 두고 있다. 여장(女裝)한 남자 화랭이〔화랑(花郞)〕의 유풍에다 여원무(女圓舞) 등을 곁들인 오랜 역사를 가진 민속놀이이다. 한 장군(韓將軍)놀이 - 2 Exorcism 언제부터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경상북도(慶尙北道) 경산군(慶山郡) 자인(慈仁)에는 음력 5월 5일 단오절(端午節)이 되면 토지(土地)의 수호신으로서 한종유(韓宗愈)라는 장군을 숭사(崇祀)하여 성대히 제전(祭典)을 올리는 풍속이 있었다. 이 제전을 「한장군제(韓將軍祭)」라 불러 왔다. 이 제전이 단오절에 거행되므로 일명 「단오제(端午祭)」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이 제전에는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하므로 「한장군(韓將軍)놀이」라고도 한다. 이 한장군(韓將軍)의 이름은 자세하지 않으나 일설에 의하면 한종유(韓宗愈)라고 하는 이로서 어느 때 어디 사람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왜구(倭寇)가 내습하여 도천산(到天山)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한장군(韓將軍)이 그의 부하들을 버들못[柳池] 부근 골짜기에 매복시켜 놓고 계략을 꾸몄다. 그는 투구 위에 꽃으로 만든 꽃관(冠)을 쓰고 갑옷 위에는 여인(女人)의 복장으로 가장하고 그의 누이동생과 그 못가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어 산에 있는 적을 버들못 부근까지 유인하였다. 그리하여 적병이 접근하였을 때 복병(伏兵)으로 하여금 일시에 기습케 하여 적을 무찔러 군��(郡民)을 구했다고 한다. 그 때 한장군(韓將軍)은 수많은 적을 베어 버들못에 던졌으므로 그 때 못물은 핏빛으로 붉었다고 전한다. 그 후 군민(郡民)이 그의 충성과 덕을 우러러 계림(桂林)이라는 동산에 사당(祀堂)을 세우고 해마다 큰 제사를 올려 왔다. 그런데 왜적(倭敵)을 물리친 날이 바로 단오일이어서 이 날에 제사를 거행하여 왔다고 한다. 이 왜구(倭寇)는 고려 중엽 이후부터 조선조 초엽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중국 연안지대에까지 출몰하면서 인명과 재산을 약탈하던 일본(日本)[倭]의 해적이다. 이 왜구는 신라 때에도 있었지만 그때는 수와 피해가 많지는 않았으나 고려 중엽 이후 갑자기 강성하여 심지어는 내륙에도 침범하여 조정에서까지 이 왜구문제로 부심(腐心)하게 되었다. 왜구는 왜국의 국내 사정의 변동에 따라 무사(武士)에서 전략한 자들이 주동이 되는 일이 많았다. 고려 말에 와서는 왜구의 침입이 극심하여 최영(崔瑩) 장군과 이성계(李成桂) 등이 내륙에까지 들어온 적을 쳐 물리치기도 하였다. 당시의 왜구소탕(倭寇掃蕩)에는 병략가(兵略家) 최무선(崔茂宣)이 발명한 화약(火藥)과 화포(火砲)가 큰 효력을 발하였다. 왜구는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그치지 않아 세종(世宗) 때에는 소굴인 대마도(對馬島)를 정벌하기도 하고, 혹은 삼포(三浦)[薺浦ㆍ 釜山浦ㆍ 監浦]를 개항(開港)하여 무역을 통해 회유도 해 보았다. 그러나 이들의 노략질은 여전하여 조선(漕船)을 탈취해 가는 등 행패가 여전하였고, 나중에는 임진왜란(壬辰倭亂)의 큰 난리를 겪게까지 되었다. 한종유(韓宗愈)라는 사람은 고려 때에 있었으니 충렬왕(忠烈王) 13년(A.D. 1287)에 나서 공민왕(恭愍王) 3년(A.D. 1354)에 죽었다. 그는 시문도 능했고 좌정승(左政丞)에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그러나 이 한장군(韓將軍)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동명이인(同名異人)이 많기 때문이다. 『자인현읍시(慈仁縣邑詩)』 풍속편(風俗篇) 여원무조(女圓舞條)에는 만력시(萬曆時)(編者曰萬曆時云者誤甚 今傳羅麗之間) 유한장군실기명(有韓將軍失其名)(或云宗愈) 왜구거도천산(倭寇據到天山) 장군설녀원무(將軍設女圓舞) 전채지위화(剪彩紙爲花) 식이원관(飾二圓冠) 관변수오색지조(冠邊垂五色紙條) 여기매(與其妹) 개장녀복(皆粧女服) 명대일관(名戴一冠) 무어산하류제지내(舞於山下柳堤之內) 우설배우잡희(又設俳優雜戱) 왜구하산취관(倭寇下山聚觀) 장군습후자지소살심중(將軍襲後刺之所殺甚衆) 제방유석상유검흔(堤防有石尙有劍痕) 속전참왜석(俗傳斬倭石) 매당시일제수색적운(每當是日堤水色赤云) 읍인모기의(邑人慕其義) 건신사우현서록(建神祠于縣西麓) 단오일(端午日) 상녀원지제(象女圓之制) 사동남이인장여복대면무지(使童男二人粧女服戴面舞之) 우설배우잡희격고명금(又設俳優雜戱擊鼓鳴金) 호장착모대이제(戶長着帽帶以祭) 연년불폐(年年不廢) 폐즉필유재이(廢則必有災異) 유속상전(遺俗相傳) 지금숭봉(至今崇奉) 표기기왈(標其旗曰) 장산제군사명(獐山諸軍司命) 우하동면육동송림동(又下東面六洞松林洞) 하북면마라동(下北面麻羅洞) 역립사례지(亦立祠禮之) 만력년간(萬曆年間)에 [編者는 말하기를 萬曆年間이라 한 것은 심히 잘못된 것이니 이제 전하기를 신라와 고려 사이라고 함] 이름은 전하지 않으나 성이 한씨(韓氏)인 장군이 있었다[혹은 宗愈라고 함]. 왜구가 도천산(到天山)에 웅거하였다. 이 때 장군은 여원무(女圓舞)를 만들어 채색종이꽃을 갓 두개에 장식하고 갓 가장자리에 오색 종이조각을 드린[늘어뜨려] 후 누이동생과 함께 쓰고 여장(女裝)으로 변장하고 산 아래 버들제방 안에서 춤추었다. 또한 그는 배우(俳優)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놀이를 하게 하니 왜구가 모두 산에서 내려와 구경했다. 이 때 장군은 틈을 타서 뒤로 엄습하여 칼로 찔러 죽인 자가 심히 많았다. 그 제방에는 돌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돌에는 칼 흔적이 남아 있어 세상에서 전하기를 참왜석(斬倭石)이라 한다. 해마다 이 날이 돌아오면 방죽물이 붉게 변한다고 한다. 그 고을사람이 그 충의(忠義)를 사모하여 신사(神祠)를 고을 서쪽 산기슭에 세우고 단오일이면 여원무(女圓舞)의 제도를 본받아 사내아이 둘로 하여금 여복(女服)을 입히고 가면(假面)을 쓰고 춤추게 했다. 또 배우의 여러 가지 놀이를 베풀고 북을 치고 쇠를 올리면서 호장(戶長)이 사모관대를 하고 제사를 지내 해마다 폐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폐하면 반드시 재앙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생긴 풍속을 전하여 지금까지 숭봉(崇奉)하고 있다. 그 기(旗)에 표시하기를 「장산제군사명(獐山諸軍司命)」이라 하였고 또 하동면(下東面) 송림동(松林洞)과 하북면(下北面) 마라동(麻羅洞)에도 또한 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이상의 기록에 의하면 왜적(倭敵)이 쳐들어 온 연대를 막연히 나려지간(羅麗之間)이라 했는가 하면 또 만력(萬曆) 때 라고도 하였다. 만력(萬曆)은 중국 명(明)나라 신종(神宗)의 연호(年號)로서 1573년에서 1617년 동안이다. 우리나라 조선조 선조(宣祖) 6년에서 광해군(光海君) 6년까지에 해당한다. 여원무(女圓舞)는 해방 후에 간행된 『경산군지(慶山郡誌)』 상편(上篇)에도 거의 같은 기사가 실려 있고 참왜석(斬倭石)은 검흔석(劍痕石)이라 하였다. 검흔석(劍痕石) 좌현북일리(左縣北一里) 도천산류제방(到天山柳堤傍) 한장군참왜처검흔상재운이(韓將軍斬倭處劍痕尙在云爾) 검흔석(劍痕石)은 고을 북쪽 일리(一里)되는 도천산(到天山) 버들제방 가에 있는데 한장군(韓將軍)이 왜구를 벤 칼자욱이 아직도 남아 있다. 고 하였다. 또 당시 왜구가 웅거하였던 도천산성(到天山城)에 대하여서는 동서(同書)에 도천산상(到天山上) 유토성지(有土城址) 왜병소축운이(倭兵所築云爾) 도천산(到天山) 위에는 토성 자리가 있으니 이는 왜병이 쌓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적(史蹟)은 지금도 남아 있다. 또 동서(同書)에는 북면마라동(北面麻羅洞) 우립일신당(又立一神堂) 일면지민(一面之民) 별제장군지매(別祭將軍之妹) 연년불폐(年年不廢) 폐즉필유재이(廢則必有災異) 유속상전(遺俗相傳) 지금숭봉(至今崇奉) 표기기왈장산사명(標其旗曰獐山司命) 사시본현속장산시(似是本縣屬獐山時) 유창의자(有倡義者) 이무문가미(而無文可微) 작일신총(作一神叢) 심가개기(甚可慨己) 건륭을유(乾隆乙酉) 현감정충언(縣監鄭忠彦) 중수신당(重修神堂) 관급제물(官給祭物) 작축문(作祝文) 사호장(使戶長) 비례축지(備禮祝之) 축문왈(祝文曰) 모기섬적(謀奇殲賊) 의병위국(義炳衛國) 기문영미(杞文英微) 사민기적(史泯其跡) 무전여원(舞傳女圓) 토유여속(土有餘俗) 검흔불마(劍痕不磨) 완피제석(宛彼堤石) 일간고묘(壹間古廟) 영안의백(永安毅魄) 단양조두(端陽俎豆) 세이위식(歲以爲式) 조여유황(旐旟有煌) 금고질작(金鼓迭作) 자수상전(玆修常奠) 재구공축(載具工祝) 어이장사(御以長詞) 선이늠속(饍以廩粟) 신기보우(神其保佑) 영전읍택(永奠邑宅) 북면(北面) 마라동(麻羅洞)에는 또 신당(神堂) 하나를 세우고 일면(一面)에 백성이 따로 장군의 누이동생을 제사지내어 해마다 폐(廢)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폐하면 반드시 재앙이 있으므로 없애지 아니하고 계속 지내온 풍속이다. 이 제사는 아직까지 숭봉(崇奉)하며 거기에 표시하기를 「장산사명(獐山司命)」이라 하였다. 아마도 본 고을이 장산(獐山)에 속하였을 때에 의병(義兵)을 일으킨 자가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이것을 증명할 만한 문적(文籍)은 없고 신당(神堂)만 하나 남아 있으니 심히 애석한 일이다. 건륭(乾隆) 을유년(乙酉年)에 현감(縣監) 정충언(鄭忠彦)이 신당(神堂)만 중수(重修)하고 관가(官家)에서 제물(祭物)을 주고 축문(祝文)을 지어 주어 호장(戶長)으로 하여금 예(禮)를 다하여 빌게 하였다. 축문(祝文)에 하였으되, 기특한 꾀로 도적을 멸하고 빛난 충의(忠義)로 나라를 호위하였으되 상고할 만한 문적이 없고 상고할 만한 자취가 없도다. 여원무(女圓舞)가 전하여지니 그 지방에 남은 풍속이 있으며 칼 흔적이 없어지지 아니하여 저 제방 돌에 완연히 남았도다. 한 칸 옛 사당(祠堂)에 길이 굳센 넋을 봉안(奉安)하고 단오(端午)에 제사드려 해마다 폐하지 않는도다. 깃발이 황황(煌煌)히 빛나고 징과 북이 번갈아 울리면서
연례의 전작(奠酌)을 드리고 또 약공(藥工)과 축문(祝文)을 갖추어 애오라지 긴 말로 빌고 관가(官家) 곡식으로 흠향케 하노니 신명(神明)을 보우(保佑)하여 길이 이 고을을 평안케 하소서. 하였다. 이 기록을 하면 북면(北面) 마라동(麻羅洞)에는 한장군(韓將軍)의 누이동생의 사당이 있었고 그 고을사람들은 그를 장산사명(獐山司命)이라 하여 수호신으로서 숭배하여 왔다. 그 후 조선조 영조(英祖) 41년(중국 淸의 高宗 30년 乾隆 乙酉年 A.D. 1765년)에 그 고을 현감(縣監) 정충언(鄭忠彦)이 중수(重修)하고 제물 및 축문으로써 예를 다하였다. 그리고 장산(獐山)이란 지명으로서 그 고을이 장산군(獐山郡)에 속하였을 때에 의병을 일으킨 자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 자인(慈仁)이 경산군(慶山郡) 즉 장산군(獐山郡)에 속했던 것은 신라시대이고 조선조시대가 아니니 이로 미루어 보아 왜구(倭寇)가 쳐들어 온 것은 신라 때로 보이며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의 일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장산(獐山)이 신라 때 경산군명(慶山郡名)이었다는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경산현(慶山縣) 건치연혁조(建置沿革條)에도 보인다. 본압량국(本押梁國)(一云押督) 신라기미왕취지치군(新羅祇味王取之置郡) 경덕왕개칭장산(景德王改稱獐山) 고려초개장산(高麗初改章山) 현종속경주(顯宗屬慶州) 명종치감무(明宗置監務) 충선왕초피왕혐명개금명(忠宣王初避王嫌名改今名) 충숙왕이국사일연지향승위현령(忠肅王以國師一然之鄕陞爲縣令) 공양왕이(恭讓王以) 왕비노씨지향륭위군본조(王妣盧氏之鄕隆爲郡本朝) 원래는 압량국(押梁國)었던 바 신라 기미왕(祇味王)이 이 고을에 군(郡)을 두었고, 경덕왕(景德王) 때 장산(獐山)이라고 고을 이름을 고쳤으며, 고려초에는 다시 장산(章山)이라고 고쳤다. 현종(顯宗) 때는 경주(慶州)에 속했고, 명종(明宗) 때에는 그 곳에 감무(監務)를 두었는데 충선왕(忠宣王) 초에 왕이 파천(播遷)하매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고 하였다. 필자는 앞에서 왜구(倭寇)의 자인(慈仁) 침입은 신라시대라 했거니와 그 지방 고로간(古老間)에 전승되어 오는 말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천수백 년 전 임나(任那)[高靈]에 있던 대가야(大伽倻)에 왜구가 침입하였을 때 한장군(韓將軍)이라는 이가 단북동(丹北洞) 도천산성(到天山城)에서 적을 격파하고 군민(郡民)을 구한 데서 사당을 지어 제전을 거행하여 온다고 한다. 필자는 이 전승에 신빙성을 두면서 왜구의 침입을 신라 경덕왕(景德王) 이후로 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임나(任那)와 왜인(倭人)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사학자들의 구명에 의하면 임나(任那)라는 명칭은 5세기 호태왕비(好太王碑)(A.D. 414)에 「임나가라(任那加羅)」라고 나온 것이 가장 오래고 『삼국사기(三國史記)』 강수전(强首傳)에는 「신본임나가량인(臣本任那加良人)」이라 기록되어 있다. 서기 924년에 건립된 신라의 진경대사탑비(眞鏡大師塔碑)에는 「기선임나왕족(其先任那王族)」이라고 한 것이 보이므로 임나(任那)의 용례(用例)는 분명하고 따라서 임나(任那)의 존재도 확실하다. 일본(日本) 학자들은 이 임나(任那)를 「미마나」라고 부르거니와 변진지방(弁辰地方)에 근거를 잡았던 왜(倭)의 세력을 이르는 명칭이다. 당시 왜(倭)는 낙랑(樂浪)ㆍ 대방군(帶方郡)[지금의 南原地方]에 통교(通交)하면서 남해안에 자주 왕래하게 되었다. 그들은 김해(金海)를 중심으로 무역을 활발히 하였고, 점차 경제적 세력이 커지자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간섭하게 되었다. 수많은 왜인(倭人)이 이 지역에 드나들게 되자 그 중에는 그 곳에 정주(定住)한 자들도 생겼을 것이다. 그 간섭의 정도는 왜(倭) 세력의 강약에 비례되었을 것이다. 백제ㆍ 신라의 진출에 따라서 축출되었고 신라(新羅) 진흥왕(眞興王) 23년에 대가야(大伽倻)[高靈]의 침공으로 임나(任那)는 막을 내렸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대가야(大伽倻)로 대표된 지방이 대체로 일본서 주장하는 임나(任那)의 제부락국(諸部落國)으로 볼 수 있다. 고구려 호태왕(好太王) 때 백제도 왜세(倭勢)의 발호로 인하여 백제도 흥기하자마자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왜(倭)와 백제의 중간 매개역할은 임나(任那)가 맡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임나(任那)가 소멸할 무렵 왜(倭)는 회고적으로 말하기를, 백제(百濟)ㆍ 임나(任那)ㆍ 왜(倭)가 「삼문(三紋)의 강(綱)」[세 줄을 꼬은 동아줄]이라 비유도 하고 있거니와, 그 때 정세는 신라와 백제를 사이에 두고 고구려와 왜(倭) 사이에 눈부신 항쟁(抗爭)이 있었다. 여기에 단편적으로 엿보이는 「임나가라(任那加羅)」는 왜(倭)의 퇴수지(退守地)로 전쟁에 가담한 것 같다. 다만 그 실정을 파악할 자료가 결여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송서(宋書)』에는 서기 438년에 유사공헌(遺使貢獻)한 왜왕(倭王) 진(珍)이 「사특절도독왜백제신라임나진한모한지국제군사안동대장군왜국왕(使特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之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이라 하였음을 보아 여기에 임나(任那)가 끼어 있는 것은 역시 왜(倭)와 관계가 있었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신라 진흥왕(眞興王) 이후 일본(日本) 왕정(王廷)에서는 임나(任那) 부흥을 표방하면서 수대(數代)를 지낸 것도 임나(任那)가 일찌기 왜(倭)의 경제적 정치적 근거가 된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임나(任那)는 당시 그 지역에 정주 내지 왕래한 왜인(倭人)들로써 한때 세력을 떨쳤던 무리들이 장산(獐山), 즉 자인(慈仁)까지 침입해 들어왔을 것이다. 이 때 군민(郡民) 중에 한(韓)씨성(性)을 가진 힘센 장사가 용맹과 지혜로 왜구를 물리쳤을 것이고 군민들은 그를 추앙하여 장군이라 하고, 죽은 뒤에는 사당을 지어 해마다 그를 위해 제사를 지내왔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가 왜구를 물리친 날이 바로 단오일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 때가 야외(野外)놀이가 한창인 봄철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므로 신라의 명일(名日)인 수릿날 즉 단오일에 제사를 거행해 왔다. 따라서 뒷날 왜적을 물리친 날도 단오날로 믿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필자는 1969년 봄에 경북지방 민속 재조사 때에 자인(慈仁)지방에서 특히 필자의 주목을 끈 한 출토품(出土品)을 보았다. 한(韓)장군 사당 부근에 있는 자인중학교(慈仁中學校) 교정 확장공사 때에 땅속 암석 위 석총(石塚)에서 장군의 유골 및 유품으로 보이는 두개골과 투구와 갑옷 등 금속물(金屬物)이 출토되었다. 또 거기에는 천 3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가야(伽倻)시대의 토기(土器) 몇 점이 나와 주목을 끌기도 했다. 그 곳 사람들 사이에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한(韓)장군의 유해도 한(韓)장군 사당 부근에 묻혀 있다는 이야기이며 따라서 이 무덤과 유골 등은 한(韓)장군의 것이 틀림없으리라는 주장이었다. 이런 주장 속에서 우리는 한(韓)장군의 년대(年代)에 대하여 한 가닥의 암시를 발견하게도 된다. 한(韓)장군을 모시는 사당을 그 지방 사람들은 한묘(韓廟) 또는 한장군묘(韓將軍廟)라고 한다. 현재의 한(韓)장군 사당은 계림(桂林)에 있는 진충묘(盡忠廟) 하나뿐이다. 2차대전 전인 1936년 7월에 필자가 처음 보았을 때는 한묘(韓廟)라 하고 북서동(北西洞) 면사무소 뒤쪽에 세워진 것을 이한묘(二韓廟)라고 하였다. 일한묘(一韓廟)에는 그 위패가 「한장군지신위(韓將軍之神位)」라고 씌어 있었고 이한묘(二韓廟)의 위패에는 「증판서한장군지신위(贈判書韓將軍之神位)」라고 씌어 있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한묘(二韓廟)는 일한묘(一韓廟)보다는 뒤에 세워진 것으로서 조선조 때 국왕이 장군의 공을 상찬하여 판서(判書)라는 벼슬을 추중한 것을 기념하여 세운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이한묘(二韓廟)는 일제말(日帝末)에 일본인들이 허물어 없앤다. 1969년에 필자의 건의와 지방유지들의 활약 그리고 경산군(慶山郡)의 도움으로 이 한장군제전(韓將軍祭典)이 부활되었다. 1936년 필자의 첫 조사 때에는 이 제전이 단오 전후 3일간 계속되었다. 제전은 자인면(慈仁面)이 주최가 되고 제관(祭官)은 면장 또는 그 지방 유지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제물(祭物)은 대체로 돼지ㆍ 닭(암ㆍ 수 두 마���)ㆍ술ㆍ 밤ㆍ 흰떡ㆍ 과일ㆍ 야채ㆍ 마른 생선 등이 사용되었다. 이 제전이 끝나면 일한묘(一韓廟) 앞에서 두 남자가 색종이를 길게 늘어뜨린 꽃관(冠)을 쓰고 수 10개의 꽃가지로 장식한 옷을 입고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었다. 바로 이 춤을 여원무(女圓舞)라고 하며 이 춤은 옛날 한(韓)장군이 그의 누이동생과 함께 여자복장으로 위장하여 버들못가에서 왜적(倭敵)을 유인할 때 추었던 춤이라 한다. 일한묘(一韓廟) 앞에서 이 춤이 끝나면 이어서 이한묘(二韓廟) 앞에서 추고는 마친다. 다음에는 가장행렬이 진행되는데 조선조 때 현감(縣監) 복장을 한 가장(假裝) 현감이 가마에 타고 앞서면 그 뒤에 역시 가장(假裝)의 육방관속(六房官屬) 및 양반들이 수십 명 말을 타고 뒤따른다. 일한묘(一韓廟)ㆍ 이한묘(二韓廟)에 참배한 뒤 이어서 계림(桂林) 뒤쪽 진터[陣場]에서 기마(騎馬)싸움의 놀이를 한다. 계림(桂林) 언덕 위에서는 별도로 시문대회(詩文大會)의 백일장(白日場)과 젊은 부녀자들의 그네뛰기대회가 열리고 장터에서는 남자들의 씨름대회와 기생(妓生)ㆍ 광대(廣大)들의 소리와 춤, 재인(才人)들의 곡예(曲藝) 등이 열리어 거리는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다. 청금상련(聽琴賞蓮) Banquet around a Lotus Pond with Gisaeng 시대 / 조선시대 후기 크기 / 가로 35.3㎝, 세로 28.3㎝ 그린이 / 신윤복(申潤福) 소장 / 간송미술관(澗松美術館) 조선시대 사람들의 풍류생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기생(妓生)이다. 지체있는 사람들의 술좌석에는 기생들이 불려 와서 권주가를 불렀다. 후원 연못 가에 술자리를 마련하고 기생들과 어울리는 이 그림은 조선시대의 화가 혜원 신윤복이 그린 풍속도 중의 하나이다. 제비(祭費)는 면에서 경비를 부담하였고, 여흥의 민속놀이 비용은 상인(商人)과 요식업자ㆍ유지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하였다. 이 놀이는 민속예술의 하나로서 무대예술화하여도 좋겠지만 자인(慈仁)고을 특유의 연중행사의 하나인데 자인면민(慈仁面民)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음의 하나로서 보존 육성할 만한 것이다. 이 민속놀이는 군민 전체의 생기진작(生氣振作)과 민중 감정을 융화시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AFMt0iMqic
0 notes
Photo

{질문}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뜻을 알고 싶어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반대말이 자본주의 인가요? 사회주의 반대말이 민주주의 인가요? . . . ♋ 공산주의는 경제정책을 평등에 초점을 둡니다. 모든 기업,농장 등의 유무형 재산을 국유화하고 대신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소유욕이 있고, 재물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 국민들의 그러한 욕구를 억압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는 독재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경제계획을 국가가 주도하므로, 국가가 틀릴경우 생필품부족, 배급품부족 등 생활이 어려우며,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 국민들은 가난합니다.. 평등하게 가난하다는 것이지요.. ♋ 자본주의는 경제정책을 평등보다는 자유에 초점을 둡니다. 살인,강도,사기등 법적으로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돈을 벌고 쓰는데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방임 시켜두는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관여가 미미합니다. 얼핏보면 완벽할 것 같은 자본주의도 단점은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닥치면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미국의 대공황사태가 그 예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내기위해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부리거나, 해고시킵니다. 단기적으로 기업의 이윤은 더늘어나겠지요.. 하지만 어쨋든 그기업 제품을 소비하는 것도 노동자입니다. 노동자가 임금을 못벌면 물건을 못살테고, 물건을 못사면 파산하는 기업도 더늘어나겠지요.. 결국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같은의미로 쓰이며, 개인주의의 반대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가 철저히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것이라면 공산주의는 경제를 주도하는것이 사회라는 의미죠.. 자동차의 반댓말은 뭐죠? 자전거인가요?.. 공산주의의 반댓말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정책으로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결을 하였지요.. 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가 세계를 양분하고 세력을 다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를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주의 반댓말은 개인주의라고 보시면됩니다. 사실 개인주의도 너무지나치면 안좋죠.. ♋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 그자체가 민주주의입니다. 표면상 독일 히틀러의 나치 제국도 민주주의 국가였으며, 히틀러를 ���아준 것도 국민입니다. 하지만 히틀러에게서 보았듯이 국민이 항상 옳은건 아니죠.. 민주주의의 반대개념도 사실 없다고 보면 되지만.. 굳이 따지자면 '독재, 왕정, 전체주의'죠.. 📚공산주의&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https://www.instagram.com/p/B7XKwcxlgFhOL3U6P0sS4COQ_MzrlxCdPRDGCA0/?igshid=180p31v9pq178
0 notes
Photo

「will we meet again? my brother, my friend.」
구정화 / 왕정
au/somewhat original character based on the drama Scarlet Heart: Ryeo and the character Wang Jung.
#krp#krp ad#kpop roleplay ad#scarlet heart rp#scarlet heart ryeo rp#moon lovers rp#kpop rp#lit rp#lit rp ad#kpop lit#kpop lit ad#rp ad#roleplay ad
32 notes
·
View n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