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t wanna be here? Send us removal request.
Text



온도
-
딱 그 정도의 온도가 좋다. 뜨거운 밤공기가 밤사이 식어 살짝 차가운 저녁.
길 위에서 느린 고개를 끄덕이는 묵념 정도가 좋겠다.
발걸음의 보폭은 크지 않게
또 눈빛은 너무 많이 담지는 말고, 차분한 걸음, 다정하나 뜨겁지 않은 눈짓.
우리의 사이가 마주치는 날엔 그 정도면 딱 좋겠다.
1 note
·
View note
Text


_
나는 내가 없어서 남의 그림자를 훔쳐 입었다.
대체로 삶의 어려운 일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 무기력함이 느껴질 땐 문을 닫은채 가만히 방안에 앉아 있다.
가만히 가만히
이런 말도 안 되고 세상에 별 쓸모도 없는 생각을 길게 한다. 혼자서 별 쓸모없는 생각을 하는 것 정도로 세상에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좋아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걱정을 끼치지도 않는 조용한 나만의 일이니까. 혼자만의 여백을 공상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좋다.
나의 친구 예진이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나는 내가 없어서 남의 그림자를 훔쳐 입었다.”
온통 카피로 둘러싸여 있던 10대와 20대의 계절. 나는 아무것도 되고 싶은 것이 없었다. 남들처럼, 그 남들이 타인의 남들보다 걸음은 느렸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조용히 생각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논쟁으로 인한 지침과 피곤함은 되도록 저만치 멀리에 두고 싶다.
그렇게 조용히 가만히 살다 보면 금방 사는 일의 어려움과 직면하게 된다. 밖에 나가 차 한잔 마시는 것이 내일 점심을 걱정하는 것처럼.
언젠간 내 쓸모없는 생각과 생각들이 돈을 벌 수 있기를.
쓸모없는 건 없다는 어느 유명한 문장처럼, 지금 내가 하는 행동들도 쓸모없지 않기를.
1 note
·
View note
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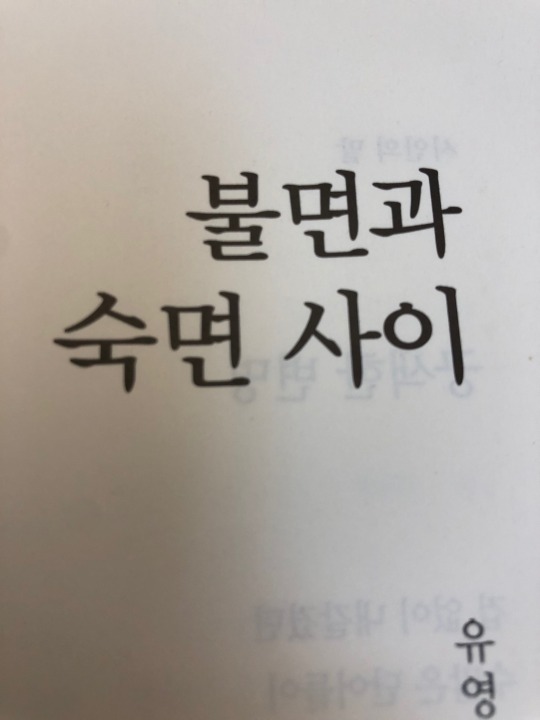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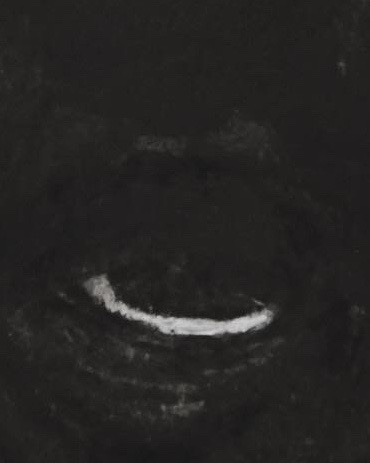

-
102동 반지하
서울 신림동 102동 반지하에는 숨이 죽어있는 종이들과 빛바랜 물감이 뒤 섞인 채 살아가고 있었다.
종이들과 물감들은 5년 동안 그와 숨을 쉬다가 최근 들어 숨쉬는 것을 그만두었다. 엄마는 삶의 길에는 쉬는 길도 있는 거라며 말을 건넸다. 그만하면 됐다고, 이제는 조금 쉼의 시간. 소화시키는 과정을 가지자고 그만 집에 오라고 하셨다.
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엎어지면 잠깐 앉았다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때는 그걸 몰랐다. 내가 지금까지 받친 삶의 가치관과 성실함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었다.
혹시나 내가 살려고 노력한 것들 중에 여전히 버릇처럼 남아 또 죽이는 것은 아닐까봐 모든게 조심스러워진다. 나와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내가 내리는 뿌리로 인해 그들을 죽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
혹시 어제 만났던 사람은 아닐까. 사랑하는 사람은 아닐까. 사랑한다고 여겼던 이들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그들의 뿌리를 썩게 하고 있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세상 모든 것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 회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불쑥 튀어나오곤 한다. 그럴 때면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숨을 고르게 쉬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적적함이 흐르는 숲길, 산책길에 만난 강아지들, 부모님의 웃는 얼굴, 여름 짐 박스 안에 든 모��리마다 헤진 종이 같은 것, 희도, 결이와 수윤이 그리고 소연이. 천진했던 아직은 수줍음이 묻어 있을 시절에 만난 나의 작은 친구들.
그들과 있으며 신경 쓰지 못한 사소한 것들에 대해 다시 곱씹어 본다. 영원할 것 같았으나 언젠가는 받아들임의 익숙함에 퇴화 해버리는 모든 것을 생각한다. 가깝고 작은 것들이 두려워질 때마다.
새벽 2시 48분.
지금 적적해진 마음이 아주 익숙해진 것이 되려면 몇 번의 계절이 지나야 할까. 언제나 겨울은 또 다가온다. 아무리 긴 새벽과 고뇌의 시간들도 그 끝에는 깨달음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짓누르듯 되새긴다. 겨울이 다가오는 새벽, 불면증에 헤엄치는 이 새벽도 곧 해가 뜨고 아침이 올 거라고 질긴 고무줄 같은 희망을 씹는다.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 먼 데서 와서 머리카락에, 그리고 발끝에 부딪히는 눈이.
1 note
·
View note
Text

이방인
-
암스테르담에 그림을 배우기 위해 배낭 가방 하나를 엎쳐들고 여행을 떠난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보고 싶어져 메세지를 남겼다.
“뭐 하고 지내?”.
1이라는 숫자가 사라지는 데에는 하루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아마도 시차의 거리감 때문이었으리라.
한참의 대화를 이어나갔다. 대화를 하던 도중 친구는 자신이 ‘이방인’ 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테면 말이야. 사람들이 나를 빼놓은 애 사건을 다루는 것 같아. 나는 참여도 시키지 않고 모든 것이 진행되어 가고 있었어. 나의 의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말이야. 그렇게 타인으로 인해 내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어.”
이러한 고민들을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이야기하면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는 핀잔 뿐이었다고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자신의 고민이 타인과 비교되어야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거냐며” 뒷말을 덧 붙였다.
‘이방인’
채워지지 않는 샘 같은 단어. 세월이 흘러 육체적 기능에 소멸할때쯤에는 조금은 이해로 채울수 있을까. 그렇게 친구와의 낮과 밤이 다른 하루가 흘러갔다.
1 note
·
View note
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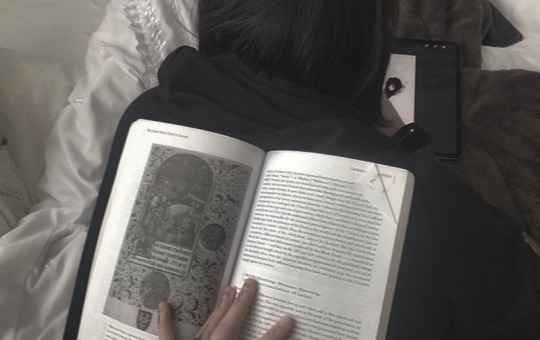


어리석게도 매번 드는 생각이지만 필요한 건 시간이었다. 외로울때도 열등감에 파묻혀 있었던 순간들도 이 모든게 시간을 필요로 했다. 그러니 나의 불안과 우울에 관한 생각들도 언젠간 희극인 마냥 대화할 수 있는 성숙함이 찾아오길.
미성숙한 나와 그런 나와 닿은 타인들이니까. 지금은 말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 줄 수 있기로.
1 note
·
View note
Text

부재.
남겨진 아이의 감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모든 것이 서툰 아이는 어른들의 얼굴 구김을 신경 쓰며 엄마의 부재를 궁금해 할 뿐이었다.
떠나간 여자는 말이 없었다. 자신의 여정에 있어 극단적인 퇴장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남겨진 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대화가 결핍되어 있는 가족
그건 나의 가족이었다.
<나의 누나를 추모하며>
1 note
·
View note
Text

길을 걸었다. 평소에는 보지 않았던 해를 바라보았다. 저만치 멀어져서 사라지는 해는 없어진 내꿈과 닮아 있었다.
해를 향해 걸었다. 분명 조금만 걸어도 손 닿을 것처럼 서 있었는데, 지금은 팔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서 있다. 단지, 천천히 걷는 것이 좋아. 주변의 사물을 조금은 더 담고 싶었을 뿐인데. 느린 사람은 천천히 걸을 자격 조차 없는 것일까.
스물 살에 간직해두었던 상상 속에 나는 그나마 망상속을 걷는 것이 더 현실인 것 같아 애써 어두운 골목을 찾아 다녔다. 어느 순간부터 해가 떠 있는 시간 보다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 더 안정을 가져다 주는 듯 하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연민과 안도감을 느낀다던데, 이런 기분일까 싶었다. 그러고 보면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일 때, 타인의 불행에 슬픔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낀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걸까 하는 걱정들. 그래서 가끔은 죄를 짓는 것 같은 마음에 친구의 얼굴을 보기 어려워 했던 순간들.
어쩌면 나는 겉햛기식 배려만 배운 모질난 사람일지도.
책에서는 타인의 불운에 안도감을 느끼는 건 본능의 범주라는 문장을 읽었는데, 아마도 이런 순간을 염두해두고 글을 쓰신게 아닐까 하는 망상을 잠깐 해본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 보다는 덜 불행한 사람이구나.”
같은 불행에도 높낮이가 나뉘는 아이러니함.

2 notes
·
View no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