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뚱뒤뚱
Explore tagged Tumblr posts
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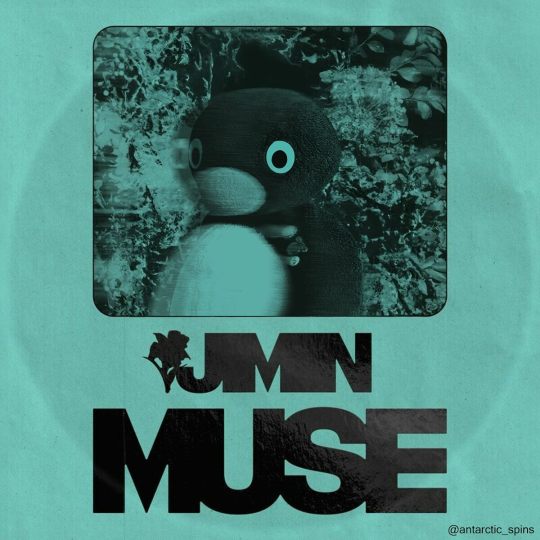

antarctic_spins instagram etiqueta a jimin bts.bighitofficial Jimin Closer Than This Corea del Sur
너도 기억하니? 우리 첫 만남이? / 수줍고 어색했던 그때 / 문득 돌아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 함께 뒤뚱뒤뚱 걸어왔던 거야 / Southeastern South Korea, July 2024. —— #jimin #pingu #spingu #지민 #박지민 #vinyl #bighitmusic #albumcover #방탄소년단 #koreanmusic #btsarmy
Spingu the Vinyl Penguin recreó la portada del álbum MUSE de Jimin con un toque divertido al estilo Pingu, usando Closer Than This como audio de fondo en instagram. cr. km_charts
antarctics_spins instagram etiqueta a bts.bighitofficial 26abr2025 JungKook Seven Corea del Sur
Think I met you in another life, so break me off another time. You wrap around me and you give me life. And that’s why night after night, I’ll be nootin’ you right. Southeastern South Korea, November 2023. ——
jungkook #pingu #spingu #전정국 #vinyl #bighitmusic #albumcover #핑구 #빅히트 #bts #방탄소년단 #latto #jungkookedit #penguinstagram
Spingu the Vinyl Penguin recreó la portada del álbum "GOLDEN" de el álbum de jk con la canción de "Seven" de fondo en instagram.
#jikook#kookmin#jimin#jungkook#jiminshiii#galletita#amor a mis chicos jmjk#park jimin#지민#Jimin_MUSE#Spingu the Vinyl Penguin recreó la portada del álbum MUSE de Jimin#Spingu the Vinyl Penguin recreó la portada del álbum GOLDEN de JungKook
8 notes
·
View notes
Text
2025.4.13.
포키와 밖으로 나왔다.
어젯밤 비가 거세게 내렸다. 예고가 있었음에도 쏟아지는 빗줄기가 어색하고 요상한 밤이었다. 비가 그친 다음 날에도 그 어색한 여운이 차갑고 세찬 바람으로 느껴졌다.
하루 산책을 건너뛰었다고 안달난 포키가 나에게 걸음을 보챘다. 공원 중턱에 조성된 소나무숲 길이 있는데 포키는 그 울퉁불퉁한 흙길이 재미진가보다. 그 길 초입부터 잔뜩 흥분을 머금고 나를 끌어당겼다. 뒤뚱뒤뚱 움직이는 엉덩이가 참 경쾌해 보인다. 응달이 가득한 소나무 숲길을 지나 동그란 잔디밭 공터로 나가니 여운처럼 남은 어색한 바람이 나를 밀어냈다. 내가 있는 곳 반대쪽 사면에는 자줏빛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다.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 살구나무에는 꽃잎도 한참 떨어져 흔적도 없다. 푸릇한 봉오리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다시 한번 찬바람. 포키는 낮은 잔디 위에서 코를 박고 나 같은 인간 따위는 알 수 없는 봄의 채취를 만끽한다.
어느 순간 구름 그림자를 쪼개고 밝은 빛이 포키에게 떨어졌다. 구름에 감춘 볕이 드러난 것이다. 햇빛에 바삭해진 포키의 모습이 너무 예뻐 몸을 낮추고 쓰다듬었다. 이제 나이가 든 포키는 몸 여기저기에 좁쌀만한 혹과 발에 제법 큰 종양을 달고 있다. '그래도 아직은 활달하다.' 하고 속으로 뇌이고 내리쬐는 볕을 가늘게 뜬 눈으로 마주했다. 반쯤 감긴 눈꺼풀 위에 뜨끈한 볕이 붉게 물들었다. 그새 어색한 냉기는 사라지고 봄의 익숙한 기운이 내 몸을 따스하게 감싸안았다. 그늘진 나의 등줄기에도 온기가 도달하였다. 저 멀리 떨어진 태양을 상상하니 그는 정말 강렬한 존재임이 틀림없다. 너무 뜨거운 마음은 먼 거리에서나 감당할 수 있는 법이야.
봄이 지나가고 있다. 대나무밭 옆 둘레길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서 봄의 소리가 들린다. 복작거리는듯 보이지만 한가롭게 지나가는 사람들. 힘차게 지면을 차며 몸에 활���를 넣는 사람들. 진달래와 푸릇한 젖니 같은 잎사귀를 내민 나무를 배경으로 봄의 장면을 연출하는 사람들. 그 장면이 내 시선에 놓이니 나는 포키 몸에 돋아난 혹과 발가락의 커다란 종양, 주름진 어머니의 얼굴과 삼촌의 노쇠한 목소리, 철든 동생과 생기를 잃어버린 K가 생각났다. 그리고 내 주변을 둘러싼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것은 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내 마음속엔 꽃잎이 아니라 낙엽이 지고있다. 봄 속에서 웃고 있는 그들과 다르게 수북하게 쌓인 기억의 낙엽 위에서 입을 꾹 다문 나의 모습. 많은 것이 저물고 있다.
봄이 지나가는 가운데 나에겐 가을이 왔다. 최승자 시인이 말한 개 같은 가을이 오고 있다.
7 notes
·
View notes
Photo

비와서 어기적 어기적 ♡ 송이는 비가 시러요 #비오는날산책 #뒤뚱뒤뚱 #물웅덩이피하기 #포메라니안 #실외배변견 #강아지우비 #핑크망또 #rainyday #puppy #takeawalk #youtubers #뽀송뽀송 #bbosong https://www.instagram.com/p/CC7ukxTn4SR/?igshid=shl6phd192cu
2 notes
·
View notes
Video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포츠마사지 받아봤어요. 와..돈내고 신나게 뚜까맞은 느낌ㅋㅋ . . . . . #뒤뚱뒤뚱 #신남 #먹을꺼사러가는길🥞🍖🍔🍕 #스포츠마사지 #농담이예용 #시원했어요😅 #멍은조금들었지만 https://www.instagram.com/p/BykoY7SHiC_/?igshid=1jh1q0ze239d5
1 note
·
View note
Photo

수술 후 일주일만에 집 앞 외출 #제주한잔 #로티번카페 #뒤뚱뒤뚱🐥 https://www.instagram.com/p/B6Xl7MSpSL5/?igshid=488os2olevbh
0 notes
Text
오뚝이들은 귀엽고 사랑스럽슴미다.
아침부터 뛰어다니는 오뚝이.
드릴로 벽을 뚫는 오뚝이.
청과물 가져오는 오뚝이.
짬뽕 만드는 오뚝이.
점심부터 얼굴이 벌건 오뚝이.
감시하는 오뚝이.
다들 뒤뚱뒤뚱 거리며 걸어다님니다.
나랑 고양이는 그걸 멀뚱멀뚱 쳐다봄미다.
여름 소나기가 지나가고 또 머리가 뜨거워요.
4 notes
·
View notes
Video
tumblr
cr. moa_ent_2nd_official
뒤뚱뒤뚱
#윤시윤 #YoonSiYoon #尹施允 #ユンシユン #모아엔터테인먼트
#moa_ent #2017 #최고의한방 #KBS #DRAMA
2 días
5 notes
·
View notes
Text

족벌을 삶자면 일단 손질을.해야 하는데
오전 내내 쭈그리고 앉아 족발을 손질 하다보면 도가니 상태가 영 거시기 하게된다 ...( 한마디로 쬬인트가 부실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 쬬인트가 뭐시기냐 하면 간단히 말해서 무릎.. ㅡ ㅡ ;; )
이게 하루이틀이면 그럭저럭 괜찮은데 이걸 벌써 근 30년 정도 하고 있으니 오늘처럼 날이 않 좋으면 당연히 찌그덕 거리는데 이따금 시도때도 없이 덜거덕 거리는건 보너스다 ..
게다가 배달 한다고 붕붕이를 타고 다니니 무릎이 그렇게 좋은편은 아닌데 ..
지난 주일 4부예배에 헌금기도를 서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가려니 몇시간 전까지 쓸만하던 무릎이 또 삐거덕 삐거덕 ... 이게 완전히 안펴지네..? ( 양쪽 다 그러면 그나마 길이가 맞겠는데 이게 한쪽만 그러니 걸어가면 뒤뚱뒤뚱 ..발란스가 안맞아 더 이상한 ...ㅜ ㅜ )
그래도 일단 가보자 싶어 나갔는데 갈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결국 2��� 예배를.드리러 들어가는데 쩔뚝 쩔뚝 ..그걸 보던 봉사자들과 아는 분들이 다들 한마디씩 하고 걱정해주고 했는데 ..
성전에 앉아 예배를 드리자니 양쪽 무릎이 왜그리 시린지 ㅠ ㅠ ( 이게 연식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 4부 예배 헌금기도는 어떻게 하나 걱정 하고 있었는데 )
신유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무릎이 아픈사람이 나았습니다 ..선포 하시기에 속으로 누군지 좋겠네 ㅎㅎㅎㅎ 하며 예배를 다 드리고 나왔는데 ..
지나가던 집사님들이 아까는 쩔뚝거리더니 이젠 멀쩡하구만 ..ㅎㅎㅎ
해서 보니 아프던 무릎이 언.새 정상으로 돌아와 있고 평소처럼 허리 쭈우우우욱 펴고 ...배도.내밀고 ..( 배는. 기도 해도 잘 안들어간다 ..ㅠ ㅠ ) 편하게 걷고 있더라 이거쥬 ..( 나도 모르게 @ @ )
덕분에 4부 예배엔 평소처럼 헌금기도를 잘 진행 할수 있었고 이후로는 오늘도 비가 오지만 무릎이 쑤시거나 저리지 않는다 ..
늘 함께 하시며 나의 작은 몸짖에도 응답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광명전통시장 #광명시장 #전통시장 #재래시장 #추천맛집 #광명왕족발 #광명할머니왕족발 은 #광명소셜상점 #미리내가게 #광명8경 #광명동굴 #광명시 #LocalGuides 와 함께 합니다
19 notes
·
View notes
Text
바다의 끝에서
바다의 끝에서 르미
수영은 바닥에 두유를 뱉는다. 가끔 그렇게 뱉고 싶을 때가 있어. 하하 웃으면서 수영이 말했다. 수영은 담배도 피우질 않으면서 터보 라이터의 버튼을 꾹꾹 누르며 불을 피웠다. 그 불은 어디에도 번지지 않았는데 민수의 눈에 자주 피었다. 민수는 수영의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는지 자주 지켜보았다. 초코맛 두유가 땅바닥에 퍼지고, 수영의 손가락이 불을 피우고. 그러다가 수영이 바닥을 가리키면 바닥을 봤다. 미안하네, 내가 개미 앞길을 막았어. 수영이 뱉은 두유를 피해 개미가 이리저리 움직였다. 다행이네, 두유 뱉은 거에 안 맞아서. 민수는 개미가 움직이는 걸 잠시 바라본다. 수영은 민수의 어깨에 기대서는 저의 무릎을 몇 번 손가락으로 친다. 속초로 향하는 버스가 20분 남았을 때였다.
여행을 간다는 것은 왜인진 몰라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동하게 했다. 누군가에게 여행을 가자고 제안할 때에도, 그를 준비할 때에도 어떤 마음이든 그 마음이 잔뜩 커져서는 동요된 얼굴을 했다. 동요되고 격앙된 얼굴로 여행을 이야기하고 준비하고 출발했다. 민수와 수영의 근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고, 바닷가로 향하는 버스는 대체로 놀러 가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기 마련이었다. 그와 달리 민수와 수영은 아주 담백한 얼굴이었다. 1박을 다녀오는 여행의 짐은 잠옷으로 입을 편한 옷과 로션이 담긴 작은 배낭 하나였다. 숙소에 칫솔 있대? 가서 보고 없으면 사면 되지. 그래. 작은 대화가 오갔다.
여행의 발단도 그들의 표정만큼이나 여상했다. 수영은 민수의 침대에 엎드려 누워서는 바다에 가고 싶다고 했고, 민수는 가자, 그런 답을 내놨다. 수영의 바람들을 민수에게 내놓으면 민수는 자주 그것을 이루었다. 다시 말해 민수는 수영의 게으른 욕구를 채우는 역役이었다. 민수는 수영이 내팽겨친 여름 이불을 그의 배꼽까지 채워 올려준다. 나 에어비앤비 쿠폰 있어. 그럼 그거로 예약하자. 내가 속초나 강릉으로 알아볼게. 그래. 너도 볼래? 난 네 취향을 믿어. 바다가 보이면 좋겠지? 응. 수영은 엎드려 누웠던 자세를 고쳐 제대로 눕곤 눈을 감는다. 눈 뜨면 일몰 보이는 곳이면 좋겠다. 수영이 중얼거린다. 민수는 수영의 뻗친 머리카락을 대강 정리한다. 일출은? 너 다섯 시에 일어날 수 있어? 아니. 그러면서 뭘 물어. 그래도. 여전히 수영은 민수의 어깨에 기대 있다. 어깨 아파? 아니. 다리는? 괜찮아, 내가 마실 거 사올까? 너 아파서 도망가는 거지. 아니라니까. 수영은 기댄 어깨에서 얼굴을 떼며 킥킥 웃는다. 민수는 손목의 시계로 시간을 확인한다.
사실 수영도 민수도 여행을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다. 누군가 놀러 가자고 하는 말에 그래, 그런 말을 쉽게 내주기는 했지만 새로운 곳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둘 모두가 공유하는 여행의 성격은 여행이 잠시 무언가를 점유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여행을 가서 묵는 곳도 발 아래로 첨벙이는 물도 일몰이 일어 누구의 얼굴도 확인하지 못하는 시간도 저의 것이 아닌데 그 순간에는 모두 본인의 것 같아서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쉽게 소유할 수 없는 세상에서 누군가가 깔끔하게 정리해둔 숙소에 들어서고 누군가가 차린 식사를 마주하고 밤바다의 물을 첨벙이는 것은 순간의 환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좋은 여행일수록 더욱 환상 같고 그 시간은 어딘가에 떼다 놓은 남의 것 같았다. 여행은 어째서 현실의 연장이 아니라 도피 같은지. 수영과 민수가 살아가는 현실이 지독해서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둘은 그 감상까지 공유하진 않는다.
사실 실감 안 나. 수영은 일어나 대충 엉덩이를 털었다. 나도. 민수는 맞장구친다. 가면 실감이 나나? 수영은 웃는다. 민수는 어깨를 으쓱인다. 승차장으로 들어서는 버스를 보면서 민수와 수영은 각자 단신으로 우뚝 서 있다. 버스표를 예매한 수영 먼저 버스에 올라탔다. 수영이 두 개의 QR코드를 찍는 동안 민수는 수영의 등에 한 손을 댄다. 우뚝 서 있는 모양에서 층계가 생기고 연결점이 생긴다. 민수는 수영이 올라서는 계단 뒤에서 버티다가 수영이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를 따라갔다. 버스의 좌석이 눈에 보이니 그제야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영은 헤드폰을 끼고 민수는 에어팟을 꼈다. 민수가 버튼을 눌러 발판을 올린다. 이거 하나 있다고 버스비가 그렇게까지 비싸지다니. 수영이 중얼거린다. 민수는 웃으면서 발판을 올리려고 이리저리 힘쓰는 수영에게 버튼을 가리킨다. 아. 외마디와 함께 수영은 저의 ���튼을 눌러 발판을 올린다. 편하긴 편하네, 수영이 혼자 중얼거린다. 수영은 민수에게 손을 흔들어 잘자, 입 모양으로 말했다. 민수는 웃으면서 너도, 답한다. 아직 출발하지도 않은 버스에서 민수와 수영은 잘 준비를 했다. 어제까지 둘 모두 해야 할 일에 잠을 설쳤기 때문에 곧장 눈을 감았다. 민수는 30분 정도 자다가 깨어나 눈을 떴고, 수영은 곯아 떨어져서는 고개를 뚝뚝 떨어뜨렸다. 민수는 뒤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시 안전벨트를 풀어 수영의 등받이를 뒤로 기울였다. 뚝뚝 떨어지던 고개가 뒤로 젖히고 입이 벌어진다. 민수는 익숙한 듯 수영의 턱을 위로 올려 입을 닫았다.
민수는 어느덧 고속도로로 진입한 버스의 창가를 바라본다. 빠르게 움직이는 버스 바깥의 풍경을 동영상으로도 찍어두었다. 민수는 이번 여행을 대강 그리면서 다리를 주무른다. 어쩌면 걸을 일이 생각보다 많을지도 몰랐다. 어쩌면 계속 비슷한 곳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기만 할지도 모르고. 민수는 원래 계획을 수도 없이 하는 타입이었으나 어느 기점부터는 수영의 기질에 맞추어 즉흥적으로 움직였다. 수영이 민수의 계획을 버거워한 것은 아니고, 민수의 몸이 계획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몸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매일 밤 수영은 민수의 다리를 안마하고 민수는 초반에만 가끔 울었다. 수영은 그 울음에 대해 일언도 붙이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 동안 자주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수는 그러자고 답한다. 그런 날들이 수도 없이 스치고 가는 동안 민수는 울지 않게 되었고 이룬 것들이 많아졌다. 계획하지 않는 성향에 성실을 붙이면 완전한 계획 없이도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다. 수영과 민수는 그런 면에서 상성이 좋았다. 민수는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곧게 편다. 수영은 깊은 꿈 속이다.
도착하고 나서는 곧장 유명하다는 횟집에 가서 멍게비빔밥과 전복물회를 시켰다. 어쩌다 보니 숙소 근처에 유명한 횟집이 있어서였다. 둘은 횟집 창가의 2인 식탁에서 보이는 석호에 시선을 고정하고 한참 말이 없었다. 그 가게에는 음식을 실은 작은 로봇이 돌아다녔고, 로봇이 식탁 앞에 멈추면 종업원이 걸어와 그것을 식탁에 내려다 주었다. 처음 먹어보는 전복 회는 아주 꼬독거렸고 신기하게도 물회에는 연어회도 들어있었다. 기대했던 물회보다 비빔밥이 나았다. 물회 안의 멍게에서는 바다향이 아주 짙게 나서 민수는 몇 번 뱉고 싶은 마음을 참았다. 수영과 민수는 생각보다 얼마 먹지 못하고 수저를 내렸다. 나 해산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수영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론을 내린다. 민수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거린다. 그니까. 3만원 어치는 남았네. 그렇게 덧붙인다. 절반은 남긴 채로 자리를 떴다. 수영도 민수도 크게 아까운 기색은 없었다. 돈을 모아둔 카드로 결제하면서 그릇을 싹싹 비운 테이블을 구경한다. 맛있는 집은 맞나 보다. 수영은 구경한다.
잠옷과 로션이 든 가방을 숙소에 가볍게 내려두고는 돗자리를 들고 모래사장으로 나갔다. 석호라고 매번 이야기하기는 번거로워서 민수와 수영은 영랑호를 그저 바다라고 불렀다. 파도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민수는 밀려오는 물에 발을 담그는 상상을 한다. 그때 수영은 이미 발목까지 물을 적신 뒤였다. 샌들에 모래가 가득 차서 따가웠고, 파도는 차가웠다. 수영은 그저 그 물이 차가워서 좋았다. 비가 내내 온다던 일기예보와는 달리 바닷가는 선선하고 태양열은 푸근하다.
민수는 곧바로 수영을 따라오지 않고 저가 들고 온 필름카메라로 수영을 찍었다. 민수가 사진을 좋아하는 것과는 달리 수영은 찍히는 데에 어색한 사람이었다. 몇 번 브이를 보이고 나면 고갈되어 뒤를 돌거나 어색해! 외치며 웃어버렸다. 수영의 웃음은 언제나 자연스러워서 포즈를 취한 것보다 와락 웃을 때 사진이 가장 잘 나왔다. 민수는 스트랩을 목에 걸고 수영을 따라 바다로 들어간다. 수영은 민수의 목에 걸린 카메라를 빼 민수를 찍는다. 수영의 사진은 번번이 초점이 나가고 조리개 조절이 잘못되어 사진이 날아갔지만 그건 그것 나름대로 추억이 됐다. 수영은 제 사진 실력에 만족한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민수를 찍었다. 민수는 바닷물을 손으로 만지며 이리저리 쳐다본다. 민수가 카메라를 보고 은은하게 웃는다. 수영은 처음으로 사진을 잘 찍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민수의 손에 어깨를 내어준 수영은 기차처럼 바닷물을 활보한다. 민수는 삼부 반바지를 입고 있고 수영은 오부 반바지를 접어 올렸다. 파도는 계속해서 민수와 수영의 다리를 차갑게 건드리고 샌들과 발 사이에는 자갈과 모래가 잔뜩이다. 모래는 털어내도 파도와 함께 다시 쓸려왔기 때문에 그 따가움은 감내해야 하는 것이었다. 민수는 두 손을 수영의 어깨에 올리고 칙칙폭폭 소리를 낸다. 수영은 유치하다며 웃는다. 저녁은 뭐 먹지? 시장에 갈까? 묻는 수영과 눈알을 데룩 굴리는 민수. 민수가 한참 말이 없자 수영이 고개를 뒤로 돌린다. 민수는 수영에게 보이게 다시 눈알을 굴린다. 수영은 그런 민수를 보고 웃다가 수산물 시장에서 오징어 같은 걸 사다가 라면을 끓여 먹자고 제안한다. 민수는 좋다고 대답한다.
기차처럼 모래사장을 빙빙 돌고 있다. 어릴 적 많이 했던 기차 모양을 하고 있으면 서로의 비언어적 표현은 보이지 않았다. 표정이라든지, 눈알을 굴리는 모양이라든지, 입 모양 같은 것들. 한숨이나 웃음 같은 건 들려도 몸짓이나 표정이나 어떤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아서 반드시 소리를 내어 일러주어야 했다. 앞의 사람은 뒤의 사람의 비언어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면 되었지만 뒤의 사람은 앞의 사람의 것을 보려면 조금 더 노력해야 했다. 팔 길이만큼의 거리를 극복해 고개를 앞으로 디밀거나 성큼 걸어가야만 했으니까. 수영이 민수의 손을 내리고 뒤를 돈다. 자연스럽게 수영과 민수는 앞과 뒤를 바꾼다. 이제는 민수가 앞이고 수영이 뒤다. 기차는 다시 출발한다. 수영은 튼튼한 ���리를 가지고 있고 민수는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었다.
영랑호에는 아무리 고개를 돌려도 바깥에 발을 씻을 수 있는 수돗가 같은 건 없었다. 숙소가 가까웠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따가운 발로 수없이 걸어야만 했을 것이다. 수영과 민수는 절뚝거리며 따가움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우습게 움직였다. 수영은 다리로 O자를 그리며 뒤뚱뒤뚱 걸었고, 민수는 이내 따가움을 피하는 것을 그만두고 평소대로 걸었다. 샌들째로 숙소의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장난을 쳤다. 젖은 다리를 씻고 샌들의 물기를 턴다. 샌들을 신발장에 비스듬히 말려두고 아까 제대로 보지 못한 숙소를 구경한다. 부엌과 침실이 큼지막하게 자리한 숙소였다. 가장 먼저는 큼지막한 식탁이 있었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영랑호가 보이는 네모난 창이 있었다. 그 앞에는 하얀 침구의 침대가 있고, 더 가까운 쪽에는 라탄 느낌의 소파가 있다.
숙소 한 편에 마련된 마샬 스피커에 블루투스로 핸드폰을 연결하고 인디 밴드의 노래를 튼다. 민수는 침대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앉아 스트레칭을 하고, 수영은 그런 민수의 등을 꾹꾹 누른다. 유연하지 못한 민수가 곡소리를 내면 수영은 와락 웃으면서 일어난다. 수영은 곧 민수의 옆에 앉아서 민수가 하는 스트레칭을 따라 한다. 민수가 누우면 수영은 침대 위에 일어나서 민수의 다리를 잡고 이리저리 스트레칭을 도왔다. 그러면서 수영과 민수는 바다를 쳐다본다. 이동식 에어컨에 달린 환풍구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파도 소리가 들렸다. 음악 볼륨을 줄이니 그 소리는 더욱 커졌다. 소라고둥 속에 들어온 것 같지 않아? 수영은 묻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거린다.
수영과 민수의 신장은 비슷하다. 수영은 키가 비슷한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시선이 비슷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수가 바라보는 것을 수영도 볼 수 있고, 수영이 가리키는 것을 민수도 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렇게 한 명은 누워서 한 명은 누워서 바라보는 풍경은 평소의 시선과는 완전히 다른 구도였다. 수영은 모래사장과 그 옆 건물까지 보이는 풍경을, 민수는 바다의 수평선과 하늘을 봤다. 위에서 보면 바다만 보이진 않네. 수영은 말한다. 나는 바다랑 하늘밖에 안 보이는데. 민수는 눈을 크게 뜨며 답한다. 수영과 민수의 시선을 합치면 창에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풍경을 담을 수 있다. 감상이 일상적으로 공유되는 사이에서는 시선의 높이가 달라도 그걸 합하면 되었다. 물리적인 수평과 전적인 수평에 대해 생각한다. 수영은 민수의 옆자리로 풍덩 뛰어든다. 민수와 비슷한 풍경을 바라본다. 수영은 어떤 풍경이든 좋다고 생각한다.
민수와 수영은 잠시 낮잠을 잤다. 이동식 에어컨이 큰 소리를 내며 찬 바람을 뿜었다. 민수는 수영의 배꼽까지 이불을 덮어주곤 눈을 감는다. 한 시간 뒤 수영의 알람이 요란히 울리면 민수가 먼저 일어났다. 수영의 알람을 끄곤 수영의 어깨를 가볍게 친다. 재료 사러 가자. 수영은 느린 새우처럼 천천히 펄떡거리며 잠에서 깨어나려고 한다. 여름의 해는 길어서 5시가 되도록 밝았다. 앉은 민수의 시야에 얼룩진 에메랄드 바다가 보였다.
바다는 언제나 그 끝을 예상할 수 없었다. 민수는 바다 위를 계속계속 걸어 어느 국가의 모래사장에 도착하는 상상을 한다. 바다 위를 걸어 어느 육지에 도착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은 무엇일까. 내가 바다의 끝을 보고 왔습니다, 이야기하는 일일까. 민수는 그렇지 않고 다시 뒤를 돌아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어떤 일은 끝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어쩌면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어느 방향으로든 마무리에 닿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며 끝에 당도했다는 사실에 대해 안도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는 또 끝없는 바다를 바라볼 것이라고 상상한다. 혹여 다시 같은 육지에 돌아오게 되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같은 육지가 아니고. 도착점이자 다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민수가 운동을 그만두고 재활을 하는 이 순간도 언젠가는 그럴 것이다. 수영의 손을 잡고 걷는 것은 모터보트를 탄 것만 같고. 그래서 기름을 채워야 하는 새로운 퀘스트를 얻기도 하지만. 마침내는 혼자보다는 빠른 속도로 어딘가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바다로 나아갈 것이라고.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 수영은 겨우 뜬 눈으로 등받이에 등을 대고 앉아서 민수의 시선을 좇아 바다를 바라본다. 숙소 선택 쩔지. 그런 문장을 갈라지는 목소리로 낸다. 민수는 푸하하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린다. 수영의 손에는 생수 하나가 건네진다.
중앙시장에 가서는 대게를 사고 근처 수산물 시장에서는 오징어를 샀다. 걷다 본 어느 가게 앞엔 대게를 사려는 사람으로 가득했다. 시장에는 어느 집이 유명한 집인지 명확히 드러났다. 다른 곳은 사람이 없거나 하나둘뿐인데 블로그나 유튜브 여행기에 자주 등장하는 가게들 앞에는 기본 열 명 이상이 서 있다. 홍게를 살 생각은 없었는데 줄이 기니 한 번 사보기로 했다. 다수가 기다린다면 보통 이상은 되리라는 것이 둘의 결론이었다. 줄이 길게 이어져 있는 닭강정도 사보려다가, 컵으로는 팔지 않는다는 말에 사지 않고 돌아왔다. 둘 다 배가 크지도 않은데 이미 홍게까지 사버린 마당에 닭강정 한 판을 다 먹을 자신이 없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친 깔끔한 카페에 잠시 앉아 호지차와 말차를 마셨다. 오징어를 산 탓에 혹시 바다 냄새가 날까 오래 앉아 있지는 않았다. 카페에서 나섰을 때에는 조금씩 해가 지고 있었다.
숙소에 와서는 라면을 끓여 먹었다. 라면을 먹으면서도 민수는 수영을 찍었다. 수영은 아무 생각 없이 라면을 들이키다가 민수의 필름카메라 소리에 민수를 쳐다본다. 나 사레 걸릴 뻔했어. 수영은 후우 숨을 뱉는다. 민수는 웃는다. 먹어, 안 찍을게. 수영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마저 면을 먹는다. 수영이 라면을 끓였고, 민수가 그릇 정리와 설거지를 맡았다. 수영은 의자를 끌고 와선 싱크대 옆에 앉아 민수를 지켜본다. 민수의 카메라도 들고 와서 민수의 뒷모습을 찍으려고 노력한다. 찰칵. 지잉. 필름이 감긴다. 민수는 카메라를 보지 않고 마저 설거지를 마무리한다. 수영은 저의 핸드폰으로도 민수를 몇 장 찍는다. 결과물은 어떻게 보아도 잘 찍은 사진이 아니었지만 민수는 수영이 저를 찍는 것을 좋아했다. 저를 찍으려고 이리저리 핸드폰이나 필름카메라를 대는 순간이나 찍은 결과물을 함께 확인하는 순간 모두를. 수영은 번번이 저의 결과물에 실망했지만 민수는 수영이 찍어준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곧잘 바꿨다.
밤에는 노래를 틀지 않고 침대에 엎드려 있었다. 수영은 ���은 민수의 다리나 발을 주무르고, 민수는 고맙다고 한다. 수영은 새침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럼, 고마워야지, 너스레를 떤다. 민수는 감사합니다, 이수영씨. 그런 말을 덧붙인다. 제대로 누워서는 발가락을 당기고 민다. 수영은 민수의 옆에 앉아서 민수의 발과 엇갈리게 발가락을 밀고 당겼다. 너랑은 아무것도 안 해도 안 심심해. 수영은 발끝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나도. 민수는 수영을 쳐다본다. 나 요즘 스쿼시가 해보고 싶어. 나 다리 괜찮아지면 해보자. 그래. 언제나처럼 수영이 뱉고 민수가 이룬다. 근데 그땐 다른 운동이 하고 싶을지도 몰라. 그럼 다른 운동하면 되지.
밤바다를 나가볼 걸 그랬나? 그러게. 근데 여기 11시 이후로는 엘리베이터 안 된댔어. 내가 널 업고 갈까? 여기 9층인데? 나 천하장사잖아. 그렇긴 하지. 그래도 그건 무리야. 그럼 내일 아침 바다를 나가자. 그래. 일어날 수 있겠지? 나 알람 잘 듣잖아. 맞지, 나는 내가 아니라 너를 믿어. 나도 그래. ...
해가 완전히 져 버린 네모난 창에는 바다도 보이지 않는데 파도 소리만 한참이었다. 가끔 강아지가 짖었고, 가끔 술을 마신 행인의 소리가 들렸다. 밤이 되고 노래도 없으니 소리는 아주 크고 예민하게 들렸다. 민수는 눈을 감고 수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창을 쳐다본다. 수영은 숙소에 있는 빔프로젝터를 연결해서 영화를 소리 없이 틀어놓는다. 흐릿한 자막이 주인공들 아래에서 떴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민수와 수영은 따뜻한 하얀 침구와 파도 소리와 색감이 아름다운 영화의 순간들을 사용한다. 오컴이 주장했던 것처럼 소유 이전에는 사용이 있어서 어떤 순간에는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었다. 포근하고 널따란 원룸이나 빔프로젝터나 바다로 난 큰 창을 현실에서는 가질 수 없어도 여행에서는 잠시나마 사용할 수 있었다. 이래서 여행을 가나 봐. 수영은 그런 마음을 잠시 가진다. 민수는 가끔씩 눈을 떠서 영상을 보고 수영을 살폈다.
그래도 사람은 사람을 가지거나 사용할 수는 없어서 오감을 이용해서 번번이 사람을 살펴야 했다. 소유한 것들도 관심을 필요로 하지만, 가진다는 것 자체의 안정감은 관심을 매번 주지 않아도 존재했다. 하지만 가지지 못한 것은 계속 눈을 떠서 살펴야 했고 눈을 감으면 느껴지지 않았다. 가지지 못했더라도 사람을 믿을 수는 있었지만, 그가 거기에 있음은 언제나 믿음에 기대어 있을 뿐 기정사실은 아니었다. 수영은 민수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민수의 팔목에 저의 팔목을 붙여 눕는다. 그때부터 민수는 눈을 뜨지 않았다. 눈을 뜨지 않아도 수영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팔목에 붙은 일정한 온도와 파도 소리, 숨소리, 번쩍거리며 바뀌는 영화 장면들. 내가 안 일어나면 아침 바다 혼자 다녀와도 돼. 수영은 작게 속삭인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거린다. 대신 사진 많이 찍어 와. 그냥 깨울 때 잘 일어나면 안될까? 그건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닌데. 그래도. 음, 노력해볼게. 민수는 ���꼬리만 올려 웃는다.
눈을 내내 감고 있던 민수보다 수영이 더 빨리 잠에 든다. 민수는 발을 당기고 밀고를 혼자 조금 더 반복하다가 빔프로젝터를 끄고 수영과 저의 몸에 이불을 덮는다. 잘자라는 말 없이도 곤히 자는 수영을 잠깐 쳐다보고. 민수는 침대 옆의 등마저 끈다. 아주 까맣게 방이 덮인다. 정적을 깨는 파도 소리. 수영의 작은 몸부림. 민수는 알람을 맞추고 잠든다. 강아지가 짖는다. 강아지도 잠든 새벽에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파도 소리가 울렸다. 누구도 깨지 않는 밤이었다.
1 note
·
View note
Photo

#피카츄페스티벌 우연히 보게댐ㅋ #피카츄 #피카피카 #졸귀 #뒤뚱뒤뚱 ❤️❤️(트리플스트리트에서)
0 notes
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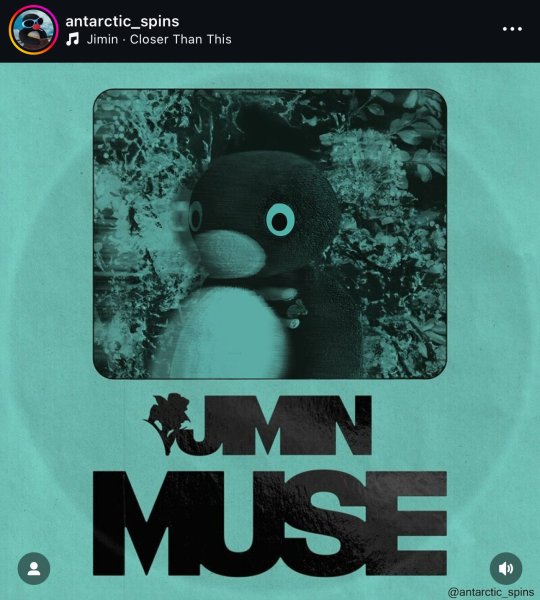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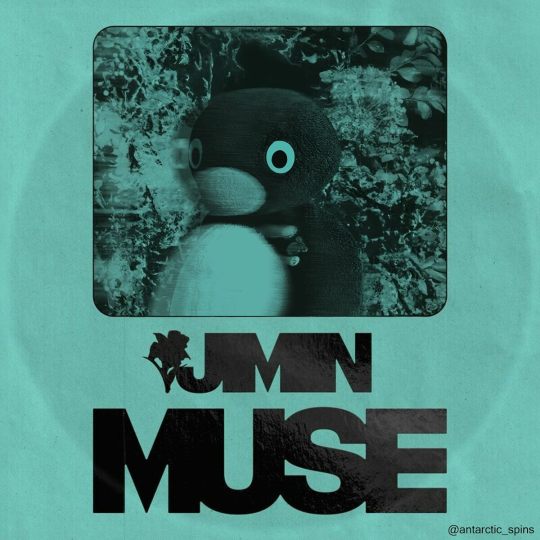

antarctic_spins instagram etiqueta a jimin bts.bighitofficial Jimin Closer Than This Corea del Sur
너도 기억하니? 우리 첫 만남이? / 수줍고 어색했던 그때 / 문득 돌아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 함께 뒤뚱뒤뚱 걸어왔던 거야 / Southeastern South Korea, July 2024. —— #jimin #pingu #spingu #지민 #박지민 #vinyl #bighitmusic #albumcover #방탄소년단 #koreanmusic #btsarmy
Spingu the Vinyl Penguin recreó la portada del álbum MUSE de Jimin con un toque divertido al estilo Pingu, usando Closer Than This como audio de fondo en instagram. cr. km_charts
#park jimin#jimin#지민#jiminshiii#Jimin_MUSE#amor a mis chicos jmjk#Spingu the Vinyl Penguin recreó la portada del álbum MUSE de Jimin
0 notes
Video
♥짧은 다리가 매력적인 사랑둥이 먼치킨 분양합니당 ♥ . . ♥견종 먼치킨 ♥성별 여아 ♥나이 2개월 ♥접종 유 ♥색상 화이트 ♥부견 먼치킨 ♥모견 먼치킨 ♥TYPE 미니사이즈 ♥애견관리사 010-9080-3375 . . 오시는 길 :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766,2층 우리강아지분양 . 100% 책임분양 ! 사후관리 철저히 해드려요 ! . 부담 갖지마시고 문의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드립니다 ! . . . 🐱#숏다리 #다리짧은강아지 로 유명한 먼치킨 . 🐱짧은다리로 낮은 점프력을 가지고 있어 이곳 저곳 뛰어다니며 어지르지않아 가정집에서 키우기 딱 좋은 고양이 . 🐱뒤뚱뒤뚱 걷는게 귀여운 개냥이 먼치킨 . 🐱애교가 많아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에게 #강력추천 . . . . #먼치킨 #먼치킨분양 #먼치킨가격 #고양이먼치킨 #다리짧은고양이 #짧은다리고양이 #뒤뚱뒤뚱 #개냥이 #고양이 #냥스타그램 #집사 #냐옹이 #야옹이 #냥냥펀치 #냥이 #반려묘 #미묘 #천사묘 #고양이스타그램 #냥 #캣스타그램 #캣 #우리강아지분양 #천호동애견샵 #분양샵 #분양 #입양 #강동구애견샵 #강동구분양샵 (우리강아지분양에서)
#강력추천#냥이#뒤뚱뒤뚱#숏다리#먼치킨#우리강아지분양#반려묘#캣#냥냥펀치#강동구애견샵#강동구분양샵#집사#천사묘#먼치킨분양#분양샵#고양이#냥스타그램#천호동애견샵#야옹이#냥#캣스타그램#다리짧은강아지#개냥이#고양이스타그램#다리짧은고양이#고양이먼치킨#냐옹이#짧은다리고양이#미묘#분양
0 notes
Video
youtube
[M/V] Beautiful Bombs (아륾다운밤) - Waddling (뒤뚱뒤뚱) (Smells Like Thirty Spirit)
0 notes
Video
instagram
#뒤뚱뒤뚱 아직은 불안하지만 혼자 걷는답니다~ ・・・ #생후424일 #이쁜아기 #아기 #지호 #베이비 #아기스타그램 #애스타그램 #귀욤포텐 #아드리 #아들바보 #도치파파 #인스타베이비 #아들스타그램 #육아스타그램 #베이비스타그램 #육아 #육아소통 #baby #세젤귀 (at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
#baby#아들바보#베이비#육아#세젤귀#뒤뚱뒤뚱#아들스타그램#육아스타그램#도치파파#인스타베이비#베이비스타그램#귀욤포텐#아기스타그램#이쁜아기#애스타그램#지호#생후424일#육아소통#아기#아드리
0 notes
Text
꺼내보는 지난 여행
1.
소나무.
엄마는 책 읽고 있는 ���를 툭 치고는 손가락으로 창문을 가르켰다. 나는 며칠 전 읽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단편 소설을 한 번 더 읽고 있었다. 책에 머리 박고 있느라 창문에 지나가는 풍경 하나 제대로 못 봤다는 생각에 반성하며 엄마가 가르킨 곳을 바라봤다. 길고 높게 뻗은 소나무들이 숲을 이룬 채 스쳐지나가고 있었다.
소나무가 원래 저렇게 얄쌍하게 길었나?
원래 소나무가 저렇게 길지. 그래서 집 지을 때 많이 쓰잖아.
내가 아는 소나무는 저런 것보다 삐죽빼죽 두꺼운 거였는데.
그런 건 절벽에서 많이 자라고. 아무튼 여기도 소나무 숲이 있네, 여기 와서 처음본다야.
엄마는 이곳에 있는 동안 무언갈 발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그 발견은 당신이 이미 아는 것들을 이야기 할 수 있을 때 의미있는 것이었다. 당신이 익숙한 한국의 것들을 이 곳에서 발견할 때마다 나를 붙잡고 얘기를 했다. 그러고는 항상 이렇게 끝났다. 한국이 제일 낫네.
우리나라가 다른데 비할 곳 없이 가장 좋은 나라라는 걸 스스로 납득하고 싶기 때문일까. 이 곳의 글도 말도 모르는 엄마가 이 낯선 나라에 정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인 걸까. 그저 단순한 반가움 때문일까. 아님 옆에 앉아 말 한 마디 없이 개인 플레이하는 하나 둔 딸래미랑 시덥잖은 대화라도 하고 싶기 때문일까. 뭐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이겠지 혼자 헤아리며 엄마가 발견한 것들을 들뜬 얼굴로 내게 보고하듯 말할 때마다 나는 그냥 작은 리액션 한 두개 해주고 말았다.
엄마랑 싸우(는 게 아니라 혼나는 것이라고 그녀는 늘 말하지만)고 난 후 나는 종종 일종의 복수차원으로 나 그만 시키고 엄마 혼자 장에 가서 사오라고 말하곤 했다. 아는 것이 없다는 것, 아는 말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공포인지 알기 때문이었다. 모르는 것만 있는 나라에서 한 달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엄마 나이대의 사람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면서도 그랬다. 그런데 엄마는 보란듯이 혼자 장에 가서 호박이니 바게트니 하는 것들을 사왔다. 불어로 시부렁대는 할아버지 앞에서 왜이리 비싸요, 싸게 싸게 같은 말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도 한국어 좀 배워야 한다며, 한국어만 해서 장을 봐왔다며 뿌듯해하는 엄마 얼굴을 보면서 나는 내가 움츠리고 무서워했던 것이 엄마에게는 얼마나 별 것 아닌 것인지 깨달았다. 여기 살면서 나는 내가 모르는 것들에 얼마나 지쳐있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숨어있었는지, 그것이 스무살적 나의 모습과 얼마나 다르고 그 달라지는 모습이 왜 나는 나이가 드는 거라 생각했었는지, 생각했다.
2.
파리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기차 안, ㅁ 자로 배치된 좌석에 내 옆엔 엄마가, 마주보는 좌석에는 영어를 쓰는 애기가, 그 옆에는 독일인인 듯한 백인 아저씨가 앉아있었다. 아저씨는 가방에서 견과류 봉지를 꺼내더니 옆자리 애기에게 나눠주었다. 우리 좌석 옆에는 그 애기의 엄마 아빠인 듯한 사람 둘과, 좀 더 큰 아이와, 그 중에 가장 어린 애기가 함께 앉아있었다. 엄마는 걔가 너무 예쁘게 생겼다며 (늘 그렇듯 한국말로) 얘, 너 왜이렇게 예쁘니, 하고는 옆 엄마에게 한 번 안아봐도 돼요? 했다. 꼬불꼬불한 검은 머리를 가진 걔는 우리 좌석으로 뒤뚱뒤뚱 걸어와서 내가 들고있던 플라스틱 통을 만지작댔다. 그러더니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자기 몸을 내게 부비더니 안아달라고 손을 뻗었다. 아만다는 내 품에 안겨서 한참을 있다가 엄마 품에 옮겨갔다가 플라스틱 통을 만져댔다가 또 내 무릎에 누웠다. 애기(이름은 아만다였다)는 아직 말을 못해 입보다 몸으로 표현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았다. 어쩐지 아만다는 엄마보다 나를 더 좋아했는데 나는 그것이 되게 어색했다. 내가 노력한 것도 없는데 별안간 날 향해 안기러 온다는 건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러다가 내가 이유없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아만다가 그렇고 건후가 그렇고 강아지가 그렇고 고양이가 그렇고……. 산이나 비나 별이나 새벽이나…… 그런 것들이었다. 국경이고 언어고 다 허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 무해한 것들. 선하고 악한 것을 나눌 수 없는 것들. 날 아프지 않게 하는 것들. 나는 왜 그런 것들이 그리 좋은지 생각했다.
3.
엄마는 내가 손톱을 물어뜯는 걸 볼 때마다 자기탓을 했다. 내가 사랑을 많이 안 줘서 그런 건지, 대체 뭐 땜에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녀의 말마따나 버릇들엔 보통 이유나 계기가 있지 않았던가. 그렇지만 이 버릇은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시작된 건지 잘 모르겠다. 어긋날 때. 괘씸할 때. 부정할 때. 초조할 때. 찜찜할 때. 무질서할 때. 무서울 때. 비정상일 때. 부족할 때······. 그럴 때마다 손톱을 물고 있었던 것 같다. 아니 작정을 하고 손톱을 뜯은 적은 없지만 지나고 보면 손톱을 뜯고 있었네. 보기에도 참 미운 버릇이고 남이 찍어준 사진 속에 손톱을 물고 있는 나를 보면 하지 말아야지 싶다가도 여전히 피가나고 삐죽빼죽한 손톱을 주렁주렁 달고 다닌다.
사실 이젠 불안을 잠재우는 테라피같은 것이 되었다. 호흡법이나 명상으로 마음을 써 진정하는 방법과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효과를(?) 주는 것 같기도 하다. 손톱에 집중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은 불안한 것이 없다는 말이고, 그러므로 내 자가 치료는 끝이 나지 않고 손톱은 성할 날이 없다. 이것도 나름 기술이 필요한 작업인데 치아의 알맞은 위치에 가져다 넣어야 원하는 만큼 잘 갈아낼 수 있다. 근데 웃긴 건 만지면 만질 수록 뜯어내면 뜯어낼 수록 예쁘지가 않다는 거다. 어느 쪽은 깔끔하게 뜯겼는데 어느 쪽은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그 울퉁불퉁한 쪽을 다시 잘 갈면 또 다른 쪽이 삐죽 튀어나��버려 어느새 내 머릿속엔 손톱모양을 잘 다듬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찬다. 그 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손톱을 뜯다보면 포도 두 개의 양을 똑같이 나눠주겠다며 한 알 한 알 먹다가 결국 다 먹어버리던 못된 여우처럼 손톱을 다 먹어치우고 만다. 가만히 두면 모양대로 잘 자라는 애를 완전하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나를 못 가만둘 때마다 괴롭혀서 내가 보는 부족한 것들처럼 똑같이 만들어버린다.
엄마의 자기탓을 들으면서 손톱 물어뜯는 버릇만큼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생각했다. 이만큼 나라는 사람이 왜그리 어딜가나 기어코 결핍을 찾아내고 그것에 얼마나 도취되는 존재인지, 그렇지만 얼마나 완전하지 않은 것을 못 견디는 존재인지,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유일한 몸뚱아리를 상처내면서 안정을 찾는 얼마나 모순된 짓을 하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이 있을까.
나는 갑자기 B를 떠올렸다. 우린 버릇처럼 스스로를 학대하는구나.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무엇이 그렇게 부족한 건지. 무엇이 그렇게 밉고, 원망스러워서 스스로에게라도 죄를 물어야 하는 건지. 이 불안과 강박의 태초, 그리고 결말을 알고싶어서 나는 질기게도 살고 있는 것일까.
4.
혼자가 아닌 여행은 보통 말들로 이루어진다는 걸 셋이 있으면서 새삼스레 깨달았다.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들은 생각이 아니라 대화라는 것을. 두고 두고 보고 싶은 말들은 많았지만 나는 수많은 말들이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었다. 평소라면 녹음을 하거나 했을테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 대신 사진을 더 많이 찍었다. 담고 싶은 것들이 찰나로 생겨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같이 있는 동안에는 오래 할 말을 생각하고 써야하는 글보다는 사진이 더 알맞아 보였다. 사진을 찍는데 왠지 편지를 쓰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만을 향해 렌즈를 두는 것. 누군가만을 위해 셔터를 누르는 것. 이 곳에 있는 당신들을 최선을 다해 담는 것. 사진을 찍는 것이 누군가만을 위해 존재하는 동작처럼 느껴져서, 사진을 찍는 나 자신도 마음에 들었다. 나는 당신들을 생각하는 사람. 아무튼 내가 나이기 위해 하려는 행동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기뻤다. 가끔은 무려 내가 나라는 것을 잊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자꾸만 나이고만 싶어서, 당신들을 위해 사진기를 드는 ‘나’이고만 싶어서 문득문득 주저앉고 싶어졌다. 이 지겨운 사실이 나는 괴로웠다. 이 감정은 스물 한 살 적 날 지우고 싶어 사진기를 들었던 것과 비슷한 것 같기도, 다른 것 같기도 했다. 스위스에 높은 어느 산정상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타면서 보았던 이 산자락 어딘가에 집을 짓고 사는 저 이름 모를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욕구와 비슷한 것 같기도, 다른 것 같기도 했다. 이 욕구는 과연 파괴적인가, 아님 나르시시즘적인가. 공책에 이렇게 적고는 그냥 말았다. 어떻게 더불어 살 수 있을지 나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적고는 공책을 덮었다.
5.
엄마가 늦게 일어나는 우릴 대신해 밥을 하면 우리는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한다. 여행루트나 교통편, 숙소를 찾아보는 일은 보통 내가 하고, 재준이는 무거워서 들기 어려운 짐들을 들어주고 운전하는 엄마 옆에서 길을 같이 봐준다. 이런 식으로 누가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분업이 되어서 베를린에서부터 스위스, 프랑스 남부까지 서로 맡은 일 마냥 책임감 있게 해냈다. 서로의 자리를 먼저 생각하고 각자 할 일을 찾아서 하기에 우린 충분히 큰 듯 했다. 생각해보니 재준이와 이렇게 여행 간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첫 여행을 서로를 배려할 수 있을만큼 큰 후에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6.
매일 아침 요가라도 하지 않음 안 될 것 같았다. 몸을 접으면서 누구와 계속 함께 산다는 건 서로를 조금씩 견디는 일이라던, 김애란이 썼던 문장을 떠올렸다. 나는 어쩐지 계속계속 답답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조급했다. 나는 조금 더 나이고 싶고, 조금 더 외로워지고 싶었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내게는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게 내게는 더불어 사는 것보다 더 쉽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4 notes
·
View notes
Text
Watch "집에 있는 고구마 이렇게 드셔보세요😄 간식으로 아주 좋아요👍 #Shorts" on YouTube
Sweet potato and cheese
0 n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