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사적 유물론의 추억






- 그나마 조금씩 회복하면서, 이전에 살펴보았던 '사회 성격' 문제에 이어, 이제 그 '사회구성체 논쟁'의 출발이 되는 '사적 유물론'에 대한 책들을 정리해보고 있다. 이 개념이 문제를 담고 있다는 것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 본인은 사용하지 않은 개념이라는 것. 그나마 디츠켄이나 플레하노프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개념에 비해서, '사적 유물론'이라는 용어는 엥겔스가 처음 사용되었다는 점이 그나마 설득력을 지니고 있지만, 마르크스가 단서적으로 정리한 역사 발전의 일반적 '묘사'가 <자본> 이후에도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기는 하다.
- 사적 유물론은 출발부터 두 가지 내적 긴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것이 역사를 바라보기 위한 도구적 개념들에 대한 집합적 설명인가, 아니면 역사에 유지될 수 있는 인과적 법칙인가의 대립에서 발견되는 긴장. 둘째는 역사가 합법칙적 발전 과정을 겪는다는 접근과 역사는 주체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접근 사이의 긴장. 이 긴장은 마르크스의 저작들 사이에서도 파편적으로 나타나고, 그 파편들 사이에서 동요하게 되는 이후 수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저작 속에도 발견되는 사항들. 아마 이번에 책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점이 이 파편들을 어떤 형태로든 봉합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의 한계 였을 것 같다.
- 가령 이후 이진경의 <사사방>이나 이후 다양한 변증법적 해석을 중시했던 PD 계열의 이론에 영향을 주었던 Ferenc Tokei의 <사회구성체론>이 보여주는 모습이나,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에 있어 농민전쟁의 요소, 즉 혁명 주체의 역동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했던 포르시네프의 입장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등장했던 코스민스키 중심의 소련 아카데미 입장을 반영하는 <봉건 사회의 기본법칙>이나 <자본주의 이행논쟁의 새로운 전개> 등은 봉건사회의 기본적 생산관계의 내적 모순을 강조하는데 집중한다. 결국 긴장의 어느 한 편에 매달리게 된다. 그래도 예전에 봤던 Robert Brenner 논쟁을 다시 읽으면서, 이전에는 욕을 했던 글들에서 오히려 사회의 복잡성에 대한 기술을 발견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즐겁다. 포스탄이나 라뒤리의 연구 작업이 얼마나 안병직 사단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까를 역으로 되새겨 보는 것도 흥미. 당시에는 큰 관심 없었던 Guy Bois의 책은 한 번 찾아 봐야 할 듯.
- 이런 연구들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어떻��� 스스로의 가능성을 좁혀 나갔는가를 보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 그런 면에서 호르헤 라라인의 <역사 유물론의 재구성>이, 마르크스의 내부 긴장을 긴장으로 유지하는 것이 알튀쎄리언이나 분석 마르크스주의의 과학 중심적 해법이 보여주는 것보다 바람직하지 않냐는 해석은 지금 시점에서는 새롭다. 당대 그 문제의식을 볼 수 없었던 것 역시, 6~70년대까지의 폭압적 정세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이라는 존재 때문에 경험해야했던 세계 좌파 운동으로부터의 강제적 단절이라는 역사적 상황 때문이니 '지성사'의 관점에서 흥미 있는 일일 듯. 한 때 윤소영이 소련 학문 사정에 대해 놀랍도록 많은 이해를 가졌던 것처럼 굴었던 것이 바로 이 책 때문이라고 알려졌던 <소련의 마르크스주의> 역시 지금 관점에서 보니 흥미진진하다. 마르크스부터 존재했던 내적 긴장을 어떻게든 봉합하려는 소련의 이론적 시도가 소련 정치 권력의 이데올로기적 요구와 맞물리면서 발생하는 공소하고 추상적 개념, 용어로 환원되는 과정은 유르착의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의 이론 버전으로 보이기도.
- 이래서 때로는 시간이 많은 것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즉 다른 퍼스펙티브에 기반한 관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지도. 사적 유물론이라는 허구가 무너지면서, 더 많은 관찰과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면 그 방향은 무엇인지 또 즐겁게 찾아봐야 할 듯.
0 notes
Text
Marx on 'the Social'?
- 식민지 사회 성격 논쟁들을 둘러보다가, 오랫만에 마르크스의 중요 개념들을 다시 읽게 되니, 긴가민가 해서 마르크스의 책들을 다시 뒤적이면서 마르크스주의로서가 아니라 마르크스가 어떻게 사적 유물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을 이야기했는가 살펴보게 되었다. <독일 이데올로기>나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 같은 정식 출판물과, <그룬트리쎄>처럼 출판 단계에 이르지 못한 초고까지 대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꽤나 흥미있는 대목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1. 변증법과 구성주의?
- '내용과 형식'이라는 변증법적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개념이 '생산력과 생산 관계' 그리고 '사회와 개인' 이 관계를 마르크스는 항상 '전화'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는데, 즉 생산력은 생산 관계라는 형식으로 전화하고, 생산 관계는 생산력이라는 내용으로 전화하는 관계다. 마찬가지로 사회는 개인이 맺는 관계의 총체, 초기 마르크스가 사용한 개념을 빌자면 '교통 관계(Verkehrsverhältnisse)'의 총합이지만 동시에 개인은 사회적 개인이다. 헤겔의 추상 수준에서는 이런 상호 전화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없지만, 이는 공시적 수준에서는 상호 전제를 통해 존재하는 하나의 패러독스다. 마르크스처럼 유물론을 전제로 하는 이라면, 그리고 세계가 정신적 운동, 즉 추상의 발현에 불과한 것이라 보지 않는 이라면 이런 수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았을 것인데, 이 전개 과정에 대한 논의가 따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어쩌면 '사적 유물론'의 뿌리는 이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의 의도에서 등장한 것일지도.
- 결국 이런 패러독스에서 스탈린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이 그려낸 선택, 즉 생산력을 내용이 아닌 1차적 독립 변수(헤겔적 표현이라면 내용이 아닌 질료?)로 전제하는 방식의 해법이 이후 소련 교과서의 사적 유물론을 규정했고, 다른 하나의 해법은 알튀쎄르의 '주체에 대한 호명' 개념에 대한 기괴한 현실화인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에 의한 '생산 관계'의 1차성으로 나타났던 것은 아닐까? (E. P. 톰슨이야 이렇게 책임을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로 돌렸지만, 사실은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이 뿌리인 것으로 보이지만....)
- 그렇다면 이런 마르크스주의의 해법은, 패러독스에 대한 현대적 해법, 반형이상으로 등장한 20세기 중, 후반의 구성주의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아닐까? 마르크스의 변증법에 대한 구성주의적 재구성은 있나? 궁금하네. 국제 관계론에서만 발견되는 듯.
2. 교통 관계와 경제적 사회구성체?
- 사회적 개인이라고 할 때, 마르크스는 개인에서 출발하는 다양한 철학적, 경제학적 접근에 대해 비판하며, 개인은 출발점이 아니라 귀결점이라는 점, 그래서 무엇보다 '사회적' 개인임을 강조하고, 이 때 그 사회적이라는 것을 추상 수준에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통일로서 생산 양식, 그리고 이 생산 양식에 조응하는 상부구조, 그리고 이에 대한 반영으로서의 의식을 나누는데, '사회적 관계의 총체'라고 할 때와 '경제적 사회구성체'라고 할 때는 꽤나 다르게 들린다. 가력 사회적 개인에서 사회적이라 할 때 거기에는 이미 상부구조의 관계와 의식을 매개로 한 관계는 들어가지 않을까? 경제적 사회구성체를 이야기할 때 사회구성체에는 이미 상부구조가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 '경제적'이라는 것을 앞에 두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사회구성체가 규정된다는, 즉 상부구조는 종속 변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되지만, 왜 '사회적'이라는 규정을 이렇게 제한했을까?
- 결국 여기서 추상 수준에서 마르크스가 인간의 '종적 존재'로서의 특징을 '노동을 통한 자신과 세계의 재생산'이라 규정한 <경제학 철학 수고>의 논의를 벗어나지 않은 것 아닌가 싶어지는데... 가령 마이클 토마쎌로와 같은 발달 심리학 연구자의 연구에 따르면 노동을 통한 자신의 재생산 자체는 모든 동물의 특성이고 그것을 인간 답게 하는 것은 '협력 행동을 통한 공동 목적의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추론 능력이라고 하면, 노동에 선행한 '협력' 혹은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자면 '사회성'이 아닐까? 그럼에도 노동에 매달린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
-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결국 18세기 말을 지배했던 사유에서, 아담 스미스는 경제적 생산의 출발이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고, 헤겔은 인간이 세상에 의해 지배되는 노예에서 세상에 대한 주인으로 바뀌는 과정을 노동이라고 보았던 것을 생각하면, 마르크스도 역시 이 시대적 지평 위에서 바라보았던 것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오랫만에 헤겔 <정신현상학>이나 스미스 <국부론>을 다시 봐야겠다는.
3. 루만이 말한 이행기 관찰자로서의 마르크스
- 그렇다면 루만이 마르크스가 2계적 관찰을 통해 '기능적으로 시스템 분화하는 사회'에 대한 관찰을 할 수 있었지만, 그의 논의가 이행기의 상황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즉 사회적이라는 규정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경제라는 사회 시스템이 기능적으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미치는 아직 충분히 분화하지 않은 다른 기능적 사회 시스템에 대한 자극을 과잉되게 바라보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지도. 이게 루만이 쓴 "개인, 개인성, 개인주의"를 읽을 때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겠다 싶어지네.
0 notes
Text
식민지 트라우마 - 식민지는 특수한가?





식민지 트라우마 - 식민지는 특수한가?
- 고조선의 영광에 매달리는 (광기의 환빠를 그나마 제외한)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유사역사학 도서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일탈 과정을 보면, "1) (리지린을 끌어온) 윤내현의 도서들을 기본으로 두고, 2) (고고학적 뒷받침에 의한 검증 없이) 이를 진리라 인정한 바탕 위에서 다양한 상상을 확장 3) 그리고 상상 확장을 설명할 연구 방법론이나 이론틀 제시"를 거친다. 대부분의 이론 생산이 다양한 상상과 이를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이들 유사역사학 이론들이 학술적 외양을 지니는 것 같지만, 논구를 통한 피드백이 필요한 두 단계, 즉 바탕이 되는 주장이 타당한지, 그리고 특정 사건을 설명하는 이론틀과 방법론이 다른 사건을 또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외양이 아무리 학술적이어도, 인정될 수 없는 주장에 머무르는 것이다.
- 물론 이들의 출발점까지 의심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말년에 당혹스러운 주장을 하시지만, 김용섭 선생이 역사가라는 삶을 선택한 건, 식민지 경험, 저개발 국가 지식인이 마주해야 하는 울분과 답답함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요즘 세대는 못 듣겠지만, 내가 어렸을 때 "엽전이 그렇지 뭐", "조센징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는 등, 식민지 폭력을 체화한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드물지 않았다. '조선 민족이 못나고 열등해서 식민지가 될 수 밖에 없었다'는 19세기 등장한 제국주의자들의 '사회진화론'은 20세기 중반, 탈식민지 남한에 여전히 사유의 한 영역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 주장은 '실제로 식민지였지 않은가?'라는 사실이 던지는 질문에 의해 무게를 얻었다. 그래서 모두 식민지 경험이라는 근원적 트라우마를 마주할 수 밖에 없었다.
- 아마도 유사역사학이 이 질문에 대해 허구적 환상으로 도피한 것이라면, 진지한 그리고 무엇보다 학문을 한다는 이들이 선택 방법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해줄 수 있는 이론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30년대, 그리고 탈식민지의 40년대까지,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나마 답을 해줄 수 있는 건 마르크스주의 였을 것이다. 모든 인류는 5단계의 생산 양식을 거쳐 진보하는데, 제국주의 국가는 피식민지 국가의 가능성을 탈취했다는 이론이다. 당연히 이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식민지 조선의 좌파 지식인들은 조선이 스스로 자본주의 근대화가 될 수 있는 기틀(자본주의 맹아론)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보이고자 했고, 반면에 웃기게도 제국주의자들은 마르크스의 '아시아적 생산 양식'론을 끌어와 중국과 조선은 봉건제에 이르지 못하는 '영원화 정체'에 놓여 있었고, 이 정체로부터 해방시킨 것이 일본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식민지 근대화론) 이 대립구도는 다시 역설적으로 식민지는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근대화 될 수 없다는 주장(식민지 반봉건론)으로 이어지고, 이후 탈식민지 국가들의 경제적 정체 문제의 원인을 한 편으로는 제국의 지도가 사라진 저열한 민족의 한계라는 제국주의자에 대해,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시기 만들어 놓은 왜곡된 경제 구조(이중구조론이나 다우클라우드론) 때문에 발생하는 '저발전' 혹은 중심과 주변의 불균등 교환에 따른 초과 착취 때문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들로 이어지기도 했다.
- 그러나 이런 몇 십년간의 논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한 번 패러다임에 사로잡힌 이상 식민지 지식인에게 탈출구는 없다는 점이다. 비록 마르크스주의가 진보적 관점에서 제국주의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선형적 사회 진화론이라는 근대적 사유의 틀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상업 자본주의가 산업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영국적 경로가 순수한 자본주의 이행 모델로 제시되는 이상,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모두 일종의 왜곡으로 보여지게 된다. (오쓰카 히사오 大塚久雄식의 유형론?) 한 번 왜곡으로 바라보면 이제 왜곡은 내생적 원인인가 아니면 외생적 결과인가라는 두 가지 답 밖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내생적 원인이라면 조선이 문제 있는 나라인 것이고, 외생적 결과면 모든 것은 제국주의의 탓이 된다. 흥미롭게도 이런 주장들에는 '통시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멀쩡한 나라도 시간이 지나면 최악의 국가가 될 수 있고, 최악이었던 상황도 개선이 될 수도 있다. 어떤 한 시점에 벌어지는 상황이, 그 상황에 참여하는 이들의 '본질'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모든 사건은 '본질의 발현'이라는 서구적 형이상학이 근대적 사회진화론과 맞물릴 때, 결국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도돌이표를 찍게 된다. 그런 면에서 한 때 가장 적극적으로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을 주장했던 안병직이, 로스토우나 게르셴크론(Alexander Gerschenkron)의 후발국 성장이론을 주목했던 (상당히 설득력 있는 전환이), 식민지 근대화론중 가장 친일적 입장으로 전환하는 것 역시 이런 궤적의 일환일 것이다. 신경제사학에서 말하는 영국의 산업자본주의 형성 역시 석탄 채산성이 높았던 토탄이 많았기 때문에 발생한 우발성이라는 설명이 들어갈 틈이 여기에는 존재할 수 없는 셈이다.
-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식민지, 탈식민지 지식인들이 고민했던 대안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가 심각할 정도로 폐쇄적 이론이었다는 사실이다. 현실을 통해 이론이 검증되기 보다는, 언제나 상황에 대한 설명은 경전과의 일치 여부에 의해 검증되었다. 이는 오랫만에 들춰본 예전의 책들에서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 1930년대 중국 혁명 과정의 논쟁인 [식민지 반봉건사회론 연구]나, 이런 중국 혁명 논쟁을 50년대 일본에서 재검토하는 [중국혁명의 전략과 노선] 등은, 모두 당대 식민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놓고 벌어진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 책은 현실에 대한 설명보다는 마르크스 혹은 레닌과 트로츠키, 마오쩌둥의 논의에서 자신들 논리의 권위를 얻고자 한다. 심지어 이들 주장은 코민테른의 식민지반봉건 사회론 규정에 입각한 국공합작 노선과 이후 장개석의 배신 이후 스탈린이 격분(!)해 일어나는 민족자본에 대한 부정 노선까지, 코민테른의 주장에 조응해 이론이 구성되거나, 50년대 마오쩌둥의 중국 혁명 이후에는 이런 코민테른에 반하는 마오쩌둥의 사유를 논의에 투영하고자 한다. 그나마 이런 논쟁을 학술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인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은, 그런 혁명론으로부터는 자유로운 경제사적 분석이 반영되지만, 여전히 5단계 발전론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
- 오히려 아시아의 논쟁보다는 (처음 책을 읽던 84, 85년 당시에는 그렇게 못 느꼇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논쟁은 아무래도 더욱 자유롭게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자 했다. 프랑크나 월러스타인처럼 세계 시스템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알튀쎄나 발리바르의 '절합articulation' 개념을 통해, 이중구조가 아닌 여러 생산양식의 절합이라는 주변부 토대의 특수성과 그 절합을 보장하는 과잉된 영향의 상부구조라는 주변부 사회구성체론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런 다양한 논의가 당시 우리에게 경제적 현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졌을까?
- 지금 다시 돌아보면, 당시 진보 진영은 현실로의 구체화보다는, 화려한 언술을 통해 '보편-개별-특수'라는 헤겔적 범주를 마르크스가 어떻게 더 멋지게(!) 해석했는가를 놓고 싸우는데 급급했던 건 아닌가 생각된다. 80년대 중반 파란을 일으켰던 이진경의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 방법론]을 보면 생생하다. 뭐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결국 식민지, 탈식민지 지식인들이 존재론적 문제를 해결하여 마르크스주의를 선택했을 때, 그 논의의 궤적은 다음과 같이 된다. '1) 경전에 근거한다 2) 그에 근거해 현실을 해석한다 3) 현실에 맞는 추가적 이론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여기서 피드백이 발생하는 것은 3)의 이론틀이 다른 현실에 유효한가 대신 경전에 적합한가를 택하는 것이다. 결국 과학적 방법론을 주장했던 마르크스주의가 생각하는 '과학적'은 뭔가 미묘한 것이 아닐까? 하기야 스탈린이 그리고 이후에 알튀쎄르가 생각하는 과학성은 최종 심급에서 노동자의 당파성에 의해 규정된다고 하니 뭔가 순환적이니...
- 결국 식민지 경험의 트라우마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길을 찾게 만들고, 선명하고 확실한 길이라 제시되는 곳을 찾아 가면 거기서 도달하는 것은 환상 혹은 이론적 도그마가 만들어 놓은 거짓 천국에 불과했던 것 아닐까? 뭔가 안 어울리는 유사역사학과 진보적 연구자들의 접점 혹은 위치 이동을 보면서 이런 생각은 더욱 깊어진다.
p.s. 1) '혁명의 대수학'을 안다며 세계 혁명을 지도했던 스탈린과 코민테른의 죄과가 정말 크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며, 하필이면 코민테른을 가장 충실하게 따르던 박헌영이, 해방 후 남로당을 맡게 된 건 안타까운 역사의 비극이구나 싶어 답답하다. 20년대 후반 조선공산당을 지도했던 김철수 선생이나 30년대를 대표하는, 아니 식민지 조선이 낳은 최고의 사회주의 혁명가 이재유 선생처럼, 소련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도를 거부했던 이들이라면 뭔가 다른 역사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p.s. 2) 책을 다시 읽다보니, ��셰비키는 자코뱅적인 비밀 테러 조직이었던 '인민의 의지'의 작풍을 계승한 반면, 마오쩌둥은 그런 전통이 없이 오히려 당시 중국을 횡행하는 비적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 아니냐는 구절이 있어 박장대소. 수호지를 좋아하던 마오쩌둥이라면 정말 자신들을 의적으로 생각했을 지도. 그렇게 따지만 식민지 조선에서 남한까지 이어지는 혁명 전통은 무엇이었을까? 지부상소하던 선비?
0 notes
Text
Psedohistory에 방법론은 있는가?







- 뭔가 시간 낭비를 하는 나 자신에 현타가 오지만, 그래도 꾹 참고 다 읽은 책들. 유사역사학에는 그냥 <환단고기>를 주장하며 판타지 소설을 써대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거기에 학문적 외양을 덧 씌우고는, 학문적 검토의 결과인 양 떠드는 사람도 있는데, 이 번에 읽은 책들은 그 중에서 후자의 대표적 전거가 되는 책들. 굳이 이 책들을 읽은 이유는, 이들이 학자로서 학문적 형식을 취한다면 그에 걸맞은 방법론은 무엇인가가 궁금해서. 예를 들어 이현중의 <고조선 철학>은, 과연 고조선 철학의 특징을 설명할만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그로부터 어떻게 논의를 전개하냐 하는 문제... 결론적으로 보자면 판타지 고조선사를 쓰는 이들과 이들의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방법론적으로 유의미한 작업을 발견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이현중은 고조선 철학을 찾아내는 과정을 주역의 방법론에 근거한다!)
- 물론 여기서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는 제외해야 하는데, 북한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자주적이었던 주체사상 이전 시절의 학자인 리지린의 작업은 지금 봐도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노력을 들여 작업을 했는지 느껴질 정도다. 다만 문제는 그가 한 것이 주로 문헌 고증을 통한 '고조선'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해 고조선 상에 대해 추측한다는 것. 당연히 이런 작업은 고고학적 검증 과정을 통해 학문적 성과로 이어져야만 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고조선 이해를 위한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책은 남한에서는 북한의 연구 성과라는 이유로, 북한에서는 이후 주체사상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대동강 문명 중심으로 역사를 '재구성'하면서 묻혀버리는 이중적 운명에 놓인다. 아마도 이는 신석기 시대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던 양상인데, 박정희 시대라는 역사적 조건이 어떻게 역사 연구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태였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점차 남한에도 알려지고, 이를 반영한 연구 작업이 등장했지만.
- 윤내현의 작업은 그런 점에서 비도덕적이라 생각되는데, 그의 연구 대부분, 특히 문헌 고증에서 리지린에 기대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정작 이를 ���폐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쁜 것은 문헌 고종 작업, 즉 출발로서의 연구를, 역사적 결론인 것처럼 치환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윤내현의 작업이 교묘한 것은, A를 바탕으로 B를 쓰고는, 이후 B를 바탕으로 C, D 등을 쓴 이후에 다시 B를 개정하면서 C, D를 바탕으로 쓴 것처럼 일종의 원환적 논증을 통해 A를 지워버린 것이다. 이 정도되면 의도적 아닌가? 고고학적 교차 검증 속에서 살펴봐야 할 문헌 고증을 이미 하나의 결론으로 전제하고 이 위에서 이후의 고고학적 발견을 재배치하는 식의 작업이 이들에게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인 듯. 이후의 많은 이런 유사역사학적 고조선 연구가 윤내현의 책을 전거로 확장되는 것을 생각하면 가장 죄가 많은 분이라 생각된다.
- 또 하나의 태도는 이현중의 <고조선 철학>이나, 임재해의 <고조선문명과 신시문화>에서 발견되는, 문학이나 문화 이론, 혹은 신화 이론 등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이 무분별하게 역사학으로 재투영되는 방식. 과거의 A와 지금의 B를 비교하고 이를 연결하여 어떤 연관성을 찾으려는 이런 시도가 어떤 아키타입을 발견하려는, 혹은 사고 구조의 진화에서 발견되는 어떤 변화 양상을 설명하려는 수준을 넘어설 때 쉽게 근거 없는 '지금 시선'에 의한 연결로 이어지는 데, 아마 그런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기야 엘리아데도 파시즘적 성향으로 이어졌던 것을 보면 신화학을 통해 '민족의 뿌리'를 찾는다는 시도가 이런 귀결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지도. (그렇게 본다면 루만이 내린 '문화 개념'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서, 이런 '비교'가 어떻게 '관찰'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가에 대한 비판이 매우 적절한 것일 듯)
- 그나마 가장 재미있게 봤던 건 윤명철의 <고조선 문명권과 해륙활동> 여기서 매력적인 것은 그간 육상 교류에 기반한 분석에서 고대 어떻게 동북아 지역에 해상 교류가 있었을까에 대한 논의로 확장한 것. 사실 신석기 시대 연구에서 제주도에서 발견되는 정착지의 토기 특성이, 한반도 내륙 보다는 주로 연해주 지역 정착지의 토기 특성과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서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해상 교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잘 뒷받침될 수 있을 듯. 그리고 이 책은 앞에서와 같이 황당한 논의와는 달리, (가령 홍산 문화가 고조선 문화의 뿌리라는 주장과 같은) 무조건적인 팽창적 해석 대신 문제를 이해하려 하다보니, 정말 해괴한 결과가 이어지는데, 이때 중국의 중심 문화인 황하 문명과 대별되는 중국 북부 몽고에서 한반도, 일본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교류와 교역을 이야기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부족들을 모두 하나의 문명권, 고조선 문명권이라 규정하고, 따라서 몽고, 만주, 한민족, 일본의 왜 등이 모두 같은 고조선 문명권을 구성하는 다양한 민족이라는 뭔가 오족협화(!)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ㅠ.ㅠ
- 역시 궁금했던 것만큼의 보람은 없었지만, 국문학이나 민속학 했던 분들이 나이 들어 '외도'에 빠지면 어떻게 자신들의 사유 구조를 가지고 역사학에 대해 한마디 할 수 있다는 망상을 하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물론 신용하 교수나 김용섭 교수의 말년 작업을 봐도 할 말은 없지만....)
1 note
·
View note
Text
2025년 1월 구입 도서

- 연말부터 정신이 없다보니, 그동안 구입한 책들을 모아서 정리해 본다. 우선 고현학 관련 서적. 고현학은 제목 그대로 고고학과 달리 현재를 생각한다는 입장인데, 그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를 관찰하자는 이야기를 한다. 여행 조차도 people watching을 주 된 목적으로 하는 우리 부부에게��� 뭔가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그 방법론에 가까운 정리인 아카세가와 겐페이(赤瀬川原平) 등이 쓴 [路上観察学入門] (筑摩書房, 1993) 70년대부터 시작된 길거리 관찰로부터 어떻게 고현학이라는 영역을 주창하게 되었고, 무엇을 관찰하며, 그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는 작업이다. 예전에 일본 러브 호텔에 대한 고현학적 접근에 관한 책도 무척이나 흥미롭게 본 적이 있는데 그 출발점이자 지향하는 방향 그리고 방법론에 해당하는 작업이라 기대된다.
- 뭐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의 연장선상에서 우선 미츠조노 이사무(満薗勇)의 [消費者と日本経済の歴史] (中央公論新社, 2024). 경제 동학의 관점에서, 거시 경제적 변화를 정리하는 일본 경제사나, 혹은 순수하게 소비론의 관점에서 일본 소비 문화를 정리한 책들은 많이 있지만, 소비라는 관점에서 일본 경제의 변동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흥미 있는 접근으로 보인다. 특히 60년대 고도 성장기라는 전환점을 계기로 소비자 주권, 소비자 중심주의 의 등장에 대한 설명은, 주주 자본주의라는 기치아래 전개된 주식 투자적 주체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본주의의 전환 그리고 자본주의 아래서 주체(더 정확하게는 이전 자본주의의 계급적 자기 인식)의 전환을 설명하는 한 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흥미롭다. 이 책보다는 더 시사적인 책으로는 카네코 마사루(金子勝)의 [裏金国家] (朝日新聞出版, 2024). 2015년을 기점으로 일본은 '뒷돈'으로 구성된 정경 네트워크의 완성이 이뤄지고, 이것이 세습을 통한 지역 지배에 기반해 상호 지원을 통한 특정 집단의 과점에 기반한 정치, 경제 지배를 달성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는 책인데, 한겨레나 시사인의 기사 정도의 느낌인 듯.
- 마찬가지로 좀 가벼운 시사적 주제들에 대한 책으로는 요즘 제일 흥미진진한 저자인 타치바나 아키라(橘玲)의 책 중에서 우선 머스크나 부테린, 샘 알트만 같은 이들이 보여주는 정치 이념(?) 혹은 사회적 이해 방식에 대해 살펴보는 [テクノ・リバタリアン] (文藝春秋, 2024) 사회를 올바름이라는 가치에 따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 (폭 넓게 사회주의까지를 포함하는) 리버럴 계열의 진보주의에 맞서 개인에 자유로운 사유와 가치를 극단적으로 존중하는 리버타리언의 이념을 기술을 통해서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 그래서 국가의 역할도 부정하는 아나키즘적 사유까지를 포괄하는, 실리콘 밸리의 철학을 극단화 하고 있는 인물들의 사유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아키라의 경우는 이들의 사유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세계를 바꿔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리버럴 이념이 가지는 내적 한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살펴보는 [DD(どっちもどっち)論 「解決できない問題」には理由がある] (集英社, 2024) 이 책은 세상을 선악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판단을 하고 답을 내려는 시도가 어떻게 역으로 사회를 적대적으로, 그리고 어지럽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며, 오히려 많은 문제는 단순하게 어느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그래서 상대를 악이라 규정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점을 다루고 있다. 어쩌면 이런 아키라의 책들 속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인 Gen-Z에 대한 이해의 단편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지만, '공정'에 대한 이런 반-리버럴 이념의 상징과도 같은 Affirmative action을 둘러싼 역사, 원래의 취지와 그것이 어떻게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미나미카와 후미노리(南川文里)의 [アファーマティブ・アクション-平等への切り札か、逆差別か] (中央公論新社, 2024)
- 위의 테크노 리버테리언의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AI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론의 문제를 되짚어 보기 위해서 구입한 책들. 우선 이마이 무츠미(今井むつみ)와 아키다 키미(秋田喜美)가 쓴 화제작 [言語の本質-ことばはどう生まれ、進化したか] (中央公論新社, 2023) 최신 언어론까지 잘 정리되어 있다고 하니 기초적 이해에 도움이 될 듯. 그리고 이들과 함께 (나의 최애 학자 중 한 명인) 오오사와 마사치(大澤真幸)가 생성 AI라는 축을 통해서 언어론에 대한 논의를 나누는 [生成AI時代の言語論] (左右社, 2024)도 함께 구입.
- 그리고 시사적인 책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서들. 아서 단토(Arthur C. Danto)의 미술 비평 이론만 접했는데, 분석 철학을 역사에 적용한 역사 방법론에 대한 책이 있어 한 번 봐야겠어 구입. [物語としての歴史―歴史の分析哲学] (筑摩書房, 2024) '역사적 지각'이라는 개념에서 이야기로서 구성되는 역사라는 접근인데, 읽어봐야 맥락을 알 수 있을 듯. 다음은 사회학자 나카노 토시오(中野敏男)의 책으로, [ヴェーバー入門] (筑摩書房, 2020) 베버 연구는 한 번 날잡고, 김덕영 교수의 책을 축으로 다른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비교해 가면서 읽어봐야 할 듯. 지난 번 사토우 토시키(佐藤俊樹)의 책에서 다룬 베버 방법론의 문제를 읽고 하도 낯설어서, 특히 요하네스 폰 크리스(Johannes Adolf von Kries)의 확률론을 ��해 베버를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 그래서 그 이전의 리카르트와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하는 시도를 비판하는 내용은 폰 크리스의 주장을 모르니 참 낯설기만 하다. 이 책도 그 연장 선상에서의 참고이론. 그리고 그 와중 그의 책 하나가 또 재미있어 보여 구입. [継続する植民地主義の思想史] (青土社, 2024) 어째서 일본에서는 제국주의적 만행에 대한 반성이 없는지를 역사적 상황을 통해 살펴보고, 전후 다양한 변화의 시도, 혹은 반성의 시도가 좌절되며 지금의 망각의 체제가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 그리고 독일의 마르쿠스 가브리엘과 함께, 유난히 일본이 사랑하는 프랑스의 인류학자 엠마뉘엘 토드의 책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서양이 빠진 근본적 문제를 다루는 [西洋の敗北 日本と世界に何が起きるのか] (文藝春秋, 2024) 일본어판 서문과 후기가 있기는 하지만, 부제에 보이는 '일본과 세계에' 에서 일본은 그냥 붙인 듯 ㅋㅋㅋ. 다음 가족 시스템으로 세계의 차이화를 설명하는 그의 작업물들, 예를 들어 [가족 시스템의 기원]이나, [세계의 다양성, 가족구조와 근대성]에 이어서 그로부터 현대 사회의 문제까지 이어가는 [我々はどこから来て、今どこにいるのか?] (文藝春秋, 2022) 앞의 책들이 인류의 출발, 근대성의 등장까지였고, 이번 책이 앵글로 색슨에 의한 세계 패권의 형성과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까지를 가족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나름 마무리 책에 해당하는 듯. 다음은 그동안 일본 잡지에 실렸던 토드의 글들을 묶어 놓은 [老人支配国家 日本の危機] (文藝春秋, 2021) 가족 시스템이 일본과 비슷하고,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서도 앞섰던 일본, 그리고 이제 장기 침체까지 유사하게 가려는 상황이다 보니 토드의 진단과 처방이 궁금하다.
- 그리고 주제별로는 대니얼 데닛의 추모 논문 모음집, [現代思想 2024年10月臨時増刊号 総特集◎ダニエル・C・デネット―1942-2024 意識と進化の哲学] (青土社, 2024) 그리고 데리다 사후 20주년 논문 모음인 [思想 2024年11月号 特集デリダ没後20年] (岩波書店, 2024),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주제로 한 [思想 2024年12月号 【特集】フランクフルト学派と社会研究所の100年] (岩波書店, 2024), 현재 시점에서 제국이라는 개념을 다시 살펴보는 [思想 2024年7月号 【特集】帝国論再考] (岩波書店, 2024),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지만, 일본 래디컬이 오랫동안 고민했던 자치라는 주제를 다루는 [現代思想 2024年11月号 特集=「自治」の思想] (青土社, 2024), 인종 문제를 다루는 [現代思想 2024年10月号 特集=〈人種〉を考える ―-制度的レイシズム・人種資本主義・ホワイトネス…] (青土社, 2024)까지.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언제나 '현대사상'에서 최신 이론을 정리해줘서, '아는 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는데, 이번 년도에는 특이하게 인류사를 통해 지배적이었다가 사라진 이론들을 살펴보는 특집. [現代思想 2025年1月号 特集=ロスト・セオリー 絶滅した思想 ―天動説・王権神授説・エーテル…] (青土社, 2024) 꽤나 재미있는 접근인 듯.
- 마지막은 취미 생활. 우선 역사책으로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서 기원전 25세기부터 형성되어 제국을 건설한 아시리아 역사서. 일본의 아시리아 전문가 야마다 시게오(山田重郎)의 [アッシリア 人類最古の帝国] (筑摩書房, 2024). 다음은 일본 운동사, 우선 주로 일본 공산당에 대한 반발로부터 시작된 신좌파 운동의 역사적 전개를 다루는 아리사카 켄고(有坂賢吾)의 [新左翼・過激派全書: 1968年から現在まで] (作品社, 2024) 앞서 구입했던 다치바나 다카시의 [中核VS革マル]가 뭔가 잡지에 실리는 르포 형태의 책이었다면, 이 책은 국민(!)학교 시절 보던 소학관의 대백과 시리즈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 오랫만에 웃음. 형식과 전개는 같지만 내용이 '핑크 레이디'에서 '신좌파'로 바뀌었을 뿐, 하는 짓은 비슷하네. 그리고 일본 좌파 운동의 몰락 이후,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저항 운동이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는, 모우리 요시타카(毛利嘉孝)의 [ストリートの思想 増補新版] (筑摩書房, 2024)도 구입.
- 취미에서는 빠질 수 없는 오컬트 관련 서적도 구입. 우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점성술 책으로 알려진 마닐리우스((Marcus Manilius)의 [Astronomica] (講談社, 2024), 서양 오컬트와 특히 18~19세기 이후 에소테리시즘이 본격화된 역사를 살펴보는 타케시타 세츠코(竹下節子)의 [オカルト2.0: 西洋エゾテリスム史と霊性の民主化] (創元社, 2024), 그리고 일본에서의 오컬트 수용과 전개를 다룬 타케다 스우겐(武田崇元)과 요코야마 시게오(横山茂雄)의 [霊的最前線に立て!: オカルト・アンダーグラウンド全史] (国書刊行会, 2024) 온갖 주장들과 음모론이 어떻게 맞물리면서 일본에 오컬트 붐을 일으켰고, 그게 80년대를 거쳐 오움 진리교나 기타 음모론 집단으로 이어졌는가를 해당 영역 잡지 편집자였던 이들에 의해 정리. 일본 피라미드의 비밀 등 뭔가 목차만으로도 흥미진진.
- 이렇게 볼 책은 잔뜩 구입했으니 또 은퇴자의 넉넉한 시간을 채울 수 있건만 하는 짓은 "저 광인은 언제 잡혀가나"하며 유튜브만 보는 슬픈 저녁.
0 notes
Text
2024년 3월 구입 도서





- 이번 달에 구입도서는 어쩌다 보니 연구서보다는 흥미로 구입한 책들이 다수.
- 우선 우연히 페북에 올라온 『革マル派五十年の軌跡』이라는 책 사진을 보고, 예전 일본 학생 운동, 신좌파 운동사를 보던 기억에 구입한 타치바나 타카시(立花隆)의 『中核VS革マル』 (講談社, 1983) 87년 노태우의 6.29 선언이 발표되고는, “혁명이 유산되는 현장”을 보고 있다는 절망감(물론 지금 보면 그 전제인 ‘혁명이 예고되는 시점’이라는 정세 규정 자체가 일종의 과대망상이었지만)에서 학교 서점에 들어가 일본 학생 운동사를 보며 고민을 하게 되었다. 시차는 있겠지만 아마 이 때 많은 학생운동가들도 비슷한 (그러나 암묵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그 후 학생운동의 행보는, 광적으로 통일운동에 매달렸던 NL 계열이나, 반-개량 투쟁을 강조했던 ND, PD 계열이나 모두 극단화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초조함? 물론 더 결정적인 건 90년 전후의 소련 붕괴 문제이긴 하지만. 하여간 ‘개량의 물적 토대’를 일찍부터 확보한, 그래서 빠른 자본주의적 성장이 가능했던 일본에서 학생운동은 어떤 궤적을 거치게 되는지 중요한 관심사였다. 대중 투쟁의 가능성을 놓칠 때 결국 운동은 소수화, 극단화 되는 것이라는 오랜 운동사의 명제를 일본은 다시 확인하게 했었다. 게다가 어찌된 일인지 스탈린 대신 마오쩌둥을 선택한 대부분의 정파들은 이런 극단화의 양상이 더 심해진다는 건, Julia Lovell의 흥미진진한 마오이즘의 역사인 『Maoism: A Global History』에서 생생하게 그린 바 있으니. 하여간 잠깐 훑어본 것만 해도 정당한 문제제기가 어떻게 광기로 전환되는지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듯.
- 다음은 아사히 신문에서 해마다 중심 주제를 가지고 여는 국제 심포지엄을 묶은 문고판들. 역시 일본이 좋아하는 학자인 엠마뉴엘 도트와 마르쿠스 가브리엘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명사들 좌담회가 그저 뻔한 이야기로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지만 어떨지 조금 걱정. 2022년 10월에 열린 심포지엄 모음은 『2035年の世界地図 ― 失われる民主主義、破裂する資本主義』 (朝日新聞出版, 2023) 중심 주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미래. 2023년 10월에 열린 심포지엄 모음은 『人類の終着点 戦争、AI、ヒューマニティの未来』 (朝日新聞出版, 2024) 중심 주제는 전쟁을 둘러싼 인류의 미래, 그리고 특히 AI와 관련한 기술 문제도 다뤄진다. 가볍게 읽어볼 수 있을 듯.
- 연구 서적으로는 21세기 들어 이미 근본적으로 전환되었다고 추정되는 정치에 대한 연구서. 여러 학자들이 지금의 분단화 된 세계에서 (즉 2차 세계 대전 이후 지배했던 ‘리버럴’ 승리에 대한 믿음, 그것이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한 성취의 가능성) 새로운 보편주의적 정치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아리카 마코토(有賀誠) 등이 편집한 『普遍主義の可能性/不可能性: 分断の時代をサバイブするために』 (法政大学出版局, 2024) 그런데 가능한 일일까?
0 notes
Text
개인, 개인성, 개인주의 (4/4)
Gesellschaftsstruktur und Semantik, Band 3. Niklas Luhmann
번역 – 조은하, 박상우
ⅩⅠ.
개인적 자기-언급의 전개, 탈-토톨로지화 그리고 비대칭성의 형성에 대한 두 번째 예는, 시스템 안으로 시스템/환경 구별을 결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개인’은 비대칭적, 비가역적 관계들을 위한 그 자신의 출발점이 되었다. 만일 ‘개인’이 어떤 디딤돌, 어떤 확실성을 찾을 수 없다면, 심지어 반성 안에서의 정체성도 아닐 수 있다면, 환경과의 차이를 수용하고, 디딤돌 혹은 더 큰 확실성을 찾기 위해서 경험을 획득할 수 있는 조사로서 환경에 대한 요구를 활용하는데 해법이 있을 수 있을까?
일반적 개념에서, plaisir/ennui 도식을, 심적 시스템의 구성을 이끄는 근본적 규칙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을 개념화하려는 18세기 인간학은, 정확하게 이 주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우연은 아니다.[1] ‘요구’ 개념은, 구조안에서 더 강력하게 환경-관계된 그리고 충족/비-충족으로 전해지는 동일한 구별을 언급한다. Plaisir/ennui와 관계해서, 17세기는 이미, 문제가 되는 인간 존재만이 그 혹은 그녀에게 plaisir 혹은 ennui을 줄 수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이를 위한 어떤 객관적 범주, 어떤 규칙 그리고 어떤 규준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대조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것에 대해 행하는 요구, 그들이 그들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 무언가를 배우게 되는 충족 혹은 비충족을 통해,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전제조건과 관계하고, 오늘날에도 조응 하는 인류학적 이론이 부족한 하나의 과정이다.
법적 교리와 이런 교리에 의해 영향 받은 실정법 안에서, 이 과정은 ‘주체적 권리’의 개념에 대한 언급에 의해 추적될 수 있다.[2] ius의 고전적인 기본 개념은 권리와 의무의 균형과 관계가 있었지만, 이점과 부담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는 최소한의 시도조차 없이, 그 자신의 개념에 대해서만 유용한 일방적인 법적 관계로 축소된다. 그래서 균형은 사회로부터 훨씬 더 기대된다.
이런 특정한 법적 발전을 버팀목으로, ‘개인’을 향한 사회적 정향성의 더 급진적인 변화를 발견한다. 즉 그는 이제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만일 이 주제의 관점에서 역사를 되돌아 본다면, ‘이해’의 시맨틱과 마주할 것이다. 이해의 개념 안에서 17세기는 요구와 자기-언급성의 개념을 하나의 통일체로 결합했다.[3]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기-실현의 하위 영역에 대한 것일 뿐, 개인성 요구를 이끌지는 않았다. ‘이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4]는 슬로건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범주로서 역할을 했다. 만일 그들의 이해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을 그들에게 남겨둔다면, 정치적 계산을 위한 객관적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기-언급적 결정은 주관적인 요구를 사회적으로 객관적인 것으로 만든다. 모든 이들이 자신의 이해를 규정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배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즉 질서의 성립을 위한 자원을 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제와 정치를 위한 기초인 것이다.
이런 ‘이해’의 사용이 정치적인 이론적 자원들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동시에 다른 방향을 따르는 다른 논의들은 경제적 영역으로 이해를 옮긴다. 사랑과 이해는 반대되는 것이며, 상호 공존할 수 없는 지향이고, 그래서 사랑은 결혼과 일치될 수 없다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처럼.[5] 비록 사랑이 요구를 들을 수 있도록 표현하고, 그 요구를 위한 기초로서 그것이 고통을 사용함에도, 사랑은 스스로를 이해가 아니라 열정으로, 계산이 아니라 책임질 수 없는 욕망으로 규정한다. 사랑의 문제에서 그것은 ‘오컬트’에 따르는 공통점과 ‘경향’을 다루기 때문에, 점성가가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는 결혼에 대해서는 이뤄지지 않는데, 여기서는 이해가 작동하기 때문이다.[6] 사랑과 이해의 이런 차이에 더해서, 이기주의/이타주의 구별은 18세기까지 잘 유지되었다. 이 구별은 Descartes(!)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기-언급을 이기주의로 돌린다.[7]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이해를 마지막에 두는 동기 (그리고 따라서 동기의 개념론이)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무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해 가능하다. 더욱이 점점 더 사람들은 여전히 권리와 의무 사이에 관계적 조응, 혹은 자연적 통일성을 찾고자 한다.[8] 17세기 말에 이르러, 특히 ‘자기-애’의 영역에서, 자기-애는 타인을 사랑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인다는 의미에서, 반성적 구성이 지배적이 된다.[9] 그래서 자기-애와 타자에 대한 사랑의 이런 종합 안에는 이해가 포함되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그러나 이런 종합이 자기-이해와 타자의 이해 사이의 차이의 기반 위에서만 정식화 될 수 있을 때 조차도, 그것은 반복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이해하는, 혹은 심지어 경제적 개념에서 배타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에 다시 불을 붙인다.[10] 무엇보다도, 특히 18세기에는 자신 안에 하나의 동기로 이해를 이해하고, 물리학의 역학 개념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행위의 일반 이론으로 통합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L'homme agit nécessairement pour son intérêt personnel” (인간은 필연적으로 그의 개인적 이해에서 행위 한다)는 것이 전형적 요구이다.[11] 그리고 드러난 이해의 부족은 특별한 이해의 기초 위에서 설명될 수 있었다.[12] 따라서 도덕적 문제는 자기-이해의 극복에서 이해들 사이의 관계로 옮겨간다. 이런 행위-이론적, 일반화 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이해 개념과 대조되어, 누군가가 자신의 이해를 미뤄둘 수 있다는 의견은, 이해에 대한 규범적인 반대 개념으로 후퇴했다. 18세기 후반,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공공의 이해’ 혹은 ‘이성의 이해’(Kant)를 말했다. 그렇지만 상호교차의 선들이 설정되었고, 이해의 시맨틱은 일반화되었으며, 모든 이해들을 하나의 이해, 개인성의 이해로 뒤섞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이��’ 시맨틱의 역사는 과도한 거친 단순화에 대해 우려를 보여준다. 요구-지향적 개인주의가 역사적으로 반성-지향적 개인주의를 대체한다고, 그리고 그것에서 이어진다고, 반성의 실패로부터 발생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더욱이 양자는 공생의 다른 형식들로 들어가며, 역사적으로 서로 나란히 진행된다. 심지어 ‘이해’의 시맨틱을 넘어서, 예를 들어 사랑의 낭만주의적 개념 안에서 그것들은 서로 (그리고 그들의 실패를!) 연결시키면서, 이 시도들을 연구하는 것은 가능하다.[13] 궁극적으로, 그것은 동일성과 차이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이런 관계들의 출발점을 결정하는 것의 불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요구를 가지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동일해야만 하는가? 혹은 동일성은 요구와 사라의 절차 속에서만 ‘형식화’ 되는가? 적어도 Bildung의 향상의 시맨틱은 이것이 결정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호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만일 개인성이 반성을 통해서 생산된 정체성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된다면, 가치 있는 행동을 지적하는 개인화의 제도적 가이드라인은 폐지될 것이다. ‘개인’은 그 자신의 충동성에 남아 있고[14], 동시에 그 정체성이 구성되는 것을 타인에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타인의 요구와 맞서게 된다. 그렇지만 ‘개인’이 그 자신과 이에 대한 사회 사이의 차이를 요구한다면, 그리고 차이의 시맨틱이 이를 위해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 기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동일성과 차이가 함축되었다는 사실에서, 시맨틱 자신의 수단이, 개인의 기본적 개념으로서 요구와 반성 사이에서 하나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이 논쟁은 사회 구조의 발전에 의해 결정된다. 다음 부분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발전은 일차적으로는 요구-기반 개인주의를 더욱 적절하게 하고, 이는 사회 자체가 기능적 차이화를 통해서 조직화된다는 사실과 이어진다. 따라서 사회는 포섭과 참여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는 것을 각 기능 시스템에 남겨 두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개인’이 개인성에 대한 요청을 탐색하도록 초대한다.
모든 자기-언급과 동일성과 차이 사이의 개념적 관계에서의 순환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가 동일성을 통해서 혹은 차이를 통해서 개인화에 대한 충동이 진행되는 것을 허용하는지는 문제가 된다. 정보의 어떤 획득과 처리 과정은 스스로를 지향하는 차이를 필요로 한다. 차이의 제시는 그래서 정보의 질을 처리하는 작동 과정 안에 놓여 있을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도, 존경, 관심 그들의 필요, 승인에 대한 요청 등등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알게 된다. 이 정보 처리 과정의 맥락에서, 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 동일성을 부여할 수 있다. 심지어 이 동일성의 의미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정체성과 어떻게 다른 지가 그들에게 접근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 조차. 동일성의 인식이 이 과정의 부분으로서 발전하는 반면, 이것이 요구-충동적 정보를 찾거나 전환할 능력에 대한 요구조건은 아니다. 반대로, 개인이 되고자 하는 그리고 따라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단순한 호소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의 도움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차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의 차이기 전에는 구별되는 단위로서 규정될 수 없다.
개인이 환경으로부터 차이를 비대칭적으로 다루고 발생할 수 있는 형식은 요구, 무언가 그 자신보다 다른 것이 되는 요구다. 요구는 이차적 차이, 즉 그것의 있는 그대로와 그 자신에 일치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과 ‘개인’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사이의 차이로 시스템/환경 차이를 보완한다. 이 이차적 차이와 함께, ‘개인’은 시스템과 환경 사이의 일차적 차이를 조작하고자 한다. 단지 시스템과 환경 사이의 관계가 비대칭적이 된다.[15] 요구는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차이를 통해 반성이 작동하기 위한 그것의 적절성은 단지 오늘날이 되서야 주제화 되었다.
그래서 요구의 사회적 정당성은 단순한 이해의 승신보다 깊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이 십년 동안 더 분명하게 되면서, 아무도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요구, 더 이상 그들이 만족하기 위해 목표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규정할 수 없는 요구들을 포함한다. 자기-실현에 대한 요구는, 누군가를 사회에 통합하도록 그리고 기대에 통합되도록 도와주는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지점까지 끌고 갈 수 있거나 사실상 끌고 갈 수 있다. 요구 발생적 개인주의는, 어떤 이해도 가지지 않은, 그리고 이 격언에 따라 살아갈 것에 대한 요구를 포함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편적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제한 없는 정체성 속에서 살 수 있고,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사회에 대한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결정에 도달하는 것에 더욱 의존적이 된다.
이 모든 것 이후, 더 이상 이름을 가지는 것, 누군가가 무엇인가 (혹은 전통적으로 말하자면 누구로 태어났는가)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보다는 요구의 형식 속에서, 그 자신이 지금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적어도, 누군가 드러내는 것에 대한 승인은 승인에 대한 요구로서 부족한다. 자기-기술로 만들어진 부정성은 사회적 그리고 시간적 차원을 가진다. 반면 사건 차원에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특화된다. 그런 결점이 없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반성의 이유는 절대적으로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 방식에서 역으로 반성은 이런 결점을, 그 자신과 그 자신이 아닌 것 사이의 차이로 생산한다. 개인성은 불만족이다.[16] 그런 개인성의 논리 안에서, 궁극적으로 타인은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요구가 놓여 있다. 이런 원리는 개인성을 완성한다. 왜냐하면 이는 단지 자신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만 형성도리 수 있는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회의주의에 맞서는 과거의 논의가 적용된다. 즉 이것은 이론가들이 모순에 빠지는 이론, 혹은 그것을 옹호할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없는 이론이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지식 수준에 다라서, 이것은 단지, 자기-언급 자체가 시스템이 스스로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는 패러독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뿐이다.[17] 더욱이 요구에 대한 반성은 정확하게 이런 자기-해방을 위한 조작적 형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모든 것이 돌아갈 출발점은 발견 가능한 정체가 아니라, 요구, 개인일 것에 대한 요구 그리고 개인으로서 견뎌야 한다는 요구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Duns Scotus의 differentia individualis를 다루는 것이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의 구별을 통해 ‘개인’의 ‘이것’을 정의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 보다는, 개인일 것에 대한 요구는, 요구를 발생하는 그래서 지식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원리, 세계를 시험할 수 있는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가 된다.
요구-지향적 개인성은 단순한 정체성-기반 개인성보다 더욱 강하게 사회적 삶과 뒤섞이는 것처럼 보인다. 비록 그리고 왜냐하면 차이가 강조되기에. (나는 나 자신이다)라는 토톨로지를 통해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아니다)라는 패러독스를 해결함을 통해서 승인된다. 요구는, 누군가 스스로 그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의존한다. 그것들은 외부적으로 다뤄진다. 거기서 요구들은 거부되거나 혹은 적어도 그것에 대해 부과되는 한계를 가진다. 이런 면에서, 개인화의 이런 형식은 복지 국가의 전제조건을 필요로 한다.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예민한 도구로서 조직, 법, 화폐 속에서 일을 한다는. ‘개인’은 적어도 정상적으로 스스로를 이런 전제조건에 버린다. 거기서 동시에 경력이 가능해진다. 문학은 우리에게, 개인이 이 맥락에 대해 반성한다면, 즉 그들이 자아의 시스템과 그들 자신의 자기-기술 안에서의 사회적 환경 사이의 차이를 포함한다면, 어떤 종류의 반성이 결과를 낳을지를 말해준다. ‘개인’은 그래서 (그 자신의 요구의 충족과 비충족에 대해서) 그 자신의 무의미함을 경험할 것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가지 마지막 노력, 그 자신의 무의미 안에서 인식될 수 있는 요구를 주장하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을 남겨둘 것이다. 말하자면 T. S. Eliot의 The Cocktail party에서 Edward Chamberlayne처럼, 이 질병은 어떤 요구를 치료제로 정당화하기에는 너무 일반적이다.
자기-선택 요구에 대한 요구까지 포함해 모든 요구는, 그래서 ‘개인’과 사회 사이의 차이에 기반한다. 그렇지만 통일체로서 ‘그’ 사회가 ‘그’ 개인과 마주칠 수 있는 장소는 없다. 이것은 이미, 비대칭적인 것으로 그 관계를 해석하고, 상호 상태의 가정을 버리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은 남겨놓지 않는다. 이것이, 동일성의 개인적 형성에 대한 사회적 상대항, ‘개인적’ 동일성의 수단으로서 ‘집합적’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다.[18] 집합적 정체성과 개인적 정체성 형성 사이의 연결은 무엇보다 사회화와 포섭의 조건의 차이화를 통해서 중단된다. 이 때문에, 개인화에 대한 사회적으로 검증된 모델, 예를 들면 우수함 혹은 적당함의 모델, 형식의 능력 혹은 통달의 모델 등이 부족한다. 그래서 그들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권위 역시 부족한다. 이것은 이미 몇 번이나 이야기했던 요구들에 대한 다소 다른 논의에 불과하다. 즉 개인은, 동일성이 아니라 차이를 통해 개인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
기능적으로 차이화 된 사회는 개인화된 경험을 소리 내기 위한 도구로서 요구를 하고 요구를 사용하기 위한 ‘개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어떤 대안을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것은 단지 실망스러운 경험을 제공하거나 조응 하는 요구의 조정을 제안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요구는 개인성에 기반한다는 요구를 인식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개인이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고, 스스로에게 타자를 제공할 수 있다는 타당성의 문턱을 낮춤으로서 자신의 진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각 개별적 인격에 대해서, 전체로서의 사회는 단지 심호한 복합성, 즉 그들이 소유할 수 없는 정보, 시스템 구성의 전체성 안에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정보로만 나타난다.[19] 어떤 수단으로도 알 수 없는 정보는 정향, 학습 그리고 자기-동일화를 배제한다. 그렇지만 비록 그들이 세계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모를 때조차도, 스스로와 타자에 대한 그들 자신의 요구를, 어떤 경우인가를 규정하기 위한 탐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그들 자신에 대해 개인을 되돌려 준다.
그 부문적 차이화를 통해서, 사회는 이런 종류의 많은 시험 선택들을 ‘개인’에게 제공한다. 학교에서 개인은 이미, 나이에 기반한 학급에서 같은 조건 하에서 출발하면서 타자와 비교해 얼마나 좋은 지 나쁜 지를 알 수 있다. 스포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기회에 대한 모든 주장은 차이의 경험을 증가시킬 뿐이고, 그것은 가정된 평등에 맞서게 된다. 사회는 성인 개인에게 수입, 고용 혹은 실업을 제공하고 이에 기반해서 대단히 개인화된 구매 결정(개인적 획득은, 모두에게 가능한 재화의 공유보다도 훨씬 높은 가치를 가진 특성적 결과를 가지며)을 제공한다. 그것은 양질의 그러나 개선가능한 의료 지원과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그것은 개인에게 정치적 결정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어느 정도까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들에게 정보와 대단히 분산된 문화적 공여물을 선택할 수 있는 폭 넓은 전형적 매스 미디어를 제공한다. 적어도 그것은, 친밀한 행위의 이점과 불이익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고 성적 만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이런 기능적 영역으로의 사회의 분할은, 개인이 스스로를 개인화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에 대응한다. 이런 목적에서 개인은 반성의 도움 없이 혹은 정체화에 대한 언급 사항들 없이 혹은 범주적 명령으로 통일된 그리고 일관된 원리 혹은 법령 없이, 오직 차이의 경험만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들이 상대적인 개인 자신의 삶의 기반에 관계되고, 개인의 관점에서 정당화 되는 한, 다양한 요구들이, 친족 관계나 시장, 아무리 ‘인간화 되어도’ 업무 활동에서 정치에서, 완전히 만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식과 차원들을 도발한다. 특정화는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비교 속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선택된 타자보다 더 나쁘게 된다. 이는, 개인으로서 사람들이 그들 자신과 그들 환경에 만족하는지 혹은 불만족스러운지 혹은 그들이 실제로 향상을 갈구하는지 혹은 수동적으로 스스로를 맡기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완전하게 열어놓게 된다. 이러한 조건들이 새로운 ‘인간 종’을 낳지는 않는다. 우리는 아마도, 일반적으로 형성되자마자 병리로서는 보이지 않게 되는 어떤 병리의 발생을 기대하기 쉬울 것이다.[20] 어떤 경우건, 대단히 개인화 된 개인의 삶의 형식이 등장하고, 개인으로서 개인이 기대한 것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모든 기능적 시스템에서 이해 가능하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가 등장한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충족은 하나의 목표, 꿈,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만 하고 적어도 받아들여지는 요구가 된다. ‘나’라고 말하는 개인과 모순되기는 어렵게 된다. 저항은 우회를 위해 전환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구의 개인화가 사회 시스템의 다양성(수많은 차이 요소)를 거대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진화적 관점에서, 이는 시스템의 과도한 특정화를 낳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진화를 위한 위험을 지닌다.
다시 사회적 시스템의 차이화는 그렇지만 이 문제에 조응 한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특정화된 요구에 대해 매우 다른 가능한 적응 선택지를 보장하고, 그리고 개인적 기능 시스템에서 높은 수준의 실망을 흡수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적응한다. 기능 시스템 자체는, 그들의 피보호자의 개인성을 육성하고 재생산한다. 이것이 그들에게, 전체 인구 전반에 더욱 평등하게 각 인물의 개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에서나 아니면 개인적 이해에 더 깊은 적응의 방향에서,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그리고 그들의 제안에 대한 향상을 테스트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이것은 ‘포섭’[21]으로 언급되었고, 배제와 ‘한계성’ 같은 상대항이 형성되었다. 이런 개념들은 사회 시스템에 대한 요구조건을 또한 어떤 사회적 기능을 충족하는데 전문화된 사회 시스템들에서 발생하는 결과적 문제들을 언급한다. 이제 포섭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기능 시스템에 위탁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총합적 개념은 재정식화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공동체에서 사회로, 혹은 공동체에서 집합성으로, 그리고 이는 조화로운 전체라는 낡은 관념이 단지 낭만적으로 혹은 노스탤지어로 단지 대립항으로서만 호출된다. 동시에, 자신이 무엇인지를 향하는 무한한 방향성에서의, 개인성에 대한 요구는 원리상, 그 요구가 그런 평등 혹은 보상 같은 지원 아래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에 의해 은폐된다. 요구와 기능 사이의 차이는 그래서, 정당화 될 필요와 같은 이런 위로 향하는 궤적 없이 상승을 위한 동기로서 역할을 한다. 그것은 개인성의 확인으로부터 나온다.
18세기 초부터, Jean Blondel[22]은 동태성이라는 개념 안에서 유럽이 세계의 모든 다른 지역보다 우월하다고 썼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람들은 자기-애의 원리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Blondel은 이미 이런 세계 질서가 다른 지역에 더 큰 이익과 더 큰 해를 끼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 때 이후로 발생한 경험에 기반해서 우리는 단지 동의할 수 있을 뿐이다.
ⅩⅡ.
개인, 개인성, 개인주의의 시맨틱이 관념 세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관념의 독립적 진화는 정교한 관념 복합물과 함께 발생한다. 어떤 것이 개인으로서 기획된다면 언제나, 그에 대한 이유와 이 기획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고, 그로부터 개인성의 문제가 등장한다. 개인/개인성의 시맨틱이 정치 개념의 소용돌이 속에 포착될 때, 개인주의의 문제가 등장한다. 이 모든 것은, 부정에 대한 하나의 잠재성과 더 큰 변화 즉 더 큰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차이의 정의를 일으킨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 개인성, 개인주의’의 연속은, 또한 더 많은 개념의 추가가 의미 있는 언급의 영역을 확장하는, 그러나 동시에 원래의 용어를 전환시키는 진화적 연속을 구성한다.
역사적 소재 속에서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언급 지점을 발견해 왔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니다. 사회구조적 진화 이론의 일반적 가정에 따르면, 관념의 진화와 사회구조적 진화 사이에는 상관 관계가 있고, 사회구조적 진화가 관념의 선택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23] 이것은 특히 성층적 차이화에서 기능적 차이화로 사회의 근대적 재구성 속에서 가시적이 된다. 관념의 가변성은 증가하고, 더 많은 부정의 가능성이 허용된다. (특히 종교적 제약의 몰락을 통해서) 우발성은 더 많이 개념 안으로 통합된다. 결과적으로 각 선택은 더 많은 선택성을 얻는다. 동시에 선택은 타당성에서의 손실과 이익을 통해서 사회구조적 진화에 더욱 엄격하게 묶이게 된다. 관념은 역할을 하지만 그들의 후속적 적응을 통해서만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전히 매우 일반적인 가설이다. 또한 시맨틱이 취하는 그리고 다양화하는 주제적 문제에 의존해서 패턴이 다양하게 갈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만일 전기가 경력에 의해 개인화 되고, 요구에 대한 인내 한도가 낮아지고, 요구에 대한 정당화가 개인화 된다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게 될 결과들을 또한 탐구할 필요가 있다. 만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심지어 더 많은 어려움을 키우면서, 압력에서 승인으로 더 높은 일탈을 사회화에서 발생할 것인가? 실망의 정도가 불균형적으로 커지고, 실망을 흡수하는 일상의 메커니즘은, 특히 종교와 법에서 이를 견딜 수 있을까? 혹은 사람들에게 이런 압력을 덜어내기 위해, 절차를 통한 정당화, 참여의 형식 그리고 소비의 자유에 대한 환상 같은 발명이 존재하는가? 증가되는 개인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쨌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상호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사회의 상호 침투를 가능하게 할 때, 어떤 사회적 형식이 적합한 지 그리고 무엇이 진화에 의해 제거될까? 그리고 이 과정의 선택성은 특별한 기능 시스템과 그것의 환경에 대한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비록 개괄은 불가능하지만, 여기서 이 거대한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자.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개인성의 속임수와 사회에 대한 충격에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인성은 개인적 사람들이 타자에 대해 그들의 특별한 성격을 부과할 수 잇는 정도까지 발전하고 강화되었다. 이는 견딜 만하지만 바로 뒤집어질 수 있는 것 안에서 성장한다. 대단히 개인화된 출발점이 더 많은 행동의 전제조건이 되면 될 수록, 더 적절한 개인성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개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무가 된다. 단지 고유성 안에서만 ‘개인’은, 타자에게 그들의 기대가 충족될 것이라는 일관성과 확신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으로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물로 있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18세기에 믿었던 권리와 의무의 기본적 통일체로 돌아가는 것이다.[24] 한 인물로서, ‘개인’은 사회적 주소, 사회적 담론에서 그 자신의 동일성의 보장자가 된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그리고 타자에 대한 문제를, 예를 들면 그룹 회의에서 요구에 대해 개방하면서, 드러낼 필요가 있다.[25] 그래서 ‘개인’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거짓된 혹은 과장된) 전기를 필요로 한다. 이는 요구될 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잘 준비된 자기-기술을 지니는 것을 필요로 한다. 심지어 그래서 이해를 (혹은 어떤 특별한 이해가 없을) 가진다는 것, 자신에게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것은 비극이 될 수도, 치료를 통해 다뤄질 수도, 연금을 위한 자격일 수도 있다. ‘개인’의 고유성과 존재의 비교 불가능성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전제다. 거의 모든 문맥, 병원의 환자로서, 행정 기관에서 흥인 혹은 거부에 대한 지원자로서, 백화점의 고객으로서, 학생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군역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으로써 혹은 도제로서, 그것이 전형화 되는 반면, 이는 여전히 유형화가 개인에게 적용되는 방식에서 일어나고, 유형은 단지 개인이 특별하게 조사되고 더 많은 행동에 대한 전제로서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는 정도까지 통제한다.
개인의 개인성은, 타자가 그들의 개인성과 그들의 삶의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의존한다. 개인은, 모든 미리 규정된 근거 없는 요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방어할 수 있는 반면, 대신에 그들 자리에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에 더욱 더 복종하게 된다. 기대하기에 타당한 것의 임계점에서의 이런 변동은, 과대평가하기 어려운 사회 시스템에 대한 충격을 가진다. 사회 시스템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다. 그것들의 형성과 한계는, 주제, 시간-구속, 관심 그리고 언제나 의심, 주저, 사람들이 일상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서로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협상가능한 타협의 측면에서, 타당한 것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발생한다. 마침내 사회적 질서로 숙성되는 것은, 상호성의 기본적 규칙이나 ‘도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것에 의해 통제된다.
모든 개인이 타자에 대한 자신을 그리고 자신만을 강요할 수 있는 극단적 경우를 가정해보자. 개인으로서, 자신의 요구를, 같은 자유를 요구하는 개인들과 마주해서만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 관계된 세계, 그들의 이해, 그들의 향유가 구성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타자를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공식적 시맨틱이 가르치는 것은 아닐까? 자기-결정의 권리, 그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타자의 요구를 인정하거나 혹은 부정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시스템에 대해 이 결과는 무엇일까? 여기서는 세 가지 가설로 제한하고, 어느 정도까지 오늘날의 사회가 기술된 조건들에 이미 가까워졌는지 그리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제도화된 개인성을 가지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실증적 연구에 맡기고자 한다.
첫째, 이런 조건하에서 요구는 점차로 조직을 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관리된다고 가정해야만 한다. 새로운 종류의 종합이 자유와 조직, 독립과 의존 사이에서 등장한다. 이 효과는, 동일한 것이 경력에 대해 mutatis mutandis를 적용한다는 사실에 의해 높아진다. 동시에, 이것은, 모든 기능적 영역에서 개인성의 사회적 포섭은 점차적으로 조직을 통해 매개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 유형의 특정한 구조적 선택성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26] 결과적으로, 조직은 사례의 개인성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압력 하에 놓인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루기 힘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비용이 드는, 그리고 불투명한 조건들의 뒤섞인 거미줄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개인은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그들이 이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기관에 제시하게 된다. 더욱이 그들이 자신의 요구 안에 더 많은 개인성을 포함할 수록, 이 요구들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들은 더욱 당황스럽게 된다. 이것은 부패, 조직 내에 인맥, 혹은 상호적인 그리고/혹은 후원인-피후원자의 관계를 구성함으로써, 즉 조직을 훼손하고, 개인적 자기-결정을 제약하는 것만으로 변할 수 있었다.
둘째, 더 많은 행위-관계 기대가 개인적 사람들에 대한 언급에 의해 풀려나면 날 수록, 사회는 믿을 수 잇는 기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다른 가능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대의 확실성의 높은 수준의 개인화는 인물에 대한 적확하고 특별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만일 모든 기대가 이런 방식으로 지지될 필요가 있다면, 요구 조건은 빠르게 실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비인격적 기대의 발전 역시, 예를 들면 역할과 관련해서, 다중적 역할을 조율할 수 있는 정확한 행동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혹은 심지어 근본적 가치를 향한 태도의 수용성과 관련해서 가능하게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위 기대의 개인화는, 단지 다수의 동일시와 기대 유지 수준을 분리하는 맥락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마치 역으로 가치/프로그램/역할/인물에 따라 이런 차이화의 형식이, 단지 다른 누구도 아닌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대들을 추려내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수준들을 떼어 냄으로써, 그런 배치는 문제가 되는 행동과 그것의 도덕적 가치 평가 사이의 단순한 구별을 전복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동일한 도덕성의 가능성에 대한 결과는 명백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상호침투의 높은 수준에서의 개인화는 또한 사회 시스템의 시스템-내부적 연결을 느슨하게 하는 것으로 기술할 수 있다. 이것이 근대사회의 특징에 필수적인 것은 아닌 반면[27], 이전 사회에서 그것은 일상 생활에 대한 거대한 총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성과 연결되어 있다. 대조적으로 근대사회는 기능적 시스템의 생활 관련성에서 거대한 증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부터 참여의 낮은 수준을 결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사회적 기능 (노동 분업)에 대한 (ⅰ) 낮은 개입과 함께 자신의 기여에 (ⅱ)높은 의존성과 (ⅲ)높은 특수화는, 기대되지 않은 축적을 통해 (ⅳ)효과의 발생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치, 경제 교육의 수용성을 심각하게 테스트하는 사회 운동에 대해,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집합적 현상을 놀랍게 나타나는 그리고는 부드럽게 다시 사라져 버리는 유행. 더 간결하게 정식화 하자면, 사회적 연결의 완화와 통제 완화는, 참여의 축적과 분해의 다수 우발적 과정을 이끈다. 개인으 더욱 더 그들의 사회적 조정에 개입되고, 그러나 결과로 또한 더욱 일탈하거나 덜 신뢰하게 되었다. 일시적으로 강하지만 빠르게 분해되는 연결은, 사회적 시스템이 이 배치에 대응하는 형식임이 분명하다. 이런 사건의 상태는 17세기부터 관찰되었다. 그 때는 그것은 매우 넓은 의미에서 ‘유행’으로 언급이 되었다.[28] 오늘날에는 ‘유행’이라는 개념은 계획된 과도적 현상 그리고 일시적인 것에 대한 특별한 설득력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행은 충동적 힘을 행사한다. 왜냐하면 개인으로서, 그것은 그것에 맞설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29] 집합적 연결의 파동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문제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개인의 참여 능력을 흡수하고, 사회 시스템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 진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그것의 등장은 통제도리 수 없고, 어떤 복잡한 정보 과정에 의해 수반되는 것도 아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회 시스템의 오토포이에시스의 요구조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런 세가지 핵심 국면들, 조직을 향한 요구의 이동, 기대의 식별을 위한 수준의 차이화, 그리고 집합적이지만 단지 일시적인 연결은 높은 수준의 개인화가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사실과 환경이 근대사회에 발생했고, 그것이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것들의 중요성과 그것들이 진화에 대한 근대사회의 기회에 영향을 미친 정도는 다른 문제다. 아마도 근대 개인주의의 지배적 시맨틱은, 이런 관점에서 그 효과들을 과대 평가하고 사회를 과도하게 관찰하게 될 것이다. 단지 정교한 사회 이론만이 이런 일방성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상세한 연구 대상과 마주한 불확실성이 그러나 다시금, 그런 이론의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바로 보여준다.
ⅩⅢ.
우리의 탐구는 개인/개인성/개인주의라는 주제에 대한 특별한 사회학적 관심에서 출발했고, 이런 이유로, 사회적인 것에 대한 이론을 위한 전망을 평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개인’의 관점에서 사회적인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시도는, ‘개인’ 자체의 개념에서의 변화에 정확하게 조응하는 완화, 추상, 그리고 분해를 향한 발전을 수행했다. 17세기 초반에는, 행위의 관찰자가 이 행위의 목적으로부터 쉽게 읽어낼 수 없는 동기의 문제가 이미, 사회의 궁극적 ‘요소’로서 개인의 자연적 특성에 기반해 사회에 대해 자연적 설명을 하려는 시도가 폭발했다. 잠시 동안, 개인이 그들을 함께 추동하고 사회를 형성하는 시급한 동기와 이익의 계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시도하면서, 계약 이론에 의지하는 것이 가능했다. 18세기에, 이런 시도 역시 거의 폐기되었다. 남은 것은, 예를 들면 자유라는 형식 안에서, 인간 개인성이 사회가 인정하거나 비판해야 할 것에 따르는 가치라는 관념이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사회는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적 자기-결정과 자기-실현을 개인’을 위해 가능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의 실패는 비판의 원인이 되고, 이 비판은 필요하다면 스스로를 폭력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사회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고, 사회는 조응하는 대응에 관한 이런 종류의 단일한 충동에 반응할 수 있기에는 훨씬 더욱 복잡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관념 역시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사회적 시맨틱의 수준에서 자연, 계약, 가치, 이런 연속은, 사회구조적 진화가 강제로 ‘개인’의 포섭에서 배제로 이동했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자연, 계약, 가치’의 연속은, 시맨틱이 사회구조적 진화에 어떻게 양보하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연속에서 마지막 결과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계약의 개념은, 자연의 개념보다 ‘개인’의 자기-결정된 자율성을 더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법적 시스템 안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이미 받아들여지고, 그 우발성을 제거하는 행위 모델을 일반화한다. 가치 관념은 단호하고, 호칭적으로 ‘개인’을 인식하고, 실제적 조건을 한탄한다. 그렇지만 그동안, 그것은, 사회적 시스템의 구조와 동학이, 단순히 인간 존재의 측정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것보다 완전히 다른 문제들 (혹은 더 주의 깊게 다루자면, 많은 다른 문제들)을 발생한다는 것을 거의 간과할 수 없다. 개인적 인물에 대한 사회 시스템의 관계는 다른 것 중에서 그 환경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이자, 다른 것 중에서 하나의 에콜로지적 문제다. 19세기 사회 이론은, 부분적으로는 사고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시장 이론에 의해서, 부분적으로는 가장 적절한 사람들과 사회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주장했다고 보이는 진화 이론에 의해,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라는 가정 위에서 에콜로지적 문제를 억압했다. 그렇지만 이 때문에 사회 이론은 여전히 부족하다.
‘개인’의 자율성 시맨틱을, 사회의 시맨틱만큼 심각하게 다루거나, 생명 그리고 심적 시스템의 자기언급적 닫힘과 오토포이에시스에 대한 이론들을 사용해서 과학적으로 재구성했다면, 사회 이론이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가시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이 근대 개념은, 이 개념을 통해서 스스로를 엄밀하게 할 것이 요청될 수 있는 사회에 속한 것이다.
[1] 이어지는 시기에 풍부한 의미론적 변형들의 단 하나의 사례를 주는 것은, “Somas, antes que otra cosa, un sistema nato (sie!) de preferencias y desdenes”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선호와 싫어함의 타고난 시스템이다) José Ortega y Gasset, Estudios sobre el amor, 1939, Madrid 1973, S. 127에서 인용.
[2] Niklas Luhmann, Subjektive Rechte: Zum Umbau des Rechtsbewußtseins für die moderne Gesellschaft, in Gesellschaftsstruktur und Semantik, Bd. 2, Frankfurt 1981, S. 45-104.
[3] 이해의 개념과 관계되어 있는, Hobbes의 관한 논쟁에 대해서는 Bernard Gert, Hobbes and Psychological Egoism, Journal of the History of ldeas 28 (1967), S. 503-520. 특히 Shaftesbury의 대단히 성공적인 논쟁은, 자기-언급의 해석에 끌어내는 이기주의/이타주의의 도식에서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이것은 개념 발전에서 불명료함의 전형이다.
[4] J. A. W. Gunn, “Interest Will Not Lie”: A Seventeenth Century Political Maxime,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29 (1968), S.551-564. 또한 Politics and the Public Interest in the Seventeenth Century, London 1969; Felix Raab, The English Face of Machiavelli: A Changing Interpretation, 1500-1700, London 1965, S. 157 ff.
[5] 이에 대한 언급으로는, Niklas Luhmann, Liebe als Passion: Zur Codierung von Intimität, Frankfurt 1982, S. 79, 83 ff., 95 ff.
[6] Annibale Romei, Discorsi, Ferrara 1586, S. 25 ff.; Virgilio Malvezzi, Ritratto del Privato politico christiano, Opere del Marchese Malvezzi, Mailand 1635, S. 92에서 인용.
[7] Robert Spaemann, Reflexion und Spontaneität: Studien über Fénelon, Stuttgart 1963, S. 117 f.
[8] 중농주의적 맥락에 대해서는, Paul-Pierre Le Mercier de La Rivière, De l'ordre naturel et essentiel des sociétés politiques, London, Paris 1767, Paris 1910 신판, S. 8 ff에서 인용.
[9] 이에 대한 언급은 Niklas Luhmann, Frühneuzeitliche Anthropologie, in: Gesellschaftsstruktur und Semantik, Bd. 1, S. 162-234, insb. S. 178f.
[10] 이런 경향에 대해, 어느 정도 과장되었지만 Albert O. Hirschman, Leidenschaften und Interessen: Politische Begründungen des Kapitalismus vor seinem Sieg, Frankfurt 1981.
[11] Abbé Pluquet, De la sociabilité, Yverdon 1770, Bd. 1, S. 126 ff. 또한 Paul-Henri Thiry d'Holbach, Système de Ia Nature ou des lois du monde physique et du monde moral, Buch 1, Kap. XV, Paris 1821에서 인용, Hildesheim 1966 재출판, S. 374 f.
[12] 이런 주장은, 더 이상 원죄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동기의 평범성과 진부함으로 이어지는 행위에 대한 인간학적으로 세속화된 비판의 맥락 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La Bruyère, Abbé de Villiers, Abbé de Bellegarde u. a.).
[13] Alfred Schier, Die Liebe in der Frühromantik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Romans, Marburg 1913; Paul Kluckhohn, Die Auffassung der Liebe in der Literatur des 18. Jahrhunderts und in der deutschen Romantik (1922); 3. Aufl. Tübingen 1966.
[14] Ralph Turner, The Real Seif: From Institution to Impuls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1 (1976), S. 989-1016은 과거 수십년의 발전을, 문제가 되는 ‘개인’의 면면들에 대한 제도적 규정에서 충동적 규정으로의 이동으로 해석한다.
[15] 개인이 오직 자신에 대해서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론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비대칭적으로 뒤집은 것이지만, 환경과의 관계를 재-대칭화하는 것은 아니다.
[16] 이 점을 주의하는 이론은 그래서 물론 더 많은 구별을 만들어 내도록 자극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를 소외론으로 이론의 사회적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선택은 3계 관찰 수준, 즉 관찰자의 자기-관찰에 대한 관찰 수준에 놓여 있다.
[17] Yves Barel, Le paradoxe et Je système: Essai sur le fantastique social, a. a. 0.
[18] 개인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동일성과 차이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의 드문 한 가지 예는, 이것을 없애서는 안 될 요구조건으로 보는 것이다. “개인적 정체서의 각각의 모델은, 이것이 긍정적 관계이건 부정적 관계이건, 집합적 정체성과 권위의 분출적 개념과의 관계에 의해 특징 규정할 수 있다” Burkart Holzner/Roland Robertson, Identity and Authority: A Problem Analysis of Processes of Identification and Authorization, in: Roland Robertson/Burkart Holzner (Hrsg.), ldentity and Authority: Explorations in the Theory of Society, Oxford 1980, S. 1-39 (26).
[19] 정보 이론은 ‘형태발생적’ 분석 개념에서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복합성의 개념을 채용한다. 이 개념은, 어떻게 구조화된 시스템의 발전이 이에도 불구하고, 즉 비정보에 대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노이즈 원리로부터 질서’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지를 포착하고자 시도한다. 이에 대해서는 Henri Atlan, L'organisation biologique et la théorie d'information, Paris 1972; ders., Entre le cristal et la fumée: Essai sur l'organisation du vivant, Paris 1979; Jean Pierre Dupuy, L'Autonomie de l'homme et la stabilité de la société, Economie appliquée 30 (1977), S. 85-111; Giovan Francesco Lanzara/Francesco Pardi, L'interpretatione della complessità: Metodo sistemico e scienze sociali, Neapel 1980.
[20] 이것은 특히 ‘신경증’에 대해서 진행된다. 그것은 수요에 의해서, 즉 누군가가 적절하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관계를 기대한다는 사실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Karen Horney, Tue Neurotic Personality of Our Time, New York 1937; Snell Putney/Gail j. Putney, Tue Adjusted American: Normal Neuroses in the Individual and Society, New York 1964
[21] Talcott Parsons, The System of Modern Societies, Englewood Cliffs, N.J. 1971, S. 92 ff.; Niklas Luhmann, Gesellschaftsstruktur und Semantik, Bd. 1, Frankfurt 1980, S. 31 f. u.ö.; ders., Politische Theorie im Wohlfahrtsstaat, München 1981, S. 25 ff.; Rudolf Stichweh, Inklusion in Funktionssysteme der modernen Gesellschaft, in: Renate Mayntz et al., Differenzierung und Verselbstäridigung: Zur Entwicklung gesellschaftlicher Teilsysteme, Frankfurt 1988, S. 261-293; ferner oben S. 169ff.
[22] Des hommes tels qu'ils sont et doivent être: Ouvrage de sentiment, London-Paris 1758, S. 166 ff.
[23] Niklas Luhmann, Gesellschaftsstruktur und Semantik, Bd. 1, Frankfurt 1980, S. 48 ff.
[24] oben S. 41ff., 239.
[25] 이런 요구 조건 뒤에 있는 도덕적 압력은 비판적 목소리만이 아니라 그 자신의 용어에서 구성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Philip Rieff, The Triumph of the Therapeutic: Uses of Faith After Freud, New York 1966; Sigmund Koch, The Image of Man Implicit in Encounter Group Theory,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11 (1971), S. 109-128. ‘개인’이 될 것에 대한 요구가 개인에 대해 맞서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특히 여기서 충격적이다. 이 모든 것은 더 많은 사회학적 분석을 요구할 것이다.
[26] 이에 대한 확장된 연구는 Dieter Grunow/Friedhart Hegner/Franz-Xaver Kaufmann, Bürger und Ver waltung, 4 Bde., Frankfurt 1978 (insb. Bd. 2 - Friedhart Hegner, Das bürokratische Dilemma - S. 130 ff.).
[27] John F. Embree, Thailand - A Loosely Structured Social System, American Anthropologist 52 (1950), S. 181-193; Hans-Dieter Evers (Hrsg.), Loosely Structured Social Systems: Thailand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Haven 1969.
[28] “ce qui concerne le goût, le vivre, la santé et la conscience” (취향, 살림, 건강 그리고 의식에 관한 것)을 언급하면서, Jean de La Bruyère, Les caracteres ou les mœurs de ce siècle, Œuvres complèes (éd. de la Pléiade), Paris 1951, S. 59-478 (386)에서 쓰고 있다. La Bruyère는 삶과 죽음의 문제조차, 대결의 예를 사용해서(p. 391) 면제된다고 보고 있다. 오늘날 시민에 대한 해방/참여/폐쇄와 같은 복합성에 대해, 그런 유행의 순환의 다양성을 그리기 위해서 조깅이나 초월 명상을 언급할 수 있다.
[29] 이것 역시 오래된 논의다. Jean Baptiste Morvan de Bellegarde, Reflexions sur le ridicule et sur les moyens de l'éviter. Aufl. Paris 1699, S. 125.
0 notes
Text
개인, 개인성, 개인주의 (3/4)
Gesellschaftsstruktur und Semantik, Band 3. Niklas Luhmann
번역 – 조은하, 박상우
Ⅶ.
1800년경 주체성과 개인성의 개념적 전통을 결합할 때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 개인적 주체는 사회성의 부족한 양식은 아니다. 그와는 달리 주체는 넉넉함과 풍부함을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내적 세계와 향상 능력을 표현한다고 간주되었다. 게다가 취향의 판단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사회의 상층에서의 언급 그룹으로서 타자를 향한 시선들은 반성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것은 마치 저절로 그런 것처럼, 그들이 스스로에게 초월적 확실성을 제공할 때 타자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 시선을 제공한다. 하나의 역사적 순간에서, 배제와 포섭이 ‘신성한’ 개인 안에서 함께 생겨나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이런 이행을 해방으로 그리고 동시에 (자기-통치의) ‘국가’ 안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경험한다.[1] 고독을 인식하는 방식의 연속성은 없다. 그것은 오랜 동안 사회에 대한 반-개념으로 생각되었다. 만일 세계가 아니라면, 사회로부터 주체로서 ‘개인’을 떼어내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고독의 개념은 특별히 이런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성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고독은 사회적 접촉의 부재로서 이해되어 왔다. 사회와 사회성 사이에는 어떤 구별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개인은 어느 정도까지는 유쾌한 상호작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또한 사회로부터 그럴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또한 궁정에서 금지되는 것으로 통해 쫓겨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초기 견해에 따르면 이는 단지 잘못된 삶의 방식, 혹은 자연의 위반이었다. 고독한 삶은 불완전한 것으로 고려되고, 개인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2] 17세기는 여전히 고독을 다시 세계의 유혹에 대한 일종의 도덕적 방어로 생각했고, 또한 animal sociale의 진정한 본성에서의 일탈로 생각했다.[3] “La solitude nous imprime jene sais quoi de funeste” (고독은 우리를 희미한 절망의 개념으로 나타낸다)고 Saint-Evermonde는 쓰고 있다. 그는 그 자신이 이것을 경험했었다.[4] 고독은 우울함과 연결되었다.[5] 그리고 다시 한번 평정심을 가지고 고독을 견디는 능력은, 누군가를 독립적으로 만드는 정치적 미덕의 하나다.[6] 종교적 금욕주의와의 연결 혹은 미덕의 옹호는 18세기로의 이행기 동안에 줄어들었고, 고독과 사회성 사이의 차이의 주제에 대한 격화도 그러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이 주제는 여전히 도덕적 도식을 통해서 통제 하에 있을 수 있었다. 앞서의 전통을 여전히 따르는 Marquis d’Argens는, 고독이 인간 존재를 내적 공허에 노출시켜, 그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썼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쁜 동료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이 공허함을 견디는 것이 나은 일이다. 단지 좋은 동료들만이 고독을 넘어 선호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단지 좋은 동료만이 그들로부터 개인에게 제공하는 사회성을 사용하기 때문이다.[7] 따라서 불안한, 자기-발생적 개인들의 새로운 인간학은, 도덕적 평가들 그리고 그것에 조응해서 인식되는 사회적 조건들을 쫓아내지 않는다. 단지 그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낸다. 18세기말까지도, 여전히 극적 과장을 통해서 사회에 맞서 고독의 균형을 유지하는 문학적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8] Kant의 ‘ungesellige Geselligkeit’ (비사회적 사회성)은 가장 적은 어떤 것조차 바꾸지 않았다. 이런 관점을 전환하는 것(그러나 여전히 같은 도식 안에서)은 오직 Valéry다. ‘Un homme seul est toujours en mauvaise compagnie’ (고독한 남자는 언제나 나쁜 동료들과 함께 있다)[9] 그렇지만 이런 반전은, 단지 도덕적 도식이 더 이상 이 문제의 정식화를 이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고독이라는 주제가 사라진다. 주체 이론은, 그것이 개인성에 대한 관심을 떠맡고,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 특성화 된다. 주제는 더 이상 고독과 사회성 사이의 차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주체로서, ‘개인’은 고독하지 않다. 그리고 그와 나란히 현대 사회에서 이제 가시적이 되는 것은 사회성의 특성을 잃었다. 고독의, 혼자 살아간다는 현상은 이제 누군가의 전기적 내용으로 귀속되고 예를 들어 수줍음, 전형적인 특정 나이의 현상 혹은 억매이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 등으로 해석된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환경에 의존해서, 사람들은 사회정치적 개입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혹은 어떻게 ‘혼자 있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가를 탐색한다.[10] 이런 상황에서 의미의 새로운 창조를 이끄는, 그리고 새로운 형식에서 ‘개인’ 개념을 통합하는 ‘주체’에 대한 고도의 시맨틱은 두 가지 사건의 발생, 즉 칸트주의 철학의 도래와 프랑스 혁명에서 발생한다. 의식의 초월성 가설을 통해, 즉 실증적 의미와 초월적 의미 사이에 차이를 가지고, 칸트주의 철학은 새로운 기반에 인식론과 실천 철학을 놓는다. 그래서 개인은 그들 자신의 내부의 보장을 통해 (그리고 더 이상 소유가 아니라), 즉 자신의 의식 속에 나타나는 세계를 통해 스스로를 성립하는 주체로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은 사회적 질서 (자유, 재산의 소유권, 억압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일반적 가정의 인식을 이끌었고, 그것은 다시 ‘개인’을 사회가 무엇과 같이 보여야 하는 지를 위한 모델로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스스로를 주장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모든 관심이 자유로워지고 동등한 무게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카오스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언급되는 개인이, 더 이상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통해, 그들의 사회적 계층에 따라 규정되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개인적 능력의 착취를 보장하는 사회는 더 이상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총체로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한 가지에 대해서, 새로운 종류의 정치적 도덕주의가 이 지점에서 형성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가능한 수단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에게 부여했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서, (프랑스의) 왕정 복고기는 자유를 제도화할 수 있는, 혹은 개인성의 제도화라고 거의 말할 수 있는 것의 새로운 형식을 찾았다. �� 과정에서 ‘개인’의 실제적 의미는 정치적으로 비결정 상태로 남아 있을 필요가 있다. 독일 관념론은 이에 조응하는 철학적 정식화를 제공한다. ‘개인’은, 자아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의식하게 되고, 인간 존재로서 실현되는, 세계에 대한 ‘일회성’의 고유한 관계로 이해된다. 세계 (혹은 사회적 관점에서 인류)는 정확하게 ‘개인’ 안에서 ‘자동적으로’ 재현되는 것이다. 그 때부터 ‘개인’을 전체의 일부분, 사회의 일 부분으로 이해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개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건, 이 과정에서 사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든, 그것의 위치는 자신 안에 그리고 사회의 밖에 위치한다. ‘주체’라는 정식은 이 이상 어떤 것도 상징화 하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개인’이 모든 기능 시스템 밖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에 참여할 수도, 그것을 구성할 수도 없다. 그것은 더 이상 Kierkegaard가 Hegel에 맞서 주장하게 될 것처럼, ‘객관적 정신’이나, 혹은 정치체의 기능 기관 안에서 나타날 수 없고, 확실힌 재산 소유나 노동의 기반 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기능 시스템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모든 포섭은, 사회적 시스템에 ‘개인’의 유기체적/심리적 환경에 대한 통합으로서, 기능 시스템의 구조 안에서 재배열되야만 한다. ‘대표’, ‘참여’, 민주주의’ 등등과 같은 낡은 개념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 사용되야만 하면서부터, 그들은 전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개념은, 무엇보다 칸트주의 철학의 기초를 형성했던 복합성 배열의 새로운 형태에 그 참신함을 빚지고 있다. 비록 그것이 정당화를 위한 철학적 수단이 부족함에도. ‘복합성’은 ‘다양성’의 통일체를 위해서 사용된다. 복합성은 ‘다양성의 통일’을 지시하는 개념이다. 칸트주의 철학은 다양성은 주어진 것이지만, 반대로 통일체는 창조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한다.[11] 만일 이것이 모든 통일체에 적용되면, 즉 어떤 것도 그 스스로에 따라 통일체일 수 없다면, 어떤 것도 자연적으로 통일체이지 않다. 이런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그래서 누군가 자연 부여된 동일성의 관념을 포기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인간 존재가 다른 실체들이 그렇듯, 본성상 육체와 영혼에 의해서 개인화 되어 있다는 관념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인간 존재와 다른 개별체들이 최소한의 공통 특징만을 부여받았고, 그래서 비교 가능한 기반에 대한 개념적 지반은 없다. 그 장소에, 초월적 의식 안에서 개별화된 정체를 구성하는 과정이 들어선다. 초월적 의식에 접근 가능한 어떤 조건 아래서, 이것은 성취된 모든 종합들의 정체성을 보장한다. 만일 모든 인간에게 의식이 부여된다면, 인간 존재는 모든 정체성의 담보자, 그들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개인성을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개인이 될 것이다. 그들의 개인성은, Georg Simmel의 적절한 규정의 문장을 인용하자면, ‘자아를 통한 자아의 정상화’[12]이고, 이것에 의존하는 모든 명백한 정체성의 구성이다. 언제나 의미론적 혁신이 이뤄지면서, 이전의 의미론적 발전은 새롭게 재배열된다. Leibniz의 모나드 개념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개인성의 범주가 언제나 개인 자신 속에 내재했다는 사실을 스콜라학파로 거슬러 확인할 수도 있다. 18세기 소설에서 감정과 향유의 점차 개인화된 개념을 언급할 수도 있고, 특히 Nouvelle Héloïse이래로, 이런 경험의 내면으로 자연과 예술의 포섭을 말할 수도 있다. 거기에 더해 Bildung, 자기-도야, ‘내적 형식’에서 ‘세계에 대한 자기-창조된 관계’ 그리고 교육학에서 수반되는 발전의 재구성된 개념들을 가지게 된다. 이 모든 것은 함께 묶이고 그래서 강화된다. ‘개인’은 언어, 자기-도야,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세계 안의 표상을 통한 현실을 획득하는 그 자신의 관념이다. 따라서 개인성의 특징은 매우 일반적인 어떤 것이 되어, 모두에게 접근가능하고 동시에 특별한 어떤 것, 즉 관점의 고유성이 되어, (언제나 선택적이고 주관적으로) 전체로서의 세계를 흡수하고, 스스로 가능한 만큼 세계를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필연적으로 영혼의 불멸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인/개인성의 개념적 배치를 통해 이런 불멸성을 보장하려는 관심은 후퇴한다. 개인/개인성의 시맨틱은, 이 단어들의 엄격한 의미에 내재하지 않은 새로운, 강조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더 이상 필멸의 세계에서 불멸성을 약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대신 내적 무한성과 표현을 위한 그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런 ‘개인’은 다른 문제들을 가진다. Tristram Shandy처럼 스스로에 초점을 맞춰, 그것은 세계의 운동보다 느리고, 그래서 불완전하게 죽을 운명이다. 세계에 초점을 맞춰서는, 그것이 가장 복잡한 속성들, 즉 직관을 감당할 수 있지 않는 한, 그것은 스스로로부터 소외되고, 세계에 대해 자신을 잃어버린다. 이런 의미에서 여전이 그것은 1800 경의 ‘미학’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의 개념은 이제 그 자체 통일체로 인식하는 ‘다양성’이다. 특정한 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 안에서 실현된 세계이고 그래서 타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그것은, 그리고 이것이 이 관념의 본질적 조건인데, 자유의 영역 안에서만 스스로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자기-창조적일 수도, 고유할 수도 없다. 이것이 교육과 정치의 제도와 실천에 대한 요구 조건을 만든다. Wilhelm von Humboldt는, (휴머니즘과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결과가 예측하지 못한 현실로 전개될 때까지, 이런 특별한 방향에서 결과를 제시했다.
그렇지만 이런 전환은 이론적 문제들에 의해 조건 규정될 수 있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건, 그들은 어떤 새로운 것을 가져온다. ‘개인’은 이제 자신의 개인성을 언급함으로써 스스로를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 그것은 모든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것에 대한 언급에 의한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자기-관찰과 자기-기술은 이제 더 이상 혹은 표면적으로는 사회적 위치, 소속 그리고 포섭에 기반하지 않는다. ‘개인’은 자기-관찰과 자기-기술에서 개인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요구된다. 적어도 이것은, 복수의, 통합되지 않는 맥락 안에서 살아가고 행동하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3] ‘개인’에게 남아 있는 정체성에 조응하는 유일한 짝은 세계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 인식된 ‘개인’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와의 어려움에 조우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자신과의 문제를 발생한다. 자아를 통한 세계와 세계를 통한 자아라는 순환적 정의 때문에, ‘개인’은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와 불완전한 과정으로만, 노력과 되어감의 내적 무한성으로서, 잘해야 통합된 조각들인 존재로서만 이해할 수 있다. 낭만주의의 맥락안에서, 이 모든 것이 어쨌건 적용되고, 그래서 더 이상의 관심을 끌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런 안정화의 맥락이 지적 매력을 상실하자마자, ,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한 낭만적 감정이 부드럽게 지나가자마자, ‘개인’은 스스로를 다뤄야만 한다. 그는 순환적 세계 관계 안의 자기-결정에 대해 부과되어진 반성의 짐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제에 직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는 그에게 가르친다. “갈급을 결코 멈추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 그의 세금은 우리 것이다’
Ⅷ.
효용과 이윤이 서구의 이웃들에게 결정적 요인이었던 반면, 독일인은 미학, 조화로운 전체, 그리고 삶에 너무 많은 강조를 두었을까?[14] 한가지 전통은 역사적 형식의 고유성에 의존하고, 다른 전통은 진보에 대한 진화의 추상적 법칙에 의존하는가? 이것이 이런 다른 전통에 속하는 Max Weber와 Emile Durkheim이 서로에 대해 이해 불가능했던 이유였는가?
자연/문명과 보편/특수의 이항 구별의 지속적 효과를 고려할 때조차도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즉 사회는, 개인들의 구성이라 보여야 한다는 어떤 요구에도 맞서서 스스로를 방어한다. 그 시대의 지배적인 사회 이론, ‘정치 경제학’의 이론은 ‘개인’을 무시하거나 적어도 ‘개인’의 목적에 대한 정확한 결정에 관련한 어떤 지시를 제공하는데 실패했다.[15] 이 과학의 주제적 문제, 사회 자체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같은 일이 일어난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자기-실현을 성취하려는 정당한 충동이라는 개념 안에서 ‘개인’에 의해 제공되는 해석은 사회 자체를 비껴 지나가고, 이데올로기로서 반성되어 시맨틱으로 돌아간다. 19세기는 시맨틱과 정치 사이의 접면이 특별히 어지러운 영역에 대해서, 특별한 ‘이데올로기적’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구별했다. 이 수준에서 관념과 원리들은, 자연 혹은 집합적으로 인정된 가치로 어떤 회귀를 적용하는 것 없이, 공격받고 방어되었다.[16] 이 커뮤니케이션의 이데올로기적 수준은 일반적으로 접미사 ‘-ism’으로 언어학적으로 지시되었다. (그것은 ‘ideologism’이 구성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개인주의’는 더 유명한 사례 중 하나를 구성한다.[17]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 ‘개인주의’는 1820년 이후 발생했고, 곧바로 적대적인 그리고 우호적인 평가를 모두 끌어내며, 새로운 조어로 계속해서 사용되었다.[18] 개인주의 자체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옹호하고 거부하는 정치적 참여와 태도로서 개인화 될 수 있다. 이런 층위에서,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가지는 문제들을 건드리는 일 없이도, 개인주의를 과도하게 취하는 것의 유용성(공리주의) 혹은 지구적 진화(다윈주의) 혹은 절망적 결과를 지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인’에 대한 추상적 언급은 충분하고, 논쟁은 개인의 관심 자체가 아니라, 자기-이해와 기본적인 사회적(혹은 곧 사회주의적이 되는) 지향 사이의 차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수준에 특정한 차이에 의해 이뤄진다.[19] ‘개인주의’ 자체는 단지 잘 포장된 집단주의, 즉 인간 존재에 대해 집단적 관념이 지니는 통제의 표현이다. 게다가 사실상 ‘사회주의’는 사회적 책임성로부터 모든 사람을 흡수한다. 이데올로기적 논쟁은 이것을 인식할 수 없게 만든다. 무엇보다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에 대한 불충분한 관심에 대해 개인주의자를 비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개인주의자들은 사회적인 것에 대한 불충분한 관심에 대해 사회주의자를 비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사회학적 이론의 형성을 우선적으로 자극한 것은 이런 이데올로기적 투쟁 노선이었다. 이것이 그렇게 쉽게 가능했던 (그리고 그런 ‘고전적’ 형식을 바로 취하게 되었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 노선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의 증가되는 추상성을 전제로 하고, 일차적 문제가 이론 형성에서 다루는 이런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차이를 (그리고 이미 1절에서 암시했던 것처럼) 반영한다. 따라서 아마도 Simmel을 예외로 하고[20], 고전 사회학은, 개인을 언급할 때면 언제나, 사실은 개인이 아니라 개인주의를 생각하고 있다.[21] 이는 ‘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다양한 경험, 지난 삼백년 동안 문학에서 풍부하게 전달되었고, 실제로 사회학에도 역시 명백해야 할 그런 종류의 경험에서 이상한 맹목을 이끈다. 만일 문학적 증언에 머물러 있다면, 제시될 수 하고 사회적으로 진정성을 지닐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자기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 가지 선택은 이 결점에서 영웅적인, 혹은 심지어 반 영웅적인 어떤 것을 추출하는 것이다.[22] 개인성과 문화에 대한 다시 살아난 관심이 오늘날 관찰될 수 있지만, 아마도 고전에 관심을 기울여서는 이런 관심을 충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23] ‘개인’이 하나의 기능성이자 기능성의 희생물이 되었던 시기, 탈 주제화 된 시기를 지나서, ‘개인’이라는 주제로의 회귀는 결정적 시기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24] 그렇지만 사회학적 고전은 부족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들은 개인적/사회적 정체성의 분리된 패러다임, 초월 철학으로부터 피상적으로 끌어온 것, ‘주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졌고, 결코 개인성을 깊게 파고 들지 않았다.
무엇보다, 어떻게 ‘개인’이, 개인성 안에서 자신을 규정하고 향상하면서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지 엄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철학은, 이런 자기-규정과 자기-향상의 가능성을 반성에 참여할 능력에 두었고, 반성에 대한 법적, 사회적, 지위 기반의 장애들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전제조건과 이런 요청과 함께 철학은 어떻게 든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 즉 일차적인 성층적 차이화에서 일차적인 기능적 차이화로의 변화에 동반하고, 지원하고 축복할 수 있었다. 어떤 경우이건, 이 변화는 심적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 형성의, 사회화와 포섭의 더 큰 차이화를 요청했다. 그래서 ‘주체’의 위치에 놓인 ‘개인’이 준비되고 반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게 될 때 환영되었다. 그래서 사회적 조건은, 타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런 주체의 위치를 채용해야만 한다는 사실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제한들의 형식 안에 던져질 수 있었다. 그렇지만 사회학자로서, 이런 동반된 시맨틱 ‘개인’=’주체’에 의존해야 하는지, 한다면 얼마나 의존해야 하는지, 혹은 사회적 이행 과정에 대한 참여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한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에서 끌어낸 결론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의심, 그리고 대립되는 입장들 사이로의 이어지는 동요 등이 의심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된다. 그리고 두 가지 추가적 징후를 더할 수 있다. 첫째는 복사를 통해서 개인성을 획득하는 경향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개인’에 대핸 복수의 자아들을 부여하는 19세기적 관념 (언어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것!)과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와 관계한다.
개인적 주체는 결코, 흉내, 잘못된 경건, 가장된 자연스러움의 분석 등등에서 등장한 경험과 관심을 한 쪽으로 단순하게 치워버릴 수는 없었다. 만일 타인에게서 이런 수작을 관찰하고, 이 관찰에서 자신에 대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의 개인성을 주체로서 주장하고 제시할 수 있을까? 경험적/초월적 차이는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떨쳐버리기 위한 단지 의미론적 속임수는 아닐까? 그런 모든 것을 관통하는 반성의 결과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트릭이 의심스러운 동기를 수용하도록 하고, 이 때문에 찾고자 했던 굳건한 기반을 발견하는 대신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 떨어질 운명은 아닐까?
타자를 모방함으로써, 즉 복제된 존재로 이끌려, 하나의 해법이 목표를, 열망하는 기준을 그리고 삶의 방식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25] 이는 시작부터, 개인성의 프로그램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했고, 개인의 삶의 원리가 대립물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강제적으로 반성적 위치가 되면 될 수록, 그래서 우발성으로 자신을 경험하면 할 수록, 더욱 더 타인과의 비교를 제시한다. 그래서 다를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누군가와 같을 능력을 의미한다. 이 ‘모방’ 동기의 발전을 자세하게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개인’의 등장과 몰락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명백히 인쇄술과 연결된다. 독서를 통해서 획득된 관념과 자신의 삶을 연결시키도록 독서가 야기한다는 것은 Don Quixote이후 최근까지 잘 알려져 있다. 물론 이것은 처음에는 단순히 잘못된 길 혹은 위험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17세기 숙녀들은 소설을 읽을 때 주의하고 과묵해야 한다고 훈계를 들었다.[26] 다음 단계는 그런 실용적, 경험적 관심과 충고의 이야기 (특히 고백자에 의한)를 넘어서 진행된다. 이 단계는, 이어지는 판단을 이끄는 의미론적 차이, 즉 자연의 모방과 저자의 모방 사이의 차이의 형성을 구성한다.[27] 자연의 모방은 독창적이지만, 작가의 모방은 단지 복제다. 따라서 개인성은 독창성(Edward Young이 ‘천재성’의 유지라고 생각했던 것)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복제자(copyist)들은 충분하게 개인화된 존재에 이를 수 없다.
문학 이론에서 처음 성립되어[28], 원본과 복제 사이의 구별은 곧 넓은 의의를 얻었다. Young의 다소간 일관성 없는 구절 ‘원본으로 태어났는데, 왜 우리는 복제품으로 죽어야 하는가?’[29]는 독립적 존재를 취하지만, 문명에 대한 비판적 색조를 담고 있다.[30] 개인성의 구성 혹은 획득에 대한 주도적 이론은, 부분적으로는 교육적이고 부분적으로는 공리주의적인데, 이는 여기서 거꾸로 뒤집어진다. 사람들이 문학과, 즉 문명과 접촉하면 자신의 개인성을 잃어버린다. 단지 천재만이 독창적인 감정 상태(이는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복제의 원형으로 역할을 한다)를 유지할 수 있다.
내적 그리고 외적 모두 자연이 그 의미의 확실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따라서, 자연에 기반한 개인성의 프로그램은 정착지를 잃어버린다. 그 주제에 대해서, 모든 것이 주관적이 된다. 자연을 포함하고 특별한 자연안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가능성들을 찾아야만 한다. 모든 사람이 복제하고, 모두가 유행을 따른다. 이미 예술가에 대한 예외를 요청하는 절망적 용기가 필요하다. 예술가들은 자기 힘으로 절대적인 것을 손대야 한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근대성의 흔들리는, 우발적인, 유행에 이끌리는 기반 위에 남아 있다.[31] 이는 얼마 안 있어 표준적인 ‘과학적’ (심리적, 사회-심리학적, 사회학적) 정식이 될 것, 즉 사회적 환경과 차이화 된 요구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복수의 자아, 복수의 정체성, 복수의 인격으로 나누는 것의 전조가 된다. ‘In-dividual’은 가분성으로 정의된다. 그것은 오페라를 위해서는 음악적 자아를, 직업적 삶을 위해서는 야심 있는 자아를, 가족을 위해서는 참을성 있는 자아를 요구한다. 스스로를 위해서 남아 있는 것은 그 동일성의 문제다.
자아의 내적 복수성 문제 역시 전통을 가진다. 이 전통은 여기서 시도되는 사회학적 해석에 의해 확인된다. 이런 이유로 짧은 회고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내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 정식화, 자아의 자신과의 대화는 오랜 전통을 가진다. 자아를 다루는 것에 관해서는, 말하자면 자신 안에 두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동기의 주제에 관할 때는 두가지 영혼을 말하는 것이다. 18세기 후반에, 이 정식화는, 죄를 짓기 쉬운 필멸자의 일탈적 경향에 대한 합리적인 도덕적 자기-통제의 설정 안에서 전개된다. 이런 해석은 여전히 Shaftesbury의 유명한 혼잣말의 에세이에서 중단 없이 유지된다.[32] 혼잣말은 스스로 문제가 되는 자아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소외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의 목적은 개인성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일차적 상태(I와 me)가 아니고, 진리를 인식하기 위한 어려운 조작으로 기능하다.[33] 그것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관심, 전체를 향한 부분들의 조화로운 범주화에 놓여 잇는 자연적 ‘감정’을 찾는데 역할을 한다. 즉 그것은 자아의 도덕적 경제를 절합한다. 새로운 것은 동일성 문제의 개인화에 있는 것이 (아직은) 아니라, 종교적-교리적 규칙으로부터의 거리에 놓여 있다.[34] 자아는, 열정을 규제하고, 그것들을 자연적 감정의 형식으로 가져오기 위해 스스로에게, 그리고 오직 스스로에게 의존하는 실현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한다. 더 나은 자아가 더 나쁜 자아에 맞서 스스로를 주장하는 내부적 구조는 위계적으로 남아 있다. 이를 위한 모델은 가정이다.[35] 위험은 통치 불가능성에 놓여 잇다. 적어도 이 문제는 이미 자아-동일성의 문제를 매우 정확하게 언급한다. “공상과 나는 하나가 아니다. 불일치가 나를 나 자신으로 만든다.”[36] 자신의 자아가 된다는 것은 오직, 규정하고 어떤 범주에 기반하지 않은 자기-언급의 자의성을 거부하는 것에 의해 획득될 수 있다. 그것은 확실히 더 이상 이런 자기-언급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체성은 그 자신의 가능성과 비조응 속에 기반한다.
이런 견해가 폐기되고, 자기-동일시의 내적 복수성에 대한 다른 종류로의 관념으로 이행이 발생한 역사적 시점을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마도 18세기 후반이나 낭만주의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19세기 말, James와 Mead가 그 문제를 지금 일반적인 형식으로 가져왔던 시점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37] 어느 정도건, 가능한 자기-동일화의 복수성의 통일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 풀어야만 하고, 단순히 도덕과 의식에 순응하거나 혹은 더 나쁜 자아를 억압함으로써 고쳐질 수 없는 가장 긴급한 개인적 문제가 되었다. 이 통일의 반성 문제는, 그들 자아의 일관성 혹은 통합의 문제로, 정체성을 다시 획득하는 문제로 정식화 되었다. ‘자아’의 통일성 주제는 구성적 차이를 통해서 절합되고, 동시에 숨겨졌다. 사회는 더 이상 해법의 방향을 지시하지 않고, 단지 문제만을 지시할 뿐이다. 그것은 더 이상 도덕적 삶의 방식에 대한 요구로서 인류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개인적 방식, 우연적이고 선택적인 방식 안에서, 행동이 향해지는 복합성으로서 마주한다.
이런 주제들이 18세기 후반 등장해서 이데올로기적 불확실성을 따라서 19세기 후반에 증가해서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문학적 시맨틱으로서, ‘개인’의 이런 해체와 재조합은, 각각의 개인에게 다른 전기, 다른 규칙의 집합, 우연성, 기회, 그리고 공적의 차이화 된 분배를 나누는 고도의 복합적 사회의 경험에 조응한다. 더 이상 고백자나 신학적인 삶의 카운셀러가 아니라, 처음에는 소설의 éducation sentimentale에서 이후에 심리학자나 심리치료사와 같은 다른 직업이 이제 ‘개인’의 배려에 관여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는 이론과 주도 차이에서 변화를 필요로 한다. 더 이상 구원/저주와 진짜/거짓 경건함이 아니라, 의식/무의식과 사적/사회적 정체성이다. 따라서 이런 시맨틱과 이런 카운셀링에 노출된 심적 시스템은 그들 자신에 대해 다른 관념을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일반 이론으로 남아 있고, 개인성이나 개인성에 대한 이론으로 이끌지는 않는다. 단지 ‘개인’이 그 자신의 통일성에 대한 반성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더 이상 구원의 성취나 완벽을 향한 향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결과로서 개별 인격에 대해 등장한 문제의 해법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된다.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 개인의 개인성을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사회를 배제하는 것이 정확히 이것이다.
Ⅸ.
만일 개인성에 대한 이런 경험이, 사실의 경험이고 (문학적 과대포장이 아니라면), 근대사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들이, 모든 반성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할까? 그것들은, ‘개인’이 주어진다면, 동일성과 반성의 인식을 통해서 스스로를 도울 자유는 단지 부르주아지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작업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가?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거기에 자연으로 돌아갈 길 혹은 천국으로 갈 뒷문은 존재하는가?
이런 형식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훨씬 멀리, 우리의 발견들이 지탱해주는 것보다도 훨씬 멀리 가는 것일 것이다. 자기-반성의 원리와 관계된 기대를 단순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반성은 동일성이 아니라 차이로 자아를 발생한다. 그것은 자아를 필수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어떤 것으로 발생한다. 이것들은, 하나의 시스템이 말하자면 그 자신 안에서 스스로를 재현하려 시도할 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논리적 비용이다.[38] 자기-언급의 논리적 문제가 이런 결과를 강제할 지,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 지는 여기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39]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반성의 도정에 ‘개인’을 설정하고, 그것의 효과 없는 노력들 속에서 그것을 관찰하려 수행했던 시도가 이런 견해를 제시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만약 여기서 옹호되는 이론을 수용한다면, 앞에서 논의되었던 ‘주체’의 두 가지 ‘잘못된 경로’, 타자를 복제하고 자아를 다른 자아들로 쪼개는 것은 자기-반성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에 대해 반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그것이 무언가를 더할 수 있다면, 노력할 가치가 있다. 사실 그것들은 시스템의 조작들 중 하나로서 조작의 정상적 수행으로부터 나온다. 조작은, 그것이 구현하고, 그것에 대해 의미 있는 무언가를 더하는 시스템을 전제로 한다. 의미 있는 어떤 것은, 다른 어떤 것, 그래서 다른 어떤 것과 관련해서 다르게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다. 단지 이런 반식으로만 시스템은 자기-반성을 통해 그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즉 차이의 도식 안에서 우발적 선택으로서 스스로에 대해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점은, 그래서 더 이상 필수적 통일체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정체성으로 기능하는 모든 것은 인공적이고, 우발적인 자기-단순화에 기반한다.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하기를 원하거나 다르기를 원하거나 상관없이. 그래서 반성 시스템의 통일성에 대한 모든 진술, 즉 그것의 개인성에 대한 모든 진술은 ���성의 대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기본적 조작과 관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심적 시스템 역시 오토포이에시스적 시스템, 즉 그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재생산하는 시스템[40]으로 특징 규정할 수 있다. 개인성은 오토포이에시스 자체, 즉 시스템의 ‘자기-재생산’의 닫힌 순환에 다름아니다. 시스템의 요소들은, 그것을 통해 존재하게 되고, 조작이 완료되자마자 존재하기를 멈추면서, 오토포이에시스적 재생산에 기여함으로써 시스템의 개인성에 참여한다. 사회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것은 각각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일어나지만, 심적 시스템의 경우에 그것은 각각의 의식 행위에서 일어난다. 사회 시스템과 의식 시스템 모두, 자기-반성은 오토피에이스의 구현으로서, 즉 커뮤니케이션을 재생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사용 혹은 의식을 재생산하기 위한 의식의 사용에서만 가능하다.
만일 이론의 정식화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자기-언급과 닫힌 순환성의 토톨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Husserl의 의식의 시간성에 대한 분석과 같은, 초월론으로 이어지는 분석을, 오토포이에시스적 시스템의 이론 언어, 즉 다른 어떤 것들 가운데서 물론 오직 한가지 경우인 의시기의 조작적 기초에 대한 경험적 시스템 이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다른 출발점은 문제를 설정하는 다른 방식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근본적 문제는, 어떻게 시스템이 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탈-토톨로지화 하는지다. 시스템은 어떻게 재생산의 순환 안에서 비대칭성을 발생하는가? 이런 과점에서 시간의 비가역성과 각 시스템이 의존하는 환경의 과잉 복합성과 같은 진화에 의해 강화되는 상황적 조건은 시스템의 자기-기술의 생산에 있어 이차적 기능을 가진다. 그들은 자기-언급 안에서 시스템이 탈-토톨로지화하고 비대칭성을 만드는 것을 돕는다. 결과는, 그것이 구별된 영역으로 구별을 ‘재-진입’하는 것이다.[41] 시스템은 언제나 오토포이에시스적이고, 이미 개인화 되었고, 항상 자율적으로 존재하면서, 시간 안에서, 환경과의 차이를 통해 구성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문제는 단지, 처음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전/이후 그리고 환경/시스템의 이런 차이들이 어떻게 시스템에 재-진입하고, 그 안에서 자기-언급의 논리적 전개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자기-반성의 논리적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해결되든, 심적 시스템 자체는 배제의 위치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그것은, 포섭-기반 개인성에 대한 점진적인 억압적 조건 안에서 발전되는 시맨틱을 계속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게 한다. 미학적 혹은 도덕적 ‘상태’에 대해, 혹은 자유롭게 구성되는 커뮤니케이션적 커뮤니티의 선험적 정당화에 대해, 포섭과 배제의 ‘신성한’ 동시성 주위에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향하는 것 역시 더 말이 안 될 것이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진짜 개인들은 그들의 개인성을 대단히 느슨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현대 시맨틱은, 불충분함에 대한 불필요한 감정을 제거하는 이것들을 위해 발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개인의 개인성이 그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개인성의 향상’이라는 지도적 관념은 폐기될 필요가 있다. 이런 관념은, 개인이 세계에 대해 비대칭적 관계를 생산할 수 있는 자기-기술은 어떤 형식인가의 질문에 의해 대치되야만 하고 대치될 수 있을 것이다. 심적 시스템의 관계에서 개인/개인성/개인주의 시맨틱의 진화는, 사회가 사용 가능하고 연결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형식의 전환으로 읽힐 필요가 있다. 그런 형식의 도움을 통해서만, ‘개인’은 자신의 개인성에 대해 다른 어떤 것보다 오토포이에시스적 절차에 위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시맨틱은 사회적 진화에 따른다. (구체적 개인들이 스스로를 구체적 개념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 없이) 개인성의 자율성은 ‘개인’에 있어 당연할 수도 없고, 기대될 수도 없다. 그것은 존재의 형식이다. 그것을 구성하는 구별의 이 형식 안으로의 재-진입은 사회적 조건의 더한 대상이다. 왜냐하면 이런 재-진입이 의미, 언어, 그리고 연결성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사례가 이런 결과를 그리는데 기여한다. 시간 차원에 대해서, 경력 인식의 예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시스템/환경 관계에 대해서, 누군가가 요구를 하는 믿음의 예를 선택할 수 있다. 경력과 요구는, 개인이 비대칭성을 생산하는 구별적 형식이고 그렇게 남아 있다. 그것들을 결합하는 것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는, 누군가가 어떤 것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경력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역으로, 누군가 자신의 요구에 관련해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경험의 연속은 경력을 구성하지 않는다. 요구와 경력을 구별된 형식으로 다루는 것을 통해서만, 복잡한 상호의존성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경력의 맥락 안에서 공정한 대우의 요구, 동등한 기회의 요구, 자의성의 배제에 대한 요구 그리고 역으로 경력이 전개되면서 실망을 줄이기 위한 태도와 제도의 발전 등.
경력과 주장의 예는, 어떤 것에서 체계적으로 도출될 필요 없이 그리고 근대 사회에서 ‘개인’의 상황에 대한 완벽한 기술을 제공하려 하지 않고도 선택될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은 단순히, 근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기-기술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는 형식과 결과적 주제들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포섭과 사회화의 사회적 문제로부터 나오는 결과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Ⅹ.
시간 차원으로 탈출함으로써 ‘사회적’ 정체성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을까? 타인의 기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자신의 자아에 대한 연속성과 변화의 개념을 통해서 개인의 전기를 더 형상화 할 수 있을까? 연속성/불연속성은, 승인/일탈보다 개인성에 더 적합한 도식일까?
거의 그럴 것 같다. 어쨋건 ‘정체성’의 근대적 시맨틱과 전기에 대한 관심은, 개인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시간 차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시간적 관점에서, 사회적 요구 조건에 초점을 맞추는 반성의 부적합성이 형성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개인’은 변화하는 방식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42] 그러나 어떻게 반성은 시간을 다룰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허용된 시맨틱이 그렇게 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까? 근대적 ‘개인’이 시간성을 반성하고자 하는 첫 번째 시도는 익숙한 결과를 생산한다. Plaisir, 상상, 공상의 형식 안에서 순수한 자기-언급은 불안정한 것으로 보이고, 오직 현재를 차지하기 위해 새로운 만족의 형식을 찾는 데에만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지속하는 관점으로서, 남아 있는 모든 것은 지루하고(ennui), 그것은 그래서 시간에 대해 견뎌야 할 경험을 차지한다. 오토포이에시스에 대한 역사적인 최초의 경험은, plaisir/ennui의 시맨틱 안에서 있는 그대로 반성 된다. 그것은 ‘주체’의 주체성과 정확하게 관계한다. 성층화 된 사회에서 상위 계층의 멤버들에게, 시간적 차원은 어떤 인식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지 사회적 차원에서만 그들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탈출해, 주연, 우전, 사랑 등을 찾을 수 있다.[43] 자기-언급이 시간이 진행되면서 반복해서 경험을 위한 능력을 갱신하는 동안, 스스로 매달린 주제는 다른 곳으로부터 나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이 하는 모든 것은 이에 대해 수용성(sensibilité)을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이다.[44] ‘부르조아지’ 해법은 이미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가장자리에 남아 있다.[45]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제가 등장하고, 사회구조적 발전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능성들을 생산하기 이전에 ‘개인’의 자기-경험으로 통합되었다는 인상을 가질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법은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은 문제에 걸맞기는 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 ‘경력’이라는 일반적 개념을 가지고 언급해보자.
경력은 사회적 필요성으로 등장한다. 왜냐하면 출생, 가정에서의 사회화, 사회적 위계 안에서의 위치 등은 더 이상 삶을 통한 정상적 성장을 예측 가능하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과 운명의 타격은 물론 언제나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회적 통제의 경계 너머에 놓여 있다. 이는 성층적 차이화에서 기능적 차이화로 이행하는 것과 함께 변화한다. 누군가의 운명은 더 이상, 사회적 위험을 포함한 외적 위험에서의 자기-보호 문제가 아니다. 사유의 변화가, 자기-선택과 외부 선택 (그러나 다른 무게를 가진) 양자를 결합시키면서, 선택적 사건의 연쇄와 관계되어 요구된다. 이런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시간적 모델을 경력으로 언급한다.
이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읽혀야 할 것이다.[46] 그리고 조직 내에서 지위 사이의 변화를 언급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학교/대학 시스템을 통한 성장을 포함한다. 그러나 또한 평판이나 악평의 경력을 생각할 수 있고[47], 마찬가지로 물론 범죄 경력도 생각할 수 있다.[48] 결정적인 사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오토포이에시스적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경력은 경력의 단지 부분만을 형성하는 사건들로 구성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경력에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충격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이런 종류의 다른 사건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경력은 스스로 경력-관계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이는 사건과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사건들이 같은 것을 적용하는 더 많은 사건을 가능하게 한다. 마치 더 나은 직업적 위치의 전제조건인 직업적 위치의 획득이나, 신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수입, 매스 미디어에 더 많이 언급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유명세, 더 많은 범죄의 전제조건인 이전의 유죄 등등. 그래서 경력은 기본적으로 사건들의 전제조건-부재, 자기-활성화 순서로 경험된다. 이는 정확하게 시간 안에서 개인성이 절합될 수 있는 이유다.
활성화 되거나 혹은 활성화 하거나, 경력에서의 모든 사건은 더 많은 선택에서의 우발적 선택이다. 각 사건의 관점에서는, 이전에 발생한 것은 사건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고, 뒤에 오는 미래는 그것의 결과가 된다. 따라서 전체성 속에서 경력은 전체적으로 우발적 구조다. 이는 그 자신 경력이 결코 자신의 연속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에도 적용된다. 거기에는 더 많은 외부적 그리고 내부적 요소들, 무엇보다 운(사건에 적절한 패턴의 형식 안에서)과 성취를 필요로 한다.[49] 그렇지만 운과 성취 사이의 연계는 경력 자체에 의해 이뤄진다. 이런 면에서, 경력 역시, 경력 안에서 계산될 수 없고, 어떤 확실성을 낳을 수 없는 것, 즉 좋은 운과 나쁜 운을 위한 본질적 전제조건을 형성한다. 왜냐하면 모든 기회는 언제나 경력 자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50]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운과 노력, 외부적 선택과 자기 선택의 결합에 대한 의존성은, 경력이 대단히 불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조건들은 결코 성취에 의해 완전하게 대체될 수 없고, 기대되는 경력이 성공적이면 성공적일수록 더욱 덜 그렇다.[51] 이런 불확실성은 물론 무엇보다 먼저 미래와 관계한다. 그러나 또한 과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경력의 과정 전반에서, 누군가가 만들어 낸 과거보다 다른 과거가 더 유용했을 것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고, 혹은 경력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했던 많은 노력들이 불필요한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언제나 현재의 불확실성이다. 그것은 현재의 의의를 강조한다. 현재가 plaisir/ennui의 순간으로서 자신과 관련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적 미래의 과거로서 경력의 맥락 안에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사람들은 나중에 보상될 수 없는 무언가를 놓칠 수 있다. 우연한 기회를 위해 준비하는 것을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교육과 훈련 (물론, 다른 예를 선택하자면, 여전히 건강한 육체의 건강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 거대한 불확실성 아래서, 시간을 자본화 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노력을 끌어내고자 한다.[52] 무엇이 의미 있는 노력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한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 많은, 혹은 다른 종류의 준비가 궁극적으로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밝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노적적 노력과 연결된다. 성공은 성공을 생산하고, 실패는 실패를 생산한다. 처음에 작았던 차이가 경력에 의해 증폭된다. 그래서 경력 자체는 자기-선택의 일부가 된다. 경력에 적절한 전기를 가지고, 자신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실망스러운 전기를 가지고는, 스스로 능력이 더 없다고 믿게 된다. 비록 불평등의 불변적 재생산에 대한 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경력은 불평등을 발생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력은 단지 성층화 몰락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또한 기회의 동일한, 그러나 불안정한 불평등을 발생한다.
삶의 과정에서 사회구조적 결정요소가 감소하는 한에서, 즉 경력에 대한 조건이 줄어드는 한에서, 경력은 삶의 보편적 방식이 된다. 그것은 게으르고, 관심이 부족하고, 조용한 삶을 위한 틈새를 찾고자 하는 것으로 밝혀질 가능성을 제공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들은 경력에 대한 그 자신의 자기-선택에 기여할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무 경력’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여전히 하나의 경력이다. 왜냐하면 이 선택 역시 같은 구조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것 역시 경력-관계의 기회를 규정한다. 그것 역시 불확실성에 직면해서 개인사를 규정한다. 또한 그것은, 그것이 우발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무 경력을 후회할 순간이 발생할 가능성을 쫓아낼 수 없다. 경력은 plaisir와 ennui를 대치한다.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시간적 차원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그것들보다 뛰어나다. 그것은 ‘개인’에게, 개인성을 잃지도 않고, 더 높은 전체로 ‘흡수되는 것’도 없이, (비록 경력 자체는 그것과 관련한 모든 사건에 대한 재귀적 연결을 허용하지만) 시간의 비대칭적 비가역성 속에 자신을 위치 지을 수 있는 형식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형식은 사회의 사회적 구조로서 이미 나타난 것에 맞춰 재단되어 있다.
경력은 성공/실패의 구별 도식을 통해 그리고 내부적, 외부적 원인들에 조응하는 부여 과정을 통해 성취 시맨틱을 생산한다.[53]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경력 신드롭의 보편성은 수행과 수행의 거부 사이의 대립적 차이에 조응한다. 후자는 예를 들면 ‘스트레스’, ‘사회적 이탈’ 그리고 무경력이 유용하고, 긍정적인 삶의 형태라고 믿고자 하는 삶의 ‘대안적’ 방식의 시맨틱 형식 속에 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은 수행의 압력을 회피한다. (비록 이 선택 역시 선택으로 남아 있지만!) 그러나 시간 혹은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는 없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plaisir/ennui의 재활성화에 이르지 않는 것인지 의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계층에게 가능한 제안인 시간이다.
[1] 그래서 이는 Schiller의 편지 ‘인간의 미학적 문화에 대해서’, Klaus Disselbeck, Geschmack und Kunst: Eine systemtheoretische Untersuchung zu Schillers Briefen ‘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Opladen 1987.
[2] ‘Non vero huomo quegli ehe la Compagnia de gli altri huomini fugge ... chiunque a se solo vive, ingrato alla Natura se dichiara’ (다른 사람들의 무리에서 도망치는 사람은 진짜 남자가 아니다. ……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가 자연에 대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 선언한다.) Ciro Spontone, Dodici libri del Governo di Stato, Verona 1599, S. 175, 또한 S. 204. 마찬가지로 Paolo Paruta, Della perfettione della vita politica, Venetia 1579, S. 49 f. 마찬가지로 더 많은 예를 들 수 있다.
[3] 예를 들면 고독 vs. compagnie의 무게 재기에 대해서는 François de Grenaille, Les plaisirs des dames, Paris 1641, S. 185 ff. Thomas Fuller, The Holy State and the Profane State, Cambridge 1642, New York 1938 재출판, S. 161 ff.이 전형적이다. (“고독에 호소하고 안고 있는 것은 자연적이지 않다. 그러나 사막이 타락한 동료보다는 낫다)
[4] Sur les plaisirs, Œuvres, Bd. I, Paris 1927, S. 9-15 (9)에서 인용.
[5] 18세기까지 지속된 이 전통에 대해서는 Wolf Lepenies, Melancholie und Gesellschaft, Frankfurt 1969; Hans-Jürgen Schings, Melancholie und Aufklärung, Stuttgart 1977.
[6] Remond des Cours, a. a. 0. (1692), S. 119 ff.
[7] Marquis d'Argens, La philosophie du bon-sens, 신판 Haag 1768, insb. Bd. II, S. 298 ff., 327; Bd. III, S. 29 ff. 다른 예를 들자면, 고독은 그 자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것은 사회로부터 스스로의 거리를 두는 도덕적 배치에 의존한다. 그래서 John Gilbert Cooper, On Solitude and Society, in: Letters Concerning Taste, and Essays on Similar and Other Subjects, 3. Aufl., London 1757, S. 204 ff. 마찬가지로 loisir, ennui 그리고 oisivité의 구별에 대해서는, Antoine Pecquet, Discours sur l'emploi du loisir, Paris 1739.
[8] Christian Garve, Ueber Gesellschaft und Einsamkeit, 3 Bde., Breslau 1797-1801, insb. Bd. II, S. 257 ff. 특히 고독이 관심과 애정의 부족으로 해석된다면 그것은 억압적이다. 그래서 큰 도시에서, 동료를 위한 기회가 분명하다. (291) Countess Dowager of Carlisle, Thoughts in the Form of Maxims, Addressed to Young Ladies on Their First Establishment in the World, London 1789, S. 119 ff. 우연한 ‘사회로부터의 이탈’을 통해서 필연적이지 않은 고독의 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9] Paul Valery, L'idée fixe ou deux hommes à la mer, Œuvres, Bd. II에서 인용, Paris (ed. de la Pleiade) 1960, S. 195-275 (275).
[10] 그들이 일반적으로 가정되는 것보다 덜 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이, Michael Hughes/Walter R. Grove, Living Alone, Social Integration, and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7 (1981), S. 48-77의 결론이다.
[11] Richard Rorty, Philosophy and the Mirror of Nature, Princeton, NJ 1979, pp. 154-155. 이 가정은 종합적 지식을 가지는 능력을 위한 선험적인 초월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만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이 가정의 정당화는 그래서, 문제의 그런 개념의 기초 위에서 구성될 수 있는 이론에 기반한다. 이 자기-언급이 받아들여지자 마자, 더 많은 자기-언급은 제거될 수 있다.
[12] Grundfragen der Soziologie (Individuum und Gesellschaft), Berlin-Leipzig 1917, S. 88. Dort S. 71 ff. 짐멜은 18세기의 네오휴머니즘으로의 전환을 훌륭하게 특징화 하였다.
[13] Loredana Sciolla, Differenziazione simbolica e identità, Rassegna Italiana di Sociologia 24 (1983), S. 41-77.
[14] 이런 대조에 대해서는 Louis Dumont, Religion, Politics, and Society in the Individualistic Universe, Proceedings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1970, S. 31-41.
[15] ‘초기 사회주의자’의 비판적 관점에 대해서는, Thomas Hodgskin, Popular Political Economy, London 1827, New York 1966 재출판, S. 39 f
[16] 반면에 Reinhart Koselleck은 1800년경 설정된 역사-정치적 시맨틱의 재구성의 한 특징으로, 많은 개념들의 ‘이념화 가능성(ideologizability)’을 고려한다. 이에 대해서는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Historisches Lexikon zur politisch-sozialen Sprache in Deutschland, Bd. 1, Stuttgart 1972, S. XVII f.
[17] 단어의 어원학적 개념적 역사에 대해서는, Richard Koebner, Zur Begriffsbildung der Kiµturgeschichte II: Zur Geschichte des Begriffs ‘Individualismus’, Historische Zeitschrift 149 (1934), S. 253-293; Stephen Lukes, Individualism, Oxford 1973. 어느 정도 사회주의에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명시적이고 마찬가지로 반응적인 새로운 조어가 1830년경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Gabriel Deville, Origine des mots ‘socialisme’ et ‘socialiste’ et certains autres, La Revolution Française 54 (1906), S. 385-401.
[18] 적대적 평가는 정확하게 ‘개인’의 이름에서 발생했다. Alexandre Vinet, Individualité, Individualisme, Semeur of 13. 4. 1836, Philosophie morale et sociale, Bd. 1, Lausanne-Paris 1913에 재수록, S. 319-335. 개인주의는 단지 추상적 관념이고 그래서 단일자의 구체적 개인성에 대한 이해를 평평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L'individualisme est sur le trône et l'individualité est proscrite” (개인주의가 즉위하고, 개인성은 금지된다, p. 329)
[19] Richard Hofstadter, Social Darwinism in American Thought, 1860-1915, Philadelphia 1945는 개인주의적/집단주의적 관념을 대조하여 이 논쟁에서의 동기에 대한 훌륭한 설명을 제공한다. 개인주의/집단주의에 대해서는 Karl Pribram, Die Entstehung der individualistischen Sozialphilosophie, Leipzig 1912.
[20]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파편적으로 보인다는 개인에 대한 Simmel의 가정은, 직접적으로 낭만주의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타자의 시선이 이 조각들을 영원한 총체로 녹이는데 필수적이라는 그의 가정(‘개인’은 통일성 속에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 관심을 지니지 않는다?!)은, 반성 과정이 사회적 관계에 의존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초월적 철학과 사회 심리학은 ‘스타일’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Wie ist Gesellschaft möglich?’, in: Soziologie: Untersuchungen über die Formen der Vergesellschaftung, 2. Aufl., München-Leipzig 1922, S. 21-30. 그렇지만 이런 가정은 사회 이론에서 충분하게 자리잡지 못한 채 발전했다.
[21] 이에 대해서는 Emile Durkheim, L'individualisme et !es intellectuels; Revue Bleu, série 4, 10 (1898), S. 7-13.
[22] Wylie Sypher, Loss of the Seif in Modern Literature, New York 1962에서는 이런 관점에서의 소재들을 모으고 있다.
[23] Roland Robertson, Meaning and Change: Explorations in the Cultural Sociology of Modern Societies, Oxford 1978, S. 4 f. 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또한 Aspects of Identity and Authority in Sociological Theory, in: Roland Robertson/Burkart Holzner (Hrsg.), Identity and Authority: Explorations in the Theory of Society, Oxford 1980, S. 218-265.
[24] 예를 들면 Ulrich Beck, Jenseits von Stand und Klasse? Soziale Ungleichheiten, gesellschaftliche Individualisierungsprozesse und die Entstehung neuer Formationen und Identitäten, in: Reinhard Kreckel (Hrsg.), Soziale Ungleichheiten, Sonderband 2 der Sozialen Welt, Göttingen 1983, S. 35-74; Die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Frankfurt 1986; Alois Hahn/Volker Kapp (Hrsg.), Selbstthematisierung und Selbstzeugnis: Bekenntnis und Geständnis, Frankfurt 1987.
[25] Stendhal에게 homme-copie는 처음에는 거의 존중할 수 없는 존재 형식이었다. (내가 알기로는 Standhal이 처음으로 이 개념을 사용했다) De l'amour (1822), Paris 1959에서 인용, S. 276. 그것은 다른 가능성들을 배제하고자 의도했던 건 아니다. 그렇지만 소설은 곧 이런 존재 형식(그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을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전달하였다. 한참 지나 Martin Heidegger, Sein und Zeit, 6. Aufl. Tübingen 1949, insb. S. 126 ff.가 이에 대한 철학적 해석을 제공했다. 또 다른 예로는 특히 René Girard, Mensonge romantique et vérite romanesque, Paris 1961.
[26] Jacques du Bosq; L'honneste femme, Rouen 1639, 재출판, S. 17 ff.; Pierre Daniel Huet, Traité de l'origine des romans, Paris 1670, Stuttgart 1966 재출판, insb. S. 92 ff.
[27] 그래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Edward Young, Conjectures on Original Composition (I759), The Complete Works, London 1854, Hildesheim 1968 재출판, Bd. 2, S. 547-586.
[28] Jean de La Bruyères, Les Caractères: Des ouvrages de l'esprit Nr. 62, 64, Œuvres complètes, ed. De la Pléiade, Paris 1951, S. 88 f.; Anthony, Earl of Shaftesbury, Characteristicks of Men, Manners, Opinions, Times, o. 0., 1714, Farnborough 1968 재출판, Bd. 3, S. 4 f.; oder Abbe de Villars, De Ia délicatesse, Paris 1671, S. 179: “Le siècle est délicat, il n'aime pas les copies, il faut estre original en tout ce qu'on écrit” (어려운 시대, 복제품을 좋아하지 않고, 자신이 쓰는 모든 것에서 독창적일 필요가 있다) 복제에 대한 이런 가치 절하는 인쇄술의 반���이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29] A. a. 0., S. 561.
[30] Vinet는 언급하지 않았고, 아마도 원전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Quelqu'un a dit que 'nous naissons originaux et que nous mourons copies” (누군가는 ‘우리는 원본으로 태어나서 복제품으로 죽는다’고 말한다) (a. a. 0., 1913, S. 326).
[31] “La modernité, c'est le transitoire, le fugitif, le contingent, la moitié de l'art, dont l'autre moitié est l'éternel et l'immuable” (‘근대성’에 의해, 순간의, 사라지는, 우발적인, 예술의 반쪽을 의미한다. 그것의 다른 반쪽은 영원하고 불변한다) Charles Baudelaire, Le peintre de a vie moderne, Œuvres complètes, ed. de la Pléiade, Paris 1954, S. 881-920 (892)
[32] Anthony, Earl of Shaftesbury, Soliloquy: or Advice to an Author, 1710, Characteristicks of Men, Manners, Opinions, Times, a. a. 0., S. 151-364 에서 인용.
[33] “누가 이렇게 자신을 두 인격으로 나누고, 자신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라고 Lord Anthony는 묻고, 이어서 답한다. “자기-분해의 작업. 이 혼잣말의 덕분에, 그는 두 개의 다른 인격이 된다. 그는 학생이자 교육자이고, 가르치고 배운다.” (a. a. 0., S. 157 그리고 158) 이것과 유사한 문장들을 읽을 때, 그 당시의 ‘person’이 개인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고, 그 보다는 더 일반적인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Shaftesbury는 개인을 ‘분해한다’는 이상한 관념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34] “종교의 진정한 효과나 조작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동일 인격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철학의 영역이다.” a. a. 0., S. 283.
[35] 명시적으로는 a. a. 0. S. 323 f.
[36] A. a. 0., S. 325.
[37] 이 두가지 시기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비교는 Jan Hendrick van den Berg, Divided Existence and Complex Society: An Historical Approach, English trans. Pittsburgh 1974.
[38] 여기서 자신을 제시하는 문학적 캐릭터는 (Paul Valéry, Œuvres, Bd. II, éd. de la Pléiade, Paris 1960, S. 9-75에서 인용하는) Monsieur Teste다. 이는 자기-인식 시스템의 닫힌 성격, 가능성/불가능성의 차이에 대한 방향 지시, 모든 자기-기술과 꾸밈은 잘못된, 자아의 깊이에서 자아의 상실 그리고 일종의 오토포이에시스가 된다는 것을 포함한다. consommation des possibles et recharge (64)
[39]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Yves Barel, Le paradoxe et le système: Essai sur le fantastique social, Grenoble 1979.
[40] Humberto R. Maturana, Erkennen: Die Organisation und Verkörperung von Wirklichkeit: Ausgewählte Arbeiten zur biologischen Epistemologie, Braunschweig 1982. 심적 시스템에 이 개념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Niklas Luhmann, Soziale Systeme, a. a. O. (1984), S. 346 ff.; die Autopoiesis des Bewußtseins, a. a. O.
[41] George Spencer Brown, Laws of Fonn, 2. Aufl., New York 1972, S. 69 ff.에 기반한다.
[42] 특히 Louis A. Zurcher, Jr., The Mutable Seif: A Self Concept for Social Change, Beverly Hills, Cal. 1972,의 ‘해양 자아 (oceanic self)’의 부적절한 개념에서 정점에 이른다.
[43]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런 출발점이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Madeleine de Scuderi, Conversation de l'ennuy sans sujets, in Conversations nouvelles sur divers sujets, Paris 1684, Bd. II, S. 457-502. Ennui에 대해서는 Friedrich Mehnert, Schlüsselwörter des psychologisehen Wortschatzes der zweiten Hälfte des 18. Jahrhunderts, untersucht an den Briefen zweier Salondamen (Mme. du Deffand und Mlle. de Lespinasse), Diss. Berlin 1956, S. 15 1 ff.; Wolf Lepenies, Melancholie und Gesellschaft, Frankfurt 1969.
[44] M. Deslandes; L'art de ne point s'ennuyer, Amsterdam 1715, insb. S. 31 f., 132 ff.
[45] (물적 재화나 의견! 모두에 연결된) 소유에 대한 갈급에 대해서는 Georges-Louis Le Sage, Le Mecanisme de l'esprit, Cours abregé de Philosophie par Aphorismes, Genf 1718, S. 345 ff. 에서 인용.
[46] 조직 사회학에서 문헌의 과다함은 제외하더라도, Howard S. Becker/Anselm L. Strauss, Careers, Personality, and Adult Socializ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2 (1956), S. 253-263; David V. Tiedeman/Robert P. O'Hara,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in Career Development, New York 1963; Niklas Luhmann/Karl Eberhard Schorr, Reflexionsprobleme im Erziehungssystem, 2. Aufl. Frankfurt 1988, S. 277 ff
[47] 후자에 대해서는 Julius A. Roth, Timetables: Structuring the Passage of Time in the Hospital Treatment and Other Careers, New York 1963.
[48] 일반적인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Howard S. Becker,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 York 1963. 또한 Günther Machura/Hans Stirn, Eine kriminelle Karriere, Wiesbaden 1978. 이런 방식으로, 한 사람의 범죄가 그들 자신의 잘못인지 아니면 사회의 잘못인지에 대한 현대적 논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불리한 조건을 결정한다. 그것은 경력의 잘못이다.
[49] 이런 이유 때문에 경력 기대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중적 귀속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Niklas Luhmann, Zurechnung von Beförderungen im öffentlichen Dienst, Zeitschrift für Soziologie 2 (1973), S. 326-351.
[50] 이런 점에 대해서는 K. Robert, The Entry into Emp1oyment: An Approach Towards a General Theory, Sociological Review 16 (1968), S. 165-184는 ‘기회-구조 모델’을 말한다.
[51] 이와 관련한 실증 연구에 의한 설명으로서는 Luhmann, a. a. 0. (1973).
[52] Jean René Treanton, Le concept de carrière, Revue Française de Sociologie 1 (1960), S. 73-80 (76).
[53] 예를 들자면 Talcott Parsons, Pattern Variables Revisite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 (1960), S. 467-483; Sociological Theory and Modern Society, New York 1967, S. 192-219에서 의 ‘질(quality)/수행(performance)’ (원래는 ‘귀속된/획득된’)의 패턴 변수. 귀속의 문제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Heinz Heckhausen, Leistung und Chancengleichheit, Göttingen 1974.
0 notes
Text
2024년 2월 구입 도서






- 오래전 석사 지도교수님 조교를 할 때, 일본에 다녀오시거나 할 때마다 잡지를 가져오셨는데, 그 잡지가 『世界』 (岩波書店) 였다. 출판사가 이와나미라는 걸 보면 짐작할 수 있지만, 대략 리버럴이나 거기서 조금 좌측으로 간 정도의 잡지다. 세계, 일본 문제를 두루 다루는데, 필자들이 대개 유명한 학자들이다 보니 논문보다는 시사적이고, 시사보다는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글들이라 꽤나 재미있게 훔쳐 보고는 했다. 지금이야 모르는 이들이 더 많겠지만, 『世界』는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이라는 코너를 통해 7, 80년대 한국 독재정권의 만행을 실시간으로 알렸으며, 특히 광주항쟁의 실상에 대해서도 빠르게 전하곤 했다. 그래서인지 당연히 국내 수입이 안되었고, 이 관행이 남아서인지 수입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어쩐 일인지 배송이 되지 않는 잡지였다. 그런데 이번에 완전 리뉴얼판(표지의 변화를 보면 얼마나 극적인지 알 수 있는데)을 내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국내 배송 가능. 그래서 일단 1, 2월호를 구입. 각기 주제는 1월호 “두 개의 전쟁, 하나의 세계”로 현재 글로벌 상황에 대해서, 2월호 “리버럴에게 희망은 있는가?”로 전후 일본 정치 상황에서 리버럴의 위치를 묻고 있다. 어떤 톤인지, 이후에도 계속 볼 만한지 확인할 수 있을 듯. 그러고 보면 6, 70년대 신좌파 이론지에 가까웠던 격월간 잡지 『情況』도 작년에 완전 리뉴얼을 통해, 훨씬 다채로운 주제를 다루던 것을 생각하면 시대적 조류인 듯.
- 다음은 요즘 읽고 있는 수학사가 참 만만치가 않아서, 문고판 수준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 없을까 하다가 구입한 책. 가토우 후미하루(加藤文元)의 『物語数学の歴史 ― 正しさへの挑戦』 (中央公論新社, 2009)과 『数学する精神 増補版 - 正しさの創造、美しさの発見』 (中央公論新社, 2020). 전자는 취지에 맞는 문고판 수준의 역사, 후자는 수학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위한 에세이 모음에 해당한다.
- 그 밖에 이번 호 『現代思想』 2024年3月臨時増刊号, 특집은 “立岩真也 ― 1960-2023” 타테이와 신야는 사회학자지만, 소유와 화폐 같은 경제 개념을 무척이나 특이하게 다뤄서 인상 깊었는데, 이번에 특집호. 갑작스럽게 세상을 뜬 그를 추도하기 위해 일본의 대표적 사회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그와의 기억, 그의 이론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확실히 최근 들어 『국부론』 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 듯한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 기반한 새로운 연구서. 오타 히로유키(太田浩之)의 『アダム・スミスの道徳理論: 人間の複雑性と道徳判断』 (勁草書房, 2024)도 구입.
1 note
·
View note
Text
개인, 개인성, 개인주의 (2/4)
Gesellschaftsstruktur und Semantik, Band 3. Niklas Luhmann
번역 – 조은하, 박상우
Ⅳ.
현대적 의미에서 개인성에 대한 ‘장소’를 남기지 않는 것은 계몽 이전 유럽의 사회구조적 조건만은 아니다. 커뮤니케이션이 학습되고 수행되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장소의 부재, 즉 topos의 부재.[1] 다듬어진 커뮤니케이션은 쌓여 있는 주제들 혹은 다른 topoi, 혹은 어느 정도 일반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 목적은 설득력과 카리스마를 통해 풍부하게 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증폭하는 것이다. 후기 르네상스까지, 주제들에 대한 이런 강조는, 인쇄술의 영향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었다. 비록 점차 그것은 웅변적 수사학으로 제한되게 되었지만.[2] 변증법과 수사학 혹은 일반적 topoi와 특정한 topoi 사이의 모든 차이와 구별을 넘어서서, 한 가지 전제가 의문 없이 받아들여졌다. 가치 있고, 중요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구별하는 강화 효과는 일반화 자체에 놓여 있고, 이런 방식에서만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적, 시간적 그리고 사회적 일반화가 여기서 상호 교차한다. 부분적으로, 이는 다른 사례들과 상황들을 가로지르는 의미 구성의 사용성으로 전해지고, 부분적으로는 기존의 전통, 검증 가능성 그리고 신뢰성의 구성 부분이라는 그들의 위치로 전해진다. 부분적으로, 그것들은 입장 혹은 의견에서의 어떤 차이와 독립해서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이런 언급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특정한 기회를 치장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것들은 논의의 ‘발견’(inventio)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들은 개인적 사례를 높이고 과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우연적이고 이행적으로 다루었다.
다듬어진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될 때면 언제나, 사람들은 일반화된 방식으로 이를 강화한다는 임무에 맞춰 교육받는다. 악과 선에 대한 도덕적 도덕 역시 그에 따라 일반화되고, 칭찬과 비난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뀐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훈계와 교육에 기여하고 부분적으로는 세계의 상태에 대해 한탄하는 데 기여한다. 사람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이 기초 위에서 유형화된다. 캐릭터 유형, 개인들에 대한 초상들이 그들 자신 하나의 문학적 장르로 발전한다.[3] 이런 캐릭터화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과에 대한 관심과 안내를 기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어떤 비교 가능한 경우도 존재하지 않는 다양하고 우연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삶의 상황 혹은 성격을 가진 고유하고 특정한 개인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을 가지길 기대할 수 있을까? 관심을 끌어 내기 위해서, 학교에서 배우고 학습한 것 그리고 가장 먼저 커뮤니케이션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것 모두에 맞서서 ‘개인’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언급할만한 가치가 있는 근대적 개인의 흔적은 18세기 이전의 자서전이나 소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4] 더 확장된 의미에서 ‘개인’에 대해, 즉 의미작용의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심지어 미학과 도덕적 자질을 분리하는 것조차 가능하지 않다. 아름다움, 특히 여성들이 관계하는 것은 미덕에 대한 주제적 지표였다. ‘선하지만 추하다’는 결합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치 이는 상승의 목적을 부숴버리는 것처럼. 영웅과 악당들이 세상에 관여하는 행위들을 기술함으로써, 이야기는 사실적으로 구성되고 제시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기술은, 일련의 경험과 결정을 통해 스스로에게 구별되는 성격을 부여하는 자기-형성적 개인성을 상상할 수 없다. 그보다는, 상승을 성취하는 방식으로서 리얼리티에 대한 언급으로 단순하게 ���장하는 하나의 사례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의 시맨틱을 추적할 때 같은 조건들에 다시 만난다. 18세기가 훨씬 지나서 개인에 대한 독창적인 어원적 이해가 확산된다. 그것은 이 존재를 다른 개인들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성을 자연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사람(the person)’은 단지 특별한 경우, 합리적 본질의 개인화다. 각 개인은 나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개인’을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그들의 파괴(그들 부분들의 부분성의 파괴를 포함하는 것)로 이끌 수 있다. 이 개념에 근본적인 하나의 이해, ‘인간 존재의 개인성’에 특별하게 연결된 것은 분명하게 인식 가능하다. 존재의 문자적인 ‘개인성’, 그들 본질, 그들의 영혼의 분리 불가능성은 그들에게 그것이 어떤 형태이건 영원한 삶을 보장한다. 분리 불가능한 것은 세상을 떠날 수 없다. 단지 복합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만이 이행적이다. 따라서 영혼은 그것이 개인적인 이상 불멸이다. 단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개별 인간 존재들이 최후의 심판에 그들 스스로에 대해 제시하고 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종교 시스템이 스스로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구원과 저주 사이에서 코드화 하는 핵심 차이다. 마침내, 그러나 적지 않게, 이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직접적 이해에 맞서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종교와 도덕을 설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는, 개인성이 관여한 곳에서, 언급할 가치가 있는 역사적 변화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실히 전통과는 관심이 없었던 작가인 Edward Young은 1759년에 “내가 생각하기에 모든 시기를 통 틀어 인간 영혼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썼다.[5] 그래서 상승은 도덕적 평가의 경로로 향하거나 혹은 Young의 경우처럼, 문명 비평과 관계한 자연 경로를 향한다.[6] 그렇지만 그들은 더 이상 ‘개인’의 개인성의 상승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contradiction in adiecto (개념상 모순)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 개념의 이런 형성과 파괴 불가능성 개념에 대한 위탁은 무엇보다, 형식의 변화 가능성이 인식될 필요가 있다는 것, 개인성은 특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소하게 특정되는 방식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형성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은, ‘개인’이 더 이상 (우연적) 특성들의 특정한 모습들에 의해 개인화 되는 것으로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 될 것이다. 개인성은 창조에 빚을 지고, 그 자신의 개인화의 원리, 그 자신 안에서 ‘차이를 개인화 하는 것’을 수행한다. ‘개인’은 하나의, 분리 불가능한 단위이고, 이는 정확하게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로서 보인다. 왜냐하면 단순한 통일체는 완전하다. (그것은 더 완벽해질 수 없다)[7] 이런 이유로, 적어도 후기 스콜라 철학 이후[8] 개인성 역시, 그 자체 principium individuationis (개성화의 원리)를 실현하고, 사실상 그 자신의 principium individuationis를 구성하는 하나의 자기-언급적 방식으로 규정되었다. Duns Scotus, Ockham, Suárez 그리고 Leibniz에 대해, 개성화는 존재의 자기-언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기-언급적 개인성이라는 면에서 이런 위치는 개인성의 원리와 범주에 대해, 본질, 개념론, 그리고 부정에 의해 기능하는 부분에 대한 길고, 뒤 얽힌 논쟁의 기초에 이르게 된다. 이는 획기적 발견이나 ‘과학 혁명’이 아니라, 어떤 확실성이 무너진 이후 획득되는 미봉책[9], 가능한 개념들의 다양한 저장고에서 선택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언급은 ‘자기-애’를 의미하고, 자기-애에 대해 주어진 이유는 자아의 동일성, 자아의 통일성이다.[10] 그래서 이런 논의는, 자기-애는 자신의 선과 완전성 속에서 충족을 찾는다고, 왜냐하면 이것 만이 대상과의 계속된 결합을 보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도덕적, 종교적인 전환을 하게 된다. 이는 적지 않게, 누군가의 선과 완전성은 타인의 선과 완전성보다 그 자신에게 더 중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애는 신에 대한 사랑에 복속하고, 그것은 동시에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신이 창조한 인간 본성을 위반하는 거을 의미한다.
운 좋게도 이런 개념은 개인적 사람에게 어떤 특성이 ‘개인’에게 어떻게 그리고 어떤 수단에 의해 부여되는가에 대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인적 존재는 다른 이에게서 구별될 수 있다. 17세기 지배적인 의견은 여전히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 특히 출생에 의해, 또한 지정학적 기원, 특정한 고향 혹은 가족에 의해, 혹은 충성심으로 연결된 가족에 대한 언급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이 모든 정보는 ‘개인’의 성격을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다. 자질은 잘 지도된 방식 안에서 사회적 문장에서 추론된다. 정신적 속성과 도덕적 대응은 자질에 대한 것인 것처럼. 따라서 이 시기 소설에서 언급되는 개인적 성격은 형식적이고 규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타자에 대한 이런 관계는 상대적 방식으로, 그래서 신분제 사회의 높아진 이상을 인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소설에서는 성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를 들면 “그녀는 그 영지에서 가장 유명하고 부유한 집안 중 한 곳 출신이다”, “그녀는 궁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또한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조건’을 지시하기 위해서) “그녀는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었다”고 쓰는 것으로 충분하다. 15세기 이후부터 양성되었고, 종종 새로운 개인주의를 표현하는 것으로 칭송 받던[11], 인문주의자들 사이에 편지 왕래는 고전적 모델에 기반했고, 18세기 이후까지 공식적으로 남아 있고, 일반적인, 도덕적 범주들로 향해졌다.[12] 사람에 대해 도덕성을 언급하는 것이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 개성(personality)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다.
소설 혹은 편지들에는, 요구된 것을 넘어서 진행하는 장점이 사적인, 종교적 혹은 정치적 감각 안에서 주입될 수 있고, 관계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어떤 Valeur, gloire를 구성한다. 그리고 또한 특정되지 않는 정상성과 대조하여, 다른 이들에게서 떨어진 개별적 존재를 설정하는 일정의 사려 분별과 성격을 구성한다. 그래서 개인성은 타자의 의견으로부터 좋은 자질이 독립한 것에서 보일 수 있다.[13] 우애의 예찬도 그것을 넘어 갈 수는 없다. 개인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판단은 인간 존재의 일종의 ‘걸작’에 묶여 있고, 그 기준은 성층화와 연결되었고, 아부로써 실용적 사용은 필수적으로 생각되었으며, 동시에 비판되었다. 이제 누군가의 평판 자체를 위해서만 찾아졌던 것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추가적인 강조와 함께, ‘vrai’ mérite를 이야기하게 되었다. 개인성을 성취하는 것은 단지 진정으로 위대한 장점뿐이다.[14] 창조의 빛나는 첨탑으로 보이는 인간 존재 자체는 그래서 동시에 먼저 세상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 영광을 스스로에게 돌릴 수 있는 ‘주체’일 수는 없다.[15] 17세기, 자기-언급적 내포가, 특히 열정의 통제, 대화에서 언어적 표현의 조절 그리고 자기-통제라는 점에서, ‘개인’을 강화하는 이런 도덕성 안으로 들어갔다.[16] 개인성과 성층화 한 사회 구조의 시맨틱은 또한 이런 의미에서 균형을 이뤘고, 그래서 도덕성이 가능해졌다. ‘개인’은 Erving Goffman이 ‘유령적 정상성’이라 불러야 했던 것과 비교해서 두드러질 것이 필요했다.[17] 따라서 orgueil이 초기 근대 서구 유럽 인간학에서 지배적 모티브로 강조되었다. 왜냐하면 도덕성의 단계는 더 이상 미덕과 이성의 객관적 개념 위에 기반하지 않지만, 여전히 성층화에 의존하였다.[18] 그렇지만 의미에서의 이상한 이동이 이미 orgueil의 성층-의존적 시맨틱 안에서 추적될 수 있다. 즉 그것은 ‘개인’을 찾아 냈다.[19] 긍정적 내포는 점차로 부정적인 부정적 의미에 의해 싫은 것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그 개념은 결과적으로 부정적 개념으로 전환된다. (독일어로는, Hoffart !)[20] 이는 성층화의 타당성 상실과 관계 있지만 동시에 미묘한 방식으로 또한 개인성과 개인성 구성을 위한 사회적 관계의 의미 작용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 17세기에 쓰여진 Jean La Placette의 Traité de l’orguil[21]는 여전히 자신들만의 특별한 방식을 구원을 찾는 종교적으로 구성된 개인들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Orgueil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Second Artifice de l’amour propre: Nous consoler de ce que nous sommes en nous mémes par la consideration de ce que nous sommes dans l’Esprit des autres’ (자기-애의 이차적 기교: 타자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고려함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너머 우리를 위로하는 것)[22]을 통해서 성격이 규정될 수 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사회적 정체성은 개인적(personal) 정체성에 대한 보상 기능을 취한다. 개인적 정체성은 그것이 얼마나 나쁘고 우아함을 필요로 하는지 보려 하지 않는다. 상상적인 사회적 판단을 만들어 냄으로써, 개인들은 그들 자신들로부터 그들 자신을 떼어내고, 이것이 orgueil가 거부되는 이유다. 거의 백 년 후, 사람들은 같은 거부에 있어 반대되는 이유를 발견한다. Orgueil는 타인의 의견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이유.[23] 그렇지만 이런 의미의 변화는 ‘개인’이 실제로 무엇인지, 그리고 타인의 판단에 대한 수용 혹은 정확하게 이런 판단에 대한 무관심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관계해서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게 되는 이유를 표현하지 않는다.
그런 복잡한 의미론적 전환은, 단순하게 차이화의 증가와 개인화의 증가 사이의 조응 관계로 이해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성층화가 의의를 잃자마자 개인화는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성층화와 관계된 도덕성의 가치 저하가 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성의 시맨틱에 대한 필요의 변화에서 발생한 문제는 (이 문제들을 적합하게 정식화할 어떠한 가능성도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은 채) 다른 많은 면에서도 감지된다. 가장 중요함 문제 중 하나는,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의미적 도움을 사용하면서 개인이 허용되냐는 것이다. 전통적인 평가의 등급으로는 이를 예상할 수 없었다. 원리상 다른 이들에 의해 성취될 수 없는 위치는 없지만, 예외적인 성취, 운명을 통해, 영웅주의 혹은 금욕주의 혹은 신성한 섭리를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유일한 위치들은 있다. 그렇지만 개인들은 고유성과 비교 불가능한 위치까지 스스로를 끌어올려야만 하는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Affection de singularité는 허영심의 형식으로 고려되었다.[24] Madame de Lafayette의 소설에서 Clèves의 공주는 그녀의 사랑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성취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관계에서 한정된 사랑 안에서!) 이런 허영심 때문에 실패한다. 개인성은 언제나 ‘개인’에 대해 부여된 어떤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고유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거나 획득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고유성 심지어 누군가가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그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만 하기 때문이다.[25] 정확하게 이런 이유 때문에 단독성은 누군가가 어떤 것, 예를 들어 사랑 같은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존 규칙을 무시한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1678년에는 이미 가능해졌고, 이에 대해서 1789년에도 여전히 거부되었다.[26] 영웅적인 것, 특별한 것, 모법이 되는 것은 여전히 갈구되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미 새로운 인간학이, 비록 그것을 통해 인간 존재를 규정하지는 않지만, 자기-언급을 통해 인간 존재를 다루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훼손된다. 그래서 영웅은 자기-숭배자가 된다. 적어도 이것은 그가 스스로에게 지닌 문제다. 만일 그가 영웅으로서 스스로와 커뮤니케이션한다면, 그리고 무엇이 영웅다운 것인지 다른 이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면, 그는 스스로의 영웅적 숭배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피할 수 없거나 혹은 악을 만들어 내는 효과를 가진 속임수를 통해서만 이를 피할 수 있다. 비록 잠시 동안 gloire의 본질로서 통일성을 주장하기 위한 절망적 시도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다른 이를 배제한다. 비극은 그 주장에 대해 책임을 지고, 희극은 폭로에 책임을 진다. 19세기 후반부터, (esprit와 대조되는) 천재의 한 가지 특성은, 그가 직접적으로 자신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없고, 발견되기를 기다려야만 한다.[27] 영웅은 독자가 규정할 수 있는 일반인으로 대체되자마자, 동작과 운명을 통한 사람의 묘사는 내부로 이동해야만 한다. 그래서 개인성의 새로운 감각은 일반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위한 조건으로 등장한다. 누군가가 이런 사람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전형적 문제들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그들 자신의 행동을 취하는 그들 자신의 경험에 의해 운명이 정해져 다른 이들과 달라야 한다.[28] 문제의 일반성(예를 들면 성차의 문제)과 운명의 특수성이,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어떤 것으로 그들 자신의 운명을 그들에게 부여하는 보다 복잡한 수준에서 전달된다. 이 모든 것은, 18세기말에 이르러서야 따라가는 개인성의 개념에 관한 시맨틱보다 개인성의 변화하는 인식을 더 많이 조명한다.
사실 시맨틱 형성과 발생한 ‘개인성’의 현재적 이해의 선행자들은 이 개념에 의해 이끌려지거나 통제되지 않았다. 한 가지 중요한 예를 회상한다면, 세계에 대한 종교적 비평, 무엇보다 얀센주의자들의 비평은 17세기 후반, 성실과 역할, 자부심과 겸손함, 진실함과 허영심 사이의 차이의 소멸을 가져왔다. 역할은 스스로를 위장하고, 술책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가면을 쓰고, 자부심은 겸손함으로 위장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반대에 기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근절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심지어 가면을 벗기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불신을 찾는 모티프들을 사용해야만 한다. 헌신적 운동의 경험은 이런 의심을 강화한다.[29] 궁극적 결과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을 궁극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그들 자신의 본성은 더 이상 그들의 규정을 위한 어떤 기초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확한 개념 안에서 내적 반성성으로서 언급될 수 있는 것에 의해 해소된다. 누군가가 성실해지기를 원할 때조차, 사람은 자신의 비성실성을 그래서 비성실한 존재라는 것을 은폐함으로써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는 원죄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그럴 것이고, 자기 자신 동기의 순수한 진부함의 기초 위에서 더욱 그럴 것이다. 종교적,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인간(human)’ 개념은 여전히 개별 사례의 기초 위에서 성실과 역할 사이의 이런 차이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칭하고자 하는 목적에 충분하다. 적어도 잠시 동안, 그 결정들이 단지 행위의 기준만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에 관계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한. 살롱의 방구석 도덕주의자들은 마찬가지의 경험을 가진다. 그들에게도, 심리적 자아는 불안정하고, (즉) 불균등하고, 기술에 의존적인 terra incognita가 된다. 사람들이 여전히 부여하고자 하는 성격 규정과 사회적 평가의 모든 정확성은 외부로부터 관계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기대되야만 한다. 그래서 이는 문제가 되는 범주의 정확성을 만든다. 도덕 이론은, 객관적으로 유용한 행위의 요구조건에서 존경에 대한 갈구와 비난에 대한 회피로 이동함으로써 이에 반응한다. 신성한 섭리를 통해서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사람 속에 새겨진 이런 갈망은 그들을 사회적 통제 아래로 밀어 넣는다. 이성이나 미덕과 같은 어떤 객관적 기준도 이를 위해서 가정될 필요가 없다. 자연적 인간학이, 그 배경과 삶의 성취에 기반한 문제에서 인간 삶의 개인화를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30]
Ⅴ.
이상의 간략한 분석의 기반 위에서, 한 편으로는 17세기 개인성의 시맨틱이 아직 영향에 이를 수 없었던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쥐고 있다는 인상을, 다른 한 편으로는 이런 시맨틱 안에서 표현되지 않은 변화를 위해 준비된 기반이라는 인상을 가질 것이다.[31] 개인성은 이미 자기-언급적 방식으로 인식되었고, 이미 사회적 불편함의 내부적 억압에 노출되었고, 이미 성실함과 자기-접근성의 문제와 마주했다. 그렇지만 동시에 성층화된 사회의 포섭이라는 맥락에 여전히 묶여 있었고, 배제를 위해 풀려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여기서 역시, 최종적인 사회적 배치를 발견할 수 없었던 관념들의 변화를 통해 시맨틱 안에서 어떤 것이 시험되야 한다.[32] 형식의 변화를 위한 요구조건은 미래에 대한 어떤 고려 없이 등장했다. 그것은 사회 구조 안에서 연결점을 찾을 수 없지만 여전히 상실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관념의 세계에 대한 특별한 문제 안에 굳게 정박해 있다. 그들은 이미 미래의 가능한 진화를 위한 소재로서, 사회 구조 안의 변화가 개인성의 더 넓은 활용을 제시하자 마자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특별히 몇 가지 관념들에 (처음에는 관계하지 않았던 그것들의 발전에) 적용된다. 1) 개인들은 자신 안에 그들 개인성의 원리를 지니고 있다. 2) 개인성은 고유성과 비교 불가능성의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증명될 수 있고, 살아 있을 수 있고, 구성될 수 있다.[33] 18세기로의 이행을 특징 짓는 주된 문제를 규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신앙 운동의 의도들과 결과들로 돌아가보자. 이것은 종교에 의해서 한정되고, 그것의 출발점으로 개인을 택하지만, 그러나 그들 자신의 구원을 향한 개인의 노력만을 개인화 한다. 구원에 대한 관심은 이제 일상 세계로 이동한다. 그리스도의 계승자로서, 폐쇄적 삶과 예외적 자비심이 행위를 통해 다른 이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더 이상 목자만이 아니다. Vita activa와 vita contemplative 사이의 차이는 줄어들고 먼저 이는 구원과 저주 사이의 차이를 더욱 심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가 거기에 노출된 것을 본다. 누군가 자신의 구원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하게 되었고, 헌신은 이런 목적을 위해 도구화 된다. ‘Être devot, c’est vouloir se sauver et net rien negliger pour cela’ (헌신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원하는 것이고 이 목적을 위해 아무것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34] 모든 사람들은 성직자의 도움을 통해 자기 자신들을 위해 이를 할 수 있다. 어떤 좋은 행위가 필요하지는 않다. 이 임무는 직업적 그리고 가족적 의무와, 정치적 복종과 재무적 투자와, 일상 생활과 병존한다. 왜냐하면 신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단지 한가지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점차로 사기라 판명된 문제, 즉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다.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들은 이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거의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동료들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를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들은 이미 잘못된 경로에 있는 것이다.[35] 그들은 그들 동기의 신실함을 커뮤니케이션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경건함에 대한 평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건함 자체를 위해서 경건하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결국 심지어 그들은 더 이상 그들 자신의 진정한 동기에 대해 확신할 수 없어야 한다. 그들은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정체성’이 부족한다.
종교적 도그마가 이런 불확실성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칼뱅주의자와 얀센주의자는, 예를 들면 예수회보다 무지(unknowability) 이론의 더 급진적 버전을 향한다.[36] 그렇지만 문제는,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종교적인 도그마적 시맨틱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안에서 구원에 대한 갈망의 개인화에서 나온다. 영혼의 구원 혹은 저주라는 주제, 그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개인에게 제시되는 주제, 영혼의 개인성(그 차에로서의 존재 그리고 불가분성)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주제에 대해서, 개인은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없으며, 그 주제에 대해 시도할 수 있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반대 효과들에 주어지는 어떤 사회적인 안전을 발생할 수도 없었다. 종교의 차이화 코드의 지도 아래서, 개인은 막다른 길에 도달한다. 물론 그들은 성층화 된 사회나 혹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스스로를 개인적으로 증명하는 것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모의 성취와 공적, 자비심, 고귀한 삶의 방식, 금욕주의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용기 등에 대한 그들 자신의 노력을 늘려 나가는 것으로도 해법을 찾을 수는 없다. 이 모든 것은 정직하지 못한 동기의 의심에 의해 오염된다. 개인은 심지어 그들이 허용되지 않는 이차적 동기를 필요로 한다고 배운다.[37] 그렇지만 주된 동기와 이차적 동기의 구별은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된다.[38] 사회적 변화의 문제가 이런 의심스러운 동기의 문제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성층화 된 사회는 다른 이들의 동기에 대한 인식과 오인에 대해서 대단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은 도덕성과 현실 사이의 매우 엄격한 불일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귀속은, 다른 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규제한다. 이런 사회의 안정성과 그들의 기대에 기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동기에 적응할 필요를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완화하는 것이다.[39]
기능적 차이화에 의해 기본적으로 특징이 규정되는 체제로의 이행에서, 이런 무차별성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제 사회에서 포섭은 더 이상 출생을 통해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가계를 통한 사회화에 의존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요구 조건은 기능 시스템 사이로 나눠지기 시작한다. 헌신 운동은 포섭의 요구조건을,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초기 차이에 독립해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도록 새롭게 정식화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시스템들, 포섭에 대한 다른 요구와 맞서야 하고, 문제적 공생에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궁정에서 경건함은 때로는 유행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며 그래서 때로는 승급에 이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다. 사랑의 문제에서는, 부분적으로 그것이 끈질긴 구호자를 막는 보호가 된다.[40] 부분적으로 사랑은 인식할 수 없는 자비심의 같은 기름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41] 그리고 부분적으로 경건함은 나이든 숙녀에게는 사랑의 대리로서 역할을 한다.[42] 이 주제의 확장된 논의는, 포섭과 사회화의 형식들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는 동기들이 보편적으로 의심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개인’의 개인성의 새로운 개념, 이런 보편적으로 의심되는 동기에 대해 정확하게 맞춰진 개념은 아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인화 될 수 없지만 여전히 특별한 층위, 비웃음의 대상인 거짓된 미덕과 거짓된 동기에 대한 제재를 위한 특별한 양식의 발견에서 이는 명백하다.[43] 비웃음은 그것과 맞설 수 있는 것, 즉 진정한 이성과 본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개인적 존재의 고유성은 여전히 시야 밖에 있다. 누군가가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르다는 요청 자체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18세기 역시 자연적(주어진) ‘개인’의 개념은 지속되고, 따라서 배경과 성층화를 통해, 다른 것들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사람들을 미리 규정하는 것 역시 지속된다. 구체적인 사람은 l’homme universel의 연속적 특정화의 최종 단계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성층화는 여전히 특별한 개인의 특정화에서 포함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배경, 양육 그리고 그가 속한 친구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주는 방식이었다. 특정화에 대한 이런 필요는 일반적 인간학에, 특히 일반적 인간 존재의 자연적 비결정성이라는 주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같은 표지를 통해서 자기-언급적 측면은 인간 개인의 이론, 즉 독립적 지위처럼, 누군가 자신의 훌륭한 행운, 자신의 미덕(행복!)을 즐길 수 있는 능력으로 진입한다. 그래서 성층화에 독립적인 혹은 심지어 성층화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순간들이 18세기 중반 이후 등장한다. 교육과 행복의 프로그램적 결합에서, 이런 순간들은 교육 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가지게 되었다. 인간 본성의 비결정성은, 존재하는 성층화 한 질서의 맥락 안에서 그들을 행복의 상태로 이끌기 위해 사용될 수 있었다.[44] 그렇지만 ‘개인’의 개념에서, 이 모든 것은 개념의 폭발적 뒤섞임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Abbé Joannet이 쓴 것[45]처럼 동시에 단순하며 확장적이고, 동시에 파괴될 수 없으면서 변화 가능하다. 단순함은 여전히 종교, 창조, 사후의 삶에 대한 보장과의 관게의 기초다. 도덕성과의 관계 그리고 특히 다른 이들에 대한 고려를 자신의 행복 추구 안으로 포섭하는 것은 이런 개념의 확장 능력에 기초한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종교와 도덕은 더 이상 통일체로 될 수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이 규정할 수 있는 한 개인에 대한 언급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개인’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양식화하고 시간화 한다. 나머지 창조를 따라서 그것은 완전성을 향한 하나의 운동으로 재 개념화되었다. 반면에 삶의 ‘조직’에 대한 새로운 개념은 완전성을 얻기 위한 능력을 보장한다.[46] 더욱이 자기-애, 자기-결정, 자기-이해와 같은 관념을 통해 자기-언급의 분명한 가치 평가가 있다. 사회와 도덕은 이런 자기-언급에 대한 판단을 금한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검토 없이 ‘좋은 것’으로 인증된다. Rousseau 이전에 루소주의가 지속된다. 단지 개인적 자기-언급 수행의 결과는 선/악 도식에 따른 도덕적 평가에 따른다.[47] 그래서 도덕성의 문제는 시간적 차원으로 이동한다. 거기서 유용성의 관념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압력 하에 놓인다. ‘개인’ 그 자체는 더 이상 이런 문제에 잡히지 않는다. 그 자체로부터 자유롭게 출발한다. 개인성(혹은 심지어 확장 가능한 개인성)의 적합한 개념이 없이, ‘개인’은 이미 그 자신을, 여전히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위계 밖에서 발견한다. 더 이상 그 자신이 이 위계를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이탈한다. 역할과 사람의 차이화는 사회 자체의 차이화 원리에 적용되고, 성층화는 사회 안에서 단순한 역할들에 대한 기술로서 재구성된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복종은 지위와 관계될 수 있지만 더 이상 사람들에게 관계되지 않는다. “(‘사람’과 ‘지위’ 사이의) Cette distinction se trouve aujourd'hui si vulgairement établie, qu'on voit des hommes réclamer quelquefois pour leur rang ce qu'ils n'oseraient prétendre pour eux-mêmes. 'Vous devez', dit-on humblement, 'du respect à ma place, à mon rang'; on se rend assez de justice pour n'oser dire 'à ma personne'” (이런 구별은 오늘날 저속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 방식에서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는 감히 요구해서는 안 될 것으로 그들의 위치에 대해 주장하면서 바라본다. 겸손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내 지위, 내 위치를 존중해야만 한다. 그들은 내 사람에게 감히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 충분히 정당하게 나를 대우한다.)[48] 그 세기 후반에는, homme du monde와 homme de bonne compagnie는 의식적으로 지위 특정한 속성 없이 정의되었고(그것이 물론 모든 사람이 동등한 접근성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49], 역사적으로 honnête homme로부터 구별되었다. homme du monde는, 위치, 가족, 성격을 가지지 않고, 단지 붙임성을 가진다.[50] 위치와 가족은 더 이상 없고, 성격은 아직 아닌. 모든 나라, 모든 지위의 선한 사람이여 단결하라!, 사람들은 거의 모두 ‘ce temps de lumières et de dégoûts’(계몽과 역겨움의 이런 시기)라는 경구를 말할 수 있다.[51] 그러나 이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않는다. 마치 개인들이 사회적 질서가 몰락하기 전에, 개방된 곳, 자유로운 곳으로 탈출하면서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서 그들은 자연적이고, 좋고, 감각적이고, 인간의 개선에 열려 있는 본성인 양식 안에서 살 수 있기를 희망한다.
Ⅵ.
‘개인’이 무엇이건, 그것은 모든 경우 하나의 통일체이다. 그러나 이 통일체가 이해되고 재정식화 되는 방식을 구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확장된 개인성에 대한 기대를 ‘개인’의 이런 개념에 포섭하는 것, 성층화로부터 그것을 뽑아내는 것, 반성된 정중함을 통한 이에 대한 보상. 이 모든 것들이 18세기의 복잡한 의미적 발전에서 단 하나의 흐름이다. 통일성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포섭과 사회화의 맥락에서, 이는 적합성과 일탈의 주제를 과도하게 강조하게 된다. 각각은 이미 충분히 개인화 되거나 혹은 그렇게 되도록 훈련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개인적 존재 혹은 19세기의 전형적 개인이건, 개인들이 그 자신을 발견하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다. 차이의 도식이 정보 획득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들 자신에 대한 정보에 의해 이끌리는 개인들은 동일성과 차이의 형식에서 자기-언급을 절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8세기 문화적 시맨틱의 탐구는, 이런 시맨틱이 ‘개인’의 개인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차이의 도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한 개인이라는 ‘개인’의 초기 버전이 의존하는 구원/저주의 구별 도식이, 구원 갈구의 개인화, 특정한 종교적 포섭의 새로운 형식, 이차적 (하위) 동기에 대한 필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위에 기반한다는 것을 보았다. 18세기 계몽 철학자들은 지옥에서 면제되었다.[52] 그들은 심지어 17세기의 자유 정신에 있어 지속적으로 지시되야만 했던 확실성의 보장에서도 면제되었다.[53] 이는 ‘개인’이 무차별적인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사실에 조응한다. 그렇지만 이런 결론은 계몽의 표면 위에서만 그려진다. 즉, 자동적으로 반성 없이 지옥의 소멸로부터 등장한다. 그러나 이는 구원과 저주 사이의 차이를 대체하지 못했고, 하나의 차이로서 그것을 대신하지 못했다.
아마도 제안 된 가장 중요한 대체는 자연과 문명(자연적 상태와 ‘문명화된 사회’) 사이의 차이다. 이런 차이는 자연과 은총 사이의 이전 구별을 대신한다. 새로운 버전은, 평등의 주제를 다룰 때 존재에 대한 정치적 이념이 차이를 만드는데 중요한 이점을 제공한다. 자연적 상태에서 이미 힘, 적성 그리고 가능한 소유에 이미 불평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문명화 된 장치로서 상태들의 불평등 속에서, 자연에 의해 메워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연/문명 차이에 대한 기술은 역사적인 그리고/혹은 지역적 투영을 사용한다. 자연적 상태는 시간적 혹은 공간적 개념이건 거리를 두고 위치한다. 이는 현실과의 인식가능한 연관에 도식을 제공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차이 역시 차이로서 다뤄진다. 사회와 개인은 동시에 자연적이고 문명적일 것이 기대된다. 혹은 이 차이를 유지할 것이 기대된다. 과학적 인간학과 문명 비판은, 정보의 전리품을 공유하면서, 같은 배에 타고 남해로 항해하기 시작한다.
18세기에 시작된 ‘부르죠아지 사회’ 이론에 대해서, 자연/문명 도식은 문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식은 ‘혁명’의 과거 의미를 날려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위한 바탕을 놓았다. 순환적 운동을 과거로 돌려보내는 대신, 노력을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조건을 바꾸는 것으로 이끌어야만 한다. 이것은 상실의 감각을 일으킨다. 문명 상태 (James Fenimore Cooper에서 읽을 것처럼 미국의 경우 조차도)는 불이익을 지니고 있다. 부르죠아지 사회의 설명은 전복된다. 회계적 개념을 그것은 적색(적자) 상태이고, 손실이 더 커지지 않도록 재무재표를 지켜보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개인은 어떻게 이런 개념을 기술된 사회와 연결될까? 이전 결과들에 대해 나은지 혹은 낫지 않은지를 비교하는 개인적 재무재표를 가지고?
자연/문명의 도식의 도움으로, 한 편으로 ‘개인’은 도덕성으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진다. 즉 사회화로부터 그리고 집에서 배우는 이상한 관습으로부터.[54] 도식의 이런 응용은 그 자신에게 비판의 권리를 제공한다. 다른 한 편, 도덕이 아니라 경제에 관계된 두번째 응용이 있다.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먹여 살린다. 문명은 질서를 생산해야만 하는 상호의존성을 도입한다. ‘개인’은 ‘소유권자’가 되고, 그래서 법적 그리고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망 안에 스스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55] 재산을 통해서 동시에 더 의존적이고 더 독립적이다. 동시에 그것의 필요는 증가하고 그것의 기쁨은 강화되고, 그리고 스스로로부터 멀리한다. 자연의 상태, 그리고 그와 함께 자유, 평등 그리고 무구함은 재소환을 넘어 상실된다. 규칙에 이끌린 사회는 ‘개인’을 족쇄로 묶어 둔다. “Dés cet instant, son existence cessa, pour ainsi dire, de lui appartenir” (그 순간부터 말하자면 그의 존재는 그에 속하는 것을 멈췄다)[56] 이런 조건은 스스로를 강화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증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의 전제조건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문명화된 사회’는 자신의 치료제만을 가지고 그 단점을 다룰 수 있었다. 이 부정의를 생산한 법을 통해서만 부정의를 다룰 수 있다. 가난하건 부자이건, ‘개인’은 이 메커니즘 안에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Il semble que la société lui devienne nécessaire en proportion des maux qu'elle lui cause” (그에게 사회는 그에게 약을 야기한 것에 비례해 그에게 필수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인다)[57] 이렇게 경제적으로 인식된 사회에서 포섭은 자연에 반대해서 작동하고, 그래서 사회화를 통해서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 자연을 억압하기 위해서 교육을 필요로 한다.[58] 혹은 중농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ordre naturel의 주장(!)을 퍼트리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인간 존재는 독립의 환상 위에서 의존 상태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만 사회는, ‘개인’이 자신들이 자유라고 믿는 것을 막지 않고 노예화 한다.[59] 만일 ‘개인’이 재산 소유자로서 성립된다면, 이는 정치적 목적으로서 평등성을 설정하는 것을 배제한다. 평등이 성취될 수 잇는 것은 개인의 조건이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 안에서(그것은 이제 국가를 의미한다) 만이다.[60] (그들의 경제적 성공과 ‘동일시되는’) 재산의 기초 위에서 자신을 개인화 할 수 있는 누구라도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사회의 관점에서, 정당하게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은 특별한 개인의 상태가 아니라 이런 관계 뿐이다. 정의는 재산의 보호다. 이런 의미에서 ‘La justice pour tous est l'encouragement pour chacun’ (모두를 위한 정의는 각각에 대한 장려다)는 진실이다.[61] 모두에게 평등한 조건을 통해 성취될 수 없는 것은, ‘개인’의 개인성으로부터 거리와 동시에 관계를 표현하는 이런 ‘l'encouragement pour chacun’이다.
그러나 부자와 빈자 사이의 불평등과 차이를 이끄는 것은 정확하게 이런 배타적인 관계적 평등성이다. 궁극적으로 이 차이가 문명화 된 사회와 자연 상태 사이에 구별을 만드는 것이다. 혹은 어느 정도, 이는 이런 원리의 효과를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재산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가 아니거나, 혹은 부자이거나 가난한 사람이다. 여기가 ‘개인’의 실체, 개선의 능력이 놓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키메라적’ 환상 혹은 이데올로기에 탐닉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응집은 노동을 통해 매개된다. 일은 부자와 빈자 사이의 차이를 동���화하고, 돈을 흐르게 하며, 빈자가 재산에 참여하게 허용하고, 말하자면 소급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면 임금 노동이 등장하지 않았을) 불평등한 재산의 분배를 정당화한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일은 사회의 연결 고리가 된다. 그것은 부자와 빈자 사이의 갭을 통해서 스스로를 파괴할 것이라 위협한다. 장치는 현상 유지의 접근법을 채택하도록 권유된다. 그렇지만 부자와 빈자 사이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노동과 노동 분업 모두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62] 따라서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자연 상태와 구별로서 문명을 규정한다. 이런 차이에 대한 언급을 통해 일 혹은 노동은 포섭되고, 배제되는 제3항, Serres의 의미에서 ‘parasite’이고,[63] 그것은 부자와 빈자 사이의 차이의 성립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즐기는 사람, (노동 시장과 관계된 필요와는 다른) 필요를 가진 사람과 대조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들 자신이 아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직접적 차이의 기생(parasite) 기능을 가정하는 한 그들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 그들은 도래하는 사회 질서, 부자와 빈자 사이의 차이에 대한 보완적 질서에서 수행한다. 이 질서에서 (다시금 즐기는 것과 필요에 대비되어) 그들은 그들의 자기-언급의 제정으로서 나타날 수 없다. 포섭되고 배제된 제3항으로서 그들은 다른 논리적 세계에서 살아간다.
만일 (일이 실제로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나, 혹은 그것이 소외시키지만 개인화 하지는 않는 이유에서건) 이런 순수하게 경제적 관점에 동의한다면, 기생적 해법에서 변증법적 해법으로 도약해야만 한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를 뒤로 하고, 국가와 혁명이 등장한다. 상대적으로 Hegel과 Marx는 거기에 궁극적 책임성을 부여한다. 즉 궁극적 책임성은 개인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빼앗긴 ‘개인’에 대한 것이다.
부르주아 사회는 더 이상 ‘좋은 사회’일 수 없고, ‘좋은 삶’을 약속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이를 알고 있다. 그것은 실체에 대한 우울한 그림을 그리면서 동시에 환상을 키운다.[64] 개인들은 다른 상태들의 무너지는 사회로부터 탈출해서 재산의 땅으로 날아가고자 노력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 모든 사람을 위해 충분한 공간은 거기에 없다. 어떤 이들은 인구학적 ‘올바름’, 극빈층이 죽어 없어지는 것을 제시하고[65], 어떤 이들은 더 합리적인 재산의 착취를 통한 성장을 옹호한다. 더 비극적인 버전과 더 낙관적인 버전도 서로 균형을 맞춘다. 양자는 경제적 개인주의를 통해 이제 우세해진 경제적 사회 이해를 뒷받침한다.[66] 그들은 사회 안에서 ‘개인’의 경제적 포섭을 다루지만, 이 (기능 특정적) 기반 위에서 ‘개인’의 개인성 개념을 제공할 수는 없다.
운 좋게도, 이것이 18세기가 ‘개인’을 개념화하려 시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어떤 지위에 특정적인 범주에 거리를 두고 마찬가지로 ‘개인’이 스스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차이 도식을 사용하는, 경제적 접근법에 독립된 관념이 발전하는 두 번째 노선이 존재한다. 이는 일에 대한 평가, 특히 예술 작업에 그리고 이후에는 그것의 이론인 미학에 관계된다. 협력, 경쟁 혹은 갈등 어디에서건, 재산이 인간 행동을 이끌지만, 이것은 무엇보다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에 대한 감수성, 포착하고 판단할 능력, 구별할 능력에 관한 것이다.[67] 이런 발전의 출발점은, 1700년경, 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와 개인(사람, 예술가)에 대한 판단이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판단의 단위, 완벽함/유용성은 분해된다. 사람/작품의 판단은 더 이상 그들이 더 완벽한지 덜 완벽한지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 무엇에서 나올까?
작품의 완벽성의 이런 전통적인 기반과 이 완벽함을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은, 개인성의 문제가 처음에는 특별한 작품(예술 작품)의 판단으로부터 등장하고, 즉각적으로 순수하고 단순한 심리적 문제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 예술 작품은 개인적 예술가에 의해 개인적으로 생산되는 작품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들의 자질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어떤 범주인가의 질문이 문제가 된다. 이 문제에 대답하면서 발전된 대답들의 조합은 현대 개인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고려될 수 있고 그래서 주의 깊은 조사가 당연하다.
이제 예술 작품에서 기대되는 제일의 가장 충격적인 특징은 참신함과 놀라움의 자질이다. 참신함과 호소력 사이의 연결이 인식되면서, 그것은 처음에는 회의주의와 함께 고려되었다.[68] 그러나 17세기를 거치면서, plaisir의 인간학의 충격과 그에 따른 참신함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다. 예술 작품이 놀라움을 만들기 위한 초기의 요구조건은 그래서 새로운 기능적 차이를 제공한다. 이 놀라움이 누군가의 기억에 작품을 남기기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서, 인쇄된 언어가 이제 이 목적에 기능하면서, 그것은 호소력의 하나의 조건을 구성한다. 예술 작품이 호소력을 가지는 것은 누군가 작품이 전달할 인상의 특별한 형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탈에 대해 개별화 하는 구별성을 제공한다.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충격적이고 즐겁다. Muartor는 ‘bello poetico’ (미적 시학)를 ‘vero muovo e maraviglioso dilettevole’ (진정으로 새롭과 놀랍게 즐거운 것)이라 정의한다.[69] 새롭다는 것이 미학적 요구, 사로잡기 위한 조건, 즐거움의 조건이 되었다. 영감 혹은 심지어 우연의 발생도 생산을 위한 정당한 순간 (그리고 어떻게 무언가를 생산하는지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당화하는 것)이 되었다. 이로부터 얼마 있지 않아, 예술가의 개인성은, 그들의 창조가 새로운 어떤 것을 보장하게 되었다. “des beautés propres à l'auteur et par conséquent Nouvelles” (작가에게만 속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아름다움)[70] 놀라움에 대한 이 놀라운 이동은 비밀리에 사회화의 문제와 연결되었다. 앞의 Ⅱ에서, 일탈된 사회화가 더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더 선호된다고 주장했다. 특정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예술 작품은 그래서 더 이상 즐거움을 줄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 그것의 효과는 미와 지루함 양자에서 역설적이 된다. 한 편으로 즐거울 것으로 제시된 것이 시초부터 새롭고 다른 모습을 취한다면, 이로부터의 일탈은 더 이상 선택이 되지 않는다. 인정-일탈의 과정 대신, 이제 일탈-인정의 과정을 가지게 된다. 같은 시기 동안 유행이 더 많이 논의된 것은 놀랍지 않다. 이전에 받아들여질 만 했던 것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일탈이 일어나고 정확하게 이 때문에 높은 수준의 인정을 획득한다.
새로운 미학의 더 나아가는 요소, 즉 도덕으로부터 더욱 멀어진 거리는, 개인성의 바탕을 준비하는데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Perfecionare la Natura, non la morale’ (도덕이 아니라 자연을 완벽하게 하라)가 Muratori가 이 프로그램을 정식화한 방식이다.[71] 이 거리의 목적은 갈등이 아니라 단지 독립이다. 놀라움과 참신함을 보임으로써 자신을 개인으로서 드러내고자 하는 무엇이건, 자신의 개념 안에서 도덕과의 관계, 즉 직접적인 존중과 경멸을 유지하는 규칙에 묶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지표들은 더 상세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맥락에서,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것은, 예술 작품을 평가하기 위한 범주들이 재정의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좋은 취향이 역할을 하게 된다.[72] 좋은 취향은 이성에 묶여 있는 연결을 느슨하게 한다.[73] 그것은 규칙에 대해 그렇고 그 자신의 영역을 수립한다. 그렇지만 이 영역은 사회적 성층화에 묶인 채 남아 있다. 비록 누군가가 점점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혐오한다고 할 지라다. 단지 이런 방식에서만 완전한 비결정성을 피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신함의 성격 안에 놓여 있고, 놀랍게도 그것은 규칙의 적용에 의해서 한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주들은 규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야만 한다. 사회적 차원에 대한 언급은 사실 차원에서 사라진 특정화를 대신한다.
그래서 좋은 취향의 교의는, 이미 ‘개인’과 함께 시작되고, 취향의 획득을 가능하게 한 시대, 그러나 사회적 지위와 시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분배하기 위한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시대에서, 포섭의 문제에 대한 인간학적 형성을 제공한다. 더욱이, 상위 계층, 한 때 차이화 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자 여전히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 여기서 이전의 그것이었던 커뮤니케이션을 대신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De gustibus non est disputandum (취향은 논쟁될 수 없는 것이다) ‘취향’ 개념은 정확하게 이런 이유로 선택되었다. 자신의 지위 안에서 누군가의 취향을 정당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만 취향의 형성에 참여함으로써 그 층위에 속하게 되고,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 역할을 한다. 그것의 기능은 취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누군가는 취향의 확실성, 즉 이성과 더 정확하게는 분석 그리고 논의가 결과적으로 직관적 감정을 산출하는 확실성에 대해 그 층위에 빚을 지게 된다.[74] 동시에, 상위 계층의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은 사라진다. 이 계층은 단지 사회화를 통해서 지속되고, 명백히 그들 자신에 대해 어떤 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다. 만일 판단의 근거에 대해 질문 받는다면, 악(그리고 정확히 그래서 성과적인)순환으로 끝날 것이다. 범주는, 범주를 다루는 방식으로서만 결정될 수 있는 판단을 통과하는 능력에서 등장한다.[75] Jean-Baptiste Dubos는 탈출구를 찾고자 했다.[76]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이성(raison)에서 마음(Coeur)으로 이동한다. 마음이 내리는 판단은 맹렬하고,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런 이유 때문에 확실하다. 마음은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규칙에 기반한 어떤 전문적 판단보다 우월하다.[77] 범주를 형성하는 능력의 상실과 함께, 상위 계층의 권위의 상실이 일어났다. 이는 이 계층에 속한 개인의 권위에 대한 요청으로 전환된다. 그들은 이제 더 많은 것을 판단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할 권위를 가졌기 대문이다. 이것을 할 능력은 내재한 것이다. 그것이 부재한 곳에서는, 레시피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이 ‘공중 (the public)’(청자, 독자 그리고 지켜보는 공중)을 구획한다. 그것은 예술 작품이 받아들여질지 아닐지에 대해 최종 판단을 가진다.
따라서 예술은 그 자신의 ‘공중’을 가지고, 그 자신의 포섭, 그 자신의 사회화를 가진다. 이 ‘공중’은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가는 따라서 개인화된다. 그는 즐거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천재성을 필요로 한다. 이것 역시, 자연주의적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학습을 통해서, arrangement heureux des organs du cerveau (뇌 기관의 행복한 배열)을 통해서 얻어질 수 없는 내적 자질이다.[78] 자연은 이 천재성을 가끔씩 생산한다. 그러나 성공은 단지 ‘공중’의 경험 속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 예술은 천재성과 마음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존재하게 도니다. 이는 특별한 미디어로서 차이화 된다.
그렇지만 어디에 차이화가 놓이게 되는가? 만일 모든 것이 참신하고 놀라운 것으로 발명되야만 한다면, 그러면 거부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자질을 아는 자질이라는 순환은 어떻게 깨질 수 있는가? 그렇게 확실하게 제시되었던 이론은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사회적 성층화로 돌아가 언급을 한다.[79] 우리는 선택된 ‘공중’을 다루고 있다. “Je ne comprens point le bas peuple dans le public capable de pronocer sur les poèmes .... Le mot public ne renferme ici que les personnes qui ont acquis des lumières, soit par la lecture; soit par le commerce du monde” (나는 시에 대해 판단을 내릴 능력을 지닌 공중의 구성원 안에 낮은 게층을 확실히 포함하지 않고 있다. …… 여기서 ‘공중’은 독서나 세계에 대한 경험에 의해 계몽된 사람들만을 언급한다)[80] 결정적 차이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차원 안에 놓여 있고, 성층화에 기반한다. 비록 그것이 더 이상 출생에 기반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계층-특정된 사회화를 통해 배운 점잖은 체하는 ‘구별’에 기반한다.
바로 만족하기에 실패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외부적으로 방향이 정해진 예술-특정적 차이다. ‘천재성’과 ‘마음’에서 서툴게 무언가를 표현했던, 예술 생산과 판단에서 개인성의 승인은, 무엇이 예술적 판단을 이끄는 차이인가를 알기 원한다면 쓸모가 없다. Breitinger와 Bodmer에서 Gottsched, Wolff, Eberhard와 Baumgarten에서 마침내 Kant에 이르는 오랜, 뒤얽힌 논쟁이 새로운 차이, 특별한 것과 보편적인 것 사이의 차이에 기여를 한다.[81] 그래서 판단 능력과 범주의 논리적 순환은 차이에 의해 대치되고, 이것인 ‘개인’의 논리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 차이의 기원은 곧 규정된다. 고대 unitas multiplex에서 도출된 차이, 복합성의 구성적 개념.[82] 특별한 것과 보편적인 것 사이의 차이는 차이로서 복합성 문제를 정식화 한다. 통일성과 총체성을 향하는 보편적인 것이 어떻게 특별한 것에서 실현될 수 있는지는 미적 반성의 중심 문제가 된다. 이는 하나의 과학으로서, 즉 보편적인 것의 이론 그리고 (단순히 취향과 판단의 정확한 적용의 안내 대신에) 예술의 반성으로서 미학의 가능성을 수립한다. 참신함과 놀라움이라는 이미 익숙한 시맨틱, 독창적인 생각과 감정적 즐거움이 포함될 수 있고, 사회적 성층화에 대한 언급은 뒷자리로 물러났다. 물론 여기서 또한 보통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 차원으로 되돌려 진다. 특별한 것과 보편적인 것 사이의 (예술-특정한) 차이는 예술과 비-예술 사이의 차이를 만든다. (마치 부자와 빈자의 차이가 문명과 자연 사이의 차이를 만들었던 것과 같이) 그러나 이런 차이의 기생자, 포섭된 배제된 3항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논리적 아포리아를 존재하게 하는 방법은 어디서 발견될 수 있을까?
18세기 후반, ‘개인’의 개념은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역할을 한다.[83] 개인은, 보편적인 것과 특별한 것 사이의 차이의 기생자로서, 그리고 이것들이 통합될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개인성을 획득한다. 이것은 무엇보다 먼저 아름다움을 주장하고 그것의 고유성에서 이를 보일 수 있는 예술 작품에서 자명하다. 한번 기반을 갖추면, 이런 관념은, 때가 맞아 떨어지면 매우 빠르게 일반화될 수 있다. 이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옮겨졌다. 그것은 전체와 부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개인적 표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살아있다. 마침내 초월적 주체의 발명은, ‘개인’이 세계를 특별한 자아 속에 통합했다는 능가할 수 없는 정식화를 가능하게 한다. ‘개인’은 세계의 주체다. 동시에 세계는 주체를 개인화 한다. 왜냐하면 세계는 다른 전체의 부분으로서 이해될 수 없는 유일한 전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개인은 심지어 취향이나, 그것과 함께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한 기존의 범주도 지운다. 단지 사회 밖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위치에서 취향의 규칙을 설정하면서, 다시 한번 과장된 의미에서 스스로를 천재로 본다.
이 개인과 주체의 동일시가 새로운 관념이라는 사실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개인적 사람, 그들의 가치, 그 자신을 강화하는(완벽성) 능력이 이전에 강조되었을 때, 개인은 인간 존재로서 생각되었고, 사회적 위치에 기반한 낡은 차이화에 맞서는 것으로 그러했다. 이런 원리가 18세기 후반 정치 저널의 페이지를 채운다. 그러나 여기서 관심은 능력과 힘의 제한 없는 발전이지 각 개인적 사람의 특성에 대한 보호와 형성이 아니다. 단지 인간 권리의 구현이, 자유 역시 이상하고, 비합리적이고 이후에는 심지어 비도덕적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차이화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논점을 끌고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보편적인 것과 특별한 것 사이에 차이의 기생자로 남아 있다. 그 어느 하나가 아니라, 배제된 그리고 심지어 요구되는 3항으로서, 그리고 이는 이 차이화에 의해 포섭된다. 초월적 주체가 그들 자신의 자아, 그들의 실제 자아, 그들 자아의 자아라고 개인적 존재를 설득하려 시도하는 것은 덧없는 일이다. 낭만주의는 이를 알고 있다. 보편적인 것과 특별한 것 사이 차이에 대한 관계에서 ‘개인’의 논리적 위치는 그들의 문제로 남아 있다. 아마도 그 문제가 개인성을 규정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Marx는 이 문제가, 노동자로서 ‘개인’이 또한 부자와 빈자 사이의 차이에 기생자로서 역할을 하는 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1] 편집자 주: Topos는 ‘주제’나 ‘공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전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문자 그대로 ‘장소’를 의미했다.
[2] Joan Marie Lechner, Renaissance Concepts of the Commonplaces, New York 1962, Westport, Conn. 1974 재출판.
[3] 전형적인 예에 대해서는 Joseph Hall, Characters of Vertues and Vices, London 1608. Diderot에 이르는 17세기 후반에 이런 문학적 장르의 (신체적 외양에 대한 언급의) 소멸에 대해서는 Louis van Delft, Le moraliste classique: Essai de définition et de typologie, Geneva 1982, S. 137 ff.
[4] 예를 들면 Paul Delany, ·British Autobiography in the Seventeenth Century, London 1969는, 17세기에 더욱 자주 등장했던 자서전이 특정한 역할에 대한 이해와 밀접하게 연결된 채로 남아 있는 것을 보여준다. 더 큰 자유는 신과의 거리라는 종교적 경험의 맥락 안에서 대부분 정식화 될 수 있다.
[5] Conjectures on Original Composition, in The Complete Works, London 1854, Hildesheim 1968에 재출판, Bd. 2, S. 547-586 (554).
[6] 그는 계몽된 낙관주의에 대해서 “자연 자신은 사다리를 놓고, 원하는 것은 그것을 오르겠다는 우리의 야심이다”라고 썼다. (Young, Conjectures on Original Composition, p. 555)
[7] “스스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뿌리는 그 스스로가 지닌 통일성과 동일성이다.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해 자연적이고, 존재 자신의 단순성에서 기쁨을 취한다. 왜냐하면 더 단순하고 단일할수록, 존재의 기초에 더욱 가까워진다. 그래서 그 안에 더욱 완전성을 가진다.” Edward Reynolds, A Treatise of the Passions and Faculties of the Soule of Man, London 1640, GainesvilIe, Fla. 1971 재출판, S. 84 f.
[8] 스콜라 학파 논쟁의 개관에 대해서는 Johannes Assenmacher, Die Geschichte des Individuationsprinzips in der Scholastik, Leipzig 1926; Jorge E. Gracia, Suárez on Individualism, Milwaukee 1982; Introduction to the Problem of Individuation in the Early Middle Ages, München-Wien 1984. 중세 개인성의 개인적 인식의 발전에 대해서는 Colin Morris, The Discovery of the Individual 1050-1200, London 1972.
[9] 이는 개념적-역사적 논의라는 맥락에서 특별하게 말하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즉 Francisco Suárez, Disputationes Metaphysicae, Disp. VI., insb. VI, 14. (“modus substantialis, qui simplex est et suo modo indivisibilis, habet etiam suam individuationem ex se, et non ex aliquo principio ex natura rei a se distincto” [하나의 본질적 양식, 그것은 단순하고, 그 자신의 방식으로 분할 불가능하고, 또한 그리고 사물의 본성에서 그것에서 구별되는 어떤 원리로부터가 아니라 그 자신의 개성화를 가진다.]) Opera Omnia, Bd. I, Paris 1866, S. 185.의 Hildesheim 1965 재출판에서 인용.
[10] 그래서 Thomas Wright, The Passions of the Minde in Generall, erw. Aufl., London 1630, Urbana, IL. 1971 재출판, S. 216; Edward Reynolds, 앞의 책, S. 84 f.
[11] 예를 들어, Pierre Mesnard, Le commerce épistolaire, comme expression sociale de l'individualisme humaniste, in: Individu et société à la Renaissance: Colloque internationale 1965, Brüssels 1967, S. 13-31. 중세의 수도사 사이의 ‘펜 팔’ 서신 왕래와 교회 정치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는 Morris, 앞의 책, S. 97 ff.; 또한 Franz Josef Worstbrock (Hrsg.), Der Brief im Zeitalter der Renaissance, Weinheim 1983.
[12] 이것이, 많은 양의 개인적이고 전기적 정보가 많은 양으로 남아 있는 이런 편지에서 수집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이것조차 주의 깊을 필요가 있지만!)
[13] “La parfaite valeur est de faire sans temoins ce qu'on serait capable de faire devant tout Je monde”(완벽한 장점은, 전 세계 앞에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보는 사람 없이도 수행하는 것이다) La Rochefoucauld의 Maxime 216, Œuvres complètes (ed. de la Pléiade), Paris 1964, S. 432는 마지막 말에 놓여 있는 제약 때문에 적지 않게 충격적이다. 이 자질은 다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는 것으로 구성될 수는 없다. 이런 자기-확신의 개인주의에 대한 사회적(지위 기반) 규율에 대해서는 Frank E. Sutcliffe, Guez de Balzac et son temps: Littérature et Politique, Paris 1959, S. 131 ff.
[14] Jean de La Bruyère, Charactères, Du mérite personnel Nr. 24 (Œuvres complètes, éd. de la Pléiade, Paris 1951, S. 97 f.): 특별한 성취가 누군가를 화가, 음악가, 시인으로 만든다. “mais Mignard est Mignard, Lulli est Lulli, et Corneille est Corneille”
[15] 한 가지 중요한 부대 효과는 자연 과학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연구에 대한 이런 시맨틱의 비판적 반응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심하게 비판 받았던) Discours anatomiques von Guillaume Lamy, 2. Aufl., Bruxelles 1679. 여기서 창조의 목적으로 인간 존재를 높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 도입되었다. (pp. 1ff.) 동물은 마치 ‘sans étude et sans erreur (S.5)’ (배움도 없고 잘못도 없는) 존재로서 어떤 비난도 없이 살아가는데, 반면에 인간 존재는 긍정적 취급도 증가하고 강화되었지만, 부정적 취급도 마찬가지다.
[16] 이에 대해서는 Maurice Magendie, La politesse mondaine et les théories de l'honnêteté en France au XVIIe siècle, de 1600 à1660, Paris 1925, Genf 1970 재출판. ‘자기-통제’로서 ‘성격’에 대한 재해석에 대해서는 Ruth Kelso, The Doctrine of the English Gentleman in the Sixteenth Century, Urbana, Ill., 1929, s. 91f.
[17] Eriving Goffman,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Englewood Cliffs, N. J. 1963, S. 122.
[18] 이에 대해 더 자세하게는 Arthur O. Lovejoy, Reflections on Human Nature, Baltimore 1961, S. 152 ff.
[19] 동등하게 goût의 성층-의존적 시맨틱에서 동일한 현상을 이후 살펴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n. 106.
[20] 종교적 맥락에서는, 이런 거부는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미 도덕성의 세속적 이론들은 기탄없이 어울리게 된다. 예를 들면 Rémond Des Cours, La véritable politique des Personnes de Qualité, Paris 1692, S. 147 ff.
[21] Amsterdam 1692.
[22] Jean La Placette Traité de l’orguil 의 5장 제목. P. 51
[23] 예를 들어 Sénac de Meilhan, Considérations sur l'esprit et les moeurs, London 1787, S. 117: ‘amour propre est flatté des hommages, l’orgueil s’en passe, la vanité les publie’ (자기-애는 찬사에 의해 우쭐해지고, 자부심은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허영심은 그것들을 공공연하게 만든다.)
[24] De La Volpilière, Le Caractère de la véritable et de la fausse piété, Paris 1685, S. 169 ff. 그래서 진정한 경건함에선 ‘singularité’는 존재하지 않는다.
[25] Charles Duclos, Considérations sur les Mœurs de se Siècle (1751), Lausanne 1970 재출판, S. 291 f. “La singularité n'est pas précisement un caractère; c'est un simple manière d'être qui s'unit à tout autre caractère, et qui consiste à être soi, sans s'appercevoir qu'on soit différent des autres; car si l'on vient à la reconnaître, la singularité s'évanouit; c'est une enigme qui cesse de l'être aussitôt que le mot en est connue” (단독성은 정확하게 하나의 특성은 아니다. 그것은 모든 다른 특성을 묶어주는, 그리고 그것을 존재 자체로 구성하는, 다른 이로부터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없는, 단순한 하나의 존재 방식이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의 단독성은 파괴된다. 단어가 나오자마자 존재를 멈추는 하나의 수수께끼다) 따라서 하나의 영향 받은, 잘못된 고유성이 그 결과다. “Ce fausse singularité n'est qu'une privation de caractère qui consiste non seulement à éviter à être ce que sont les autres, mais à tacher d'êtres uniquement ce qu'ils ne sont pas” (이런 가짜 단독성은 단지 다른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이 지니고 있지 않은 다른 존재를 담고 있는 것을 구성하는 특성들의 타락이다) 역시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의 불가능성이 인식의 금지에 이른다는 것이 놀랍다. 모든 개인의 자기-언급이 원리상 요구하는 것과 반대로,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26] “단독성을 통해서 대중의 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도하라”라고, Contess Dowager of Carlisle은 그녀의 책 Thoughts in the Form of Maxims Addressed to Young Ladies on Their First Establishment in the World, London 1789, S.40에서 충고한다.
[27] Louis Gabriel Ambroise, Vicomte de Ronald Réflexions sur l'esprit et le génie (1806), Puvres complètes, Paris 1858에서 인용, Genf 1982 재출판, Bd. X, S. 164-175.
[28] Ian Watt, The Rise of the Novel: Studies in Defoe, Richardson and Fielding, London 1957, 1967 재출판에 따르면, 이것이 소설의 문학적 형식을 가능하게 한다.
[29] 이런 경험의 의미는 또한, 예수회가 진짜 경건과 가짜 경건의 구별 불가능성 (신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기도자들에 의해서도)에 부여했던 반론의 약점 속에도 간접적으로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Pierre de Villiers, Pensées et réflexions sur les egaremens des hommes dans la voye du salut, Paris 1693, 3. Aufl., 3 Bde., Paris 1700 -1702에서 인용.
[30] 일차적인 서유럽의 원천에 대해서, Lovejoy, a. a. 0., S. 128 ff. 심지어 Kant는 이런 생각에 진화적 우위성을 부여했다. 그것을 그는 겸손(Sittsamkeit)이라 불렀다. (in: Muthmaßlicher Anfang der Menschengeschichte (1786) Sämtliche Werke, Bd. 6, Leipzig o. J., S. 49-68, 56 에서 인용) 그러나 도덕 이론 자체는 객관적인 ‘도덕 법칙’(Sittengesetz)에 기반했다.
[31] 이것은 무엇보다도 역사가들의 사회역사적 연구에서 보인다. 예로는 Lawrence Ston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London 1977, insb. S. 221 ff.
[32] 동일한 것이 관찰된다. Mutatis mutandis, in Niklas Luhmann, Liebe als Passion: Zur Codierung von Intimität, Frankfurt 1982.
[33] 여기서 소위 르네상스 개인주의와 근대성의 개인주의가 등장하는 데 선행한 그것의 (논쟁적) 성격에 대한 복잡한 연구들이 범주화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Norman Nelson, Iridividualism as a Criterion of the Renaissance,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logy 32 (1933), S. 316-334.
[34] De Villiers, a. a. 0., Bd. 2, S. 93. 또한 Alois Hahn, La sévérité raisonnable: La doctrine de Ja confession chez Bourdaloue, in Manfred Titz, Nolker Kapp (Hrsg.), La pensée religieuse dans la littérature et la civilisation du XVIIe siècle en France, Paris-Seattle-Tübingen 1984, S. 19-40. 17세기에서 특별한 강조에 대해서는 Jacques Le Brun, Das Geständnis in den Nonnenbiographien des 17. Jahrhunderts, in: Alois Hahn, Nolker Kapp (Hrsg.), Selbstthematisierung und Selbstzeugnis: Bekenntnis und Geständnis, Frankfurt 1987, S. 248-264.
[35] “On tombe en faisant profession d'être devot dans tous les vices ordinaires à ceux qui se piquent de quelque profession particuliére”(독실함에서 나와 공개적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공언의 흉내를 내려는 사람들의 일상적 모든 악덕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II y en a beaucoup qui seroient devenus devot, s'ils ne s'etoient piquez de le devenir”(그리고 그런 척을 하지 않는다면, 독실해야만 할 많은 사람들이 있다) “qui voudra être devot pour en faire profession, ne le sera pas; qui Je sera veritablement, en fera profession sans penser de le faire” (공언으로서 독실함을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독실한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도 그것의 공언을 할 것이다) (De Villiers, a. a. 0., Bd. 2, S. 96-98). 그렇지만 위선과 ‘거짓 경건함’에 연관된 악평 때문에,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기독교적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모든 방향에 함정이 놓여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정신적 카운셀러를 필요로 한다. 모든 임무는 전문적인 수행자의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다. 그들은 그것을 대단히 어려운, 그러나 넘을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린다. 이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은, 개인성의 시맨틱 대부분이 행위의 전문화의 부산물로 등장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가진다. 이는 전문적 고백자, 전문적 조신함, 그리고 전문적인 유혹자, 즉 모든 종류의 abbés에게도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36] 이에 대해서는 특히 Pierre Nicole, Essais de Morale, Paris 1671-1674, Bd. 1-4, Paris 1682에서 인용.
[37] “On a beau prêcher la devotion; presque personne ne s'y determineroit si l'on devoit trouver dans sa devotion que la devotion” (어떤 이가 아무리 독실하게 기도하는 지와 상관없이, 어떤 누구도 독실함 속에서 단지 독실함 만을 발견할 수 있을 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Pierre de Villiers, Réflexions sur les défauts d'autrui, Amsterdam 1695, S. 144.
[38] “Faire servir la piété à son ambition, aller à son salut par le chemin de la fortune et des dignités; c'est du moins jusques à ce jour le plus bel effort de la dévotion du temps” (경건을 야심의 종으로 만들어라, 부귀영화의 길을 따라 구원에 이르러라, 적어도 오늘날에는 그것이 시간의 독실함 속에서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력이다) Jean de La Bruyère, Les caractères: De la mode Nr. 21, Œuvres complètes, éd. de la Pléiade, Paris 195 1, S. 398. 또한 인간의 덕과 진정한 덕 사이의 구별, 이 주제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춘 인공적으로 보이는 구별에 대해서는 Jacques Esprit, La Fausseté des Vertus Humaines, 2 Bde., Paris 1677/78.
[39] 17세기 격언이라는 문학 장르에서 이런 관념이 형식화 된다. 이에 대해서는 Madeleine de Scuderi, De la connoissance d'autruy et de soy-mesme, in Conversations sur divers sujets, Bd. 1, Lyon 1680, S. 65-135.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확장된 지식은 어떤 우애나 모든 상호적 평가를 파괴하면서, 사회적 담론에서 유지될 수 없는 우월성을 만들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회적 담론은 불투명성에 기반한 투명성을 필요로 한다.
[40] Jacques du Bosq, L'honneste femme, Neuaufl. Rouen 1639, S. 132 ff.에서는 난봉꾼은 숙녀에게서 우선 그들의 경건함을 빼앗고, 그리고는 나머지를 빼앗는다고 경고한다.
[41] Charles Duclos, Les confessions du Comte de ... (1741), Lausanne 1970 재출판, S. 77 ff.
[42] Nicolas d'Ailly, Sentimens et Maximes sur ce qui se passe dans la société civile, Paris 1697, S. 40 f.; de Villiers, a. a. 0. (1700), Bd. 2, S. 100 ff.
[43] 상세하게는 Jean Baptiste Morvan de Bellegarde, Réflexions sur le ridicule, et sur les moyens de l'éviter, 2. Aufl., Amsterdam 1701. 여기서 비웃음은 피할 수 있는 제재로 이해된다. Shaftesburysms dl 원리를 더 능동적이고 ‘증명의 방식으로서 비웃음’이라고 방법론적으로 만들었다. Anthony, Earl of Shaftesbury, An Essay on the Freedom of Wit and Humour, 1709,: Characteristicks of Men, Manners, Opinions, Times, 2. Aufl., o. 0. 1714, Bd. 1, S. 57-150 (S. 61에서 인용).
[44] 특히 Ernst Christian Trapp, Versuch einer Pädagogik, Berlin 1780, Leipzig 1913 재출판.
[45] Abbé Joannet, De la connaissance de l'homme dans son être et dans ses rapports, Paris 1775, Bd. I, S. 96 ff. bzw. S. XCVIII ff. 자아의 현실성(!)에 대한 추가에 있어서, 이런 사고의 대담한 본성(a. a. 0., S. XCVIII f.)을 인식한 Joannet은, “l'existence du Moi est susceptible de plus et de moins ... car on conçoit qu'elle a, si j'ose m'exprimer ainsi, d'autant plus de réalité que Je sentiment est plus agréable et plus pleine, la connaissance plus étendue et plus vraie, la volonté plus efficace et plus universellement satisfaite” (Me라는 존재는 더 감각적일 수도, 덜 감각적일 수도 있다. …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존재는 더욱 더 현실성을 가진다는 것을, 그 감정은 더욱 즐겁고 더욱 완벽해지고, 그 지식은 더욱 확장되고 진실될 수 있고, 그 의지는 더욱 유효하고 더 완전하게 만족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 몇 세기동안 감수성은 이미 증가의 매개로서 이해될 수 있었다. “Les âme sensibles ont plus d'existence que les autres: Les biens et les maux se multiplient à Ieurs égards” (감각적 영혼은 다른 이들보다 더 풍부하게 존재한다. 선과 악은 그것에 따라 증폭된다), Charles Duclos, Considérations sur les moeurs de ce siècle, a. a. 0., S. 235.라 썼다.
[46] Pierre-Louis Moreau de Maupertuis, Essai sur la formation de corps organisés, Berlin 1754 그리고 같은 해 George Sulzer, Versuch über die Glückseligkeit verständiger Wesen, Vermischte Philosophische Schriften, Bd. I, Leipzig 1773에서 인용, Hildesheim 1974 재출판, S. 323-347.
[47] “Les hommes sont, dit-on, pleins d'amour-propre, et attaché à leur intérêt. Partons de là. Ces dispositions n'ont par elles-mêmes rien de vicieux, elles devient bonnes ou mauvaises par les effets qu'elles produisent.” (인간은 자기-애로 가득 차고 자신의 이해에만 매달린다고 이야기된다. 그것을 잠시 치워두자. 그들 자신에게서 이런 배치에 대해 타락한 어떤 것도 없다. 그들은 그들이 생산한 효과에 의해 선하거나 악하게 된다.) (Charles Duclos, a. a. 0., S. 198).
[48] Duclos, Considérations, a. a. 0., S. 350 f.
[49] ‘Une espèce d'Aristocracie’, Sénac de Meilhan, Considérations sur l'esprit et les mceurs, London 1787, S. 312 f. 에서 의식적 무심함을 가지고 쓴다.
[50] Siehe Senac de Meilhan, a. a. 0., S. 317 ff.
[51] Sénac de Meilhan, a. a. 0., S. ·41.
[52] (세기초 이후 수고 형태로 알려진) Pierre Cuppé, Le ciel ouvert à tous les hommes, ou traité theélogique, 1768 J. J. (= Dom Nicolas Louis), Le ciel ouvert à tout l'univers, o. 0. 1782. 이런 제목의 형식은 종교적 포섭에 대한 관심의 완벽한 실례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섭하는 대신, 이제 사회화에 대한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
[53] Pascal을 따라서 Pierre de Villiers, Pensées et reflexions, a. a. 0., Bd. l, 1700, S, 204 f. 에서는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영원한 저주의 처벌에 대한 고려 없이 사는 광기라 쓰고 있다.
[54] 많은 예 중 하나는 Diderots ‘Supplément au voyage de Bougainville’, Œuvres, éd. de la Pléiade, Paris 1951, S. 993-1032. 초기의 인간학적 연구와의 결합에 대해서는 Eberhard Berg, Zwischen den Welten: Anthropologie der Aufklärung und das Werk Georg Forsters, Berlin 1982.
[55] Locke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영향력 잇는 전통 노선 중 하나는, 재산이란 이미 자연 상태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문명화 효과는 화폐 경제를 통해서 발생한다. 화폐 경제가 18세기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이 문제는 근본적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Locke에 의해 이뤄진 전통의 노선은 재산이 자연 법에 기반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 문제에 다른 관점을 취한 이들은 실정법 위에 재산을 다룰 필요가 있었다. 어떤 경우에건, 재산은 불평등과 연관되었고, 그래서 부정의와 연결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건 법은 스스로가 만들어 낸 부정의를 다뤄야만 한다.
[56] Simon-Nicolas-Henri Linguet, Théorie des loix civiles, ou Principes fondamentaux de Ja société, 2 Bde., London 1767, Bd. 1, S. 193.
[57] Linguet, a. a. 0., S. 187.
[58] “L'education vient étouffer la voix de Ja nature”,(교육은 자연의 목소리를 질식시킨다)라고 Linguet, a. a. 0., S. 184는 주장한다. Sade는 동일한 것을 훨씬 더 주장한다.
[59] Linguet, a. a. 0., S. 199.
[60] Mögen also die Menschen immer verschieden bleiben und untereinander in Rang, Titeln, Reichthümern, Kenntnissen, wirklichen Nutzleistungen, Religionsmeinungen u.s.w. bald vorgehen, bald nachstehen. Nur gegen die Gesellschaft, gegen den Staat, müssen sie alle gleich seyn und mit edlem Eifer auf diese Gleichheit halten” (인간 존재는 그들의 위치, 직책, 부, 지식, 진정한 능력, 종교적 의견 등등에 따라서 언제나 때로는 우월하고, 때로는 열등하게 다를 수 있다. 단지 사회, 국가와 관해서만 그들은 모두 동등하고, 고귀한 열정으로 이 평등을 추구해야만 한다.) Carl Friedrich Bahrdt, Rechte und Obliegenheiten der Regenten und Unterthanen in Beziehung auf Staat und Religion, Riga 1792, S. 37
[61] Boesnier de l'Orme, De l'esprit du gouvemement économique, Paris 1775, München 1980 재출판, S. 55.
[62] 이 논의는 Boesnier de l'Orme, a. a. 0.
[63] Michel Serres, Le parasite, Paris 1980.
[64] 회고적으로, 부르주아 사회의 전-혁명기 이론은 종종 잘 못 평가되고, 부르주아 사회 비판은 Hegel과 Marx의 발명처럼 보인다. 이런 버전은 또한 확실하게 낙관적인 ‘성장하는 계급’의 허구에 잘 맞아 떨어진다. 그렇지만 이런 회고적 맥락에서, 그것은 역사에 대한 강하게 단순화된 해석의 산물일 뿐이다.
[65] Claude François-Joseph Auxiron, Principes de tout gouvemement, ou examen des causes de la splendeur ou de la foiblesse de tout Êtat considere en lui-même, et indépendenment des mœurs, 2 Bde., Paris 1766, Bd. 2, S. 302.
[66] 이에 대해서는 Louis Dumont, Homo aequalis: Genèse et épanouissement de l'idéologie économique, Paris 1977
[67] 그렇지만 여기서 시작된 사유의 발전이 개인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지지하는 한에서, 순수하게 수동적인 이해는 더이상 충분하지 않다. 취향이 판단이 되면서 능동적이 된다.
[68] 이 전통은 Ovid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여기에는 특히 신학자에 대한 하나의 빛나는 그리고 유혹적인 자질이 존재한다. Jean Pierre Camus, Les Diversitez, Bd. 1, 2. Aufl., Paris 1612, S. 289 ff. (292)는 sorciere Nouveauté에 대해 말한다.
[69] Lodovico A. Muratori, Della perfetta poesia italiana (1706), Milane 1971에서 인용, Bd. 2, S. 104 ff. 일반적으로 Gracián (혹은 ‘Spanish’)이 원전으로 인용되지만, 그러나 이런 관념 자체는 훨씬 더 오래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François de Grenaille, La Mode ou Charactere de la Religion ..., Paris 1642, S. 5: “Si la durée fait subsister toutes les parties du monde la nouveauté les faict estimer” (만일 인내가 상류 사회[le monde]의 모든 부분을 유지해 준다면, 참신함은 그것에 가치를 제공한다)
[70] Jean Le Rond d'Alembert, Dialogue entre la poésie et la philosophie, in: Mélanges de littérature, d'histoire et de philosophie, Berlin 1753, Œuvres complètes, Bd. IV에서 인용. Genf 1967 재출판, S. 373-381 (379)
[71] A. a. 0., S. 150 f.
[72] Muratori, a. a. 0., S. 91 ff. 또한 Lodovico A. Muratori (Pseud. Lamindo Pritanio), Riflessioni sopra il buon gusto intorno le scienze e le arti, 1708.
[73] 더 이른 시기의 개념에 매달린 이들은 이것을 좋은 취향의 ‘타락’으로 그렸다. 이에 대해서는 Anne Lefebvre Dacier, Des causes de la corruption du goust, Paris 1714.
[74] 이런 17, 18세기 취향론의 표준적인 topos에서 나타나는 이전/이후의 연대기적 구조는(이에 대해서는 John Gilbert Cooper, Letters Concerning Taste, 3. Aufl. London 1757, S. 6 f.) 그 자체 상호의존성의 중단과 비대칭적인 순환성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다. 그리고 이미 이성이 직관을 승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의견을 물을 필요는 없다. (특히 상호작용의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의심의 목소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75] R. G. Saisselin, Taste in Eighteenth Century France: Critical Reflections on the Origins of Aesthetics, or Apology for Amateurs, Syracuse, N. Y. 1965, S. 64 f. “18세기 취향은 취향을 가진 사람으로 설명되었고, 취향의 정의는 예술적으로 해결되었다. 그것은 순환적 추론이지만 역사적으로 이것이 그런 경우다.”
[76] Réflexions critiques sur la poésie et sur la peinture, (1719), Paris 1733 확장판에서 인용.
[77] “Le coeur s'agite de lui-même et par un mouvement qui precede toute déliberation, quand l'objet qu'on lui présente est réellement un objet touchant” (마음은, 저절로 동요하고 현실에서 제시된 대상이 하나의 접촉한 대상일 때, 모든 숙고에 선행하는 하나의 운동을 통해 성장한다.) (a. a. 0., Bd. 2, S. 326).
[78] Dubos a. a. 0., Bd. 2, S. 13.
[79] 물론 이런 정식화는 어느 정도 과하게 명백해서, 수정을 필요로 한다. 비록 좋은 취향이 그 규칙을 알거나 명명할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취향과 나쁜 취향 사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Abbé de Bellegarde, Reflexions sur le ridicule et sur les moyens de l'éviter, 4. Aufl. Paris 1699, S. 160 ff. 에서 쓰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역시 “cinq ou six honnêtes gens, qui se connaissent en vrai merité” (서로 다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대, 여섯 명의 정직한 사람)에 매달릴 필요가 있다.
[80] Dubos a. a. 0., Bd. 2, S. 334 ff.
[81] 이런 관념의 발전에 대해서는 Alfred Baeumler, Das Irrationalitätsproblem in der Ästhetik und der Logik des 18. Jahrhunderts bis zur Kritik der Urteilskraft (1923), 2. Aufl., Tübingen 1967.
[82] 복합성〔unitas multiplex〕 문제에 대한 특별히 인상적인 해법을 제시한다는 주장을 통한 예술의 흥미로운 ‘상승’은 감정화를 향한 〔낭만적〕 경향과 독립해서 증명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Jean Pierre Crousaz, Traité du Beau, Amsterdam 1715, S. 12 ff.
[83] 이것이 미학 자체에 만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살펴볼 수는 없다. 어떤 경우건, 그 때 이후 예술작품이, 스스로를 재현한다는 사실 이외에 예술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왔다.
1 note
·
View note
Text
요하 지역과 한국인의 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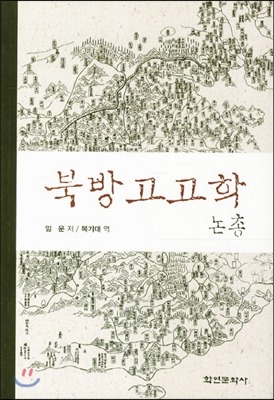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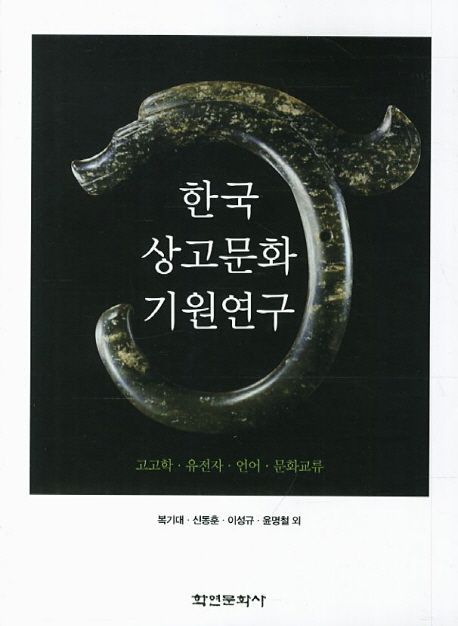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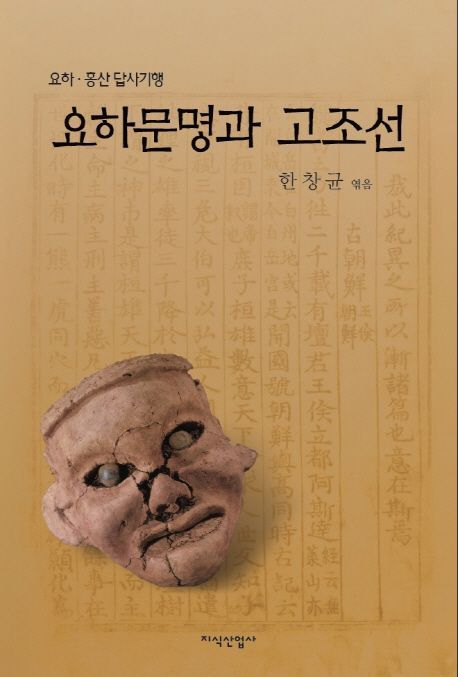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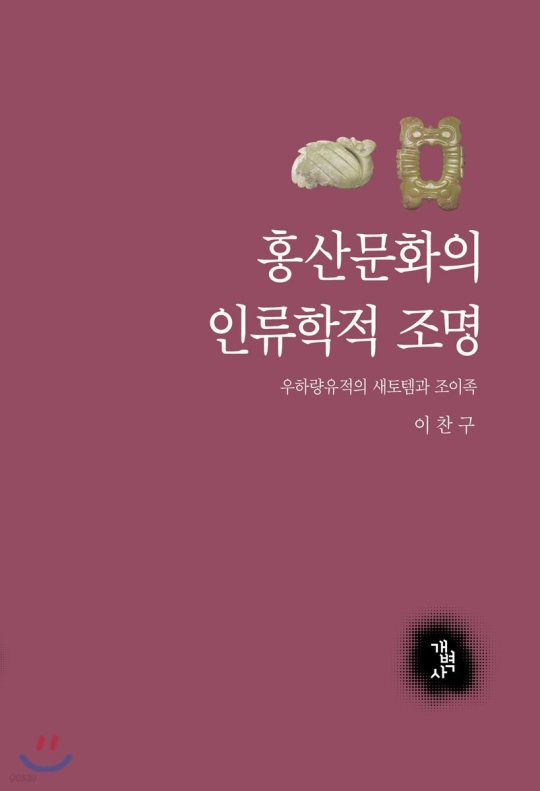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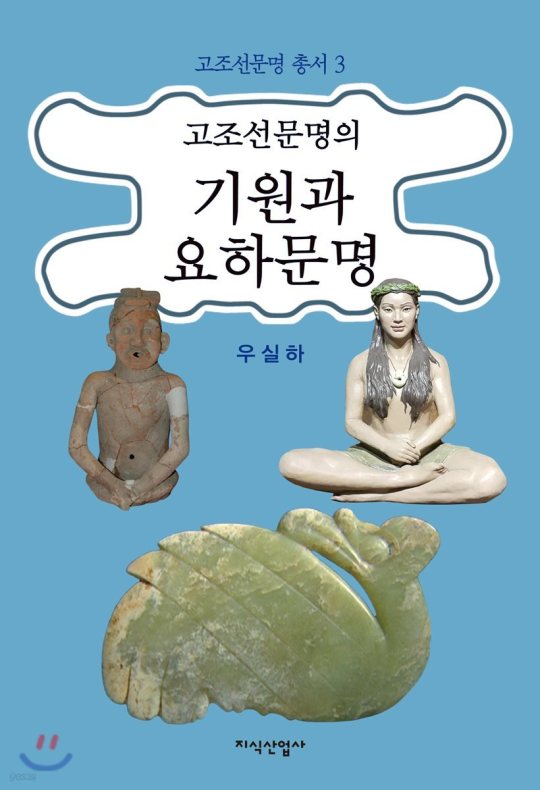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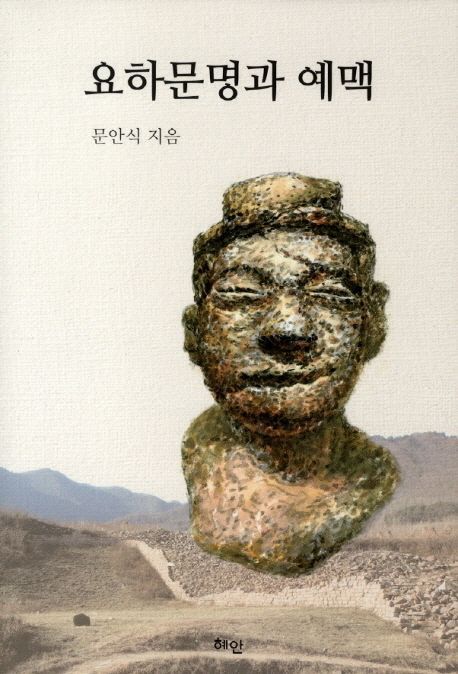

- 몇 년 사이 부쩍 많이 이야기되는 요하 지역의 역사 유적. 일단 기본 배경은 그 동안 중국 역사에서 ‘오랑캐’ 땅이라 불렸던 장성 너머 북쪽에서, 정작 중국 황하 문명보다 앞선 문화적 유적지들이 발견된 것. 기원전 4000~3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신석기 문화인 홍산문화를 전후 해서 신락 하층 (B.C. 5300~4800), 홍륭와 문화 (B.C.5500~4800), 조보구 문화 (B.C.4500~4000), 부하 문화 (B.C.3300~2700), 소하연 문화 (B.C.3000~2000) 등과, 이후 청동기의 하가점 하층 문화 (B.C 2100~1500), 위영자 문화 (B.C. 1400~1000), 하가점 상층 문화 (B.C. 1100~600), 십이대영자 문화 (B.C. 900~400)까지. 이 중 ‘홍산 문화’의 경우 옥으로 만든 ‘용’과 묻혀 있는 ‘여신상’의 모습이 발견되면서, 용을 숭배하는 중국 역사의 뿌리가 이곳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등장.
- 이런 발견과 함께 ‘다민족 통일국가’라는 중국의 정체성을 구축하려 하는 중국 사학계는 이 발견을 중국 역사에 통합해서 해석하려는 시도를 전개. 이전까지 오랑캐라 불리던 이 영역을 갑자기 3황5제 중 황제의 자손이 다스리던 땅으로 규정하고, 이 오랑캐들이 결국 중국을 구성하는 민족이자 문화의 일부로 해석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역사 속에서 요하 지역에 등장하는 모든 문화와 역사가 중국사의 일부가 되는 황당한 일이. 그러다 보니 이제 부여, 고구려 등도 중국 변경사가 되는 일이. 민족주의적 통일성을 강조해야만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관변 학자들이 어떤 접근을 할 지 예상 가능하다.
- 이런 사실과 중국의 관변 학자들의 대응이 증폭되면서 국내에도 특이한 자장이 벌어지는데, 당연한 몇 가지 사실들 1) 요하 지역은 이후 고조선/부여와 삼국 시대로 이어지는 우리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지역 2) 특히 요하 지역 중 요동의 경우 고조선과 부여의 국가 형성의 기원이 되는 지역이라는 점 등에서 다양한 논의 등이 등장한다.
- 우선 이렇게 우리와 ‘연관이 있는’ 지역이니까 우리도 이 지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 『북방고고학 논총』, 임운 저, 복기대 역, (학연문화사, 2013), 『한국과 중국문명의 기원 홍산 문화의 이해』, 복기대, (우리역사연구재단, 2019), 『한국 상고문화 기원연구-고고학, 유전자, 언어, 문화교류』, 복기대, 신동훈, 이성규, 윤명철 외, (학연문화사, 2013) 등은 복기대가 수학한 중국 학자 임운의 저작과 이후 복기대가 참여한 책들. 요하 문명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에 대한 기초 자료들. 이 중 임운의 책 같은 경우 요동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유적들이 ‘예맥’ 계통의 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내용 정도가 특기할 것.
- 그리고 점점 이상해지는 논의들. 『요하문명과 고조선』, 한창균 엮음, (지식산업사, 2015), 『홍산문화의 인류학적 조명 - 우하량유적의 새토템과 조이족』, 이찬구, (개벽사, 2018), 『동북공정 너머 요하문명론』, 우실하, (소나무, 2014), 『고조선문명의 기원과 요하문명』, 우실하, (지식산업사, 2018). 우선 한창균의 책은 요하 문명의 다양한 발굴 성과에 따라 이후 고조선/부여 등의 국가 건설 과정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점에서 뭐 딱히 틀린 말은 아니라 본다. 그런데 실린 논문들 중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 요하 문명이 고조선의 직접적 기원으로 설명하는 글들도 있다. ‘연관이 있다’, ‘교류가 있다’는 이야기와 ‘여기가 거기다’라는 이야기에는 꽤나 거리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어진다. 가장 심각한 건 이찬구나 우실하의 책들. 이들은 요하 문명의 주역이 예맥족이라 이야기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중국보다 더 앞선 요하 문명을 예맥족이 건설하였고, 이 예맥족이 다양하게 분화해 나갔다는 일종의 ‘범 요하문명 민족주의’를 구축하는데, 이는 세계 각지에 등장하는 파시즘의 논리와 비슷해서 흥미 있다.
- 하지만 사실 이런 주장은 기본적 사실조차 맞지 않는데, 요하문명이라고 묶지만, 세계 많은 교역 통로 지역이 그렇듯, 이런 지역은 중심 세력이 끝없이 교체한다. 게다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부족 사회의 안정성이 떨어지니 꽤나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 집단이 국가로 성장하지 않고, 해당 지역을 떠나 사라져버리는 사례가 많다. 이런 관점에서 요하 문명을 하나의 민족에 의한 안정적 성장, 발전의 역사로 보는 것 자체가 황당한 접근이다. 게다가 이런 교류 지역에서는 인근 지역에 문화적 유사성이 발견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오히려 그런 유사성 속에서도 발견되는 차이가 이들의 정체성 이해에 더욱 중요할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대부분 신화학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신화학이 문화적 원형성을 통해 단순한 수준의 사유에서 발견되는 공통점, 그리고 이런 공통성의 분화 과정에서 발견되는 지역적, 사회적 차이를 검토하는 것이라면, 이들이 사용하는 신화학은 공통성의 흔적을 찾고, 공통성이 있다면 그것으로 모두가 같은 민족이라는 식의 황당한 결론으로 이어진다. 즉 통일과 차이에 대한 시간적 이해가 적절하지 못하고, 확장이라는 방향 위에서 작동할 뿐이다. 하긴 19세기말 20세기초에 등장한 많은 신화학자들이 파시스트가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아주 낯 선 일도 아닌 듯. 게다가 일베와 메갈이 서로 혐오를 증폭시켰듯, 이들이 자신의 황당한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하는 중국 역사학, 특히 동북 공정에 대한 문제는, 학술적으로 그 황당함을 지적 해야지, 동일한 민족주의적 견강부회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인데.
-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나름 재미있는 책도 있다. 그게 발견의 즐거움이겠지만. 『요하문명과 예맥』, 문안식, (혜안, 2012), 『요하유역의 청동기문화와 고조선』, 백종오, (지식산업사, 2018) 등인데, 우선 문안식은 요하문명에 등장한 다양한 문화적 교류 속에서 선진 문헌에 등장한 숙신에 주목하고 숙신에 원고조선 민족이라 해석한다. 그리고 오히려 책 대부분의 내용은 예와 맥족이 각기 부여, 옥저, 동예, 고구려, 백제, 신라로 분화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백종오 역시 요하문명의 주도 세력의 지속적 교체를 살펴보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국가들의 확장 형성과 확장 과정이 어떻게 요하 문명에 거주하던 선주민들의 이동과 국가 형성에 기여하게 되었는가를 검토한다.
1 note
·
View note
Text
개인, 개인성, 개인주의 (1/4)
Gesellschaftsstruktur und Semantik, Band 3. Niklas Luhmann
번역 – 조은하, 박상우
Ⅰ.
시작부터 사회학은 ‘개인(the individual)’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심리학과, 특히 생물학과 경계를 그어야 할 필요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은 ‘개인’에 대한 시선을 놓지 않았다. ‘개인’은 언제나, 실증적 사회 연구의 변수 혹은 단위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비록 이 연구가 개인으로부터 개인화된 데이터보다는 집계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사회학의 역사는, 개인주의(자유주의)와 집합주의(사회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논쟁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 논쟁은 ‘개인’과 사회라는 주제에 대한 새로운 학문을 제시했다. 사회학은 이데올로기적이 그리고 정치적으로 양 쪽 모두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과학이 될 수 있었다. 만일 이 논쟁에서 단지 어느 한편에 드는 것을 피하기 바란다면, 개인과 사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 혹은 사회적 집합에 편을 드는 가능한 방식은 이미 할당되었다. 이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혹은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면, 그러면 적어도 19세기 후반에는 새로운 것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만 했다.
이런 상황 상태는, 심지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기에서 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성취들에 박차를 가했다. 사회학의 탄생부터 이 이론들에 빚을 지고 있으며, 창시자들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정비되어 튀어나왔으며, 그 때 이래로 탄생부터 사회학을 구성하는 텍스트와 함께 담겨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과장은 아니다. 이 이론은, 어느 한 편을 선택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무지한 것으로 그려낼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관리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그 반대편이었고, 이런 방식으로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사이의 적대는 논쟁의 주제로 남아 있다. ‘두가지 사회학’은 이론이 아니라 논쟁의 결과로 존재한다. 어떤 정교한 사회학적 이론도 개인과 사회 사이의 ‘적대성’을, ‘개인’ 그리고 사회에 양 쪽에 대해 조건 혹은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이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생산적인 의견 차이는 이것이 일어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그렇지만 성공은 더 나은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을 제공하고 잘못된 편향성을 회피하면서 문제들을 정식화 될 수 있는 방식이 장기에 걸쳐 생산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아무리 간략화 되고 단순화된 형식이라도 적어도 고전적인 이론적 접근을 제시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 만이, 이 문제를 제시하는 데 있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어떤 규정인지를 체크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사적 이해와 공통의 이해를 가로질러 배분되는 불변의 양을 적용함으로써, 제로-섬 게임의 생각과 단절할 수 있다. 특히 Durkheim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양 쪽 편 모두 증가가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 야심 찬 집합적 목적, 강한 국가, 그리고 더 커진 개인적 자유는 확실히 결합될 수 있다. 문제는 단지 이런 증가를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있었다.[1] 그래서 초기 사회학의 이론적 관심은 이런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사회학적 개념으로 정식화 하려 했으며,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경제학의 자동성을 거부했다. 중농주의적 가치론[2]에 의해 이뤄진 비판으로부터 발전된 노동 분업에 대한 생각은 역할 차이화의 개념으로 먼저 대치되었고, 이후 시스템 차이화의 개념으로 대치되었다. 증가된 차이화는 그래서 사회학 이론의 중심적 명제, 근대사회의 그 특성화가 되었다. 어떤 이전 사회보다도, 이 사회가 더 큰 개인성(individuality)을 약속하고 만들 수 있는 이유를 이것이 설명한다.
이 이론의 사회학적 내용은, 그 논의가 분배론(계급론에 기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상의 것에 의존한다는 사실에서 자명하다. 분배 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단순히 더 커진 생산력이 아니다.[3] 그 보다는, 증가하는 차이화의 진화적 과정을 통해 개인의 개인성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개인주의의 ‘제도화’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사회 자체다. 사회는 단순히 재화를 배분하는 하나의 파티가 아니다. 그것은 개인과 사회 사이에 차이를 발생하고, 이에 대응하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이데올로기를 발생하고, 그래서 무엇보다 ‘연대’의 필요성을 발생한다. 그래서 조응하는 도덕성의 도움을 통해 충족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이론적 디자인 안에서, 사회는 스스로 안에서 재등장한다. 그것은 ‘개인’과 구별된 것으로 자신을 발생한다. 사회는 작동 수준에서 사회와 개인 사이에 구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신에 대한 기술을 자신 안에서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이 이론을 완성하는 병렬적인 틀은, 문화와 사회화가 논의 형성의 목적으로 함께 짝이 될 때 발견될 수 있다. 역시 여기서 관심 거리는 어떻게 개인에 기반한 사회 질서가 가능하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다. 이는 또한 그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할 능력을 포함한다. 그리고 여기서 역시 사회학적 접근이, 정치 그리고/혹은 경제를 고려에 넣는 전통적인 정치-경제적 접근들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다. 대답은 이렇다. 사회적 질서는 문화에 몰입함으로써 개인을 사회화 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이론적 프로그램은 폭이 넓고 탄력적이다. 그것은 정치와 경제를 포함할 수 있고, 이들은 자신들을 문화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다. 더욱이 그 프로그램은 진화적 변화와 일탈적 현상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화가 결코 완전하게 성공하지 않아도, 일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이론 부분이 스스로 자기-관찰 혹은 자기-기술의 문제와 맞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회화된 개인은 사회의 요구와 자신들을 구별하도록 배운다. 그들은 ‘I’와 ‘me’로,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으로 이중화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신들과 커뮤니케이션하도록, 그들 자신의 상상적 삶의 파편화된, 불규칙한 발전에서는 처음에 거기 없었던 총체(a wholeness)가 되야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Simmel과 Mead는 이런 이론적 전통을 세우는 정식을 제공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어떤 초월적 이론 혹은 의식의 심리적 분석에 매달리는 시도를 막았다.
Parsons가 The Social system[4]에서 이 이론적 구성물에 규정적 정식을 제시한 이후 그다지 많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고전들이 더 잘 알려졌고, 전보다 더 자주 논의되었다. 그러나 The Social system은 최종 진술이었고, Parsons 자신도 이후의 이론적 발전을 고려해서 책을 수정하지는 않았다. 너무 나아갔고, 너무 좋았다. 이 고전 이론의 성공은 그렇지만 또한 어떤 가정을 더 상세하게 탐구하는 것을 막았고, 이는 이론 발전에서 현재의 정체에 대한 이유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검토는 ‘대안적 주장’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단지 사회학적 고전의 사회학이 이전에 논의되었던 사고에 대해 매우 선택적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과도하게 일반화된 개념이라 생각된다. 첫째 (증가하는) 차이화의 개념과 관련해서, 둘째는 개인의 개인성(의 강화 가능성)에 관련해서. 만일 이 양 자에 관련해서 더 깊은 영역을 필요로 한다면, 양 자 사이의 고전적 연관은 훨씬 더 복잡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근대 사회가 ‘진보적’이라 찬양하는 것 중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도입적 반성은 이중적 의미에서 개인, 개인성, 개인주의의 역사적 시맨틱에 대한 문제를 위한 기반을 놓고 있다. 한가지 면에서, 고전 사회학의 등장과 함께 이미 획득되고 사회와 사회가 개인에 대해 맺는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찰은 한 쪽으로 치워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이론이 발전하는 것은 선택을 하도록 하는 제약과 함께 이뤄지고, 유지될 가치가 있는 것이 배제될 수도 있다. 아마도 이것이, ‘주체’ 개념이 계속 다시 등장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첫번째 문제는, 고전적 사회학이 기대했던 것보다 관념의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더 많은 무언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두번째 문제는 이미 얻어진 통찰과 연결되어 있다. 만일 사회가 개인의 개인성만이 아니라, 사회가 사회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는데 사용하는 시맨틱을 생산한다고 가정한다면, 역사적 분석은 이런 관점에서도 좋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사회로 개인과 상관하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가? 이런 목적으로 발전된 시맨틱에서 두 가지 형식 사이의 연결이 증가한다는 가정을 추론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 고전적 사회학은, 자신의 주제 영역에서, 동시에 그 자신의 사유에 재료를 제공하는 시맨틱으로 재등장할 수 있는가? 만일 사회 구조와 시맨틱 사이의 이런 연관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고전적 사회학의 기본적 이론들에 대해 동시에 검증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진화가 사실 사회 구조를 변화하는 수준까지 개인성의 시맨틱을 생산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그것들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가정 또한 스스로를 언급하고 그에 따라 정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연함으로써, 그것들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Ⅱ.
고전 사회학에서, 사회적 차이화의 상대적으로 일반적 개념은 ‘개인’의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개념에 조응 한다.[5] 점차 증가하는 조응에 어떤 편도 상세하게 한정되지 않고, 이론의 적확성에 기여하는 것은 정확히 이런 부정확함이다. 나머지에 대해서, 이론은 고대 사회와 근대 사회 사이의 역사적 대립으로부터, 그리고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원자론과 전체로, 공리주의와 역사주의 사이의 차이를 극복했다는 주장에서 생명력을 끌어온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의 후퇴와 더 많은 문제에 불을 붙이는 ‘근대 사회’의 증후군에서 발생하는 사회에서의 변동과 함께 상황은 변한다. 이제는 차이화와 개인성 사이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의 미래와 가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둘에 의해 의미하는 것을 더욱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첫번째 검토로, 사회학이 ‘개인’의 개인성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명백하다. 개인성의 증가 가설은 이런 문제제기를 가로막는 것은 아닐까? ‘개인’의 개인성을 (그것이 정신적 능력, 역량, 인지적 복잡성, 발달 성취 등등을 의미할 수 없는데) 어떻게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혹은 오늘날 정체성 어휘를 사용하자면, 어떻게 어떤 개인이 타인보다 더 많은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상상할 수 있을까?
“‘개인’의 밖에서” 준거점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반대가 제기되어 왔던 사회적 차이화 개념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다른 곳[6]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차이화의 다른 형식이 아니라 시스템 차이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이다. 더욱이, 증가하는 차이화라는 개념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차이화의 일차적 형식에서의 변화 즉 성층적 차이화에서 기능적 차이화로의 이행 안에서 근대를 향한 결정적 운동을 보았다. 그래서 차이화의 형식에 기반해서, 그것은 사회적 시스템과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양 자에 더 큰 복잡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차이화의 형식만이, 진보의 단선적 과정에서는 쉽게 실현될 수 없는 복잡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은 강조된 채 남아 있다. 높은 수준의 복잡성이 성취되고 유지될 수 있는지(혹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기능적 차이화가 가치가 있지 않다는 것을 밝힐지)는 다양한 더 많은 조건들에 의존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은, 대응하는 복잡한 배치를 안정화하기 위한 이런 추가적 조건들과 함께 구조적 그리고 의미적 실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일반적 맥락에서, 인간의 개인성 이해의 의미적 전환에 대한 구조적 이해는 흥미 있다. 인류학적 그리고 역사적 연구를 간단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증가하는 개인화’의 사회적 실체에는 의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등장할 수 있었는지 묻게 된다. 가장 단순한 사회에서도, 사회에 속하는 한 모든 특이점과 함께 누구라도 수용하면서, 높은 수준까지 개인에 향해 있다.[7] 이는 규범적 지향에서의 약점에, 그리고 아마도 또한 규칙과 행위 사이의 구별 부족에 조응 한다. 이름, 알려짐, 권리와 의무,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포섭에 의해 제공되는 이익과 보상의 맥락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에 의해 사회적 포섭을 통해 개인성이 구성된다. 낯선 이는 적합한 방식으로 다뤄질 수 있지만, 개인성을 소유할 수는 없다. 다른 한 편, 특히 마녀와 마법사가 만연할 때 어떤 종류의 과잉 속성이 기대될 수 있는 것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경험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전달하는 것에 의해서다.[8] 더 복잡한 사회적 조건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복잡한 소유권과 재산의 조건은, 자기-훈련으로 보충되는 증가된 개인적 특성의 사회적 표현을 야기한다. 훈련된 개인성은 말하자면, 농업의 결과다. 그렇지만 개인화의 원리는 포섭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가 성층화 될 때 유지되고 더욱 본질적이 된다. 성층화 된 사회에서 누군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것은 오직 누군가의 사회적 위치, 카스트 혹은 지위에 대한 할당이다. 더욱이 성층화는 언제나 상위 위치에 대한 접근의 제한에 기반한다. 새로운 복잡성의 구성은 존재하는 복잡성이 감축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분절된 사회에서 성층화 한 사회로의 이행과 그 이후 모두, 새로운 복잡성의 구축은, 개인성의 여전히 포섭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있어 우발성으로 남아 있다.[9] 그래서 포섭을 조절하는 가족과 가계의 사회적 기능은 줄지 않는 채 남아 있다. 성층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선택된 개인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 보다 그것은 전체 가족과 가계를 그 과정에서 개인적 사람을 사회로 통합한다. 이런 방식으로, 마치 이런 방식만이 개인을 배치하고, 즉 사람들에게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성층화는 이전 사회의 분절적 질서를 단일한 성층 안에 유지한다.[10] 그것들이 자연적 창조물로 간주되지 않는 한, 사회적 조건은 도덕적 용어로 이해된다. 이는 비판이 스스로를 모든 층위에서 악에 대한 도덕적 판단으로 표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11] 그래서 각 개인은 사회의 유일한 하위 시스템에 속한다. (특히 이런 사회의 높은 인구적 불안정성이 주어질 때, 그것은 결코 이동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육체와 영혼, 이 세계의 삶과 그 이후의 삶 사이의 구별이, 도덕성과 확증을 제공하면서 이런 사회 층위로의 할당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사회의 자기-기술은 위계를 질서를 위한 조건, 자연적 필연성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스스로 행동하는 방식에 의해 나타나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사회적 의무와 손상의 관점에서 모든 계급에 대한 초기의 도덕적 비판을 담고 있다.
Norbert Elias[12]는 이런 사회적 질서의 최종 국면을 관찰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길을 타오르게 했다고 믿었던 것은 아마도 더 이전의 원리의 적대 혹은 퇴화뿐일 것이다. 대안의 증가에 맞서기 위해 사회적 압력은 내면화하고, 그래서 제거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만일 문제가 패러독스로 정의될 수 있다면) 그렇지만 이는 단지 사회가 이미 이전의 질서를 뒤에 남겨두고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능적 시스템 차이화로의 이행은 전제를 질서화 하는 방법을 바꾼다. 사실 그것은 전제들을 뒤집는다. 정상으로 나타나곤 했던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개인적 사람으로, 그들은 더 이상 사회의 유일한 하위 시스템에 종속될 수 없다. 그들은 경제 시스템, 법적 시스템, 정치, 교육 시스템 등등에서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위치가 그들의 전문적 경력을 따르는 방식에서 전문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하나의 기능 시스템에서만 살 수는 없다. 그렇지만 사회가 내면화된 시스템/환경 관계의 총체에 다름아니고 전체로서 스스로 안에서 재-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개인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개인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사회 밖에서만 살 수 있고, 사회의 환경 안에서,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는 환경으로서 사회와 함께 그 자신이 한 종류의 시스템으로서 스스로를 재생산할 수 있을 뿐이다. 더 이상 포섭을 통해서 개인을 정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들은 오로지 배제를 통해서만 정의될 수 있다. 이것이 ‘개인과 사회’의 새로운 (포스트 자연주의 법칙) 드라마에 대한 구조적 이유다. 시맨틱에서 이는 ‘개인’이 더 이상 기지(旣知)가 아니라 (자생적, 가변적, 블랙 박스 등등으로) 미지(未知)라는 사실에 의해 표현된다. ‘개인’을 하나의 가치로서 이데올로기로 재-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확하게 사회 시스템에서의 배제다. 단지 이 순간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은 개인과 사회 사이의 차이를 돌아서 스스로를 향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다. 그리고 역으로 어떤 실제의 개인도 이 차이에 의해 다뤄진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그리는데,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역사관을 생산하는 방식을 드러내는데 하나의 인용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Adam Ferguson은 직업과 전문 직업에 따라 차이화 된 노동을 가지고, 근대, 문명화 한 사회와 마주한 한 명의 비문명인을 상상한다. 그 비문명인은 “자신의 재능, 성차, 인종 이외의 구별은 알 지 못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는 그에게는 애정의 최고 대상인데, 그는 이 문명화된 사회라는 자연의 경관에서는, 남자라는 것이 그에게 어떤 근거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당황하게 된다. 그는 놀람, 불편함, 혐오감을 가지고 숲 속으로 도망가 버린다.”[13] 포섭은 하나의 문제가 된다. 인식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언제나 문제였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인간 존재도, 순수하게 한 명의 인간 존재로 사회의 멤버였었던 점이다. 이에 대한 갈망은 특히나 근대적 현상이다. 동시에 근대 개인주의는, 사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이 누군가를 개인으로 만드는 것이지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일찍 발생할 수는 없었다는 진실을 방해하다.
누군가가 더 이상 그 자신의 개인성을 사회적 포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은 시스템 이론적 진술이다. 그것은 인과적 의존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아마도 단독의 개인에 대한 더 많은 더 많은 대안과 선택을 가지고, 그러나 또한 개인이 의존하는 방식에서 더 큰 증가와 함께, 인간 존재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유지되고, 이는 그 이전 시대가 아니라 바로 근대 사회의 경우다. 개인성의 시맨틱은 이제 더 큰 의존성에 대한 보상 기능을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개인’은, 일종의 실증-인과적 의존성에 의해 문제로 호명되는 하나의 기술로서 주체성과 고유성으로 탈출할 수 있다. 이런 의존성의 연쇄가 지닌 더 큰 양과 더 큰 복잡성이 주어진다면, ‘개인’은 이전보다 더 급진적 의미의 개인이다.
개인들에 대한 사회의 관계가 포섭 기반에서 배제 기반의 개인성으로 옮겨지는 반면, 정확히 반대되는 원리가 사회적 시스템의 시스템 차이화에 적용되고, 연결은 정의하기 쉽다. 더 오래전 사회는 포섭을 통해서 개인성을 수립하기 때문에 배제를 통한 내적 차이화를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14] 한 사람이 하나의 가족에 속한다면, 그들은 동시에 다른 가족에 속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하자면 괴물 같은 혹은 혼종의 개인성을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만일 개인성이 근대 사회처럼 출발부터 초사회적 권리로 인식된다면, 사회적 시스템의 차이화는 개인들을 (유권자로서, 환자로서, 독자로서, 예술 관람자로서 등등) 포함하는 사회적 형식들에 기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문제는 이미 개인화된 개인들의 참여에 있다. 만일 두려운 소외가 원리로 되지 않는다면, 참여자에 대한 상이한 제안들이, 기능 영역에 의존해서 이에 대해 발전할 필요가 있다.
만일 시스템 분석이 사정들에 이런 새로운 상태와 개념적으로 연결되었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대 사회의 자기-기술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자신의 자율적인, 자기-언급적 시스템으로 생물학적 삶과 의식의 형식 안에서 개별 사람이 재생산하는 것을 다룰 수 있을 필요가 있다. 현재 이런 영역에서 가장 발전된 이론은 오토포이에틱 시스템 이론이다.[15] 이 이론은, 시스템 요소들의 배열 수단을 통한 시스템의 자기-재생산(오토포이에시스)과 이런 배열이 발생하는 구조 사이의 구별을 이끌게 된다. 이는 존재에 대한 언급과 증가 능력에 대한 언급을 분리할 수 있게 해준다. 오토포이에시스는 그 자체로 시스템의 닫힌 (순환적) 재생산이다. 그것은 발생할 수도 멈출 수도 있다. 다른 한 편 구조는 이 과정의 복잡성에서 증가를 그래서 잠재적으로 이 과정이 가능한 환경적 조건의 범위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오토포이에시스는 순환적 자기-재생산의 닫힘으로 시스템의 개인성을 정의한다. 구조적 발전은, 이런 자기-재생산이 가능한 혹은 진화적 개념 안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조건을 확장할 수 있다. 고전적 사회학 특히 사회화 가능한 개인 개념과 비교한다면, 이 이론에서 출발점은 근본적으로 이동했다. ‘개인’으로 이전에 언급되던 무언가의 통일체는 이제 오토포이에시스와 구조 사이의 차이에 의해 대체된다. 그래서 상호 침투 개념의 의미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포섭과 사회화의 의미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Parsons가 개인과 사회의 매개화에 대한 학설의 관심을 정식화하기 위해서 고전적 사회학의 후기 단계에서 사용했던 개념들.
오토포이에시스 개념을 기초로 사용한다면, 상호 침투는, 상호 침투되는 시스템의 요소가 부분적으로 동일하거나 혹은 다른 말로 시스템들이 요소 수준에서 교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자기-언급적 재생산의 닫힌 자율성 이론과 모순될 것이다. 대신에 한 시스템의 구조적 복잡성이 다른 시스템의 구조적 복잡성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면 언제라도 상호침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16] 이런 이해에서는, 상호침투 개념은 공-진화(co-evolution)를 언급한다.
이런 개념화에 따르면 포섭은, 의식의 기반 위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심적 시스템이 사회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자신의 복잡성을 가능하게 할 때 언제나 나타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심적 시스템은 사회적 시스템의 부분이 (심지어 조금이라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심적 시스템은 커뮤니케이션이 이해될 (즉 의도된 의미에 관계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귀속시킬 가능성을 성립한다. 이것이 가능할 때만이, 이중 우발성과 관련한 문제로 경험되는 상황들이 등장하고, 이것이 발생할 때만이 사회 시스템이 등장한다. 심적 시스템은 환경으로서 사회 시스템의 구성에 참여한다. 그들은 사회 시스템의 등장을 위한 조건이다. 그러나 그들의 오토포이에시스가 그 자신의 의식-기반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정확히 이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회 시스템도 포섭 없이 존재하게 될 수 없다. 그렇지만 그것의 부분에 있어 사회적 시스템의 진화는 어떻게 포섭이 가능한지를 규제한다.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성층적 차이화에서 기능적 차이화로의 이행은 포섭에 대한 조건에서 변화를 이끌고, 개인성의 시맨틱은 이 변화를 추적하고 기술하는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사회화는 반대의 경우를 구성한다. 그것은 사실 커뮤니케이션의 기초 위에서 작동하는 오토포이에틱 사회 시스템(사회)이 자신의 복잡성을 심적 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 시스템, 사회는 심적 시스템 안에 영토 혹은 특별한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히 행동에 대한 언어와 의미 있는 목적의 매개를 통해, 기한이 있는 에피소드들을 거쳐 의식 과정을 구조화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문장, 연속적인 말, 연결을 통한 언어적 사고, 그리고 행동의 연쇄, 그것의 종료가 의식의 종료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콘텐츠로 오토포이에시스의 어느 정도 불규칙한 이행을 지시한다.[17] 단지 이런 의미의 의식의 집행 과정이 사회화될 때, 각자의 인식은 의식의 지루하고 단호한 상태를 넘어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사회 모델에 기반한 인식 가능한 구조들을 통해서만, 심적 시스템은 그들 자신의 복잡성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기회들은, 심적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감소하기 보다는 증가하기 쉽다. 왜냐하면 그러면 부정조차도 여전히 질서와 연결 가능성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층적 차이화에서 기능적 차이화로의 이행은 한 편으로는 사회화의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그리고 18세기부터 이후까지 사실상 사회 모두를 의식적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다. 다른 한 편, 증가는 일탈적 사회화의 가능성과 문화적 유산의 단절 안에서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 문화는 참신함에 우위를 둔다. 어쨌건 새로운 것은 일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는 누군가의 행동안에서 일탈하는 것을 막는다. 17세기 이후, “패션” 개념이 있었고, 그것은 사회화에 중요한 압력을 행사한다. 18세기가 시작할 때, 새로운 사고의 독창적 발견에 대한 찬미, 문화적 유산에서 빛나는 변형에 대한 찬사가 유행했다. 자연법에서 실정법으로의 이행은, 계약적 배치 안에서 더 큰 자유와 범위를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우선 여기서 이뤄진 개념적 결정들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용어와 개념들의 사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계속 나아가 Parsons로부터 벗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통을 계속하고자 하지만)[18] 포섭과 사회화는 엄격한 관계 안에 있다. 그렇지만 각자는 서로의 조건이고, 이것이 반드시 ‘사회적 통합’ 경향의 가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이 관계는 그 자체 진화적 변화에 종속되고, 진화는 사회와 심적 시스템 모두에게 차이화를 증가하는 경향이다. 그래서 사회화는 포섭의 결과이고, 역으로 포섭은 사회화의 결과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회적 규준에 대한 반쯤 기계적인, ‘내부화된’ 적합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언급적 취급, 언제나 먼저 오토포이에시스의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 자기 자신의 행동 선택을 지배하는 조건으로 사회적 조건 규정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19] 사회화는 포섭을 가능하게 하고, 포섭은 다시금 개인적 사람들이 스스로(!)를 사회화하는 사회 시스템과 마주한다.
포섭과 같이, 사회화는 증가로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이 증가는 더욱 잘 유지되고 덜 이탈하는 행동의 선택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토포이에시스에 대한 구조적 조건이 더 많은 심적, 사회적 복잡성을 취하고, 모든 구조와 모든 요소들의 우발성이 이에 따라 더 커지는 곳에서, 이뤄진 선택이 심적 시스템의 더 많은 조건, 사회적 시스템의 더 많은 조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그것들이 그렇게 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커진다.
Ⅲ.
이제 우리의 중심 주제 그리고 추가적 요소로서 사회 시스템의 차이화 형식에 대한 설명을 통해 역사적 분석에 도달했다. 그래서 성층적 차이화에서 기능적 차이화로의 변환과 포섭/사회화 관계에서의 증가된 복잡성 사이의 연결에 대해 탐구한다. 우리의 주된 가설은, 사실상 개인성은 포섭에서 배제로 이동했지만, 이런 재구성의 결과가 개인을 더욱 개인적으로 인식하고, 다루고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대체로 유럽의 중세는 다른 지위에 기반한 성층화 한 사회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가족, 가계, 귀족 지배 그리고 후원에 따른 단편화 된 차이화는 생존하고 있었고, 특히 귀족이 지방에 살 때 더했다.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농업 사회’의 일반적 이미지에 조응하는 지는 논쟁거리다.[20] 그럴지도 모르지만 가족 밖의 삶은 거의 상상할 수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불행하고 위험하고 짧은 삶이 될 것이다.
문자대로 그리고 은유적으로도 가족 왕국은 개인성이 발전하기 위한 공간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근접성/거리, 강한 그리고 덜 강한 연대의 도식은, 누군가에게 주어진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기대와 야망을 발전시킬 어떤 자극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성층화 한 사회의 구조는 단지 작은 변화만을 이끌었다. 개인은 가족을 통해 ‘위치’가 정해진다. 그들의 ‘입장’, 그들의 ‘특질’, 그들의 ‘조건’은 이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 사이의 구별 조차도 어떤 개인적 야심을 위한 방아쇠로 역할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지위에 적합한 삶의 형태에 대한 요청은 주어진 질서에 따라 분류된, 비개인화된 정당성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다는 의미에서 개인성, 개인적 특성이 획득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다. 신분제적 교육에 대한 이론들은 이런 요구조건을 구성한다. 독립된, 계획된 교육적 목적에서 출발하는 대신, 이런 이론들은, 특히 주의가 부족하고 쉽게 산만해지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혹과 타락에 맞서 단순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는 완전함을 향한 자연적 운동을 가정한다.[21] 포섭과 사회화는 그래서 크건 작건 가족 가계 안에서의 삶을 통해 거의 배타적으로 매개된다. 이는 사회의 고급 문화의 종교적, 정치적 시맨틱이 일상생활에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의의만 가진다는 것을 의미해야만 한다.[22] 무엇보다 더욱 개인화된 방식으로 문화적 유산에 대한 자기-승인을 가속하는 인쇄된 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더 오래된 사회에 전형적인 포섭과 사회화의 통일성을 보증한다. 누군가의 사회적 삶이 이뤄지는 장소, 즉 집에서 사회화된다.[23]
예의는 도덕의 한 측면이다. 18세기 초반, 사회화로서 ‘좋은 훈육’은 여전히 사회적 삶의 도덕적 자질의 불가결한 기초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적으로 그 자체의 합의를 발전시키는 행위의 전제 조건으로서 고려되었다. 따라서 교육자의 힘든 작업은 거의 가치가 있지 않았다.[24] 가족과 충성심의 관계를 가진 측근 시스템의 경계가 모든 지위에서 실재 생활에서 적용되는 특수한 도덕성에 따라서 지배적이다. 이해되고 기대되는 행위의 범위는 오늘날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사회는 더 평화적이거나 더 통합된 것은 아니다. 더 수용되고 가능한 것은 물리적 폭력이었다.[25]
이는 다시 폭력을 통해 폭력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로서 귀족의 특별한 필수불가결함에 대한, 그래서 정당성에 대한 기초를 형성한다. 이 그림은 곧 이탈리아에 적용되기를 멈췄다. 이탈리아에서 귀족의 도시 기반 라이프스타일은 중세 초기 봉건제의 정치적 해소를 가속화했다.[26] 16세기, 인쇄술의 발명과 보급 이후에[27], 사회적 변화는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기세를 얻기 시작했고, 성층화와 왕정 규칙 사이에 있었던 이전 균형을 해소하는 변화가 일어났다.[28] 한 편에서 귀족의 자기-인식이 성장하고, 지위 차이의 경계는 형식화되고, 가계, 가문, 명예, 결투 그리고 높아진 라이프스타일과 정중함이 낡은 왕정 규칙의 몰락에서 추출되어, 자기-유지 구조로서 제정된다. 마치 이제는 이전 질서의 장치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그 질서는 ‘고전주의적’(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논의한다)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태도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세속적 사유 속에서 문제시된다. 동시에 새롭게 등장하는 포섭에 대한 기능적 맥락의 요구가 증가한다. 16세기 중반 이후, 이런 종류의 다양한 운동이 기세를 모으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1)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법적 장치들을 합리화하는 법적 개혁; 2) 독서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사용하고 또한 동시에 여기에 필요한 가독 능력을 생산하기 위한 종교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영감의 학교 개혁; 3) 가정 생활에 침투하고, 이전에는 수도사에게만 기대했던 의식적인 종교적 삶의 방식(경건함)을 일반적으로 선전하는 종교; 4) 상업적으로 착취 당하는 생산과 화폐 순환에 인구의 더 큰 부분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적어도 5) 이제 수도에 항구적으로 세워진 정부와 관계하여 정치적으로 포섭되어진 인구, 그것이 관심있는 주체라는 지위를 통해서나 아니면 (특히 영국의 경우처럼) 정치적 대표자의 이론들을 통해서건.
마침내 가족도 포섭과 사회화의 새롭게 질서화된 조건들로 향한 이런 경향을 따르기 시작한다. 더 이상 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치에서 개인적 사람을 굳게 정초했던 것은 가능하지 않다. 대신에 포섭에 대한 자신의 야망이 증가하고, 가족만이 제공할 수 있었고, 다른 어디에서도 충족될 수 없었던 어떤 것인 포섭의 정의를 향해 움직인다. 가족은 친밀성의 현장이 된다. 이런 면에서, 우발성, 사회화의 이익, 개인적인, 의미 있는 충족에 대한 요청은 이제 증가할 수 있다.[29] 기능-특정한 요청과 기대들이 증가할 때, 같은 문제는 항상 발생하고, 또한 이제 이 문제들은 가족과 관련해서도 등장한다. 이것들은, 개인적 사람들이 보조를 맞출 수 있는지 맞춘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그들이 이런 증가를 견딜 수 있는지, 견딘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포섭 문제와 일탈적 사회화는 이런 발전과 함께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인지 등등이다. 다른 말로, ‘소외’는 경제 혹은 정치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적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하게 거리를 둔 방식 안에서 행동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의 해법이 가능해진다. 즉 갈라서는 것이다. 그것은 경제의 영역이나 정치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더욱 어렵다. 한 때는 도망칠 수 없는 존재의 형식이었던 것이었지만, 오늘날 가족은 개인이 벗어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기능 시스템 중 하나다.
그렇지만 이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심지어 포섭과 사회화에 대한 증가되는 요구 수준과 연결된 문제들을 더욱 분명하게 제기하는 많은 다른 시스템 영역 중 단지 하나의 시스템 영역이다. 포섭의 이런 차이화 한 형식들의 개인적 궤적과 결과적 문제들은 분기한다. 그것들은 기능-특정적 상황들과 만난다. 이는 종교의 기능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거기서 일상적 경건함에 대한 증가된 요구에 관계되는 증가된 포섭의 노력은 빠르게 ‘잘못된 경건함’의 문제와 ‘진실함’, 신실한 믿음 혹은 진정한 구원에 대한 범주 부족에 이르게 된다. 경제에서는 조응하는 결과적 문제는, 부자와 빈자 사이의 명백하게 성공-기반의 차이에 놓여 있는데, 이는 같은 시스템에 양자가 함께 포섭되는 것을 의심스럽게 한다. 도덕적 범주와 도덕적 사회화는 이런 포섭 문제의 어느 쪽에도 해법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하나를 다른 것에 언급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30] 법적 능력 역시 더 이상 정치적 충성을 보호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정치는 장기에 걸쳐 종교적 사회화에 의존할 수 없다. 이런 주제 모두는, 점점 더 그것들을 함께 다룰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졌음에도, 16세기부터 18세기 후반까지 논쟁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사회�� 변동의 결과로 이해될 수 없었고, 하나의 큰 그림의 일부로 보이지도 않았다.
상호관계가 사회 구조적 발전과 의미론적 발전 사이에 사실상 존재했다면, 포섭과 (대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화의 구조적으로 보장된 통일성에 대한 이런 완화는, 이 영역 안에 위치한 사고와 개념들에 대한 반향을 가져야만 했다. 고결한 삶의 완벽함을 기술하는 문헌이나, 기술된 지혜 안에서, 우리는 완벽성 혹은 지혜의 주체성을 지시하는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척도를 알아야만 하고, 자신의 무지를 인식해야만 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 자신이 독립적인 무엇이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다. 행동과 지식이 주체에 의해 내려지는 결정들에 의존하게 되는 정도까지 이는 변화한다. 이와 함께 포섭과 사회화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이론들에 의해 보여지듯, 낡은 세계는 무너진다. Comenius에서 Schleiermacher와 Herbart까지 교육 이론의 변화가 생각나고, 특히 본성과 재능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교육의 전환 등이 등장한다. 계몽의 지지자들과 중농주의와 같은 경제 철학자들은 자연 질서(ordre naturel)와 그것의 단순한 법칙을 언급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그런 명백하고 자명한 사실들을 정확하게 주입하기 위해서 국민 교육에 대한 추진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패러독스가 지적된다.[31] 여기서 자연과 예술은, 포섭과 사회화 사이게 이미 가시적인 차이를 연결하기 위해 이상하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재결합한다.
신분제의 사회적, 의회에서의 위치에 대한 18세기 후반 마지막 몇 십년에 걸친 논쟁은 바로 이런 특징을 폭로한다.[32] 신분제의 이점은 이제 사회화의 이익으로 기술된다. 그들의 세련된 예절, 사회 문제를 다루는 그들의 우아함, 그들의 억제되지 않지만 그러나 규율 있는 행동, 그들의 지도자의 위치에서 가정하는 용이함, 의무에 대한 그들의 관대함과 준비됨, 그들 이상의 무엇처럼 보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섭인 개인성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신분제적 덕목에 내재한 기대는 사회의 요구와 충돌한다. 이 요구는 기능적 시스템들로 차이화 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사회화는 여전히 숭상되지만, 그러나 더 이상 요구되지는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 요청되는 능력은 개인적 성취로 이해돼야만 하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목적한 교육을 통해 생산될 필요가 있다. 여전히 매력이 발휘되지만, 신분제는 더 이상 필수적인 것이라는 특별한 위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여기서는 이에 대해서 더 살펴볼 수는 없다. 우리의 주제 ‘개인, 개인성, 개인주의’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사회적 포섭과 사회화의 강력한 분리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 사람의 위치를 변화한다고 가정했다. ‘시민 사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계약 이론’은 이미 개인적 사람에게 사회와의 관계를 규제하는데 더 큰 범위와 자유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자연 상태와 문명 상태 사이에 수반되는 차이는, 우리에게 이것이 문제를 지닌 결과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게 한다. 개인적 사람을 개인적 사람으로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개념 안에서 이를 추적할 수 있다. 18세기 후반, 개인적 사람으로서 개인적 사람은, 전통적으로 훨씬 더 일반적인 개념을 이상하게 좁히면서 ‘개인’이 최종적으로 언급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1] 예를 들면, 특히 Emile Durkheim, Lecons de Sociologie: Physique des mœurs et du droit, 2. Ed. Paris 1969, pp. 100ff. 이는 어쨌건 결코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19세기 후반 이론적 논쟁에서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가능했다. 18세기 후반 부르주아지 이론가들은 이미 이 노선에 따라 생각하기 시작했고, 정확히 이런 이유로 (권력의 분산에 기반한) 영국의 의회 모델을 거부하며, 계몽적 절대주의에 대해 개인 재산의 보호와 조장을 보장받기 원했다. 이는 중농주의자 (예를 들면 Folkert Hensmann, Staat und Absolutismus im Denken der Physiokraten: Ein Beitrag zur physiokratischen Staatsauffassung von Quesnay bis Turgot, Frankfurt 1976) 뿐만 아니라 Linguet나 boesnier de l’Orme와 같은 비판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2] 이 논쟁의 맥락에서, Boesnier de l'Orme, De l'esprit du gouvernement économique, Paris 1775, S. 60: 토지 소유권의 불평등은 “fondée sur la nécessité du partage des différens travaux entre les citoyens. De ce partage résulte une épargne prodigieuse de tems et de travail, qui tourne au profit de la societé, par un emploi mieux combiné de ses forces”(시민들 사이에 다른 노동을 나눌 필요성에 기반한다. 이런 분배는 놀라운 시간과 노동의 절약을 가져오고, 이는 힘의 더 나은 결합의 사용하여, 사회의 이익이 된다) 다음 해에는 Adam Smith의 영향력 있는 저작들이 출판되었다. 노동 분업의 등장을 특징 짓는 불평등의 보상에 대한 초점은 경제 이론의 설명과 정의라는 특정화에 의해 자연화 되었다. 이에 맞서 사회학은 다시 반역을 일으켰다.
[3] 이 문제가 되는 경로는 John K. Galbraith와 같은 신고전파 경제학자에 의해 제시되었다. The Affluent Society, Boston 1958. 그들은 이미 해법이 이뤄진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믿는다.
[4] Talcott Parsons, The Social System, New Yor 1951.
[5] 영역자 노트: Luhmann의 두 가지 다른 독어 단어(Einzelner와 Individuum)를 사용하는데, 영어로는 모두 ‘individual’로 번역된다. 맥락에 따라서 Luhmann은 실제 사람에 대한 의미에서 individuals로 혹은 시맨틱 개념으로 ‘the individual’을 언급한다. 이런 두가지 사용법을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후자를 지칭할 경우에는 인용 부호로 번역한다.
[6] Niklas Luhmann, Gesellschaftsstruktur und Semantik, Bd. 1, Frankfurt 1980, S. 21ff.
[7] 특히 인상적인 예에 대해서는 Eleanor Leacock, Status among the Montagnais-Naskapi of Labrador, Ethnohistory 5 (1958), S. 200-209. 또한 A. lrving Hallowell, Ojibwa Ontology, Behavior, and World View, in: Stanley Diamond (Hrsg.), Culture in History: Essays in Honorof Paul Radin, New York 1960, S. 19-52. A. lrving Hallowell, Seif, Society, and Culture in Phylogenetic Perspective, in: Sol Tax (Hrsg.), Evolution After Darwin, Chicago 1960, Bd. 2, S. 309-371; Stanley Diamond, The Search for the Primitive, in: Jago Gladston (Hrsg.), Man's
Image in Medicine and Anthropology, New York 1963, S. 62-115 (93ff.); Fredrik Barth, Ritual and Knowledge Among the Baktaman of New Guinea, Oslo 1975, z.B. S. 25; Theodore Schwartz, The Size and Shape of a Culture, in: Fredrik Barth (Hrsg.), Scale and Social Organization, Oslo 1978, S. 215-251. 개인화 과정에 대한 출발점으로서 Durkheim의 문화적 동질성을 비판한다.
[8] Diamond에 따르면 “마법은 개인 생활의 밀도에서 오히려 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밀도는 사람에 대한 이상한 정교화와 미묘함을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위험한 감수성을 생산한다.” (The Search for the Primitive, pp. 93-94)
[9] 이런 관점에서 Gerald D. Berreman, Scale and Social Relations: Thoughts and Three Examples, in: Fredrik Barth (Hrsg.), Scale and Social Organization, Oslo 1978, S. 41-77은 세 종류의 사회 시스템에 대한 충격적 비교를 제공한다. 그 중 하나는 카스트 기반 구조가 되기에는 너무 작고(너무 개인 의존적이고), 중간은 가장 적절한 사이즈이고, 세 번째, 대 도시는 너무 복잡해서, 개인들은 사회의 질서 압력을 회피할 수 있다.
[10]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바로 이 관찰 자체가 성층 층위에 따라 변한다는 것, 즉 낮은 층위보다 더 높은 층위에 더 강력하게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더욱이 사회가 동시에 중심/주변(도시/농촌)으로 차이화 할 때까지, 본질적으로 고대의 부족적 조건이 농촌 영역에서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11] John W. O'Malley, Praise and Blame in Renaissance Rome: Rhetoric, Doctrine, and Reform in the Sacred Orators of the Papal Court, c. 1450-1521, Durham, N.C. 1979, S. 193에서의 정식화를 따르자면, ‘모든 악을 도덕적 구성 조응물로 감축하는 경향’
[12] Über den Prozeß der Zivilisation: Soziogenetische und psychogenetische Untersuchungen, 2. Aufl., Bern-München 1969.
[13] Essay on the History of Civil Society (1767), 독일어 번역에서 인용: Abhandlung über die Geschichte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Jena 1904, S. 254 f. 루만의 강조.
[14] 그래서 명시적으로 (그러나 개인성이 아니라 접촉의 규제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Elisabeth Colson, A Redundancy of Actors, in: Fredrik Barth (Hrsg.), Scale and Social Organization, Oslo 1978, s. 150-162 (161).
[15] Peter M. Hejl은 Sozialwissenschaft als Theorie selbstreferentieller Systeme, Frankfurt 1982에서 이런 출발점으로 사회적-과학적 개인주의를 구성하려 시도했다. 그렇지만 그는 생물학이라는 이론의 출발점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삶, 의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사이를, 오토포이에틱 시스템의 형성에서 차이화 된 기본적 작동들로 충분하게 구별할 수 없었다.
[16] 상세한 부분은 Niklas Luhmann, Soziale Systeme: Grundriß einer allgemeinen Theorie, Frankfurt 1984, S. 286 ff
[17] 의식의 언어적 집행 과정은 결과적으로 일종의 ‘내부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 의식의 이런 언어적 집행 과정은 어떤 지시적 기능을 지니지 않는다. (Edmund Husserl, Logische Untersuchungen, Bd. Ⅱ, 1 § 8, 3. Aufl., Halle 1922, S. 35 ff.)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어떤 것을 공유하기를 바라는 이고 안에 어떤 대체 이고가 있는 것이 아니다.
[18] 이론 구조의 용어에서, 차이는, 여기서 제시되는 반성들이 Parsons의 표, 즉 통합적 ‘사회 공동체’의 하위시스템과의 관계 이상으로 포섭을 이해하는 것과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상호침투의 개념과 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Niklas Luhmann, Interpenetration bei Parsons, Zeitschrift für Soziologie 7 (1978), S. 299-302.
[19] Klaus Gilgenmann, Sozialisation als Evolution psychischer Systeme, in: Hans-Jürgen Unverferth (Hrsg.), System und Selbstproduktion: Zur Erschließung eines neuen Paradigmas in den Sozialwissenschaften, Frankfurt 1986, S. 91-165.
[20] 특히 영국에 대해서는, Alan McFarlane, The Origins of English Individualism, Oxford 1978.
[21] 예를 들면 Matteo Palimieri, Vita civile, Gina Belloni, Florenz 1982판본에서 재인용; Annibale Romei, Discorsi, Ferrara 1586, 특히 S. 58 ff., 136 ff.
[22] 그리고 인도의 브라만 카스트 혹은 성직자 그룹에서 그리고 특히 유럽의 왕정 질서에서 만일 예외가 발생한다면, 높은 수준의 제의화 그리고 상설화가 매개의 메커니즘이 된다. 그래서 인도의 경우에는 Ananda E. Wood, Knowledge Before Printing and After: The Indian Tradition in Changing Kerala, Delhi 1985. 인도의 경우에 대해 이는 동시에 왜 실용적인 의미에서의 개인성이 탈락자들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다.
[23] 특히 영국에서 다른 가족의 가계가 종종 역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유에서 이런 목적으로 선택된다는 사실(도제)은 이런 논의에서 진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24] “교사의 목소리와 높은 긴장, 명령, 존경과 경외” “멀리서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해를 유지하는데 훌륭하게 사용된다.” Anthony, Earl of Shaftesbury, Characteristicks of Men, Manners, Opinions, Times, 2. Aufl., o. 0. 1714, Bd. 1, S. 73 f. 또한 S. 154: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다른 이들이 그들을 가르치는 무엇이든 배운다. 그들은 수학, 음악, 혹으 어떤 과학이건 대가로 자랄 수 있다. 그러나 오성과 좋은 감각에서는 아니다.”
[25] 이는 오늘달과 달리 모든 지위에 적용된다. 예를 들면 Lawrence Stone, The Crisis of the Aristrocracy 1558-1641, Oxford 1965, S. 223 ff. 부수적으로 이런 사실들은 또한, 개인성에 대한 어떤 측면도 어느 정도 배제하는 폭력의 경향이 사회적 차이화의 형식과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개별 하위시스템 사이의 차이화 혹은 정치 권력의 특별한 강함 혹은 약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해 준다.
[26] 13세기 중반 Aquila와 같은 새로운 도시의 건설은 이런 목적에 기여했다. Fontana delle 99 canelle은 이전에는 성에 거주하던 가정의 새로운 정치적 통일체를 상징한다.
[27] 인쇄술에 의해 작동하게 된 구조적 변화의 의의에 대해서는, Elisabeth L. Eisenstein, The Printing Press as an Agent of Social Change:· Communication and Cultural Transformation in Early Modern Europe, 2 Bde., Cambridge, Engl. 1979; Christopher Small, The Printed Word: An Instrument of Popularity, Aberdeen, Scotland 1982. 물론 이런 요소에 대한 강조가, 그 단일 원인으로 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쇄는 많은 다른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받지 않는 상태를 극복해 종교, 법, 교육, 정치와 같은 개별 기능 시스템에서 인구의 더 넓은 범위에 대한 강력한 포섭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28] 일차적으로 농촌 지역에 대해 언급하는 특히나 인상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Mervyn James, Family, Lineage, and Civil Society: A Study of Society, Politics and Mentality in the Durham Region 1500-1640, Oxford 1976.
[29] 예를 들면 Hartmann Tyrell, Probleme einer Theorie der gesellschaftlichen Ausdifferenzierung der privatisierten modernen Kernfamilie, Zeitschrift für Soziologie 5 (1976), S. 393-417; ders., Familie und gesellschaftliche Differenzierung, in: Helge Pross (Hrsg.), Familie - wohin? Reinbek 1979, S. 13-77.
[30] Johann August Schlettwein, Grundfeste der Staaten oder die politische Ökonomie, Gießen 1779 (Nachdruck Frankfurt 1971), S. 433은 여전히 부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을 자애롭게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이것을 믿을까?
[31] Mirabeau는 영지가 작은 부분으로 나뉘어 소유되는 지역에서 중농주의적 개혁 문제를 지적했던 Carl Friedrich of Baden 후작에게, 그의 영지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시킬 것을 충고했다. 그를 통해 그들은 자연적 질서와 그 법칙을 더 잘 이해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Helen P. Liebel, Enlightened Bureaucracy versus Enlightened Despotism in Baden 1750-1792.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n. s. 55, part s (1965), S. 49. enseignement économique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Nicolas Baudeau, Prémière lntroduction à la philosophie économique, ou Analyse des états policés (1771), Eugène Daire (Hrsg.), Physiocrates, Paris 1846, 1972 재인쇄, S. 657-821에서 인용. 이 주제에 대한 Mirabeau 자신의 더 확장된 논의는 L. D. H. (= L'ami des hommes = Victor de Riqueti, Marquis de Mirabeau), Science ou les droits et les devoirs de l'homme, Lausanne 1774, S. XXII ff., 130 ff.; 혹은 Mirabeau, Lettres sur la législation, Beme 1775, 특히 Bd. 3
[32] 이 시기 독일의 정치적 잡지에 기반한 개괄은 Johanna Schultze, Die Auseinandersetzung zwischen Adel und Bürgertum in den deutchen Zeitschriften der letzten drei Jahrzehnte des 18. Jahrhunderts (1773-1806), Berlin 1925, Vaduz 1965 재출판, 특히 S. 85 ff.
0 notes
Text
치명적 매력? 경제 시스템에서 포섭의 Popular 양식
In Soziale Systeme 8 (2002), Heft 1, S.110-123
Urs Stäheli
번역 – 조은하, 박상우
요약 – 이 논문은, Popular를 젠더, 인종, 성차 혹은 계급 같은 사회-문화적 정체성의 헤게머니적 절합 개념으로 언급하는 주류 Cultural Studies에 대한 대안으로 이해할 수 있는 popular 개념을 제안한다. 문화 연구와는 달리 Popular는 기능적으로 차이화 된 시스템의 보편주의와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Popular는 어떻게 기능적 시스템들이 포섭의 보편주의적 시맨틱과 유혹적이고, 초(hyper)-보편적인 과장 사이의 구별을 사용하는지 기술한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초-보편주의의 새로운 형식을 다룰 시맨틱을 제공한 것은 군중 심리학(예를 들면 르 봉(Gustave Le Bon))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투기와 주식 거래에 대한 담론 분석에서 popular의 이러한 재정의된 개념을 사용할 것이다. 더 유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포섭 과정을 내재적으로 문제화하는 시맨틱에 포커스를 맞춘다. 투자자에 대한 포섭은 유혹의 과정이고 결과적으로 포섭의 불안정한 확장을 가져온다. 어떻게 그런 “대다수(massive)의 보편주의”가 주식 시장 커뮤니케이션 자체에서 생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더욱 더 포섭적인 사회에 대한 현대적 이상과 연결되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그로초 막스(Groucho Marx)는 주식 시장에 매혹되었지만 크게 실망하게 된 이들 중 한 사람이었다. 인터뷰를 통해서, Groucho는 1929년 주식 시장의 대폭락에서 상처 입었는지 질문을 받았다.
Groucho: 예 나는 완전히 날렸어요. 내가 보드빌(vaudeville) 공연을 수년 동안 하면서 저축했던 $200000을 시장이 폭락하고 이틀만에 날렸습니다. 오랜 친구인 Max Gordon이 Great Neck에 있는 집으로 전화했어요. ……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전화를 해서는 말하더군요. “Marx 이제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지요. 나는 다시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Marx 1974)
두 형제들과 비교하자면, Groucho는 언제나 근면한 사람이었다. 도박, 내기 그리고 사치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정말로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저축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했다는 건 더욱 더 주목할 만하다. 그의 아들인 Arthur의 회상에 따르면 사실 Groucho는 문자 그대로 주식 시장에 유혹당했다.
포섭 이론의 관점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이 유혹이다. 어떻게 보통 채권이나 안전 자산(예를 들면 그의 집)을 선호하는 아주 주의 깊은 사람이 어떻게 주식 시장에 그의 저축을 투자하도록 될 수 있을까? 더욱이 투자자가 된 다는 것이 너무 흥분 되어 새로운 투자자들이 그것에 열정적으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일까? 그것을 뒷받침할 어떤 지식도 없이, Groucho는 주식 거래에 관한 거의 모든 팁을 믿었다. 그는 매일 거래소에 가서는 숫자의 주문 아래서 완전히 몇 시간을 보내곤 했다. (Klingaman 1989, 63ff.) Groucho는 주식 시장의 패러독스적 담론에 의해 눈이 멀었고 치명적으로 유혹되었다. 이 담론을 바라보면, Groucho의 매혹은 단순히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담론의 구조라는 것이 분명하게 된다. 주식 시장에 대한 담론은 도박의 popular 논리를 따르지만, 또한 그곳은 ‘심각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unpopular’ 경제의 장소이기도 하다.[1]
‘unpopular’와 popular의 이런 절합은 포섭과 배제의 논의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Groucho의 대폭락에 대한 반응을 본다면 매우 분명하게 된다. 한 편으로 그는 주식 시장 친구로부터의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았다. 다른 한 편 그는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대폭락 이전에 Groucho는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 시스템에 과잉-포함되어 있었다. 아들인 Arthur와 산책할 때 조차, 거래 사무소에 규칙적으로 들렀다. 그리고 새로운 쇼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언제나 주식 시장 뉴스를 찾아봤다. 대폭락 이후에, 그는 문자 그대로 그의 포섭을 되돌리려고 노력했다. 그는 더 이상 경제 시스템의 커뮤니케이션적 주소이기를 거부했다. 이런 숫자 아래서의 어떤 연결도. 그렇지만 Groucho의 이전의 초-포섭은 단순하게 사라지지는 않는다. 거기에는 후폭풍이 있다. 주식 시장으로부터 중요한 소식을 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은 잠자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되었다. 여기서 Groucho에 대한 사소한 심리적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는 완전 연결성에 대한 불가능한 욕망의 문화적 은유로서 불면증을 심각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 * * *
이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질문이다. 우선 Popular에 대한 시스템 이론적으로 다룬 개념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논의에서 시작한다. Popular 담론적 수단에 의해 포섭이 작동한다는 관찰에 이어서, 어떻게 포섭의 보편적 시맨틱이 Popular에 연결되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Groucho의 커뮤니케이션적 거부와 불면증을 진지하게 다루면서, 보편적 초-연결성의 상상들(‘불면증’)과 커뮤니케이션적 붕괴(‘이런 숫자에 대한 연결 중단’) 사이의 연결고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논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어떻게 Popular가 경제 시스템에서 투자자의 포섭적 정체성의 보편화와 함께 등장하는가를 보이고자 한다.
1. 시스템 이론과 Popular
Popular의 개념은 문화 연구의 다양한 분파들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Grossberg 1992; Hall 1981; Williams 1973; McGuigan 1992) 거기서는 자주 억압 받은 이들, 불이익을 받는 이들, ‘파워 블록’에 속하지 않은 이들로 정의된 사람들의 경험에 목소리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2] ‘Popular’는 ‘사람(people)’들이 헤게머니적인 문화적 의미를 재-절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명칭이 되었다. 사람들을 구성하는 이들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종 재-절합과 전환의 생산적 힘으로 특징 지어진다. (비판적 검토에 대해서는 Morris 1988)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적 동학의 주요한 장이 되는 경향이 있다. 파워 블록에 저항함으로써 덜 배제적 행위을 재-코드화하거나 발명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다.
그런 방식으로 Popular를 말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생산하고 재-절합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람들’이라 부를 수 있는 하나의 심급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엘리트나 혹은 전문가에 의해서 생산되고 이야기되는 커뮤니케이션과 다른 것으로 다뤄진다. 커뮤니케이션의 탈-본질화된 개념에 기반한 Niklas Luhmann의 시스템 이론이 ‘popular’를 다시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부분이다. (Stäheli 1999, Stäheli 2003) 그런 포스트 휴머니즘 관점에서, 단순히 탈코드화 하는 코드화 하는 하나의 심급 개념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관점에서 흥미 있는 분석적 질문은 ‘전송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나 ‘수신자가 정확하게 이해했는가’가 아니라 그보다는 ‘어떻게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 다음 커뮤니케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이다.
생산적 심급 혹은 수용적 심급이라는 개념으로 popular를 규정하는 대신에, 문제를 차이화 된 기능적 시스템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연결성으로 이동하고자 한다. Popular는 기능적 시스템의 ‘특별한 보편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맥락에서 특별한 보편주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의 기능적 시스템은, 특별한 관찰 도구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은 그 자신의 작은 ‘존재론(ontology)’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는 그 자신의 하나의 세계가 된다. 예술 시스템은 모든 것을 예술 작품으로서 관찰할 수 있다. 그게 어떤 종이로 만든 박스 혹은 불타는 자동차일지라도. 정치 시스템은 ‘같은’ 현상을 정부의 복지 정책 실패로 관찰할 수 있다. 이런 보편주의는 모든 기능 시스템이 구성하는 중요한 포섭적 정체성의 중심에 있다. 시스템 이론은, 어떤 순수하게 기능적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시스템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자격이 부여된다는 가정에서 진행된다.[3]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젠더, 인종적 뿌리를 이유로 경제적 시스템으로부터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시스템 이론은 계몽의 보편적, 포섭적 수사를 공유한다. 시스템 이론은 포섭의 리버럴 모델이라 부르고자 하는 것을 제시한다. 모든 사람들은 포섭될 자격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포섭될 이유는 없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 밑에 넣어두기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리상 시스템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시스템 이론에서 보통 무시되는 것이 포섭을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커뮤니케이션적 전략이다.
포섭적 정체성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순간이다. 이런 정체성은 포섭 과정에 부착되는 것을 조직해야만 하고, 기능적 시스템의 특별한 보편주의에 맞아떨어져야 한다. 달리 말해, 설명해야만 하는 것은 포섭적 정체성의 중심에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popular 양식이다. 이 포섭적 정체성은 문화 연구의 ‘만트라’라고 불리는 것과 혼동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시스템은 보편주의와 나란히, 그리고 시스템의 보편주의적 입장을 “대표”하려 노력하면서 정체성을 구성한다.[4] 예를 들어 정치 시스템은 포섭적 정체성으로 시민(citizen)을 구성한다. 정치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표상으로 규정돼야만 한다. 정치 시스템의 자기-기술은 가상적으로 텅 빈 표상인 보편적 시민의 구성에 기반한다. 그 표상에는 계급, 젠더 인종은 어떤 관련도 없다. 다른 기능적 시스템에서 동일한 포섭의 표상을 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뒤에 다시 다루겠지만 경제 시스템에서는, 포섭의 표상으로 역할 하는 것이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oeconomicus)’의 표상이다. 이 표상들 모두가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내용을 포기하려고 노력하는 보편적 시맨틱 안에 기입된다는 것이다. 기능적 시스템에 의해 구성되는 포섭적 정체성은 젠더, 인종, 성차 혹은 계급적 경향성을 중립화 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기능적 시스템은 특별한 정체성을 무시하려고 하는 보편화의 장치다.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다고 가정된다. 그렇지만 다양한 포스트 구조주의나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이론, 특히 페미니즘과 포스트 식민주의에 의해 이뤄졌던 것처럼 보편주의에 의문을 던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 Popular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자. 시스템의 기능적 논리의 전개에 의한 보편화는 또한 ‘순수한’ 포섭적 정체성의 오염 가능성에 대한 능동적인 표시 해제다. 예를 들어 보편적 시민은 보편화 된 특별한 위치다. 백인, 서구의 이성애적 남성이라는. 이런 관찰은 또한 정체성의 문제가 왜 시스템 이론에서 사실상 전면에 있지 않은가를 보여준다. 성공적으로 기능적으로 차이화된 사회를 가정한다면, 포섭적 정체성은 언제나 이미 표시 해제된다. 그들은 다른 정체성 형식들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개념적으로 잘 방어한다. 젠더 혹은 계급 같은 정체성은, 시스템의 핵심에 속하지 않고, 시스템의 배제 프로그램 안에서 보조적 도구로서 재-등장할 뿐이다.
어떻게 이런 표지 해제가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능적 시스템의 보편주의와 함께 등장하는 다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Luhmann에게 이 보편주의는 언제나 ‘특별한 보편주의’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이유는 이들 시스템이 여전히 계급이나 젠더와 같은 ‘낡은’ 정체성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기능적으로 차이화된 시스템이 내재적으로 다루는 유일한 특수성은, 시스템의 특정한 관점을 구성하는 그들 자신의 코드에 있어서의 특수성이다. 그래서 보편주의는 언제나 시스템의 관점(즉 코드)의 특수성에 의해 제약된다. 그리고 포섭의 과정을 조절하는 것 역시 이 특별한 관점이다. 시스템은 어떤 요구 조건 혹은 기준(즉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증명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다. 이런 필수적인 특별주의 역시 문제를 발생한다. 어떻게 해야 포섭적 정체성이 더 많은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을 배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시스템의 특별주의는 피수적으로 가능한 포섭의 범위를 제약한다. (과학은 지루해지고; 정치는 패자들의 타락한 게임으로 보이고; 예술은 엘리트주의자들의 활동이고 등등) 그리고 동시에 자기-기술의 보편주의는 더욱 더 포섭적인 포섭 양식을 필요로 한다.
기능적 시스템의 이런 ‘unpopularity’ 문제는, 우리가 포섭을 단지 특별한 기능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라는 방식으로 개념화한다면 가시화될 수 없다. 그보다는 어떻게 ‘unpopular’한 시스템이 popular하게 되는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어떻게 그들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포섭의 표상을 개방하려고 노력하는지. 제시하고자 하는 Popular의 개념은 일차적으로 주류 Culture Studies에서와 같이 반-헤게머니적 popular 형성의 구성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Popular의 문제를 정치적 정체성에서 기능적 시스템의 포섭적 정체성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popular의 가장 오래된 의미 중 하나가 놀랍게 유용하다는 게 증명된다. Raymond Williams(1976)는 Jeremy Collier에 의한 popular에 대한 흥미로운 정의를 언급한다. (“A Short View of the Immorality and Profaneness of the English Stage” 1968) Collier는 popularity를 “과도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 정의한다. 비록 Collier가 신성모독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싸우기도 했지만, 그의 Popular 개념은, Popular에 대한 비난이라 생각하는 것과 무관하게 대단히 유용하게 남아 있다. 그런 정의가 포섭과 배제에 대한 논의와 관계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것은 포섭이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포섭은 언제나 설득의 과정이다. 그것을 대단히 단순하게 다루자면(Grossberg 1992), 내가 포함되는지 아닌지 문제가 돼야만 한다. Groucho Marx에게서 본 것처럼 포섭은 항상 유혹이다. 포섭은 인지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 지도 위에 기반해야만 한다.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눈부신 과정이 돼야만 한다. 포섭은 단순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언제나 포함되는 것이 실제로 좋은 일이라는 것을 믿게 만드는 담론적 전략을 사용한다.[5]
둘째, 이를 위해서 “과도한 행동”이 사용된다. 시스템 이론에 따르면, 이는 기능적 시스템의 특별히 보편적인 프로그램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의해 사용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는 아직 Popular의 정확한 기술은 아니다. 나타나자마자 보통 잊혀지는 수많은 “과도한” 행동이 있다. 그렇지만 “과도한”이라는 것은 역시 어떤 것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Popular의 개념을 특징짓는 것이 정확하게 이 순간이다. 시스템은 단순하게 과도한 커뮤니케이션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보편주의를 과장함으로써 그것들을 만들어 낸다.
이제 논쟁점은 포섭이 필연적으로 Popular의 두 가지 차원, 유혹과 “과도한” 과장-보편화(over-universalization)에 의존한다. 보수적인 문화적 비판 그리고 또한 선형적인 차이화의 내러티브(Ausdifferenzierung)와 반대로, Popular는 단순한 변형 혹은 기존 표준의 우연한 붕괴는 아니다. 사실 Popular는 시스템의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과도”하다. 그렇지만 그것의 무능력 그리고 그것의 “자리 이탈”은 진화적인 (더 오래된 성층화된 사회의) 나머지가 아니고, 시스템의 외부에서 온 강요도 아니다. 그보다는 이런 과도한 커뮤니케이션은, 그것의 보편화를 육성하기 위해 시스템에 의해서 창조된다. 그래서 과도한 행동은, 기능적 시스템의 자기 기술을 지배하는 보편주의적 욕망을 지원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 때문에(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아닌!) 등장한다.[6]
이것이 “포섭의 공포”라 부르고자 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보편화의 끝이 없는 압력은, 시스템이 포섭의 새롭고 더 넓은 형식을 계속해서 알아내도록 강요한다. 정확하게 기능적 시스템들이 자신의 과거로부터 구성하는 “역사”의 특징은 언제나 더 포섭적인 포섭의 이런 성공 이야기이다. 정치 시스템에서는 시민권에 대한 이전의 매우 배제적으로 규정된 개념 역시 이제는 여성과 어떤 재정적 수단도 갖지 못한 이들까지 포괄한다.
2. 붐비는 보편주의
그렇지만 그런 포섭적 내러티브의 한계는 무엇일까?[7] 어째서 보편적 근대 포섭의 내러티브가 호러 스토리로 바뀐 것일까? 이것은 이론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어려운 문제다. Ernesto Laclau와 Chantal Mouffé의 헤게모니 이론에서, 어떻게 등가물의 연쇄가 통합력을 상실하지 않고 얼마나 멀리 확장될 수 있는가 문제가 된다. (Laclau/Mouffé 1985) 다소 다른 개념으로는, Homi Bhabha가 “People”의 수행적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Bhabha는 민족주의 담론이 목표로 하는 people의 동질성과 보편성이 만일 극단적으로 추구하면, “독재적 군중(mass)의 고전적 신체에 가깝게 되는지 아니면 전체주의적 군중의 그것”에 가까워지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Bhabha 1994, 294)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군중이 되는 이런 위협이 기능적 시스템의 보편적 수사에 대해 외부에서 생산되는 위협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로, 자기-기술의 보편적 동작이 일으키는 위협이다. People을 만드는 수행적 구성은, 국민 국가 원리의 특수성 자체에 의해서만 제약되는 동질적이고 보편적 논리를 따른다. 더욱 더 포섭적이 되는 포섭은 동질적 내면을 이루려 노력한다. “people이 되는 것”이 더 끔찍하고 시끄러운 “군중이 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확하게 여기다. 이는 군중 심리학에 의해 너무나 분명하게 예시되었던 수사적 표상이다.
군중 심리학의 “창립자” 중 한 명인 Gustave Le Bon의 작품을 보면, 주식 시장에 대한 담론에서 또한 다시 나타날 군중의 적어도 세 가지 결정적 특징을 규정할 수 있다.
1. 전염성: 군중은 자급자족적이지 않다. 그보다는 전염과 모방의 논리를 따른다. 바이러스의 유행과 다르지 않게, 군중은 어떤 기존의 사회적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은 구성 요소들의 개별적 특징을 무시한다. 단지 통제되지 않고, 혹은 통제될 수 없이 확산될 뿐이다. 이 전염의 과정은 환유의 논리를 따른다. 그것은 “사고들의 연합이지만, 군중들이 연합한 사고들 사이에는 단지 비유 혹은 계승의 명백한 연결만이 있을 뿐이다.” (Le Bon 1952 [1985], 65f.) 그것은 어떤 기능적 시스템의 합리성도 따르지 않는 스펙타클의 논리다. 그래서 군중은 순수한 감각, 이런 이미지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충격과 쾌락에 열려 있다. 거기에는 역사도, 기억도 없다. 그래서 군중은 사회 시스템의 복잡성과 대조되는 상상적 구성물이 된다. 감염은, 어던 기존의 한계도 무시하는 환유적이고 시각적 연결에 기반해, 보편적 포섭의 논리를 초-보편주의로 전환한다.
2. 제안: 합리적 개인들을 “탈개인화된” 군중의 멤버로 전환하는 가장 결정적인 메커니즘은 제안 혹은 제안 가능성이다. 최면 상태에 있는 사람과 같이, 군중은 “제안을 쉽게 만드는 기대적 관심 상태에 있다.” (Le Bon 1952, 39) 합리적 계산이나 주장 대신에, 군중 속에 사람은, 자기-기술 가능하지 않고, 눈부신 흥분에 쉽게 반응한다.
3. 근대적 현상인 군중: Le Bon의 책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근대 사회에 남은 진화적 나머지가 아니라, 그 보다는 근대성과 함께 등장한 문제다. Le Bon의 군중 심리학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정치적 시스템에서 보편적 포섭의 관념에 반하는 이론이다. People에 기반한 정치는 언제나 더 이상 통제될 수 없는 군중에 의해 위협 받고 홀리게 된다. “민주주의” 혹은 “평등”과 같은 단어는 “마법적 힘”을 가지고 군중을 유혹하는 텅 빈 단어다. (Le Bon 1952, 103) 의회 민주주의의 오류는 “많은 사람을 모아 놓으면 적은 수보다 훨씬 더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가정 자체다. (Le Bon 1952, 187) 그래서 포섭의 영역을 증가시키면 필연적으로 함께 진행되는 필연적 단순화를 무시한 것이다.
* * * *
군중은 보편적 연결성의 유령이다. 어떤 존재하는 경계도 무시하는 열정적이고 맹목적인 모방. 군중은 보편주의의 상상력이 “너무 멀리 밀어 붙였다는 것”, 외부 없는 발본적 보편성으로서 스스로를 상상하는 보편주의를 지시한다. 기능적 시스템의 포섭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은 이런 보편화다. 이런 경우 포섭은 혼란스럽고, 통제되지 않고 가능한 파괴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도입한 Popular의 개념은 두 가지 결정적 차원을 가진다.
a) 초포섭(hyperinclusion): Popular는 기능적 시스템의 보편주의의 결과다. 그것은 아직 포함되지 않은 군중을 포함하기 위해서, ‘과도한’ 그리고 유혹적 커뮤니케이션(즉 눈부신 커뮤니케이션 혹은 경제학 그리고 도박의 시맨틱을 혼합함으로써) 포섭적 과정을 지원한다.
b) 탈차이화: Popular는 보편주의를 강화한다. 그러나 보편주의을 너무 멀리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기능적 시스템의 “특별한 보편주의”은 그 자신의 특별성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다. 기능적 시스템의 자기-기술은 이를 탈차이화의 이미지 안에서 인식한다. 군중 시맨틱이 그 경계를 파괴하는 보편주의의 트라우마적 경험을 다루는 결정적 도구가 되는 것이 여기다.
그래서 Popular는 이 초-보편주의 그리고 실패한 차이화의 잔상을 의미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Popular는 포섭적 보편주의와 다른 기능적 시스템들에 의한 탈차이화 사이에서 이런 구별 과정이다.
3. 공황에 빠진 투자자와 시장 군중
이제 경제적 시스템에서 Popular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자. 가장 명백한 포섭적 정체성으로 보일 수 있는 소비자 표상을 분석하는 대신,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의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런 예를 선택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Friedrich Engels (1967)가 “자본” 마지막 권이 출판된 이후 강조한 것은, 경제의 논리는 주식 시장보다 더 분명하게 포착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주식 거래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가장 눈에 띄고 대표적인 심급이다.[8] 그렇지만 사실 주식 시장에 대한 책을 출판한 것은 Marx가 희화화 했던 다른 사회적 사상가였다. Pierre-Josef Proudhon과 익명의 공저자들은 주식 거래와 다른 주식에 대한 정보 책자와 주식 거래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뒤섞었다.[9] Proudhon은 주식 거래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증권거래소는 근대 사회의 탁월한 기념비다.” (1857, 23) 철학자, 경제학자, 시민 그리고 적지 않은 사회주의적 개혁가들이 문명의 비밀을 연구해야만 하는 것은 이것이다. (“문명의 숨겨진 의지”)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내가 아는 한) 19세기 사회주의 경제학 문헌에서 예외적이었던 Proudhon은 주식 시장과 투기의 존재를 정당화하고자 했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기쁘게 받아들여졌다. 한계주의 학파(예를 들어 Walras)와 함께, 적어도 주식 시장은 경제 시스템의 자기-기술 안에서 중심적 위치를 가정했다. 경제 교과서에서 주식 시장은 종종 시장의 이상적 모델로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 대한 담론은 경제의 보편주의를 가능한 멀리 까지 밀어붙이려 노력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포섭적 정체성으로서 투자자의 표상을 선택한 두번째 이유는 그것이 긴 시간에 걸쳐 매우 배제적 정체성이었다는 점이다. 그것의 개시와 보편화는 미국의 대공황 전이었던 1920년대 첫번째 정점에 이르렀던 현재적 과정이다. 그렇지만 투자자가 더 보편적 표상이 되었던 것은 특히 (인터넷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기술적 양식과 함께 했다.
투자자의 표상에 적용되는 보편주의의 수사학은 온라인 거래소 E*Trade의 연간 리포트에서 가장 분명하게 된다. 이 리포트는 “하나의 혁명에서 다음 혁명으로”라 불린다. 먼저 리포트는 버스 뒷자리에 있는 흑인 여행객의 사진을 싣고 있다. “1964: 그들은 평등이 우리 중 일부에게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음에는 해방 이전의 백인 여성의 사진이 실렸다. “1973: 그들은 여성은 결코 유리 천장을 뚫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로 이는 결론에 이른다. “21세기에 이제 막……개별적인 개인의 금융 서비스를 민주화하고 있다. 혁명은 계속된다.” (Frank 2000, 92) E*Trade 리포트는 포섭과 배제에 대한 논의에서 잘 알려진 두 가지 이슈로 시작한다. 비록 기능적 시스템의 보편적 시맨틱은 바이어스 없는 접근을 주장했지만, 배제는 젠더 그리고 인종적 정체성에 의해 통제되었다. 그렇지만 세 번째 “혁명”과 함께 초점이 변한다.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된다고 고려되는 것은 특별한 사회적 정체성이 아니다. 배제된 이들은 이름 없이 남아 있다. 그들은 아직 더 나아간 포섭에 대한 특정한 잠재성이 아니다. 제시되는 포섭의 기술은 잘 알려진 좌파적 수사학으로 설명된다. 그것은 권한 부여의 문제다. 사람들은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수단과 기술을 가져야만 한다. 연결된 것은 두 가지 다른 담론 전략이다. 첫째, 주식 시장으로 더 접근 가능하게 혹은 “민주적”으로 만드는 “혁명적” 전략. 이 전략은 조건 없는 “개방”을 목표로 한다. 이는 “Wired”의 저자인 Bill Schwartz의 글에서 가장 분명하다. “개방은 좋은 것이고 폐쇄는 나쁜 것이다. 이마에 이걸 문신으로 새겨라. 기술적 표준, 비즈니스 전략, 삶의 철학에 이를 적용해라. 이것이 이후 시대에 개인에게, 국가에, 글로벌 공동체에 대한 성공 개념이다.” (Frank 2000, 61에서 인용)
둘째, 이 전략은 이상적 투자자를 교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권한 부여 기술과 뒤섞여 있다.[10] 흥미로운 것은 어떻게 ‘아직” 특정되지 않는 것이 투자자로 전환되는가 문제다. 포함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모르는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간다. 정확하게 그들이 새롭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그것은 포섭의 짧은 시기 이후에 그들을 문자 그대로 배제할 것이다.[11] “만일 월 스트릿의 투자자로 시작하고 있다면, 주식 시장은 위협적인 괴물이다. 하지만 깊게 숨을 쉬고 여유를 가져라. 우리는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고, 바로 출발점에 대해서 전문가의 충고를 제공할 것이다.” (www.traders.depot) 여기서 주식 시장은 새롭게 포함된 사람들이 사실상 포착할 수 없는 하나의 괴물로 나타난다. 이 괴물의 위협을 피해서 가는 유일한, 패러독스적 방법이 존재한다. 스스로 괴물과 같은 전문가 중 한 명이 되는 것이다. “첫번째 성공적 투자를 이제 만들어라……스스로 투자해서” (www.tradersdepot.com) 투자자는 TV에 나오는 핫 팁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독립적 투자자가 되기 위해 교육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미 스스로 투자하면서 그러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아는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보편적 포섭의 표상이 빠지게 되는 악순환을 사례적으로 보여준다. 포섭되어 가는 사람은 이미 포섭적 정체성 속에 위치한다. 스스로 투자하는 투자자. 그렇지만 동시에 괴물의 은유는 악순환을 중단하기 위해 노력한다. 외부로부터 오면서, 자기-언급적 순환은 엄청난 차이의 파괴처럼 보인다. 새로운 투자자는 괴물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되는 자문과 권한 부여의 기술에 의해 유혹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렇지만 목적은 괴물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 보다는 스스로 괴물 같은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토톨로지적 자기-언급과 괴물 같은 시장에 대한 관계라는 투자자의 두 가지 표상은 Popular의 구별, 보편적, 텅 빈 포섭과 보편적 표상의 탈차이화 사이의 구별을 예시한다.
이 구별에서 괴물 같은 쪽은, 포섭의 ‘민주적’ 보편화가, 경제 시스템의 자기-기술이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무료 운동과 대조된다는 것을 지시한다. 1929년 대폭락의 한 관찰자는, 미국 전체가 폭도가 되었다고 쓴다. 모든 사람들은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에 현혹되었고, 결과적으로 위험한 군중 히스테리로 이어졌다. (G. Selders in Klingaman 1989, 31) 다른 관찰자는, 1920년대 금융적 낙관주의가 “전염병처럼 모두를 사로잡았다”고 쓰고 있다. (Robert Patterson in Klingaman 1989, 30) 그래서 이야기의 앞부분, 투자자의 ‘민주화”와 보편화는 다른 이야기에 의해 채워진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군중 히스테리의 이야기다. 처음 이야기와 대단히 달라 보이지만, 그 둘은 특히 전염이라는 개념에 의해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이는 군중의 통제되지 않은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Le Bon의 ‘군중 심리학’의 핵심 개념이었다. 이제 포섭 자체가 전염병이 된다. 모든 이들은 빠르게 부자가 된다는 생각에 매혹 당했다. 포섭되고자 하는 의지는 풍토병이 되었다.
군중 심리학과 질병이 어휘들이 경제에 대한 담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회학에서 쉽게 간과되지만, Gustave Le Bon은 시장 심리학, 행동 금융 그리고 투자 관련 문헌에서 기념비적인 참고 지점이 되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나온 ‘The Investor’s Anthology: Original Ideas from the Industry’s Greatest Minds’ (Ellis/Vertin 1997)에는 Le Bon의 ‘군중 심리학’과 Charles McKay의 대중적 환상(Popular Delusions)에 대한 책의 부분이 포함된다. 양 자 모두, 그들의 군중에 대한 이론이 Bill Valentine과 같은 투자 은행가 다뤘던 것처럼, “시장이 왜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이라 생각된다. (http://quicken.webcrawler.com / cms /viewers / article/investments /15917)[12]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경제 시스템의 자기-기술에서 ‘군중’ 수사학의 두 가지 차원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1. 풍토병으로서 군중: 군중에 대한 수사학은 병리적 질병과 함께 등장한다. 군중 분석은 시장의 비정상성 그리고 심지어 대폭락에 대한 설명에 도움이 된다. 지배적인 자기-기술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장 모델을 선호하지만, 왜 시장이 그런 가정된 합리성을 따르지 않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그렇지만 동시에 비합리적 시장의 시맨틱은 경제 시스템의 자기-기술에서 언제나 나타나는 담론이다. 몇 가지 예만 들자면, “광적인 부동산 투기…맹목적 열정…재정적 난교…열광적 투기…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병적 욕망…술에 취한 투자자들…바보들의 천국안에서 사는 투자자들” (Kindleberger 1989, 30) 그래서 시장의 “비합리성”은 합리적 논의를 따르지 않고, 감정적 특권을 따르는 군중 행동 탓이 된다. 더욱이 열광적 투기자들은 어떤 합리적 분석 없이 서로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전염 과정에 따라서, 시장은 더 가속화되고 더 과열될 수 있다.[13] 간단하게 말하자면, 군중의 수사학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하게 투자자의 보편주의를 너머 멀리 밀어붙이면 무엇이 일어나는 지에 대한 기술이다.
2. 탈개인화로서의 군중: 그렇지만 군중이 초-보편화만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군중의 수사학은 또한 시스템의 보편주의적 움직임에 저항하는 것을 지시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그래서 군중은, 그것이 포함될 수 없기에, 보편적 개방성의 주자에 대한 존경을 보이지 않기에 하나의 위협이 된다. Thomas Frank는 ‘시장 포퓰리즘’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만들었다. 시장에 대한 담론은 스스로를 people의 목소리로 기술한다.[14] 시장의 people의 외부는 군중의 수사학에 가가운 은유의 개념으로 기술된다. 보통 자신의 개인성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군중 속의 사람과 같이, 시장 속 ‘people’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기본적인 인간적 특징이 부족한 것처럼 나타난다. Popular 경제 담론에서 노동 조합에 대한 자주 사용되는 기술처럼 그들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지 않은 로봇이다. 그들 외부인은 쉽게 조작되고 비합리적이다.[15] 흥미롭게도 ‘people’의 보편화된 표상에 저항하는 것은 더 이상 다른 ‘people’, 공사주의자 같은 적이 아니라, 아직 자신의 의지를 소유한 개인화된 멤버가 되지 않은 people이다. 시장의 이런 외부인은 “멍청한 로봇”이다. “그러나 시장 맥락의 밖에서 people을 다루면 갑자기 그들은 바보가 된다.” (Frank 2000, ⅹⅵ)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외부인의 상을 거의 필수적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쉽게 더 나아간 보편화를 위한 저장소로 사용될 수 없게 하는 것은 보편주의적 수사다.
군중 시맨틱은, 동시에 시스템의 보편성과 외부성을 지시하기 위한 경계적 시맨틱이다. 질병 담론과 탈개인화 담론 모두 포섭의 정상적 표상을 문제 삼는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정상적, 합리적, 공리주의적 투자자는 광적인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투자자와 맞선다.[16] 군중의 병리적 담론은 경제 시스템 외부에 위치한 무언가를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 그것은 조건없는 개방(“열리면, 좋은 것이다”)의 표상, 광적인 모두의 포섭에 관계한 것이다. 시스템의 보편주의에 따른 필수적인 개방은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된다. 비록 그것이 여전히 포섭의 보편화를 육성한다 할 지라도.[17] 그래서 전염은, 잘 정립된 한계가 동요할 때 일어나는 것을 손에 쥐고자 한다.[18] 초-보편화의 결과인 전염은, 노력해서 구성된 투자자의 포섭적 정체성을 개인화 이전의 것으로 전환한다. 투자자는 군중의 한 부분이 된다. Le Bon이 썼듯 군중 속에서, 개인은 모든 특별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단순한 모방과 눈부신 구경거리로 환원된다. 예시적으로 투자자의 구성은 Popular의 구별을 진행한다. 문제가 되는 건 전체-포섭의 포섭적 정체성과 그것의 탈차이화 된 밑면 사이의 절합이다. 보편적인 것은 군중으로 전환된다. 아마도 이런 Popular의 양식을 ‘거대한 보편주의’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Baecker, Dirk (1999): Die Preisbildung an der Börse. Soziale Systeme 5, 287-312.
Bagehot, Walter (1966): Bagehot’s Historical Essays. Ed. N. St. John-Steva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Bhabha, Homi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Engels, Friedrich (1968; orig. 1895): Die Börse. Nachträgliche Anmerkungen zum 3. Band des Kapital·. pp. 917-919 in: MEW 25. Berlin: Dietz.
Ellis, Charles D. and Vertin, James R. (1997): The Investor's Anthology: Original Ideas from the Industry's Greatest Minds. New York: Chichester.
Frank, Thomas (2000): One Market Under God. Extreme Capitalism, Market Populism and the End of Economic Democracy. New York: Doubleday.
Göbel, Markus and Schmidt, Johannes F.K. (1997): Inklusion /Exklusion: Karriere, Probleme und Differenzierungen eines systemtheoretischen Begriffspaars. Soziale Systeme 4, 87-118.
Goux, Jean-Joseph (1997): Values and Speculations: the Stock-Exchange Paradigm. Cultural Values. Journal of the Institute for Cultural Research 1 (2), 159-177.
Grossberg, Lawrence (1992): We Gotta Get Out of This Place: Popular Conservatism and Postmodernism in Contemporary America. London: Routledge.
Hall, Stuart (1981): Notes on Deconstructing ‘the Popular’. pp. 227-240 in: Richard Samuel (Ed.), People's History and Socialist Theory. London: Routledge.
Kindleberger, Charles D. (1989): Manias, Panics, and Crashes. History of Financial Crisis. New York: Basic Books.
Klingaman, William K. (1989): 1929: The Year of the Great Crash. New York: Harper & Row.
Laclau, Ernesto and Mouffé, Chantal (1985):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London: Verso.
Le Bon, Gustave (1952; french 1895): The Crowd: A Study of the Popular Mind. London: E. Benn.
Luhmann, Niklas (1995): Soziologische Aufkärung 6: Die Soziologie und der Mensch.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Luhmann, Niklas (1997): Die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 Frankfurt a.M.: Suhrkamp.
McGuigan, Jim (1992): Cultural Populism. Routledge: London.
Marx, Groucho (1974): Playboy Interview: Groucho Marx. A Candid Conversation with Minna Marx's Third - and Funniest - Son. http://rtf.cracked.com/groucho.html
Morris, Meughan (1988): The Pirates Financee: Feminism, Reading, Postmodernism. London: Verso.
Proudhon, Pierre-Josef (1857): Manuel du spéculateur à la bourse. Paris: Libraire de Gamier Frères.
Nassehi, Armin (2002): Exclusion Individuality or Individualization by Inclusion? Soziale Systeme 8, 124-135.
Stäheli, Urs (1997): Exorcizing the Popular Seriously: Luhmann's Concept of Semantics.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7 (1), 127-146.
Stäheli, Urs (1999): Das Populäre zwischen Cultural Studies und Systemtheorie. pp. 321-336 in: Udo Göttlich and Rainer Winter (Eds.), Politik des Vergnügens. Zur Diskussion der Populärkultur in den Cultural Studies. Köln: Von Halem.
Stäheli, Urs (2003): The Popular in the Political System. In: Cultural Studies 17.
Stichweh, Rudolf (1988): Inklusion in Funktionssysteme moderner Gesellschaft. Pp. 261-293 in: Renate Mayntz et al., Differenzierung und Verselbständigung. Frankfurt a.M.: Campus.
Williams, Raymond (1976):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r. Urs Stäheli, Fakultät für Soziologie, Universität Bielefeld
P.O. 100 131, D-33501 Bielefeld
[1] Popular와 진지한 시맨틱 사이의 구별에 대한 담론에 대해서는 Stäheli(1997)를 보라.
[2] Populist의 입장과 대조적으로 Stuart Hall(1981)은 ‘Popular’가 자동적으로 전복적 힘인 것은 아니고 그 보다는 정치 투쟁의 장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다.
[3] 몇 년 동안 구별의 다른 쪽인 배제 역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cf. Luhmann 1995; 1997, 618-633; Stichweh 1988; Göbel/Schmidt 1997)
[4] 예를 들어 Nassehi(2002)는 포섭이 단지 개인(person)에게 작동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주체를 구성한다고 강조한다. 즉 경제학에서의 공리주의적 주체나 정치 시스템에서 정치적 주체.
[5] 어떤 포섭의 영역이 생산하는 배제만을 지켜보려 한다면, 이 전략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6] 보편주의는 결코 끝에 도달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지만 보편화를 위한 명령은 또한 기능적 시스템에 문제를 창조한다. 왜냐하면 상상화 된 총체를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없이 스스로를 완전한 세계로 상상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언제나 보편주의적 입장에 저항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는 포섭에 대한 위협이나 혹은 잠재력으로 보일 수 있는 무언가 가 존재한다.
[7] 무엇보다, 포섭이 구별의 한 쪽 편에 불과하다는 단순한 사실에 의해 스스로에게 제시하는 논리적 대답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어떤 포섭적 행위에도 필수적인 연관항으로 배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단순히 논리적 해답은 문제에 대한 진정한 답은 아니다.
[8] Engels는 “그러나 이 책이 쓰여진 1865년 이후 오늘날 주식 시장의 역할이 상당히 증가하고 계속 커지는 변화가 일어났으며, 더 발전하면서 전체 생산을……그래서 증권거래소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가장 뛰어난 대표자가 된다”고 썼다. (1967, 917)
[9] Cf. Jean-Joseph Goux(1997)의 Proudhon과 “주식 거래 패러다임”이라 부른 것에 대한 논문.
[10] 이런 권력 기술은 특별한 포섭적 정체성을 구성함으로써 담론의 개방을 닫고자 노력한다.
[11] 어떤 투자 자문은 이렇게 말한다. “이 정점에서 털리는 사람들은 전문적 투자자가 ‘아니다’… 그들은 가정 주부, 점원, 건설 노동자, 농부, 목장주, 젊건 늙건, 부자건 아니건. 그들은 우리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 하나는 그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더 나은 재정 상태를 얻으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J. R. Snell; www.tradersdepot.com) 여기서 전면에 나서는 이들은 이제 막 주식 시장에 포함되는 사람들이다. 한 편으로 “우리와 똑 같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직업, 다른 나이, 그리고 다른 재정 상태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것은 자신들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희망이다. 주식 시장의 내부는 위협적인 동시에 매혹적인 것처럼 보인다.
[12] 그것은 시장의 비합리성에 대한 설명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지에 대한 안내서다. “군중은 우리 나머지에게 기회를 창조한다” (Valentine)
[13] 이런 맥락의 고전적 예 중 하나가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였다.
[14] ‘시장 포퓰리즘’이 주장하는 시장은 정치 시스템보다 더 민주적이다. 그런 담론 안에서는, 외부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상이 존재한다. 한 편에, 시장에 개입하려느,ㄴ 정치적 엘리트, 다른 한 편에는 시장에 포함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자에 대한 논의다.
[15] Frank (2000: ⅹⅲ)는 이 수사학을 비판적으로 인용한다. “그들은 자동 장치, 자신의 주체성이 부족한 인간, 다른 이들의 의지로 채워지는 텅 빈 그릇이다.…” 그래서 경제 시스템의 자기-기술이 정체성 정치의 수사학을 통해 시장에 맞서는 이들을 관찰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 시장에 대해 증오하는 이들은 이제 인종주의자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16] 한 편으로, 그것은 시스템의 보편주의가 ‘너무 나아가는 것’을 상징한다. 경제 이론은 완전히 동적인 시장을 자기-언급적으로 조직되는 것으로 기술한다. 투자자는 다른 투자자를 관찰하고, 이 관찰에 따라 반응한다. (cf. Baecker 1999) 그리고 경제 시스템의 자기-기술이, 시장이 비합리적이고 투자자와 거래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대신 서로를 맹목적으로 모방한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정확히 이 지점이다.
[17] 예를 들어 19세기 후반, 주식 시장에서 인구의 대부분에 대한 최초의 집중��� 포섭이 있었다. Walter Bagehot의 기술은 이야기한다. “광란, 결코 다르게 말할 수 없다. … 이것이 가장 추레한 환경, 그리고 상업적 고려에 의한 추구에 의해 가장 멀리까지 밀려난 이들에게 퍼졌다. 점원, 노동자만이 아니라 하인들까지, 그들이 늙고 병들 때를 위해 모아 놓았던 얼마 안 되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Bagehot 1966, 35)
[18] Williams(1976, 166)가 강조한 것처럼, 군중은 구별을 그리는 것의 실패이며, 실패의 메커니즘은 전염의 병리적 개념이다.
0 notes
Text
현대 사회의 자기-기술에서 토톨로지와 패러독스
Niklas Luhmann, "Tautology and Paradox in the Self-Descriptions of Modern Society" in 『Essays on Self-reference』(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번역 - 조은하, 박상우
자기-언급 시스템은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다. 자기-동일성을 그리기 위해 근본적 구별 스키마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자기-동일성을 향한 스스로의 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이유로 발생할 수도 있고, 매우 다른 구별과 관계할 수도 있다. 특별한 상황 속에 놓아 두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경향을 통한 직접적 자기-관찰에 대한 필요가 생겨나자 마자, “자기-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은 관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 혹은 “텍스트”를 고정하고, 이 가능한 관찰은 이제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더 쉽게 기억되고 전달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더 잘 연결될 수 있다. 독립적이고, 경우마다 생겨나는 자기-관찰은 그렇다고 배제되지는 않지만 덜 중요하게 된다. 경우마다의 관찰은 이제 자기-기술의 선택을 위한 “다양성 풀”을 형성한다. 이는 관념의 진화 동안 테스트될 수 있고, 전통으로 안정화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들은 자기-기술의 전통에 접착될 수 있다. 이는 시스템의 구조적 복잡성의 관점에서 적절성을 상실하지만, 자기-기술들이 중요한 시스템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버려질 수는 없다.
그래서 시스템의 환경에 대한 관계안에서, 시스템의 사회적, 구조적 그리고 의미적 구성 부분들은 반드시 동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체로 자기-기술의 구태의연함과 자기-관찰의 잘못된 방향 지시가 마침내 분명하게 되었다는 것, 심각한 수준의 불일치를 장기간 견딜 수는 없다는 것, 자기-기술에서 리얼리즘의 상실이, 비록 문화적 전통의 타당성이 지닌 원래 수준이 매우 빠르게 회복될 수는 없을 지라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공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 안전하게 보인다. 어떤 경우 건 사회적 자기-기술과 자기-관찰이 사회의 구조적 전환에 따라 어떻게 전환되는지 관찰하고 기술하려고 한다면, 넓은 관점과 조응 하는 추상적 이론이 그런 이행 시기가 주어질 때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단순히 분절된 사회에서는, 자기-기술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의미적 복잡성의 수준은 대단히 낮게 유지될 수 있었는데, 이는 이들 사회가 가계, 부족, 정착지와 같은 매우 작은 단위 주위에서 조직되었고, 더 복잡한 연계는 단지 때에 따라서 기능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주위의 지정학적 공간, 개별 인간, 때로는 놀라울 정도의 대안적 질서로부터 인간 삶의 주어진 질서에 대한 경계를 짖는 신화학에 대한 기본적 지식들로 충분했다. 신화와 종교적 형식은, 우발적 의사 결정으로 가시화되는 과정 없이, 환경 조건, 구조, 이해와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 예를 들어, John Middleton과 David Trait가 이야기한 것처럼, “특히 고대 종교는 세습에 기반한 조직의 제의화(ritualization)인 반면, 대지 종교는 기본적으로 세습 그룹들 사이에 높은 수준의 정치적 상호의존성을 지닌 지역성 혹은 공동체에 기반한 조직의 제의화다.”[1]
의미적 복잡성은, 사회가 더욱 비대칭성과 불평등에 기반하게 될 때까지는 증가하지 않는다. 중심과 주변, 특히 도시와 농촌 지역이 분리되자 마자 사회적 질서의 비개연성은 분명해지고, 만일 정당화가 없다면, 설명이 필요 하게 된다. 이는 특히 위계적 성층화의 경우에 사실이다. 되돌아 본다면, 마치 이런 불평등이 특권적 위치의 정당성에 대한 어떤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아니다. 만일 사회적 구조가 이런 방향에 따라 차이화 된다면, 정당성은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대안적 질서는 결코 사실적으로 상상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마치 사회적 질서가 다른 가능성들 중 하나의 의식적 선택에 기반했던 것처럼, “동의” 혹은 “동의에 대한 필요성”을 가정하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 의미와 사회적 삶의 “좋은 형태”를 결합하는 것은 순수하게 상층 계급, 즉 도시 현상의 문제였다. 사회적 자기-기술은 polis-civitas-civilitas-societas civilis라는 개념, 그리스도 성체 축일(the corpus Chrisiti) 혹은 구원에 대한 다른 전망을 갖춘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개념 혹은 코드화 된 도덕성을 갖춘 집합적 교의(Ständelehre)라는 개념을 통해 표현된다. 그러나 이런 자기-기술 모두는, 그것이 중심으로부터 등장했건 아니면 상층 계급의 자기-개념화로 제시되었건, 사회 자체의 비대칭적 구조를 이용한다.[2]
사회 구조를 사회의 자기-기술과 관계하는 이런 패턴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특징은 사회 안에서 사회의 이의 없는 표상의 기회다. 자기-기술을 발전시키고 순환시키는 단 하나의 위치, 중심이나 혹은 위계적 지도자의 위치, 즉 도시 혹은 귀족의 위치만 존재한다. 사회적 차이화의 비대칭적 형식은 다른 가능성을 신뢰할만하고 효과적으로 배제한다. 이런 환경 하에서,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종교적 개념과 기본적인 정치적 개념 사이의 차이들은 균형을 갖출 수 없다. 그것들은 문화적 시맨틱으로 채용되고, 종종 스스로를 위계적으로 구조화된다. 문화적 시맨틱에서 우선성을 얻는 대신, 종교는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정치적 중심과 연결돼야만 한다. 회고적으로 본다면, 이런 노동 분업은 현대적 경험에 중요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이런 형태의 고급 문화(high cultures)를 구별하지는 않는다. 그보다 과거와 오늘날의 사회 사이에 결정적인 역사적 차이는, 사회적 차이화의 기본적 기능 양식으로 이행하면서, 사회 안에서 사회에 대한 이의 없는 표상의 가능성은 버려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기능적 시스템의 어떤 것도 이제 특권적 위치를 주장할 수 없다. 각각은 스스로의 기능에 추정된 우위성에 따라 사회에 대한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킨다. 그러나 특별한 시스템의 구체적 작업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도 다른 것에 자신의 기술을 부과할 수 없다. 비록 새로운 형태의 차이화가 발전한다면, 즉 기능적으로 차이화 된 시스템들과 기능적 차이화에 대한 저항 사이의 차이 혹은 Habermas[3]의 말에 따르자면, 시스템과 생활-세계(life-world) 사이의 차이가 발전한다면,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것에 따라 사회가 포괄적으로 혹은 적어도 전형적으로 기술할 수 있을 지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적 비교를 통해 본다면, 현대 사회의 특징적 모습은 자연적 표상의 상실 혹은 더 오래된 개념을 사용하자면 구현된 동일성(representation identitatis)의 불가능성이다. 사회의 총체성은 결코 완전하게 표현될 수 없고, 총체로서 실현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표상 개념은 특별한 정치적 개념으로 재구성되었다. 이는 이제부터 표상은 단지 정치적 시스템의 기능적으로 제한된 견해에 따라서 조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자연적 표상이 한 번에 포기돼야만 할 때 사회의 자기-기술은 어떻게 가능하냐는 문제가 등장한다.
이하의 논의에서 내재된 가설은, 사회가 더 추상적인 방식으로 동일성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자연적이고 이의 없는 표상의 상실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18세기에 이성의 신격화가 해법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를 포괄적으로 기술하려는 이런 시도는 실패했다. 추상적 이성의 개념을 통해 동일화 된 사회는 사회적 실체에 대한 구현에 있어 전적으로 비효율적이었으며, 반(反)직관적 효과를 발생했다. 그렇지만 더 추상적인 방식으로 표상의 문제를 재언급 하는 것은 그 임무의 성격에 대응하는 것이고, 고전적인 사회학적 개념에서는 사회적 통일체를 표현하는 문화적 상징주의를 일반화함으로써 증가하는 차이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에 대응하는 것이다.[4] 이성의 원리들의 정식화와 “절차화”는, 특정화가 요구될 때 구체적 결과를 약속할 수 없는 단순한 수단이다. 결과적으로 단지 이성에 반사적으로 매달리거나, 단순히 고집하거나, 한탄하거나, 포기하는 선택만이 남는다. 물론 이성을 포기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는 문화적 시맨틱의 역사적 브랜드에 대해 단순히 충성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에 리얼리티는 그동안 변하고 있다. 어쩌면 사회적 통일체의 이성-지향적 반성의 기능적 등가물, 대안을 찾는 것이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독일 관념론에서 “Ego”의 신격화, 특히 Fichte의 과학에 대한 교의에 따르는 것 역시 적합한 사회적 자기-기술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 그렇지만 “Ego”는 이미 근사치의 관념이라는 수단을 통한 패러독스의 해법으로서 매우 적합하게 이해된다. Ego는 Ego와 비Ego 사이의 차이를 가정하고, 이상적 Ego에 대해 스스로를 “한계 위에서 그리고 한계 안에서”[5] 제시한다. 그러나 더욱 이성을 향해 지향하게 되면서, 사회적 차원은 과정 중에 사라진다. 패러독스의 문제는 지식과 관계하지, 사회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론의 탐구는 종교적 혹은 미학적 그리고 때로는 교육적 이슈에 선점되었고, 경제학이나 정치의 주제는 아니다.
첫째, 우리가 원하는 건 발본적 반성을 통해 이성이 형식주의와 Ego의 관념론을 넘어서는 것이다. 시스템의 동일성에 대해 반성하는 것에는 두 가지 다른 형식이 있을 수 있다. 토톨로지적 형식과 패러독스적 형식이다. 따라서 사회는 있는 그대로의 것이거나 아니면 대신해서 사회는 있는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두 가지 반성 형식 모두 시스템의 관찰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는다. 먼저 이성에 있어서, 반성의 두 가지 형식 모두 가능한 사회적 자기-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적이고 규범적인 의미가 부족하다. 두 가지 버전 모두 생산성에서 결점을 지녔기 때문에, 관찰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추정하거나, 어떤 하나를 선택하라고 추천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중 어떤 자기-기술의 버전이 사회에 가져올 결과를 예측할 수 ��다.[6]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관찰의 관찰 혹은 기술의 기술조차 시스템의 자기-차단에 기여하거나 토토로지적 혹은 패러독스적으로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회적 자기-기술에 대한 구체적으로 고심해 만드는 것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개념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이를 힘들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이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시스템은 자기-언급의 “전개”를 통해 의미 있는 자기-기술에 대한 토톨로지적인 혹은 패러독스적인 장애들을 피한다.[7] 즉 (긍정적 혹은 부정적) 자기-언급의 순환은 중단되고, 마지막 분석에서 설명될 수 없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집합론의 패러독스에 대한 타입-이론적 해법이다. 어쨌건 “탈 토톨로지화” 그리고 “탈 패러독스화”의 과정은 놓여 있는 시스템 기능들과 문제들을 “비가시화”할 것을 요구한다.[8] 즉 비토톨로지 그리고 비패러독스적 사회의 자기-기술들은 개별 계획이나 의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중요한 시스템 절차와 작업이 감춰져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혹은 대신에 문제는, 자기-언급적 시스템의 동일성 문제들 같은 토톨로지와 패러독스를 제거할 수 있는 것 없이도, “이상한 루프”, “얽혀 있는 위계”[9] 혹은 “이중 구속”과 같은 그들의 효과를 회피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자신의 자기-기술이 토톨로지 혹은 패러독스 문제와 마주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사회는 자신의 동일성을 코드화 함으로써 사회 이론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기술에 대한 토톨로지 혹은 패러독스적 접근에 의존하는 것은 선택되면, 매우 다른 의미 시스템이 등장한다. 토톨로지적 접근은 다소 보수적인 자기-기술을 이끈다. 패러독스에 기반한 접근은 다소 진보적인, 그러나 혁명적이지는 않은 자기-기술을 이끈다. 자기-기술의 기본적 문제가 두 가지 접근 사이에 대립을 만든다. 만일 사회가 있는 그대로의 것이라 가정된다면, 문제는 오직 사회를 유지하고, 그 문제를 계속 해결하고, 가능하면 문제 해결 방식을 개선하고, 예상치 않던 난점을 극복하는 것일 수 있다. 다른 한 편 만일 사회가 있는 그대로가 아닌 것이라 가정되면, 그러면 다른 종류의 이론이 제시돼야만 한다. 예를 들어 Marxism의 대중적 버전들 혹은 화물 숭배(Cargo Cult)가 보여주는 것처럼, 미래의 가능성인 사회적 동일성을 어떤 힘들에 의해 가로 막힌 것의 실현으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신에 문제들은 일시적인 비대칭 방식 안에서 다시 언급된다. 그렇다면 구조적-논리적 발전은, 혁명 혹은 진화를 통해서 현재 사회는 “아직 아닌” 것을 실현하는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포괄적 이론으로 정련 된다면, 각각의 버전은, 여기서는 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특정한 난점들에 직면한다. 이 두 버전 사이에 차이 혹은 개념적 정련에 투하된 지적 세련됨의 총량에는 관심이 없다. 그보다 흥미를 끄는 것은 이 두 가지 사이에 보이는 분기 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유하는 특성들이다. 사회적 자기-기술에 대한 토톨로지 그리고 패러독스적 접근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은, 그들이 사회의 기술을 이데올로기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1800년대 등장한 이후, 이데올로기 개념은 다양한 전환이 수행되었다.[10] 먼저 이데올로기는 관념을 통해서 사회적 재생산의 의미적 통제로서 생각되었다. 순수하게 경멸적이고 논쟁적 방식에서 사용된 이후에, 이데올로기 개념은 마침내 사회적인 과학적 수용성을 승인 받았다. 이는 대부분 Marx와 Engels의 덕이다. 그들이 이데올로기의 완벽하게 적절한 개념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개념이 기능적으로 위치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그들의 이론 덕분이다. 그때 이후 이데올로기 개념은 실증적 증거와 비평에 면역을 보이는 특별한 재귀성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들의 잠재적 기능이 드러나자마자, 이데올로기는, 분해로부터 막아주는 일종의 “지원”에 의지하였다. 즉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편향된”(“parteilich”) 것이나 혹은 실용적 지식, 즉 “실천(praxis)”이 되는 이론으로 전파되었다. 사회적 행위를 지시하거나 정당화 하면서, ���데올로기는, 다른 행동 노선이 더 적절하게 보이면 바로 대체 가능한 것이 되었지만 결코 비판에 의해 파괴될 수 없었다.
실용적 중요성은 이데올로기의 핵심 본성과 자기-설명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데올로기적 자기-기술을 관찰하는 것은 더 복잡한 언급의 틀을 드러낸다. 이데올로기는 기본적 문제 정의의 암시성, 의도의 은폐, 근본적 가정의 잠재성에 굳게 기반한다. 사회적 자기-기술의 기술은, 토톨로지와 패러독스의 더욱 근본적인 문제들을 언급하는 대신 이데올로기의 적대성에 직면한다. 경쟁 이데올로기들이 왜 존재할 수 있는 지 설명할 수 있다면, 각각의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통찰적인 전체적 이론을 대표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가장 야심 찬 모델을 제공했던 Marx와 함께, 그것을 만든 성공적 이데올로기들은, 동일성의 문제들을 사회적인 자기-기술이 개념화하는 기본적 (토톨로지 혹은 패러독스적) 형식들에 의지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보인다. 이데올로기는 반이데올로기를 자신의 시스템에 포함함으로써 스스로를 안정화 한다. 보수주의자들이 비판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촌평 이상 아무 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그들 자신의 입장을 지시하면서, 반계몽에 대해 묵인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전략의 변종에 다름 아니다.
초기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주제들은 프랑스 혁명 혹은 현대적인 사회 문제, 특히 빠른 산업화의 결과와 같은 역사적 사건에 의존했다. 사회적 동일성에 대한 이런 새로운 언급 형식은, 그것들이 가능한 장소에서 소재와 주제를 얻는다. 그리고 이는 역사적 상대성과 사회주의 혹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중 어떤 것이 개입되었는지 상관 없이 많은 의견의 점진적 쇠퇴를 이끈다. 그것은 결코 “이데올로기의 끝”을 조기에 알리는 것은 아니었다. 그 보다는 지적 회의주의 그리고 사소한 도덕화를 위한 준비 혹은 프랑스를 생각한다면 문학적 비전술(arcanistics)로의 후퇴가 더욱 유명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자기-기술의 근본적으로 다른 형식들이 성립되지는 않았다. 전에 지배적이었던 이데올로기의 노쇠는 각각의 지지자들에게는 문제지만, 반드시 새로운 제안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장기로는 2계적 시스템 이론적 관찰(즉 사회적 자기-관찰과 자기-기술의 관찰과 기술)이 매우 다른 결과를 생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이미 실재 사회적 지식으로 구현되는 이런 종류의 정련 된 의미론적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단지 이런 관점의 함의를 분명하게 하고, 이런 관점에서 이데올로기 개념을 재정식화 시도할 수 있을 뿐이다.
19세기 다양한 근본적인 구별 스키마들이 특별한 이데올로기적 내용을 위한 구조적 틀로서 발전되었다. 사회의 자기-동일성은, 사회가 무엇인지를 사회는 무엇이 아닌지를 결정함으로써 규정하는 근본적인 구별에 기반한 기술들을 필요로 했다. 이미 18세기에 지배적이 된 권력과 소유 사이의 구별을 따라서, 국가와 사회 사이에 구별을 지시하는 제안이 등장했다. 이 구별을 극복하고, 패러독스 문제의 필연적인 재등장을 독창적으로 억제하려는 Hegel의 시도가 거부된 이후, 국가와 사회 사이의 구별은 19세기 중반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졌다.[11]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의존해서, 이 구별은 국가에 대한 더 많은 혹은 어 적은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만 중세적 사유에 반대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사회 사이의 구별은 또한 경제로 종교를 대신하고, 경제라는 개념을 통해 시대의 미래 전망을 기술하는 것(바로 이런 이유에서 “사회”로서 언급되었던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 개념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 사이이 차이의 동일성에 초점을 맞추는 (토톨로지 혹은 패러독스적) 입장은 비여 있는 채이다. Hegel의 국가 개념 안에 여전히 기억되던, 구 유럽의 societas civilis는 어떤 계승자도 찾지 못했다.[12] 정보 처리 과정을 지시하는 구별 스키마의 매력적인 능력들이 구별되어진 것들의 근본적 통일성에 대한 시야를 막는다. 다른 것을 구별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이해하는 것을 허용하는 숨어 있는 동일성을 위치 규정할 때에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비록 국가와 사회 사이의 구별이 사회 개념을 규정하고, 당시 등장하던 사회학에서 그 구별의 사용을 거의 불가능하게 했음에도, 사회의 “진짜” 이론은 사회 시스템으로서 사회를 초월하는 구별에 의존해 구축되었다. 이 구별은 개인에 대해 다양한 의미에서 사회를 연관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회를 넘어서는(extrasocial) 존재로 개인을 인식했다.
이런 이론화 노선은 이미 새로운 정신 철학과 주체에 대한 개념 속에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은 개인성(individuality)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만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한 편, 모든 사회적 위치와 참여를 추상하는 개인(the individual)의 개념 안에서 나타난다.[13] 그런 개인은 복수의 맥락 안에서 사는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14] 이 추상적 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한 개인은 소외에 대해서, 혹은 실현되지 않은 자유의 약속들에 대해서, 불평등에 대해서 혹은 모든 개인들이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믿는 기준까지 삶을 끌어 올릴 수 없는 사회의 무능력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개인이 더 이상 자연의 고유한 한 부분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대립물로 이해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으로 사회는 그래서 하나의 집합성이라는 면에서 개인과 구별될 수 있다.[15] “집합성”은 아마도 매우 다른 관념들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존재들의 인구에 대해, 국가에 대해, 사회 질서에 대해, 혹은 “자본주의”와 같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회 구성에 대해. 그렇지만 개념적인 엄밀함은 여기서 덜 중요하다.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것의 본성”에 대한 정의를 가능하게 하는 감춰진 구별, 사회 혹은 집합성과 개인성 사이의 구별이다. 이런 기본적 구별이 받아들여지자마자, 정보가 진행되고,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자기-기술이 이 구별의 구체적인 의미와 함의를 표현할 수 있다. 즉 사회와 개인성이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개인적 불만족이 나뉘어진 이데올로기적 맥락 속에서 표현될 수 있다. (즉 보수적 혹은 진보적 맥락들) 사회와 개인성 사이의 기본적 구별은, 변화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불만족과 절망의 이데올로기적 체계화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19세기 후반, 이 구별은 마침내 자연적 진보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학이 현대 사회의 구조적 맥락 안에서 개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자극했다.[16]
국가/사회와 개인/집합성 사이의 두 가지 구별을 비교해 본다면, 양자 모두 같은 기능을 충족한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정보 처리 절차를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놓여진 차이의 통일 그래서 토톨로지와 패러독스의 문제들에 대한 시야를 가로막는다. 사회의 진행 중인 자기-관찰 안에서 정보의 처리 절차는 이런 “구별 방향(distinction directrices)”을 이용하고, 승인하고 전환한다. 이런 구별이라는 수단에 의해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정보”가 된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 사이의 구별이 사회적 질서를 초월할 수 없고, 그래서 단지 하위시스템만을 정의할 수 있는 반면, 개인과 사회 사이의 구별은, 평가할 사회적 조건을 위한 기준으로서 기능하는 영원한 언급 지점을 제공한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시대까지, 이런 절차는 개인과 사회 사이의 대립에 기반한 사회 이론을 창조했다. 오늘날 이런 기본적 틀은 포기되고, 작업과 상호 작용 혹은 시스템과 생활-세계 그리고 주체의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ation)”과 “절차화(proceduralization)” (Habermas) 사이의 새로운 구별들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구별들은, 모든 구별에 감춰진 결정적 통일을 은폐하기 위한 다른 방식일 뿐이다.[17]
그러나 다시 한 번 이데올로기 문제로 돌아가보자. 사전 Geschichtliche Grundbegriffe에 대한 프로그램적 서문에서, Koselleck은, 18세기 중반 이후 구-유럽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시맨틱은 의미의 근본적 변화를 겪었다고 주장한다.[18] Koselleck은 의미에서의 이런 변화의 특징적 모습은, 많은 개념이 이제 일시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이해되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Koselleck의 주장은 이데올로기가 사실 시간화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는 강력한 가설을 지지한다. 이데올로기는 역사적 시간 그리고 사회의 현재 조건에 대한 언급으로 자연�� 대한 언급을 대체한다.[19] 어떤 의미에서 시간화 그리고 “이데올로기화”는 함께, 사회 구조가 더 이상 단 하나의 특권적 표상으로 호환 가능할 수 없게 된 이후 피할 수 없게 된 리얼리즘의 상실을 보완한다.
역사적 시간에 대한 언급에서의 차이는 보수적 그리고 진보적 이데올로기 사이의 차이를 반영한다. 확실히, 사회적 변화를 가속하는 경험은 진보와 보수적 이데올로기 사이의 단순한 적대를 방해하고, 그 적대를 시장 경제 혹은 통제 되지 않는 과학 연구와 같은 사회의 기본적인 내적 동학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혹은 근본적인 인간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 통제가 필요한가와 같은 문제로 전환한다. 빠른 사회 변화는 좌익과 우익 사이에 주제의 교환을 이끌 수 있고, 그래서 문화적 비관주의, 기술 비판, 그리고 “국가”에 대한 호소와 같은 이전에 보수적이었던 주제들이 이제는 기본적으로 좌파 진영에서 논의되고 있다.[20] 그러나 역사적 시간 그리고 현재 사회적 조건 해석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이데올로기적 선택을 구별하는데 결정적이다. (앞에 이야기를 떠올린다면, 토톨로지 그리고 패러독스적 동일성 언급들 사이의 차이를 이것들이 언급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주제의 교환은, 구체적인 이데올로기적 참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것들은 단지 그것의 근거를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회의 현재 상황 해석의 형식 안에서 실현되는 더 근본적 적대를 구현하는 것에만 기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사회적 자기-기술의 시간화와 빠른 사회 변화의 관찰은 진보와 보수적 지향성 사이의 구별을 공격한다. 보수주의자는 실망과 함께 시작하고, 진보주의자는 실망과 함께 끝난다. 그리고 양자 모두 시간으로부터 고통받고 시간 안에서 합의한다. 위기는 이제 어디에나 있다. 극단적인 경우 사회의 자기-기술은, 비록 데이터가 논쟁의 여지가 없을 지라도, “상황의 정의”에 언제나 논쟁의 여지를 남기며 끓어오른다. 기대 그리고 각각의 이데올로기적 대립물에 의존해서, 현재의 사회 복지 수준은 대단히 뛰어날 수도 혹은 불충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추가적 지출의 비용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지적할 이유를 찾을 수도 있고, 요구를 북돋을 수도 있다. 그리고 논쟁은 사실들에 동의할 때조차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포스트 모더니티”에 대한 논쟁에서 보여진 것처럼, 지적 언급은 후퇴할 수 있다. 진보 진영은 그들의 목표가 더 이상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는 것을 애석해하면서 “아직 아닌”에서 “더 이상 아닌”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반면에 보수 진영은 이런 변화에서 이득을 얻고 그래서 더 많은 언급을 포기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한 확장된 시간화는 여전히 우리가 이데올로기에 기대하는 것들을 성취한다. 사회적 동일성에 대해 탈패러독스 혹은 탈토톨로지하는 것. 즉 “순수한” 토톨로지와 패러독스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이데올로기는 사회에 대한 특정한 기술을 제공하고, 행위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티에 대한 논쟁은 곳 지루해졌다. 왜냐하면 그건 새로운 사유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현재의 시간을 흘려 보낼 뿐이기 때문이다.
기능적 차이화로의 이행 때문에 사회에 대한 통찰적 자기-기술이 더욱 문제가 되면서, 변화는 단지 시간적으로 관찰될 뿐만 아니라 사실적 차원에서도 관찰된다. 결과적으로 자연적인 변화 엾는 표상의 상실의 결과로서, 사회는 더 큰 양의 우발성을 다뤄야만 한다. 즉 어떤 사회적인 거시적 행위자도 안전하게 정의되지 않음에도, “의사 결정”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시장 질서와 민주주의는 더 선택적인 의사 결정을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패러독스는 도덕적 패러독스로 다뤄진다. 이는 패러독스들이 의사 결정의 결과로서 관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 경제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이기적인, 이윤-지향 행동이 그럼에도 고결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반대되는 상황은, 공공의 의견을 따르는 정치에서도 사실이다. 프랑스 혁명은 “보수적” 관찰자들에게, 가장 좋은 인도들이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도덕적 버전에서, 패러독스는 역으로 경제와 정치, 사회와 국가로 분배되고, 상응하는 제도들(예를 들어 계약의 자유, 선거)을 거기서 제공한다.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그 자체가 패러독스지만)은 자유의 제도화이다.
그러나 자유의 제도화가 정치적 의사 결정 그리고 이데올로기(먼저 관념이라는 수단에 의한 사회 통제를 의미하는)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채용되면, 새로운 의미적 확실성에 대한 유래 없는 필요가 등장한다. 우발성의 놀이에 저항하고, 패러독스와 토톨로지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재인되는 “불가침 수준”의 질서[21]가 존재해야만 한다. 커뮤니케이션 되는 사회 밖의 위치는 없지만,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절대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의미적 언급을 검토할 수 있다. 이것이 19세기 중반 “가치” 개념의 의미론적 전개의 출발점이다.
가치는 시스템이 관찰하고 행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맹점(blind spots)”이다.[22] 가치의 가치-담기(value-ladenness)가 규정하는 위치로부터 관찰하고, 수요하고, 이해를 정식화하고, 행위를 준비한다. 가치와 대안적 가치 사이, 혹은 가치와 바람직하지 않은 조건들 사이의 구별이 관찰을 위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행위는 가치가 동기를 안정화 하는 의미 시스템 안에 포함될 것을 요구한다. 기치는 깊이, 정확성 그리고 관찰의 범위와 방향성을 개선하지만 동시에 타자에게 그 관찰과 방향성을 관찰할 것을 요청한다. 가치는 동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찰을 비판적으로 관찰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가치”의 개념사는 아직 충분하게 분석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개념은 “Valeur”에 대한 귀족적 에토스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거의 아니다.[23] 그 보다는 경제학이 항상, 감춰진 가치의 더 안정된 양상 안에서 가격의 우발성과 변동성에 대한 기반을 놓으려 시도했던 이후, 경제학에 뿌리를 둔 것에 가깝다.[24] 기본적으로 유일한 문제는 이 기능적 맥락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19세기 중반 이후, 이런 일반화는 도덕, 문학 그리고 미학 영역으로 가치 개념을 확장하면서 이뤄졌다.[25] 결국 가치 개념은, 불일치를 직면하는 일 없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안전하게 가정될 수 있는 타당성의 선호를 지시한다. 시스템의 입증된 “고유값(eigenvalues)”으로, 가치는 자기-언급적 작동의 맥락 안에서도 안정적인 것이 된다.[26]
명백히 가치의 가장 의심스러운 특징은, 그들이 의심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제된 절대적 유용성에 따라서, 가치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암시로서 적용된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정의를 선호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단지 소득 분배에서 더 많은 정의를 요구한다.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협상할 수 있고, 부동의가 있을 수 있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가치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숨어 있다. 가치는 간접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재생산되고 안정화된다. 일반적 가치들이 충분하게 발견하기 쉽기 때문에, 가치의 은폐 역시 부동의를 억압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사람들은 가치의 유용성을 문제삼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 현대 해석학은 불가침의 가치의 새로운 양상에 대한 팬던트로서 발명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종교 시스템에 대한 일 종의 반성 이론으로 등장해, 주체화되고, 마침내 문헌학으로 향하면서, 현대 해석학은 논의 불가능한 것을, 스스로에게 향할 수 있는 순환의 형식(“해석학적 순환)”으로 연결하였다. 해석학적 접근은 또한 토톨로지 그리고 패러독스의 정련된 형식 혹은 자기-언급의 전개를 지시한다. 더욱 분명하게, 자기-언급의 해석학적 형식은, 이러저러한 이데올로기적 담론에 대한 선택을 회피하기 원할 때 선택된다.
그렇지만 가치 개념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은 스스로의 결과와 비용을 지닌다. 일반적 믿음과 반대로, 해석학은 가치 개념에서 실용적 의의를 빼앗는다.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오토포이에시스를 상징화 한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해석학적 접근은 올바른 행동을 추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제나 우발성 상태로 남아 있고, 스스로 가치의 “불가침 수준”에 안전하게 기반할 수 없는 가치 갈등의 해소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27] 이 후반의 주장은, 미리 정해진 위계로서 평가될 수 있는 어떤 가치의 이행적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찰에 대한 대안적인 정식화일 뿐이다. 즉 특별한 환경에 관계없는.
가치의 영역에서, 시간 지평을 “상황의 정의”로 감축하는 것은 무엇이 전역적 가치 변동으로, 때로는 “포스트유물론 (postmaterialist)”과 같은 아주 잘못된 개념으로, 관찰되었는지에 따른다. 명백히 이런 가치 변동은, 현대 사회의 에콜로지 문제와, 사회 복지 수준 유지의 어려움에 의해 확산되는 글로벌 위기에 대한 빠르게 성장하는 인식에 기반한다.[28] 특히 타자 혹은 모든 이들에 대한 공포 혹은 관심의 형식 속에서, 불안은 더 이상 금기가 아니라 공공 이슈가 되었다. 심지어 지금의 시대를 “가면을 벗은 불안의 시대”로 특징지을 수도 있다.[29] 이런 성격 부여가 구체적인 개인의 심리 상태에 대한 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공적 수사에서 가치 언급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공적 이슈로서, 불안은 a priori한 것에 대한 대체물로 발전한다. 즉 불안은 논쟁되지도, 거부되지도, 회복되지도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커뮤니케이션에서 진정성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너는 잘못되었다”고 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안은 그래서 그렇게 다뤄져야 할 것이고, 존경을 혹은 적어도 관용을 만들어 낸다. 그것은 커뮤니케이션할 수 없는 부동의 그리고 그래서 “새로운 가치”에 대한 초점으로 역할한다.
동시에 불안은 토톨로지와 패러독스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가로막고, 전에 언급한 것처럼, 그것에 대한 순수한 반성은 커뮤니케이션을 막을 것이다. 다른 한편 불안은 커뮤니케이션을 해방하고, 이 해방이 제공하는 안도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는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된다. 심지어 커뮤니케이션을 해방하는 불안은 비이성적인 수다쟁이라는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형식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념의 고전적 의미로 이데올로기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적 동일성 문제를 탈패러독스하는 방식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는 언제나 단순한 가치 추천 이상을 제공하기를 요구 받아 왔다. 그들은 인지적 구성 부분, 즉 사회적 조건과 문제들의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 가능한, 인지적 구성 부분은 이제, 기술의 선택, “시나리오”, 세계 모델 그리고 일반적 소환물을 지시하는 불안의 보편적 정식화로 감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식은, 자신의 임의성을 보기 전에 사회의 자기-기술을 종결해야만 한다.
이제까지 관찰과 기술의 논리적인 등가물 그러나 역전된 스키마로 토톨로지 그리고 패러독스를 다뤘다. 그렇지만 토톨로지를 패러독스의 특별한 경우들로 간주한다면, 이런 가정은 문제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사실 토톨로지는 패러독스라고 밝혀졌지만, 반면에 그 역은 사실이 아니다.
토톨로지는 구별되지 않는 구별이다. 그것이 정말로 구별하는 것이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부정한다. 토톨로지는 그래서 관찰을 가로막는다. 그것들은 언제나 이중적 관찰 스키마에 기반했다. 어떤 것은 그 자신이다. 그렇지만 이 진술은 놓여 있는 이중성을 부정하고 동일성을 주장한다. 토톨로지는 그래서 최초의 장소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을 부정하고 그래서 부정 자체는 의미를 상실한다.
이런 고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토톨로지와 패러독스 혹은 탈패러독스와 탈토톨로지의 기능적 등가성을 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정치적 그리고 지적 스펙트럼에서 좌파적 측면에 대한 어떤 선호를 가진다는 자주 보고되는 관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명백히 토톨로지의 전개보다는 패러독스의 해소를 다루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다. (그것은 탈패러독스가 진짜 이데올로기적 지식을 만든다는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그래서 시간화에 대해서 그리고 패러독스와 탈패러독스에 기반한 자기-기술의 문제에 대한 다른 해법이 가능한 지에 대해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 연��에 내재한 주된 질문은, 탈패러독스화가 병리적이지 않고 생산적으로 혹은 악순환 대신 창조적 순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에 있을 것이다.[30] 사회이 모든 자기-기술이 패러독스 아니면 토톨로지에 기반하기 때문에 문제는 패러독스나 토톨로지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언급적 반성을 중단하는 것, 그래서 순수한 토톨로지와 패러독스를 회피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자기-기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문장은 하나의 문장이다”와 같은 패턴을 따라서) “해가 없는” 자기-언급의 잘 알려진 문제는 덜 중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야기했듯 이는 관찰자에게도 패러독스로 보이고 그래서 패러독스처럼 같은 방식으로 다뤄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탈토톨로지화는 탈패러독스화이고, 두 경우 모두 문제는 무한한 것에서 유한한 것으로 정보 부여를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논리학-수학적 방식은 개정돼야만 한다. 패러독스는 (필연적인) 악순환을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순환은 탈패러독스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것이다.[31]
스스로를 관찰하는 시스템 각각의 관찰은 자기-언급적 작동에 대한 내적 한계의 문제에 직면한다. 특히 진실에 대한 철학적 이론에서, 제약 없는 자기-언급의 허용이 토톨로지와 패러독스로 이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대 사회의 자기-기술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데서, 현대 사회가 이 문제와 맞서지만 하나의 문제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인상을 얻게 된다.
몇 가지 회피성 전략들이 관찰될 수 있다. 그 중의 하나인 “주체”에 대한 담론은 사회에 외재적인 경우에 대한 문제를 시뮬레이션 한다. 이는 사회가 결점이 있지만 패러독스가 아닌 방식으로 구성된 환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주체의 역설적 자기-계몽에 대한 Jürgen Habermas(1985)의 뛰어나고 영리한 제시 조차 자기-언급의 외부화에 의존한다. Habermas는 커뮤니케이션 자체에 적용되는 조절적 이상으로서 커뮤니케이션적 상호주관성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마치 자신의 합리성을 제시하는 주체만이 자기-언급의 문제에 직면하는 것처럼. 그러나 제약 없는 자기-언급이 순수하게 논리적인 이유를 통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호주관적 커뮤니케이션의 이상화는 단지 자기-언급적 구성의 과정을 해석할 뿐이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자기-언급은 왜 다른 것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작동해야만 하는가?[32]
Habermas의 이론에 대한 이런 평가는 앞의 논의에서 얻은 결과에 따른다. 사실 기술할 수 없는 것을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회적 자기-기술은 이 사실 자체를 감추지만 그럼에도 자기-기술을 허용하는 의미적 편의를 사용한다. 다른 어떤 것(“사회”, “Gemeinschaft” 혹은 “개인”)과 대립되는 것으로 사회를 규정하는 어떤 구별들은 이런 방식으로 알리바이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데올로기화 그리고 시간화는 이런 알리바이 기능을 위태롭지만 투명하지는 않게 만든다. 가치는 대응하는 설명을 제공한다. 만일 모든 것이 우발적이고 무엇이 자기-언급의 전개를 위한 출발점으로 역할을 하는 지 커뮤니케이션 스스로 테스트해야만 한다면 새로운 “불가침의 수준”이 요청된다.
사회에 대한 자기-언급적 구성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사회학적 계몽”이 어떻게 여전히 이런 환경 아래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어떤 의미 시스템이 기술의 기술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안정화될 수 있을까? 특히 개인의 정신이 관찰과 기술에 대한 유일한 기반이라는 의미에서의 “주체”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사회적 관찰과 기술이 오직 자기-관찰과 자기-기술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의 함의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한 기초는, 사회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행될 수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관찰하는 것과 같은, 어떤 관찰되지 않는 조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있다. 사회의 오토포이에시스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언제나 커뮤니케이션과 관찰 양자 모두에 적용되는 구별의 형식 속에서 관찰된다. (예를 들면, 이것은 이야기되지만,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니다.) 이런 사실적 기초 위에서, 작동과 관찰 사이의 구별이 보편적이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영구적으로 재생산한다고 가정될 수 있다. 사회의 오토포이에시스는, 관찰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동시에 창조하지 않고는 지속될 수 없다.[33] 이 가설의 보편적 유용성은, 관찰 스스로가 오토포이에시스 작동으로서 혹은 사회 시스템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언급의 “자연적” 그리고 “인공적” 제약 사이의 구별은 작동과 관찰 사이의 이런 구별에 기반한다.[34] 시스템이 작동의 가능성을 위한 필연적 조건으로 간주하는 자기-언급의 중단은 “자연적”이라 관찰될 수 있다. 다른 한 편 자기-언급의 “인공적” 제약이, 우발적 즉 다른 대안 중에서 선택으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자기-언급의 자연적 중단은 그래서 자기-언급적 동일화의 패러독스 그리고 토톨로지 문제에 대한 통찰을 가로막는다. 사실 그것들은 이런 문제를 비가시적으로 만든다. 다른 한 편, 인공적 중단은 이런 통찰을 허용하지만 패러독스가 해소된 것으로 가정한다.
자연적/인공적(필수적/우발적)이라는 구별은 언제나 특별한 시스템을 언급한다. 더욱이 그것은 빠른 변화 혹은 학습 과정에 종속된다. 하나의 시스템이 자신의 동일성을 탈패러독스하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불가침의 수준”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필수적으로 간주되는 의미 시스템은 우발적이 될 수 있다. 유럽의 계몽은 이런 종류의 진화 과정이었지만, 주체적 이성의 의미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자기-언급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 더욱이 필수/우발의 구별은, 사회적 시맨틱이 지닌 이전의 의심할 것 없던 기반이 어떻게 진화가 사회적 차이화의 패턴을 바꾸자마자 갑자기 우발적인 것이라 의심받게 되는가를 설명해준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이런 구별은 관찰(자기-관찰)과 작동 사이의 관계,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회와 그 자신의 자기-언급과 기술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관찰자는 자기-언급적 시스템이 패러독스적 방식으로 구성되었음을 깨닫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통찰 자체는 관찰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토포이에시스가 봉쇄된 오토포이에시스를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수하고 제약 없는 자기-언급에 대한 가정은 패러독스를 관찰 자체로 전달한다. 그러한 관찰은 그 자신의 의도와는 모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언급적 구성의 과정에서 중단의 필요성은 관찰의 대상 그리고 동시에 관찰 자체를 탈패러독스화 한다. 지식의 가능성에 대한 모든 선험적 조건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런 통찰은 관찰과 대상을 통일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자기-관찰과 기술을 가능하게 한다.
자기-언급의 자연적 그리고 인공적 제약 사이의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관찰과 작동 사이의 구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비록 양 자 모두 시스템으로서(즉 전개된 혹은 탈패러독스화된 작동으로서) 가능하지만. 자연적/인공적의 구별은, 시스템 자체가 자연적이고 필수적이라 가정하는 것을 관찰이 인공적 그리고 우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속에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찰자는, 어떻게 시스템이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그리고 기능적 대안들이 부족한 자기-결정이라는 인상을 만들어 내는지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래서 그는 종교적 시스템을 탈패러독스화 하는데 기여하는 신의 개념에 대한 기능적 등가를 찾을 수도 있다. (이 책의 8장 “정치 시스템 속의 「국가」”) Heinz von Foerster(1979)의 정식[35]을 사용하자면, 이런 방식으로 관찰자는, 관찰되는 시스템이 그것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통찰이 2계 사이버네틱스가 제공해야만 하는 진정한 인식론적 이익을 나타낸다. 사회-논리적 계몽의 어떤 다른 목표도 잘 알려진 자기-모순으로만 이르게 될 것이다.
Von Foerster의 정식이 궁극적 진리를 표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그것이, 어떤 유형의 사회적 자기-기술이, 인공적이고 우발적이라 드러날 때 조차 적합하다고 입증될 수 있는 지를 결정하기 위한 이론의 출발점을 규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현실인 것은 또한 관찰될 수 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어떤 사회 구성이 획득한 경험은 축적된다. 현대 사회가 18세기 들어 스스로를 관찰하고 기술하기 시작한 이후, 전보다 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어떤 경우에는 부르주아지 운동의 출발 당시부터 관찰되어 왔던 근대성의 부정적 양상들은 이제 이행적 현상이라거나 문명 과정의 피할 수 없는 비용으로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 오늘날 이전에는 사회는 그것의 구조적 선택들의 결과와 충분하게 맞설 수 없었다. 이는 그 자신의 합리성에서 발생한 에콜로지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사실이다. 그래서 자기-관찰과 자기-기술을 명백한 패러독스적 결론 지점까지 끌어올리기에 이른 것처럼 보인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현대 사회를 기술하기 위한 입장을 찾는 것에서, 사회적 운동을 마주하게 된다. 매우 전형적으로 이 운동들은, 그들이 사회에 대해 외부적인 것처럼 사회 안에서 사회와 싸우고자 한다. 키워드 “자본주의”라는 특별한 현상에 대해 조직하려는 시간을 들이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시도 이후에, 소위 오늘날의 “새로운 사회 운동”은 훨씬 더 발본적 관점을 발전시키고 자기-기술에 대해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역사적 상황에 적응한다. 새로운 사회 운동은 더 넓은 관심을 추구하고 그래서 더 이질적인 동기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것은 하나의 통일된 운동으로 그들을 해석하려는 많은 시도를 좌절 시킨다) 그들은 동시에 발본적이고 발본적이지 않다. 그들은 나무를 보존하는 것에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비자연적 방사선을 피하는데, 그리고 삶의 다른 형식에 관심을 가진다. 종종 이런 운동들은 모순적 방향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그들은, 그들의 적들이 지닌 순수한 경제적 합리성을 비판하면서 에콜로지적 목적을 추구한다. 혹은 이런 운동은 내부적으로 분열한다. 예를 들면 여성 운동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는 평등 주제는 순수한 부르주아지 요구와 절합된다. 반면에 여성성의 시맨틱에 대한 추구는 완전히 다른 삶의 형식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다. 이런 운동은 Marx가 상상하고 도전했던 어떤 것보다 더욱 급진적인 사회 비판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들은 기능적 시스템의 차이화의 많은 결과들에 관심을 가지고, 만일 그들이 발본적 관심을 가진다면, 기능적 차이화에 대한 비판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기능적 차이화에 대한 비판은 대안의 한계에 이른다. 하나의 사회는 안정성의 원리, 차이화의 패턴 혹은 대이변에 다름 아닌 시스템적 경계선을 그리는 패턴 안에서 변화를 상상할 수 있다. 봉건 질서에 대한 과거의 비판과 같이, 기능적 차이화에 대한 비판은, 진화의 대안적 노선을 지시할 수 없는 도덕적 비판에 머문다. 개선이 항상 이뤄졌고,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 운동은 일상의 문제들에 필연적으로 집착했고, 그것들을 다루는 덜 복잡한 방식이라는 점에서만 다를 뿐이다. 그들의 반공공성은 스스로를 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서, 대항하는 부르주아지 공공성과 활발한 교환에 의존한다. 새로운 사회 운동은 그들의 도덕성에 대한 지나친 과정이나 자기-제시의 관례적이지 않은 기술을 선택함으로써 공중의 승인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들은 어쨌든 인정되었고, 이는 항상 사회와 맞선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발생한다.
대안적 운동의 비밀은 그들이 어떤 대안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이들과 그들 스스로에게 이 사실을 은폐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탈패러독스에 기여한다. 그리고 명백히 이런 기여는 다소 생산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1] John Middleton and David Trait, eds., Tribes Without Rulers: Studies in. African Segmentary Systems (London: 1958), p. 25.
[2] 게다가 Edward Shils (1961)는 정확하게 중심과 주변의 분리에서 발생하는 중심 문제는 문화의 뒤섞임이라 언급한다. Shils, "Center and Periphery," The Logic of Personal Knowledge: Essays presented to Michael Polanyi (London: 1961), pp. 117-131
[3] Jürgen Habermas, Der Philosophische Diskurs der Moderne: Zwölf Vorlesungen. (Frankfurt: 1985).
[4] Talcott Parsons, "Durkheim's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Integration of Social Systems," in Kurt H. Wolff. ed., Emile Durkheim, 1858-1917 (Columbus: J960), pp. 118-153.
[5] Johann G. Fichte, ''Grundlage der Gesamten Wissenschaftslehre,'' in Johann G. Fichte, Ausgewählte Werke in Sechs Bänden (Darmstadt; 1962), 1:509.
[6] 관찰자에 대해 생겨나는 그런 딜레마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Frank R. Stockton, The Lady, or the Tiger?, and Other Stories (New York: 1969)를 보라.
[7] Lars Löfgren, "Some Fundamental' Views of General Systems and the Hempel Paradox," International Journal of General Systems (1978), vol. 4; Lars Löfgren, "Unfoldment of Self-Reference in Logic and Computer Science," Proceedings of the Fifth Scandinavian Logic Symposium (Aalborg: 1979)
[8] Yves Barel, "De Ia ferméture à l'ouverture en passant par l'autonomie?" in Paul Dumouchel and Jean-Pierre Dupuy, eds., L'Auto-Organisarion: De la physique au politique (Paris: 1983), pp. 466-475.
[9] Douglas R. Hofstadter, Gödel, Escher, Bach: An Eternal Golden Braid (Hassock, Sussex, England: 1979)
[10] Ulrich Dierse, "Ideologie," in Joachim Ritter. ed.,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asel and Stuttgart: 1976, 4: 181-185); 그리고 Ulrich Dierse, "Ideologie," in Otto Brunner et al., eds.,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Historichis Lexikon zur Politisch-Sozialen Sprache in Deutschland (Stuttgart: 1982), 3: 131-168.
[11] Emst-Wolfgarng Bckenförde, "Lorenz von-Stein als Theoretiker der Bewegung von Staat und Gesellschaft zum Sozialstaat,'' in Staat und Gesellschaft (Darmstadt: 1976), pp. 131-171. Lorenz von Stein, Geschichte der Sozialen Bewegung in Frankfurt von 1789 bis auf Unsere Tage (Leipzig: 1850)
[12] Niklas Luhmann, Die Unerscheidung von "Staat und Gesellschaft": Vortrag auf dem 12th Weltkongress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Athens: 1985)
[13] 여기서 개인성의 구성 역시 자기-언급적 동일시에서 전형적인 토톨로지와 패러독스적 문제들을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마찬가지로 탈토톨로지 그리고 탈패러독스의 전략, 그리고 의미 있는 자기-동일시의 전략이 개인적(personal) 시스템에 대해 고안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성을 규정하는 “무의식”에 대한 의미적 경로 혹은 이중 혹은 다중적, 즉 개인과 사회적 정체성의 이론들.
[14] Loredana Sciolla, ''Differenziazione Simbolica e Identita," Rassegna Italiana di Sociologia (1983), 24:41-77
[15] 집단주의에 대한 개인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19세기 후반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명백히 이런 구별은 개인주의와 대립하는 입장들 (사회주의/공산주의/집단주의) 사이에서 더 차이화 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서는 Rauscher, "Kollektivismus, Kollektiv," in Joachim Ritter, ed., Historisches Worterbuch der Philosophie (Basel and Stuttgart: 1979), 4: 884f.
[16] Otthein Rammstedt, "Zweifel am Fortschritt und Hoffen aufs lndividuum," Soziale Welt (1985), 36:483-502
[17] 이에 대해서는 계몽에 대한 주체-지향적 프로그램의 패러독스적 결과에 대한 Habermas의 엄격한 비판을 보라. (Der Philosphische Diskurs) 그러나 그의 비판은 비패러독스적 개념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낳는다. Habermas는 커뮤니케이션적 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패러독스의 문제를 피한다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자기-언급이 패러독스를 피할 수 있도록 제약되는 것일까? 나에게는 자기-계몽적 주체와 그 대립물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 일반적인 자기-언급적 시스템의 패러독스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추상적 분석을 가로막는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케이션적 이해의 패러다임은 커뮤니케이션과 이해에 대해 충분하게 입증되기 어려운 문제적 방식으로 제시된다. 사회적인 자기-기술의 기술로서, Habermas의 패러다임은 그 자체 패러독스로 바뀐다. 그리고 내가 Heinz von Foerster를 따라서 “2계 사이버네틱스”라 부르는 관찰 양식을 통해 다뤘던 것이 바로 이 문제다.
[18] Reinhart Koselleck, "Einleitung," in Otto Brunner, Werner Conze, and Reinhart Koselleck, eds.,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Historisches Lexikon zur Politisch-Sozialen Sprache in Deutschland (Stuttgart: 1972), 1: xiii-xvii.
[19] Jürgen Wilke, Das "Zeitgedicht": Seine Herkunft und frühe Ausbildung (Meisenheim: 1974)
[20] 기술 비평에 대해서는 Ortwin Reno, "Die Alternative Bewegung: Eine historisch-soziologische Analyse des Protestes gegen die Industrie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Politik (1985), 32:153-194, 실정법과 국가에 대해서는 Dieter Grimm, "Reformalisierung des Rechtsstaates als Demokratiepostulat," Juristische Schulung (1980), 20:704-709.
[21] Hofstadter, Gödel, Escher, Bach.
[22] William James, "On a Certain Blindness in Human Beings," in The Works of William James (Cambridge: 1983), pp. 132-149.
[23] 비록 18세기에 “힘(force)” 혹은 “활력(vigeur)”에서 “효용(utilité)으로의 변화 같은 것이 관찰되지만, Abbé Morellet, Prospectus d'un Dictionnaire de Commerce (1769, reprint, Munich: 1980)
[24] 물론 이런 시도는 매우 다양한 이론들에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서는 Rudolf Kaulla, Die geschichtliche Entwicklung der modernen Wertthearien (Tübingen: 1906).
[25] 18세기에 이미 매우 넓은 가치 개념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Jacques Pernetti, Les Conseils de l'amitie, 2d ed. [Frankfurt: 1748], 그의 정의는 의무와 쾌락, 명예와 삶, 건강과 부 등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는 공리주의적 인류학의 맥락 안에 위치한다.
[26] Heinz von Foerster, Observing Systems (Seaside, Calif.: 1981).
[27] 가치와 프로그램을 구별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Niklas Luhmann, Soziale Systeme: Grundriß einer allgemeinen Theorie (Frankfurt: 1984)를 보라.
[28] ''새로운 가치의 주된 원리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Walter L. Bühl, Okologische Knappheit: Gesellschaftliche und technologische Bedingungen ihrer Bewältigung (Göttingen: 1981)
[29] Werner D. Fröhlich, Angst: Gefahrensignale und ihre psychologische Bedeutung (Munich: 1982).
[30] Klaus Krippendorff, "Paradox and Information," in Brenda Derwin and Melvin J. Voigt, eds., Progress in Communication Sciences, 5:45-71.
[31] Charles S. Chihara, Ontology and the Vicious-Circle Principle (Ithaca, N.Y. : Cornell University Press, 1973)
[32] 만약 옳다고 해도, 이런 이상화가 커뮤니케이션에 적용된다는 주장은 문제를 풀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언급 역시 커뮤니케이션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33] 스스로를 관찰하기 위해서 귀속이라는 수단을 통해 행위를 규정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 보이다. Luhmann, Soziale Systeme
[34] Löfgren, "Unfoldment of Self-Reference."은, 탈패러독스의 자연적 형식 혹은 인공적 형식 중 어떤 것을 다룰 지 결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묵시적으로 이런 구별을 주장한다.
[35] Heinz von Foerster, "Cybernetics of Cybernetics," in Klaus Krippendorff, ed., Communication and Control in Society (New York: 1979), pp. 5-8.
0 notes
Text
『사회구조와 시맨틱』 3권, 서언
Niklas Luhmann
번역 – 조은하, 박상우
『사회구조와 시맨틱』이라는 테마 영역에 관한 기존 두 권의 책과 『정열로서의 사랑』에서, 나는 구조적 변동과 시맨틱 상의 변동이 연동하고 있다는 것을 구명하고자 했다. 양자의 연동은 중세 말기의 신분 사회로부터 근대 사회로의 이행을 수반한 것이었다. 독��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책에서 이 연구는 더욱 추진되고 있다. 연구의 이론적 틀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구조적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라는 시스템의 편성 교체는 사회 시스템 차이화 형태의 전환으로서 기술된다. 즉 계층 차이화에서 기능적 차이화로 1차적인 차이화가 이행한 것으로서 기술되고 있다. 작동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 편성 교체는 사회 그 자체에서 수행돼야만 한다. 그렇다면, 살아서 활동하는 사회가 그러한 변화를 이루고 추진한다는 것이고, 다른 비유를 사용하자면, 바다를 항해 중인 배의 선체를 교체하려 하는 것이다. 그를 위한 유일한 수단은, 사회 그 자체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작동 방식, 즉 커뮤니케이션이다. 사회라는 시스템의 안정성의 원리는, 시스템 차이화의 형태에 있다. 왜냐하면 시스템 안에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만으로 진화가 짊어지는 부하, 즉 사회라는 시스템과 그 환경의 고도한 복잡성을, 의미에 기반한 작동으로 변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 유의한다면, 차이화 형태의 교체는 (엄밀하게 시스템 이론적인 의미에서) 일종의 <카타스트로피>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단지 수리가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지원 없이 토대부터 다시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한 가설은, 행위의 동기 부여 수준에 서는 것은 아니고, 인과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 이 가설이 사용하는 것은, 사회구조와 시맨틱의 구별이다. 출발점이 되는 것은, 시맨틱(즉 유의미한 지시대상을 가진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있어서는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완만하게 뒤섞이고, 다른 것과는 다른 시간적인 리듬을 성립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례 연구에 기반해서 밝히고자 하는 셈이다. 시맨틱은 아직 구조적 지주가 되는 기능의 틀에는 맞춰지지 않고, 그 때문에 언제라도 버려질 수 있는 혁신적 시도를 해치우는 것이다. (나는 이 점을 『정열로서의 사랑』에 있어서 결혼의 동기로서 널리 사용되게 되는 이전 사랑의 시맨틱에 대해서 보였던 것이다) 시맨틱은 또한 이미 오래된 것이 되어 버린 관념과 개념,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구조전환이 급속하고 근본적인 것이라는 것을 은폐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Societas civilis나 civil society라는 개념은 18세기까지 계속 사용되었지만, 잘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개념의 사용은 오늘 날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시맨틱은 구별에 있는 반대 개념을 교체하고, (그 구별에 있어서) 스스로에 있어서 중요한 항을 유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자연/기술이나 자연/은총 이라는 구별에 있어서, 한 쪽만을 교체해서 자연/문명으로 한다) 시맨틱은 복수의 구별(예를 들면 사적/공적이나 비밀/공개)을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들의, 또한 복수의 유사한 트릭을 사용해서, 지속성에 대해 강한 인상을 주고, 변화한다고 하는 인상을 약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것이 행해지는 것은, 특히 18세기였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 <문화>라 불리는 사태는, 변화에 앞선 것이기도 하고, 변화의 뒤를 쫓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변화를 예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변화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사정은 시끄러운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기도 한다. 이러한 관념 진화는 (예를 들면 신학, 경제, 법, 정치, 미학이었던) 부분 영역에 준거한 변화에 의해서 완수되는 것이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 영역에 준거하는 것에서, 변화의 거점으로서 충분한 컨텍스트가 얻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 그 자체의 구조 전환은 동시대의 사람들에 의한 관찰과 기술로는 다뤄지지 않는다. 사회의 구조전환이 완수되고, 실제로 뒤돌아갈 수 없게 되면서 처음으로, 시맨틱은 지금이야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된 것을 기술한다고 하는 과제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 때문에 유럽에서는 1800년경에 역사와 이데올로기라는 댓구 형식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예시한 구별의 테마 영역을 넘어서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였지만, 새로운 사회 편성이 현실에 수반하는 귀결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일러도 이 19세기이고, 그것이 전면적으로 밝혀지게 된 것은 잘 해야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어떤 시매틱 -이제는 이것을 <사회학>이라 불러야 하겠지만- 에서, 이러한 사태를 새로운 구별을 사용해서 사회이론에 의해서 적절하게 다룬다는 과제가 부여된 것이다.
간결하게 말하자면, 이 책에서 행하는 연구에서는 이 테마를 다양한 사례에 기반해서 논한다. 법의 정통화는 16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서, 소유권의 과제에 관한 관한 법원을 둘러싼 법해석학의 발전과 병행하는 형태로 논의되었다. 그래서 이미 법의 정통화는 차이 개념을 사용한다고 하는 조건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지만, 기원을 이야기하는 신화의 형식으로 이야기되어 정리되고 있다. 다른 한 편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화폐만을 통해서 통합되는 경제 시스템의 차이화를 지탱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고도로 분화된 정치 시스템은 이미 <국가>라는 새로운 술어를 만들어 냈지만, 이 <국가>라는 개념을 투영한 것은 기존의 시민사회였다. 사회(Gesellschaft)라는 사회 시스템(Sozialsystem)에 대한 인간의 입장은, 포섭으로부터 배제로 교체되었다. 이 교체는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수행되었지만, 이 개념에 강한 평가 부여가 주어져서 <주체>로 변모했기 때문에 이 교체를 올바르게 보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체>로 가치 부여가 이뤄진 결과, 소외를 한탄하고, 또한 그러한 것을 다루는 풍조가 생겨난 것이다. 꽤나 일찍부터 개시되었던 종교 시스템의 분화는, 종교 자신이 협력하는 사회의 도덕적 통합에 관한 문제들에 직면하는 것에서, 도덕에 대해서는 국외 중립의 입장을 취하는 독자의 코드 유지에 위험이 미치는 것을 피하는 것이 가능했다. 도덕 그 자체의 기술은, 윤리학으로서 정식화되었다. 이것은 증대하는 복잡성과, 반성 이론의 발전에 수반해서 생겨난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의 저하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반성이론이 수반한 것은, 더해져서 하나였던 도덕과 매너의 분리였다. 또한 이 이론은 도덕적 판단의 근거 규정만을 스스로의 일로 보았던 것이다.
이 책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경험적인 자료는, 인쇄물로부터(그렇지 않는 편이 좋았을지도 모르지만) 얻은 것이다. 인쇄가 없었다면, 이 책에서 그리던 전환은 성립할 수 없었을 것이다. 확실히 자료의 선택은 우연에 좌우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방대한 텍스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텍스트에 눈을 돌렸고, 나아가 2류의 텍스트를 언제나 제1급의 텍스트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것으로서 유포되었던 시맨틱을 보려하고자 했다. 부언한다면 제1급의 저작자들에 전념한다면, 통제의 효과가 없는 선택 효과가 생겨날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개개의 저자에 대해서 면밀한 해석을 수행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을 그 인물에 귀속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태에 해당하는 정당한 처리 방식은 아니다. 그 보다 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회는 어떻게 해서 선택된 테마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가를 다루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통상 2차 문헌으로 보였던 것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알고 있다. 또한 그 때문에 각각의 시대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 관념사 연구자나 전문의 역사가로부터의 비판을 초래할 것이다. 나는 자기자신의 연구 방법에 특별한 <방법론>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보는 것은 그 보다는 이론을 기초로 다룰 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일종의 연구방법이다. 즉 사회만이 커뮤니케이션한다고 하고, <저자>라는 형상은 나아가 이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인공물에 다름 아닌 것은 아닐 지 생각하는 연구방법인 것이다.
1988년 12월 빌레펠트에서
니클라스 루만
0 notes
Text
2014년 1월 구입도서




-새해 첫 도서 구입은 마르크스주의 연구서와 자주 구입하는 잡지 現代思想. 우선 『現代思想』 (青土社, 2023)은 12월 "感情史" 특집, 생각과 달리 대부분의 필자가 일본 학자들이라는 점에서 놀랐는데, 감정사라는 주제로 책 한 권을 채울 사학자들이 이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것도 다양한 지역과 시대를 가로질러 이렇게 '감정사'라는 방법적 접근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신기하네. 그리고 연말에 항상 나오는 신년 특집. 언제나 새해 주목되는 새로운 학자들이나 학문 영역을 소개하는 특집이었는데, 올해는 새로운 시도로 "ビッグ・クエスチョン, 大いなる探究の現在地"로, 특집 제목 그대로 다양한 큰 주제의 질문을 탐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왜 사람을 죽여서는 안되는가?",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같은 층위에 질문에서, "인간과 동물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사람은 왜 우주를 목표로 하는가?"나 "전쟁 없는 평화는 가능한가?, "더 우수한 정치체제는 무엇인가?" 등등. 예전에 도쿄대 교양 교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 학문적 도달점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것의 조금 더 최신 버전인 듯.
-다음은 John Holloway를 조금씩 보는 김에 다시 일본 마르크스주의 연구서도 구입. 우선 우리나라에서도 꽤 알려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사사키 류지(佐々木隆治)의 『マルクスの物象化論』 (堀之内出版 新版, 2021) 그 동안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한 편에서는 다른 정치경제학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게 해석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소련 등의 교조적 해석에 의해 오염되었던 반면, 마르크스의 수 많은 초고로부터 '온전하게' 마르크스주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 방향에서 가장 충실한 학자가 오타니 데이노스케(大谷禎之介)라 생각하는데, 사사키 류지 역시 이 연장선상에 있는 학자다. 국내에서는 '하필이면' 정성진 교수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상하게 외면 당했던 듯. 별 거에 다 정파성이 작동했던 남한 마르크스주의 연구 풍토였는데 지금 모두가 함께 망한 걸 생각해 보면 뭐... 뭘 선택했건... 다음은 수미다 소이치로(隅田聡一郎)의 『国家に抗するマルクス』(堀之内出版, 2023) 마르크스의 국가론을 짚어 보는데, Holloway의 이론적 바탕 중의 하나인 '국가도출논쟁'으로부터 '어소시에이션', '어셈블리 코뮤니즘'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Holloway를 보면서도 그렇지만, 노이쥐스나 히리쉬의 주장을 다시 보자니 흥미진진. 한동안 알트파터 논문들에 매달렸던 추억도 떠오르고...
-새해 목표는 더 빨리 책들을 읽고 치워버리는 것으로... 최소한 사는 속도보다는 빠르게 읽어야지...
0 notes
Text
신용하와 Pseudohistory



- 오랜 시간 경제, 사회사를 중심으로 역사 연구를 해왔��� 신용하 교수는 어느 시점부터 고조선에 대한 연구에 천착하더니, 독특한 역사 이론을 세팅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주장을 펼쳤다. 당연히 이런 작업은 우려와 탄식에 찬 반응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70년대 이후 평생 수행했던 작업들, 조선말, 일제 강점기의 근대 사상, 근대화 운동 등에 대한 연구에 대한 신뢰도 떨어져, 이는 이영훈을 위시한 역사 수정주의자들의 좋은 먹이감이 되고 있다.
- 이번에 본 책들은 신용하 교수의 이런 Pseudohistory의 결과물인 『고조선 국가형성의 사회사』(2010, 지식산업사), 『한국민족의 기원과 형성 연구』(2017,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고조선문명의 사회사』(2018, 지식산업사) 등 세 권. 사실상 세 권이지만 같은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반복해서 정리하고 있는 수준이라 한 권으로 따져도 큰 차이가 없다. 주장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전개한다. 첫째는 빙하기 말기 생존을 위해 도달한 한반도 중부를 중심으로 1만 2천년 전 처음으로 농경 사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런 농경 사회의 형성을 통해 앞서간 ‘한(韓)민족’은 이후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적극적으로 북쪽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요동, 요서 지방으로 농경 문화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게 된다. 이런 문명이 요하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예족과 맥족을 통합하면서 B.C. 30세기경 고조선을 건국하게 된다. 둘째는 이렇게 건설된 고조선은 빨리 국가 형성을 이루면서 주위에 다양한 세력들을 제후국으로 삼아 느슨한 연합 제국의 형태를 구축하게 된다. 여기에는 부여 뿐 아니라 이후 몽고족이나 만주족으로 독립 성장하는 부족들도 포함된다. 뭐 이런 주장이다. 가장 중요한 논거는 이융조 교수의 “소로리 볍씨”에 대한 논의, 그리고 요하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홍산문화”와 고조선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복기대의 논의.
-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두 근거로서는 크게 부족하다. “소로리 볍씨’가 정말 이융조 교수의 발표처럼 농경을 나타내는 순화종인 지도 분명하지 않지만, 농경이 지속되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압력(예를 들어 ‘괴베클리 테페’처럼 종교적 목적으로 대규모 인력이 집단 생활을 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고고학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 인정해서 (빙하기에 내려온 이들이 집단 생활을 해야만 했고, 그런 사회적 압력 때문에) 단기적으로 농경을 영위했다 하더라도, 이후 이 집단이 이런 사회 구조를 지속, 발전시켰다는 자료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농업사 연구에 따르면 농업은 결코 우리가 배웠던 ‘농업 혁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수렵, 채취보다 효율성이 떨어졌기에 사회적 압력이 사라지면 언제라도 포기될 수 있는 생산 방식이다. 홍산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이 지역에서 지속한 역사적 흔적이 이후 고조선 사회로도 이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문화 전체를 고조선 문화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특히 최근 유전학적 연구로 볼 때, 홍산문화에서 발견되는 유골들의 유전적 특성이 고조선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양자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 내용적 신뢰성 문제만이 아니라, 신용하 교수의 방법론도 문제다. 아예 판타지에 기반한 ‘환빠’와 달리 일견 증거에 따른 기술을 통해 결론으로 도달하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것처럼 보인다. 보통 사회과학에서는 사건 a, b, c, d가 있고, 개별 사건들에 대해 a로부터 추론되는 가설 A, B, C, b로부터 추론되는 가설 A, D, E, c로부터 추론되는 가설 A, F, G라 하면, 이에 기반해 가설 A를 도출하고, 이것이 독립된 사건 d를 통해서도 반증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A를 잠정적 선택 가설로 택하게 된다. 그런데 신용하 교수는 일단 가설 A를 선택하고, 이에 기반해 사건 a, b, c를 설명한 후, 역으로 a, b, c를 통해 가설 A를 논증했다고 평가한다. 전형적인 순환 논법이다. 물론 반증이 될 수 있는 사건 d는 제외한다.
- 신용하 교수의 pseudohistory에 어떤 신뢰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찾아보는 이유는 “왜”라는 궁금증 때문이다. “왜” 그는 이런 뻔한 pseudohistory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일까? 책 여기저기에서 발견되는 요소들이 그래서 더 흥미가 있다. ‘왜’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것은 ‘역사적 사정’이다. 식민지 경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고통이었을 것은 당연하다. 특히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부분 삭제되어 있지만, 철저하게 제국주의적 사고에 기반해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하던 학자들과 그들의 영향력이 남아 있으리라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들과 맞서 객관적인 형태로 학문을 정립하고자 했던, 그리고 그것이 민족의 정신적 독립에 기여하리라 믿었던 많은 학자들이 해방 시기 북한으로 옮겨간 것 역시 무시하기 어려운 역사적 사정이다. 예를 들어 신석기 유물 탐사의 경우, 해방 전 탐사 연구를 했던 학자들이 대거 북한으로 옮겨 가는 바람에 남한 고고학의 신석기 연구가 7,80년대까지 암흑기를 겪어야 했다는 점 역시 하나의 역사적 사정을 구성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용하가 자신에게 던진 질문, “우리 민족은 어떤 존재인 것일까?”에 대한 대답은 불만족스러운 것임에 틀림없다. 그는 혼자서 이 문제에 답을 하고자 했고, 그런 동력이 조선말기 근대화 운동에 대한 치열한 연구와, 식민지 시기 일본의 침략 과정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지만, 여전히 ‘민족’이라는 문제에 매달리게 되었을 것이다.
-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이승만-박정희로 이어지는 가짜 독립운동가에 친일 군인이 자신의 약점을 덮기 위해 허황된 민족주의적 제스츄어를 내세우고, 이런 동향 속에서 싹튼 ‘환단고기’류의 파시스트적인 민족주의 세력과 정작 이런 시대적 상황에 불만을 품고 민족의 역사에 대해 자신이 답을 내고 싶었던 이의 결과물이 마주하게 되는 역사적 상황은 흥미롭다. 이는 20세기 초 대표적인 민담 연구자, 신화 연구자들이 파시스트적 행보를 겪게 되는 서구의 상황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지적 변동사에 해당하는 것일 텐데, 이 뒤틀린 과정의 지성사를 누군가 정리하면 꽤나 재미있는 일 아닐까 생각된다.
0 notes